
[MD 리뷰 대전] 예술은 누구의 것이지?
하염없이 읽다 - 『시대의 소음』
꼭 읽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읽는 건 소설이나 에세이를 제대로 읽는 방법이 아니다. 서점에서 일하느라 ‘문학 작품’ 읽기가 일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끔 직업이나 이유 같은 건 잊게 되기도 한다. 그런 독서를 ‘하염 없이 읽다’라고 한다. (2017.07.25)
- 글 | 김유리(문학 M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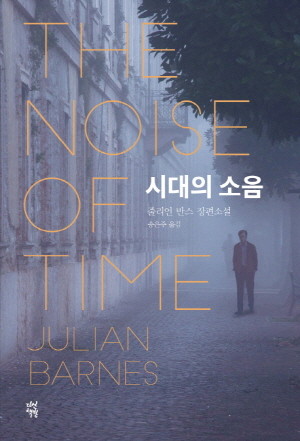
 |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는 소비에트 연방의 작곡가였다. 클래식을 모르는 이라도 영화 <아이즈 와이드 셧> 내내 흐르던 ‘왈츠 no.2’는 들어봤을 터.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의 음악 속에서 살고 있다. 그는 『증언』 등 각종 기사와 연구, 회상록 등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나 음악적으로 이미 많은 평가를 받아 정리된 음악가를 굳이 선택한 이유? 위대한 예술가를 전복시키는 이야기는 실패할 수 없는 소재다.
줄리언 반스는 주특기인 ‘내레이터로서의 소설’을 이번에도 선택했다. 『플로베르의 앵무새』,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에서 탁월하게 돋보였던 그의 편집 능력은 불운한 쇼스타코비치의 일대기에서도 빛을 발한다. 이념 전쟁이 세계를 집어삼키던 시간을 들여다보기 위해 줄리언 반스는 ‘쇼스타코비치의 인생’이라는 표본을 최악의 윤년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줄리언 반스가 실패할 수 없는 소재를 가장 자신 있는 말투로 다룬 작품이다.
첫 윤년은 1936년 1월 28일 층계참에서 시작한다. 쇼스타코비치는 <므첸스크의 맥베스 부인>의 평가를 한 신문에서 읽는다. “음악이 아니라 혼돈”. 평가는 어떤 의미에서 정확했다. 오페라를 관람하러 온 스탈린 동무의 자리가 타악기와 금관악기 위였으니까. 그것은 말마따나 혼돈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음악가의 불행이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숨죽인다.
그 뒤로도 쇼스타코비치는 권력층과의 관계를 죽을 때까지 유지해야 했다. 이를 테면, 두 번째 윤년, 1948년에 미국 뉴욕으로 가서 ‘낙관적인 쇼스타코비치’가 되어 연설문을 읽고, 소비에트 체제와 이념을 찬양했다. 존경하던 스트라빈스키를 살기 위해 배신하면서 그는 벌레가 되었다. 마지막 윤년은 1960년. 스탈린이 죽고 난 뒤, 쇼스타코비치는 끝없는 공포에 휩싸인다. 아이러니하게도 공포의 근원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삶이었다. 그는 울면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공산당 입당원서에 서명을 해야 하고, 권력에게 자신의 껍데기를 내줬다.
위대한 이념을 음악으로 승화했다는 말로 평가 받았던 쇼스타코비치에게 오히려 조국은 비극이었다. 그는 ‘말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음악을 택했다. ‘낙관적인 비극’, ‘위대한 소련의 동지’라는 말을 피해 “강하고 진실하고 순수”한 음악을 추구했던 쇼스타코비치. 줄리언 반스는 겁쟁이로 살아 ‘시대의 소음’에 맞섰던 쇼스타코비치를 일인칭 시점으로 훌륭하게 입체적으로 재현해냈다. 윤년마다 불행이 찾아와도 끝내 독재자의 초상화를 걸지 않았던 그를 납작한 역사 속에서 끄집어낸다. 그리고 묻는다. “자, 예술은 누구의 것이지?” 쇼스타코비치에게 요구했던 정답은 ‘예술은 인민의 것이다’라는 레닌의 말이었다.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관련태그: 시대의 소음, 플로베르의 앵무새,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쇼스타코비치


- [기사] 나바호 타코를 먹으며
- [기사] 6년 만에 연락한 작가
- [기사] 전자책 겁먹지 마세요
- [기사] 단유, 첫번째 분리 연습

-
글 | 김유리(문학 MD)
드물고 어려운 고귀한 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요.
-
-
플로베르의 앵무새
<줄리언 반스> 저/<신재실> 역
10,620원(10%
 + 5%
+ 5% )
)
-
-
시대의 소음
<줄리언 반스> 저/<송은주> 역
12,600원(10%
 + 5%
+ 5% )
)
-
-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줄리언 반스> 저/<최세희> 역
11,520원(10%
 + 5%
+ 5% )
)
PYCHYESWEB03









































 + 5%
+ 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