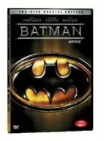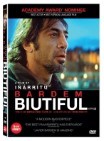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버드맨>
<버드맨>
영웅이라기에 마이클 키튼은 너무 노쇠해져 버렸다. 마이클 키튼은 리건의 신경병적인 몸짓을 따르며, 벗겨진 머리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중년의 몸을 드러내면서 불운과 불행, 연민과 동정을 자아내게 만든다.
- 글 | 최재훈

엔딩 크레디트가 올라가고 한참을 멍하게 있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책장 한 귀퉁이에 꽂혀 있던 잉게보르크 바하만의 시집을 꺼냈다. 그의 동명시집 속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의 한 구절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읽는 사람에 따라 절망 속 희망일수도, 희망 없는 절망의 나락일 수도 있는 시구처럼 마지막 장면은 보는 사람에 따라 그 결이 다르게 읽힐 것이다.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의 <버드맨> 얘기다.
한때 <버드맨> 시리즈로 영광을 누렸던 주인공 리건 톰슨(마이클 키튼)은 ‘전직’ 슈퍼 히어로라는 수식어에 갇힌 채 노쇠해져 버렸다. 진정한 연기자로 인정받으면서 재기하고 싶은 리건은 할리우드 영화로 돌아가는 대신 브로드웨이를 선택한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가 않다. 극단은 늘 재정난에 시달리고, 캐스팅된 배우는 마땅치 않다. 게다가 공연 직전 교체된 남자 주인공(에드워드 노튼)은 제멋대로라 통제 불능이며, 리건의 매니저이자 딸(엠마 스톤)은 약물중독에 매사가 불만스럽다. 자기 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를 연극을 준비하면서 리건은 버드맨의 환청과 환영에 사로잡힌다. 게다가 애인은 임신한 것 같다고 하고, 이혼한 전처와 친구이자 제작자, 그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비평가는 리건의 주위를 맴돌면서 서서히 그의 내면과 갈등을 폭발시킨다. 알레한드로 감독은 이를 위해 리건의 심리를 내밀하게 쫓기보다 리건의 움직임에 따라 유영하는 장면들 속에 리건을 중심으로 인물들을 계속 등퇴장시키면서 그의 목을 조르는 주변 인물과 그 관계를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리건이 느끼는 강박증을 관객들에게 전달한다.

국내에도 잘 알려진 <21그램>과 <비우티풀>을 통해 삶과 죽음 사이의 철학적 사유를 녹여내며 거장의 반열로 접어든 알레한드로 감독은 <버드맨>을 통해 그 명성을 깊게 뿌리내렸다. 리건의 숨통을 조여 오는 삶의 무게와 과거의 환영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알레한드로 감독은 웜홀처럼 관객들의 시선을 고정시켜 버린 롱테이크 장면으로 주목받은 <그래비티>의 엠마누엘 루베스키를 촬영감독으로 택했다. 엠마누엘 촬영감독은 <버드맨>이 마치 원 신 원 테이크로 촬영된 것 같은 기법을 선보인다. 씬과 씬이 자연스럽고 세밀하게 이어져 있어, 언제 컷이 나뉘는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다. 이를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심장이 쿵 떨어져 내면의 분열을 겪게 되는 정통비극의 주인공 그 자체인 리건과 함께 관객들은 숨통을 조이는 압박감을 함께 체험한다. 마치 카메라가 리건의 호흡을 그대로 이어받아 숨 쉬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이런 연출과 촬영 기법은 비로소 리건이 진정한 버드맨이 되는 순간 관객들도 함께 해방감을 느끼게 만드는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가장 화려한 도시 뉴욕 브로드웨이를 배경으로 하지만, 영화는 줄곧 폐쇄적인 극장 공간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매우 답답하다. 정말 버드맨이 된 것처럼 새의 시선으로 뉴욕을 누비는 화려한 장면과 그 쾌감을 배가시키는 것은 물론이다.
주인공 마이클 키튼의 캐스팅은 신의 한 수라 할 만큼 성공적이다. 영화 속 히어로 물 <버드맨>을 통해 우리는 20년 전 마이클 키튼이 주인공이었던 팀 버튼의 <배트맨> 시리즈를 자연스럽게 연상시킨다. 게다가 영웅이라기에 마이클 키튼은 너무 노쇠해져 버렸다. 마이클 키튼은 리건의 신경병적인 몸짓을 따르며, 벗겨진 머리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중년의 몸을 드러내면서 불운과 불행, 연민과 동정을 자아내게 만든다. <사랑에 대한 모든 것>에서 스티븐 호킹 역할을 맡아 보여준 빼어난 연기로 에디 레드메인이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버드맨>의 마이클 키튼의 연기가 최고였다고 박수를 쳐주고 싶다.
리건이 세계적인 극작가 레이먼드 카버에게 연기를 잘 봤다는 메모를 받은 후 연극을 동경해 왔고, 수십 년 간 냅킨을 소중히 아껴온 것처럼 사람들은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서야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동료 배우와 평론가에게 냅킨의 가치를 무시당하고 리건은 한없이 무너져버리는데, 유튜브 동영상과 트위터를 통해 대중들의 관심은 다시 리건을 향한다. 여기에 ‘좋아요’의 숫자를 통해 자존감을 느끼는 SNS 중독에 빠진 우리의 모습도 투영된다. 그렇게 <버드맨>을 보자면 점점 자신의 꿈과 멀어지고, 먹먹한 현실의 벽 앞에 훌훌 날고 싶은 우리의 모습이 겹친다. 영웅을 연기하지만 현실에서는 너무나 보잘 것 없는 리건처럼 우리에게도 ‘버드맨’ 같은 영웅이 되어 훨훨 날아보고 싶은 욕망이 있다. <버드맨>을 통해 우리는 이미 너무 노쇠해져 버린 우리 아버지, 혹은 점점 꿈에서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 혹은 미래를 묵도하게 된다. 그렇게 <버드맨>은 낭만적 관조도 복고의 기억상실도 아닌 지금 바로 현실 속 리건의 삶을 통해 꿈을 향해 한때 날개 짓을 했지만, 지금은 추락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만든다. 그 경험은 씁쓸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다.
[추천 기사]
- <조선명탐정> 한국형 콤비 캐릭터의 유연한 안착
- <백설공주 살인사건> 세 치 혀와 세 마디 손가락이라는 흉기
- <빅 아이즈> 버튼인 듯 버튼 아닌 버튼 같은 조롱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 [기사] 소설 『이별까지 7일』을 영화로 만나다
- [기사] 영화평론가 허문영의 두번째 평론집
- [기사] 영화라는 삶의 미장센 <러브 액추얼리>
- [기사] 『꾸뻬씨의 행복여행』 영화화

-
글 | 최재훈
늘 여행이 끝난 후 길이 시작되는 것 같다. 새롭게 시작된 길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보느라, 아주 멀리 돌아왔고 그 여행의 끝에선 또 다른 길을 발견한다. 그래서 영화, 음악, 공연, 문화예술계를 얼쩡거리는 자칭 culture bohemian.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졸업 후 씨네서울 기자, 국립오페라단 공연기획팀장을 거쳐 현재는 서울문화재단에서 활동 중이다.
-
-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잉게보르크 바하만> 저5,400원(10%
 + 5%
+ 5% )
)
-
-
그래비티 (1Disc)
19,800원(0%
 + 1%
+ 1% )
)
-
-
21 Grams (21 그램)(지역코드1)(한글무자막)(DVD)
<Sean Penn>,<Naomi Watts>
26,300원(0%
 + 1%
+ 1% )
)
-
-
배트맨 SE (2disc)
<잭 니콜슨>, <마이클 키튼>, <킴 베이싱어>
8,800원(0%
 + 1%
+ 1% )
)
-
-
비우티풀
7,700원(42%
 + 1%
+ 1% )
)
PYCHYESWEB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