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난 것이 못난 건 아니잖아
나는 ‘표준’이란 말을 지우고 싶다
그러나 좀 더 예쁘게 타고난 구석이 있으면 좀 못한 구석도 있는 게 당연한 거지. ‘예쁜 건 다 내 꺼!’ 이건 좀 유치하잖아. 그 누가 내 예쁜 구석을 부러워하다가 내 못난 부분을 발견하고 위로를 얻는다면 그것도 좀 괜찮지 않나? 서로서로 힐끔힐끔 헐뜯으면서 위로를 주고 살아도 좋잖아!
- 글 | 임자헌
나와 음식을 함께 먹어본 사람이면 알 것이다. 내가 얼마나 잘 먹는지. 어려서부터 그랬다. 먹는 것을 무척 좋아해서 친구 생일잔치에 다녀와서도 곧바로 배고프다며 저녁밥을 달라던, 나는 위대한 소녀였다. 물론 이렇게 먹으면 살찐다. 따라서 나도 살이 쪘다. 어렸을 때 동네에서 예쁘단 말도 좀 듣고 했던 미모였지만 살 앞에 장사 없다. 점점 불어나던 살은 청소년기에 폭발하였으니, 제2차 성징으로 인한 호르몬 이상분비가 비만과 쌍을 이뤄 나의 외모는 어린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낯선 방향으로 마냥 흘러갔다.
사족을 붙이자면, 이쯤에서 한식의 위대함을 한 번 짚어야겠다. 내가 전주에서 자랐기에 망정이지, 서울에서 성장했다면 고도비만이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전주에서 햄버거란 방학식과 개학식을 기념할 때나한 번씩 먹는 음식이었다. 내가 초등학교 시절 서울 친척집에 놀러갔다가 케이에프씨(KFC)에서 중고등학생 쯤으로 보이는 애들이 어른을 대동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치킨을 바께쓰에다 쌓아 놓고 먹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었다. 당시 전주에는 중앙동에 햄버거 가게가 한 개 있었는데, 거기서 청소년들이 자기들끼리 치킨을 마구 쌓아 놓고 먹는 그런 풍경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주로 나물로 구성된 한식은 아무리 먹어도 고도비만이 되기는 참 어렵다는 것이 나의 경험이 내린 결론이다.
여튼 점점 차근차근 꾸준하게 체중이 불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는 전교에서 가장 우량한 소녀가 되는 영예를 누렸다. 그해 초여름 마침 적당히 입을 만한 여름용 반바지가 없어서 반바지도 살 겸 유행하는 옷도 구경할 겸해서 엄마랑 쇼핑을 나섰다. 우리 엄마는 예쁜 것을 참 좋아하신다. 패션 센스도 남다르시다. 그래서 딸인 나에게 ‘이런 거 입혀야지, 저런 거 입혀야지’ 하시며 몹시 들뜬 기분으로 옷가게로 향하셨다. 그런데 이럴수가! 나는 그냥 맞는 옷이나 찾아 입어야 하는 신체 형편이었다. 그 어떤 옷도 고를 수가 없었다. 맞는 치수를 찾기만도 벅찼다. 결국 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고, 나는 어머니와 30미터 쯤 떨어져 고개를 푹 숙이고 집에 따라가는 것으로 그 좋은 쇼핑이 마무리되었다.
고2 때 나는 갑자기 뮤지컬 배우가 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스스로 살을 빼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뮤지컬 배우가 되는 것이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서자 살 빼던 것도 중간에 그만뒀다. 대학생이 되고 아가씨가 되고 보니 내가 벌어 내 옷을 사 입는 날이 왔다. 가느다란 몸이 아니어서 언제나 옷을 사 입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 나를 몇 년 동안 내리 학대하다가 문득 ‘뭔가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다. 자기학대에 지쳤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가만 보니 옷 모양은 다양한 게 많지만 치수는 딱 세 가지 밖에 없었다. 캐주얼은 85, 90, 95. 정장은55, 66, 77.(44는 외계인들이 입는 것이니 지구인을 위한 이 글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자.) 아니, 이게 말이나 되나? 대한민국 성인 여성을 딱 셋으로 분류하고 있단 말인가? 그런데 더 우스운 사실은 이 세 가지 치수에 나를 포함한 거의 모든 여성들이 다들 몸을 맞추고 있더라는 점이었다.
“제가 체형이 좀 이상해요.”라는 말을 안 하는 여자를 본 적이 거의 없다. ‘다리가 짧아요.’ ‘허리가 굵어요.’ ‘팔이 짧아요.’ ‘팔이 두꺼워요.’ ‘엉덩이가 커요.’ ‘엉덩이가 작아요.’ ‘허벅지가 굵어요.’ ‘허벅지가 너무 가늘어요.’ ‘종아리가 굵어요.’ ‘종아리가 짧아요.’ ‘종아리가 길어요.’ ‘목이 길어요.’ ‘목이 두꺼워요.’ ‘목이 짧아요.’ 등등. 그래 알겠는데,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지극히 정상인 거 아닌가? 표준체형이란 것이 대체 뭐지? 이건 뭐 로보트를 찍어 내는 것도 아니고. 체형이 이상한 게 아니라, 체형의 특징이라 해야 맞지 않겠냐는 말이다. 얼굴이 모두 다르듯 체형도 다른 게 ‘정상’이지 않나?
요즘 ‘강남미녀’란 말이 유행이다. 모두 성형을 해서 다 똑같이 생긴 여자를 풍자하는 말이다. 사실 눈 작아지려고 성형하는 사람 없고, 코 낮추려고 성형하는 사람 없고, 이마 주저앉히려고 성형하는 사람 없고, 작은 얼굴 키우려고 성형하는 사람은 없겠지! 그러나 좀 더 예쁘게 타고난 구석이 있으면 좀 못한 구석도 있는 게 당연한 거지. ‘예쁜 건 다 내 꺼!’ 이건 좀 유치하잖아. 그 누가 내 예쁜 구석을 부러워하다가 내 못난 부분을 발견하고 위로를 얻는다면 그것도 좀 괜찮지 않나? 서로서로 힐끔힐끔 헐뜯으면서 위로를 주고 살아도 좋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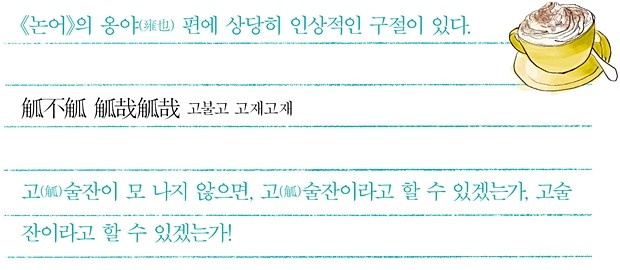
모가 난 술잔을 고술잔이라고 하는 것이니 모가 나지 않으며 고술잔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모를 쳐내면 그 술잔은 더 이상 고술잔일 수 없다. 이렇게 생기고, 이런 체형인 사람은 전 지구상에 유일무이한 ‘나’ 밖에 없다. 성형을 하면 무조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일단 자신이 못나거나 혹은 못생긴 모습이기 이전에 하나밖에 없는 희귀 레어템이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했으면 하는 것이다.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전 지구 유일의 내 모습이니, 내가 버리면 이 모습과 이 특징적인 존재는 아예 전 지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나는 ‘표준’이란 말을 지우고 싶다. 그 근거 없는 말이 너무나 많은 개인들을 학대하고 있다. 고술잔의 모를 쳐내면 고술잔은 정체성을 잃는다. 원래 굴곡이 다르게 생겨 너는 너이고 나는 나인데, 너나 나나 다 똑같아져서 후천적 가족관계를 맺는 건 좀 아무래도 꺼림칙하다. 이것도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가 된다면 할 말은 없겠다만.
[추천 기사]
-‘피아노 소나타 11번’ 3악장,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고?
-막이 내려도 음악은 계속 된다
-문학평론가 류신 “공간을 사랑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
-‘그린플러그드 서울(GPS) 2014’ 블라인드 티켓 매진, 그래도 볼 수 있다
-함정임 백영옥 윤고은 작가와 함께한 ‘향긋한 북살롱’


- 맹랑 언니의 명랑 고전 탐닉 임자헌 저 | 행성:B잎새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이제는 거의 쓸 일이 없는 한문을 공부하고 사극에서나 볼 법한 옛글을 번역하는 저자는 소위 ‘문자 좀 쓰는 여자’이면서도, 누구보다도 지극히 현대적이고 시크한 요즘 여자이다.이 책은 현대 여성들이라면 다 겪을 법한 소소한 일상의 사건사고에 저자 특유의 기발한 발상과 위트, 독특한 관찰력을 담고 거기에 고전을 살짝 토핑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선보인다.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관련태그: 맹랑 언니의 명랑 고전 탐닉, 임자헌


-
글 | 임자헌
의욕 넘치게 심리학과에 지원하여 합격했으나 막상 가 보니 원하던 학문이 아니어서 대학시절 내내 방황했다. 어쩌다 보니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고전번역연수원에 입학하여 깊은 고민 끝에 본격적으로 뿌리내렸다. 상임연구원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나름 ‘문자 좀 쓰는 여자’가 되었다. 《일성록》 1권을 공동번역하고 3권을 단독 번역했으며, 《정조실록》을 재번역 중이다.
-
-
맹랑 언니의 명랑 고전 탐닉
<임자헌> 저12,600원(10%
 + 5%
+ 5% )
)
“하루키보다 공자를, 커피보다 맹자를 사랑한 문자 좀 쓰는 언니의 촌철살인 일상 수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이제는 거의 쓸 일이 없는 한문을 공부하고 사극에서나 볼 법한 옛글을 번역하는 저자는 소위 ‘문자 좀 쓰는 여자’이면서도, 누구보다도 지극히 현대적이고 시크한 요즘 여자이다.이 책은 현대 여성들이라..
PYCHYESWEB02








































 + 5%
+ 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