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가은의 나만 좋아할 수도 있지만] 숙제에 진심인 사람
<윤가은의 나만 좋아할 수도 있지만> 1화
가장 좋아하는 체호프의 단편을, 내 인생을 걸고 이렇게 엉망진창 오마주하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지만, 어쨌든 나는 새해 첫 날 세운 작은 목표 하나 이루지 못한 채 기어코 살아남아 다시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2020.12.11)
- 글 | 윤가은(영화감독)
 언스플래쉬
언스플래쉬
벌써 12월이라니. 정말 어이없다……고 쓰려다 문득 ‘터무니없다’는 말이 떠올라 사전을 찾아봤다. ‘어이없다’는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힌다는 뜻이고, ‘터무니없다’는 허황하여 전혀 근거가 없다는 뜻이란다. 그렇다면 이번 경우는 ‘터무니없는’ 쪽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의 사태는 뜻밖을 넘어 허황하고 근거도 없는 상황임에 틀림없으니깐.
올해는 하루하루가 정말 터무니없이 빠르게 지나갔다. 돌아보면 이따금 정신없고 분주할 때도 있었는데, 정작 굳게 마음먹은 일이나 꼭 해야 하는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한 채 세월이 흘러가버렸다. 쏜살같이. 그리고 속절없이. 나이를 먹을수록 체감 시간에 가속도가 붙는다지만 이번 경우는 거의 타임슬립에 가까웠다. 뭐랄까 좀…… 심했다.
1월 1일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른다(이 문장은 곧 거짓으로 밝혀진다). 그 날 아침 느지막이 일어나 엄마 집으로 향했다. 엄마랑 달걀을 잔뜩 푼 떡국을 아점으로 먹고, 아빠와 동생한테 전화로 새해 인사를 전하니 벌써 오후였다. 부랴부랴 집에 와 세탁기에 빨래를 돌리고, 잠시 친구들과 톡으로 “내가 살다 살다 <2020년 우주의 원더키디> 해를 다 맞이한다”, “그런데 거기서 지구 망하지 않았냐ㅋㅋ” 하는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는데 문득 졸음이 몰려왔다. 잠깐 자고 일어났더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고, 이 책, 저 영화 들춰보며 귤을 까먹고 있는데 갑자기 밤이 되었다. 그래도 새해 첫날인데 하루를 이렇게 얼렁뚱땅 보낼 수는 없어 일기를 몇 줄 썼다(그렇다. 이 회고도 실은 그날의 일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사실 난 어제 일도 잘 기억하지 못한다). 그리고 금세 잠이 들었다.
 1989년 KBS에서 방영된 국내 애니메이션 <2020년 우주의 원더키디>
1989년 KBS에서 방영된 국내 애니메이션 <2020년 우주의 원더키디>
그래도 잠들기 직전 생각했던 것들은 어렴풋 기억이 난다. 내일부터는 꼭 아침 일찍 일어나자.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새 작품도 열심히 쓰자. 인터넷과 핸드폰 사용은 줄이자. 좋은 책과 영화와 음악을 많이 만나자. 가족과 친구들을 잘 챙기자. 철마다 여행을 다니자. 부디, 오늘과는 다른 꽉 찬 내일을 살자. 올해는 진짜 계획한 대로, 바라는 대로 잘 살아보자!
너무 많은 결심을 하느라 잠을 설쳤던 걸까. 다음 날은 알람을 못 듣고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그냥저냥 시간을 때우며 첫날과 비슷한 하루를 살았다. 다행히 잠들기 직전 정신이 들어 다시 새로운 다짐을 품어보았지만, 그다음 날은 설거지거리가 유독 많아 지쳐버려서, 다다음 날은 낮잠을 자다가 심각한 가위에 눌려버려서, 다다다음 날은 달걀 후라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아니 사실은 이게 다 번아웃 증상이고 그러다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결국 어제와 같은 오늘을 보냈다.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은 늘 내일로 미루고 매일 어제를 살았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걸음을 옮기며 집을 돌아다니던 나는 오늘 아침도 잠옷을 벗지 않은 채 소파에 누웠다. 그리고…… 죽었다.’
아. 아니지. 아직 안 죽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천만다행으로. 그리고…… 어느새 12월이 되었다.
가장 좋아하는 체호프의 단편을, 내 인생을 걸고 이렇게 엉망진창 오마주하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지만, 어쨌든 나는 새해 첫 날 세운 작은 목표 하나 이루지 못한 채 기어코 살아남아 다시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변명거리는 모두 탕진했고 남은 건 부끄러움뿐이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하는 걸까. 「관리의 죽음」 속 체르뱌코프처럼 전전긍긍 과거로 파고들다 그대로 소파에 누워 죽어버리지 않으려면, 다시 내 삶의 고삐를 바로잡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진짜 어떻게 살아야하는 걸까.
딱 내 몫의 삶만 계획하고 책임지면 되는데, 그게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는다. 역시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어렵다. 차라리 누가 내 인생을 숙제로 내준다면 좋겠다. 그런 건 내가 또 성실하게 잘 해낼 수 있는데. 그래. 숙제하듯 사는 삶. 완벽한데?
사실 나는 숙제하는 걸 좋아한다. 어릴 때도 그랬다. 나는 초록 지붕 집의 앤처럼 혼자서도 충분히 황홀하고 즐거운 상상에 빠지거나, 뒤죽박죽 별장의 삐삐처럼 스스로 기발하고 번뜩이는 모험을 찾아 나설 수 있는 타입이 전혀 못 되었다. 대신 임무가 주어지면 열의를 갖고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이었다(뭐든 시키면 열심히 했다는 얘기다). 숙제가 주는 안정감과 만족감이 있었다. 매일 일정하게 해야 할 거리가 있다는 것에 안심했고, 끝내면 후련한 마음으로 자유 시간을 더 즐길 수 있었다. 무엇보다 그저 흘러가던 무의미한 시간들이 손에 잡히는 것으로 바뀌어 차곡차곡 쌓여가는 과정이 기뻤다. 나같이 작고 평범한 사람도 매일매일 열심히 하다보면 언젠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따금 우쭐하며 설레는 상상도 했다.
그런 하루하루의 작은 일거리와 소박한 기쁨, 확실한 보람을 바라는 와중에, 마침 딱 좋은 숙제가 찾아왔다. 더 이상 귀한 시간을 얼렁뚱땅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 이렇게 얼렁뚱땅 글쓰기를 시작한다. 좋아하는 것들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작고 소소하게 풀어보려 한다(이 문장은 바로 거짓으로 밝혀진다). 이미 첫 판부터 분량을 한참 초과해버렸지만(그럼 그렇지).
기왕 초과한 김에 조금 덧붙이자면, 안톤 체호프의 「관리의 죽음」은 가장 좋아하는 단편소설 중 하나다. 일단 너무 웃기고, 또 너무 슬프다. 짧은 글 안에 어떻게 꼭 나 같은 사람의 인생을 이토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압축해 그릴 수 있는지 읽을 때마다 깜짝 놀란다. 시나리오를 쓰다 뇌가 꽉 막힌 기분이 들 때 꼭 찾아 읽는 단편이다. 그러고 보니 오래전 스터디를 할 때 이 작품을 모티브로 짧은 시나리오를 쓴 적이 있다. 그 숙제도 혼자 신나서 열심히 했었는데.
아무래도 나…… 숙제에 너무 진심인 걸까?
그래도 오늘 밤은 안심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을 것 같다. 그걸로 충분하다.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관련태그: 예스24, 채널예스, 윤가은칼럼, 도서MD, 영화감독


-
글 | 윤가은(영화감독)
영화 만드는 사람. 좋아하는 게 많습니다. 단편영화 <손님>(2011), <콩나물>(2013), 장편영화 <우리들>(2016), <우리집>(2019)을 만들었습니다.
PYCHYESWEB02



























 1989년 KBS에서 방영된 국내 애니메이션 <2020년 우주의 원더키디>
1989년 KBS에서 방영된 국내 애니메이션 <2020년 우주의 원더키디>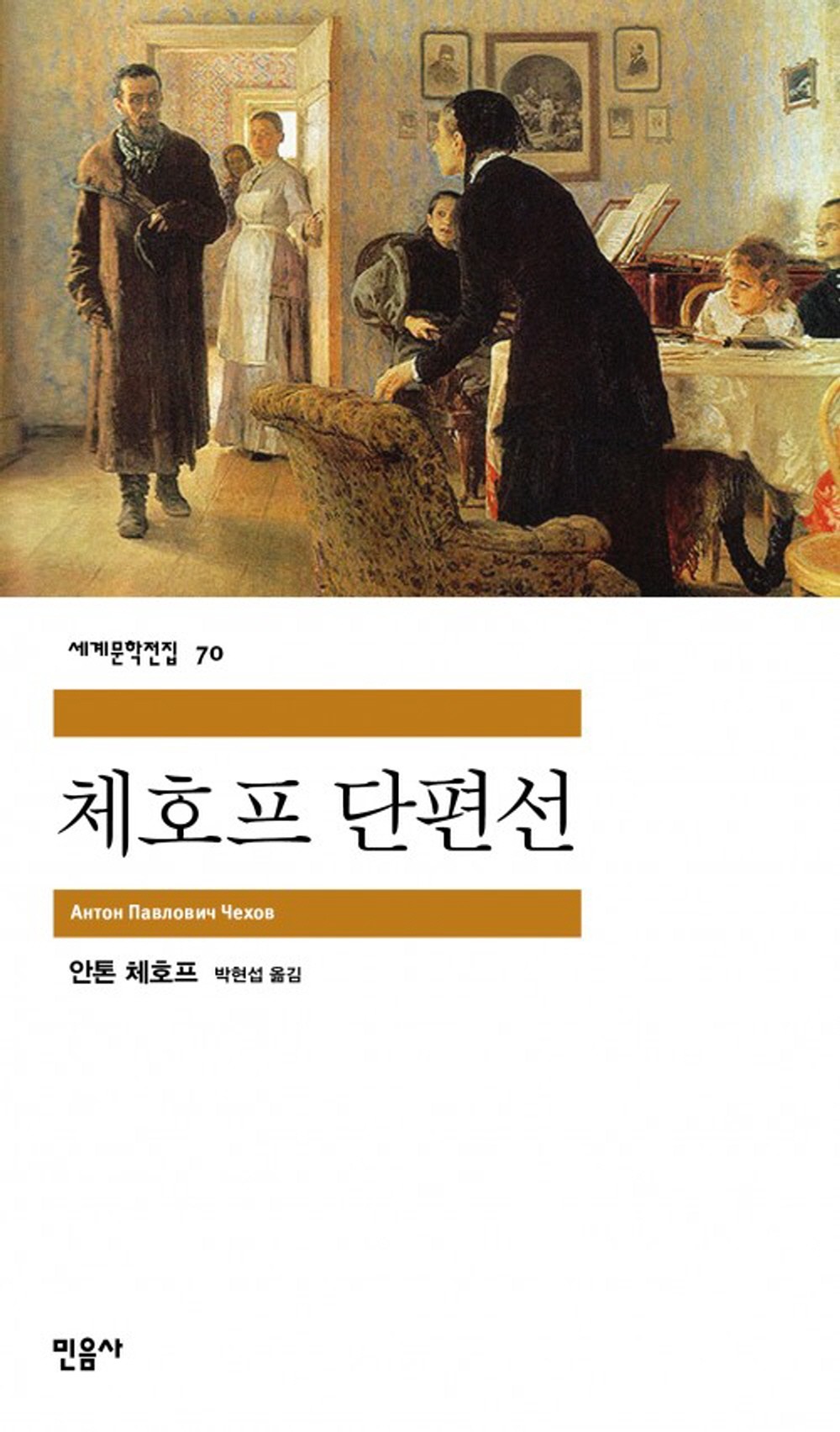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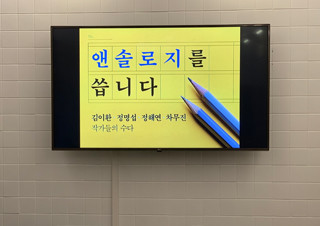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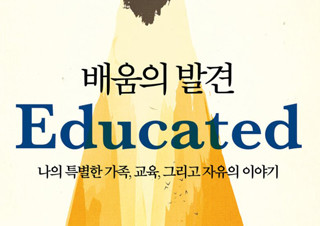



















 5%
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