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쓴다고 달라지는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계속 써보겠습니다
누구라도 해낼만한 시시한 목표를 세우고, 그 시시함을 무기로 반복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면. (2018. 03. 09)
- 글 | 최지혜
새해 첫 날 텅 빈 다이어리를 채울 방법을 고민하다, 손이 가는 대로 고른 책에서 무심히 읽은 문장에 마음이 흔들렸다. 풀지 못해 기어코 해를 넘겨버린 고민들은 새해가 되어도 여전히 고약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짐을 지우는 일은 계획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누구라도 해낼만한 시시한 목표를 세웠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의 가장 좋은 문장을 훔쳐 쓰는 것. 되도록이면 겹치지 않게 책을 골랐고, 나날의 문장들로 다이어리의 빈 페이지는 조금씩 채워졌다. 지치고 피곤한 날에도 누워버리고 싶은 마음을 겨우 달래 책상에 앉아, 어떤 문장이라도 썼다. 일단 한 글자를 쓰고 나면 그 다음은 쉬웠다. 옮겨올 단어를 하나하나 눈에 담고, 그대로 똑같이 쓰기만 하면 됐다. 그런데 앉아서 쓰기만 하면 되는 이토록 시시한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내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그냥 모르는 척 눕고 싶은 마음에 자꾸만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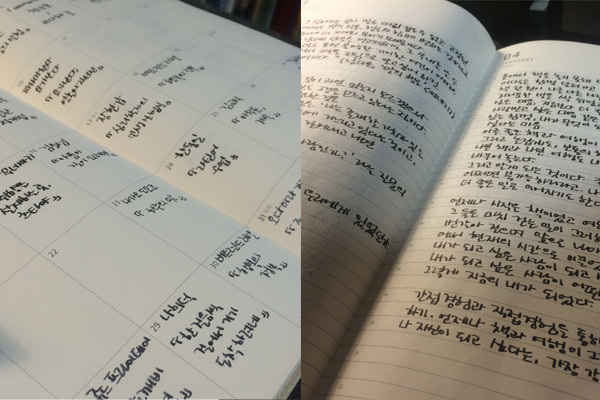
띄엄띄엄, 빈칸들이 보이는 필사 기록(한 눈에 볼 수 있게 책 제목과 저자는 Monthly에 정리하고, Daily 페이지를 필사 노트로 사용했다)
항상성 높은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루틴이다. 자기만의 루틴을 마련한다는 것은 자신의 일상을 지키고 가꾸겠다는 다짐이다. 살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유혹에 노출되고 휩쓸린다. 바빠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실연을 해서, 기분 좋은 일이 생겨서, 심지어 배고파서인 경우도 많다. 그런데 루틴은 일종의 일상 지킴이랄까, 온갖 사정과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빚어내는 예외의 유혹이 피어날 틈을 주지 않는 터프한 보안관이다.
일상 루틴의 제1조항은 정해진 루틴에 의문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고, 제2조항은 예외 없음이다. 어떤 상황, 어떤 사정, 어떤 감정의 돌발 변수에도 흔들림 없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정언명령과도 같다. 협상의 여지는 아예 없다. 민주적인 의사 결정이라든가 철학가의 끊임없는 회의는 필요 없다. 정했으면 토를 달지 않고 지키려고 애쓰기만 하면 된다
- 김교석, 『아무튼, 계속』 39~40쪽
 |
단순히 제목(『아무튼, 계속』)에 이끌려 읽기 시작한 이 책에서 생각지도 못한 아주 명쾌한 답안을 발견했다. 정했으면 ‘토를 달면 안 되는’ 거였고, 협상의 ‘여지는 아예 없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일이었던 것이다. 문장을 옮겨 쓰지 않고 잠든 날, 몸은 편했을지 몰라도 마음은 그러지 못했다. 저자처럼 주3회 빠지지 않고 수영을 한다거나 막 체크인한 호텔처럼 방을 정리한다거나 술자리를 피하거나 하지는 못하겠지만. 내 목표의 ‘시시함’을 무기로 반복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면, 마음에 지는 일도, 또 마음에 짐을 지우는 일도 없을 텐데.
'하비투스'라는 말의 유래가 재미있습니다. 이 명사를 살펴보면 '습관'이라는 뜻 외에도 '수도사들이 입는 옷'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수도사들은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아침 기도를 바치고 난 뒤 오전 노동을 하고 점심식사를 하기 전 낮 기도를 바쳤어요. 점심식사 뒤에는 잠깐 휴식을 취한 뒤에 오후 노동을 하고 저녁식사 전에 저녁 기도를 바쳤고요. 저녁식사가 끝나면 잠깐의 휴식 뒤에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의 일과를 마치는 끝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두 일괄적으로 잠자리에 들었고요. 그래서 수도자들이 입는 옷 '하비투스'에서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한다는 의미에서 '습관'이라는 뜻이 파생하게 된 겁니다.
- 한동일, 『라틴어 수업』 85쪽
 |
루틴, 반복, 습관에 대한 계속된 고민이 책을 끌어 당겼을까. 별 생각 없이 펼친 다른 책에서는 '습관'이라는 단어의 유래(영어의 '해빗habit'은 라틴어 ‘하비투스habitus'에서 왔다)를 설명했다. 수도사들 역시 자신이 하는 기도와 노동에 대해 ‘그냥’ 할 뿐,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하지 않을 수 있는지 핑계를 찾는 사람도 없었다. 그렇다면 계속 해보는 수밖에. 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 것도 없겠지만.
만년필에 좋아하는 색의 잉크를 가득 채우고 펜이 종이에 가 닿는 감촉을 느끼면서 문장을 천천히 옮겨 적고 나서야 비로소, 하루가 마무리된다.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은 키보드로 타이핑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일이다. 타이핑이 뇌로 보내는 글이라면, 손으로 쓴 글은 마음으로 흘러간다. 마음에 다다른 문장은 지친 하루를 위로하기도, 또 느슨해진 생각을 바로 잡기도 한다. 쓴다고 달라지는 일은 없겠지만, 매일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어쩐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아니 어쩌면, 그 기분만으로도 내 삶은 이미 달라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 [기사] [팟캐스트 특집] 책으로 만나는 팟캐스트
- [기사] 내 일의 쓸모
- [기사] 할머니의 미역 줄거리
- [기사]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3주 연속 1위로 인기 지속

-
글 | 최지혜
좋은 건 좋다고 꼭 말하는 사람
PYCHYESWEB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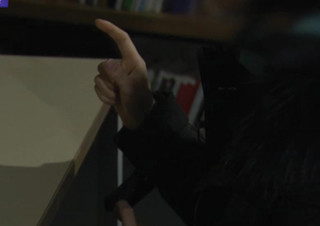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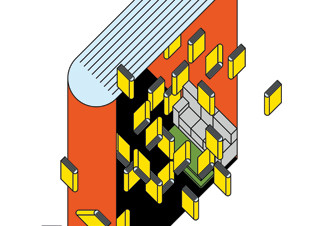












 + 5%
+ 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