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맛있는 걸 먼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겨우 이따위 일에 써 버릴 순 없지
일이 인간의 활동에서 최우선 순위가 된 배경을 생각해 보라고. 일의 성취도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문화는 그 결과물을 이용하고 싶은 자들이 설계한 교묘한 장치야. (2017.12.06)
- 글ㆍ사진 | 이기준(그래픽 디자이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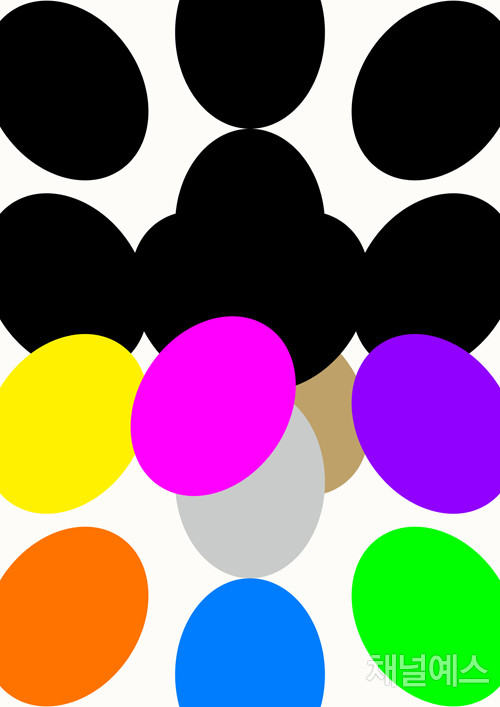
김병호 이기준, <아름다운 반복> 스케치. 인간은 허상을 품는다. 난 맛있는데 남은 맛 없다는 걸 보면 맛도 허상이고, 난 추운데 남은 괜찮다는 걸 보면 날씨도 허상인가 보다. 내 눈엔 이리 보이고 남 눈엔 저리 보이는 ‘나’ 역시 허상일지도 모른다. 허상은 정해진 형체가 없어서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으로든 보일 수 있다. 허상을 다루는 방식에 따라 실체(라는 것이 있다면)가 달라지지 않을까?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무는구나.”
“뭐가 그렇게 다사다난했는데?”
“아니, 뭐, 진짜로 그랬다기보다 자그마치 360일이 넘는 날이 지났는데 당연히 다사다난하지 않았겠냐는 소리지.”
나도 속 편하게 살지만 노바를 보노라면 신선이 따로 없으리만큼 만사가 쾌통하다.
“사춘기 때였어. 새 옷을 샀는데 입기가 아까운 거야. 중요할 때 입으려고 잘 모셔 뒀지. 나중에 마음에 두었던 여자애랑 데이트를 하게 됐어. 그 옷을 입으려고 꺼냈는데, 세상에, 작아서 못 입게 된 거야. 한창 클 때였거든. 아마 다섯 번도 못 입었을 걸. 어찌나 억울하던지. 그 사건 이후 좋아하는 건 아끼지 않고 낡을 정도로 자주 써먹기로 했지.”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나중에 입을 옷은 나중에 사면 된단 얘기지. 지금은 지금 입을 옷 생각만 하면 돼. 생기지 않은 일을 걱정해서 뭐 하냐.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니 걱정하는 대신 낙관하면 적어도 지금은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지 않겠냐? 연말이면 다들 한해를 되짚어보며 ‘그래, 그런 일이 했었지’ 하던데, 야, 그럴 시간에 오늘에 충실하는 편이 훨씬 낫지 않겠냐? 돌이킬 수 없는 지난 일 후회, 알 수 없는 다가올 날 걱정, 이 두 가지는 노바 랜드에 반입 금지다.”
 |
아끼던 옷 얘기가 적절한 비유인지 짚어 보려는데 비슷한 일화가 떠올랐다. 어릴 적 본 『닥터 슬럼프』에 나온 에피소드. 세 식구가 케이크를 먹고 있다. 꼬마는 나중에 먹으려고 케이크 지붕의 체리를 아껴 두고 있다. 그러자 아빠가 “체리 싫어하는구나?” 하며 포크로 콕 찍어 먹는다. 꼬마는 울분을 토하며 가출한다. 꽤 여러 권짜리 시리즈이건만 오직 이것만 기억난다.
그러자 또 다른 일화가 꼬리를 물고 나타났다. 디자이너로 막 일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굉장히 멋진 작업을 구상했다. 이야기의 핵심에 다가가기 앞서 변명부터 해야겠는데, 나는 대체로 아둔한 편이지만 그때는 역대 급으로 어리석었다. 그 일화를 떠올리며 타이핑을 하는 지금도 손가락이 부들부들(심지어 ‘두블두블’이라고 쳤다 고쳤다) 떨릴 지경이다. 용기를 내 이야기를 이어 보겠다. 멋진 구상을 펼치고 나서 한 생각은 이랬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겨우 이따위 일에 써 버릴 순 없지.’
“뭐? 진짜 그랬어?”
노바가 소스라쳤다. 그래, 그랬어. 부끄럽지만 그랬다. 불만이 넘치던 시절이었다. 유명한 디자이너의 작업을 보며 “난 언제 이런 프로젝트 해 보나. 왜 나한텐 시시한 일밖에 안 오지?” 투덜거리곤 했다. 멋진 아이디어는 ‘겨우 이런’ 일이 아닌, 멋진 프로젝트를 위해 남겨 둬야 할 것 같았다. 늘 차선을 택했다. 그때 쌓인 멋진 아이디어들은 다 어찌 되었을까? 버려졌다. 왜? 당시의 나에겐 최고의 아이디어였지만 경력이 쌓이면서 조금이나마 성장한 나에겐 더 이상 멋져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중에 든 생각은 이랬다.
‘고작 이따위 아이디어에 그토록 감탄했다니…….’
그래. 미루다가는 그 길로 끝이다. 최고의 것은 지금, 당장, 취해야 한다.
대충 여기까지가 작년 이맘때쯤 노바와 나 사이에 오간 대화다. 그 영향이었는지 올 초 작업실을 새로 꾸리면서 꽤 무리를 했다. 있는 돈은 물론 없는 돈까지 써가며 가구를 맞췄고 오래도록 눈독들이던 스탠드 조명을 샀다. 버는 족족 옷 사는 데 탕진하는 노바가 걱정할 정도였다.
“야,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해야지 그렇게 허덕일 정도로 쓰면 어떡하냐?”
“어허. 허덕이지 않는다면 감당할 수 있는 한 최고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 아니겠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 뜨끔했다. 노바와 나의 감당 수위가 다른 것 같았다.
“수중에 백만 원이 있다 치자. 그 돈으로 마음에 쏙 드는 백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 되겠냐, 안 되겠냐?”
“사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최고를 선택한 셈이지.”
“야! 그건 사치지!”
“오늘은 오늘 입을 옷 생각만 하자며. 내일 입은 옷은 내일 마련하면 된다며.”
“말이 그렇단 얘기지.”
 |
저런 말은 쓰지 못하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하지만 나 역시 ‘말이 그렇단’ 얘기지, 전 재산을 그 자리에서 다 쓰는 대범한 인물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카드 할부 내역만 소복해진다. 책상 위에 『심플하게 산다』와 『물욕 없는 세계』가 굴러다니는 걸 보면 나도 걱정은 되는 모양인데 『심플하게 산다』에서 내가 취한 메시지는 핵심 맥락 다 잘라먹고 심플하게 ‘필요한 물건은 최대한 좋은 것으로’다. 낙관인지 몽매인지 모르겠다.
한편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최고의 물건을 들이기는 비교적 쉽다. 값을 지불하면 그만이니까. 반면 작업에서 최고를 지향하는 일은 상당히 힘들고 복잡하다. 우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야 한다. 힘 빼고 슬슬 해야 잘되는지, 생각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는지,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구조를 만들어 끙끙대며 작업을 수행하는 취미가 있는지, 생각도 실행도 최소한을 선호하는지, 아침형인지 저녁형인지 새벽형인지 등 자신의 영역을 알아내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다. 난 요새 6-7시쯤 출근하지만 회사에 다닐 땐 자기가 좋아하는 시간대에 일하는 행위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다. 일찍 출근한다고 잠을 덜 자는 건 아니다. 그만큼 일찍 자야 하는데 회사에서 다른 직원과 보조를 맞추려면 야근은 피하기 힘들고 단순히 깨 있기도 벅찬 시간대에 일까지 해야 하는 고통이 따르기에 피로도는 점점 더 높아졌다. 당연히 일찍 일어나기 힘들다. 그 상황에서 작업의 수준을 유지하려면 나를 더 옥죄야 한다는 뜻이다. 자신에게 상해를 입히면서까지 작업의 질을 높이는 일이 진정 ‘감당해야 하는’ 일일까? 더 큰 그림을 놓치는 건 아닐까?
“넌 작업 얘기할 때면 꼭 일상생활을 들먹이더라.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남는 시간에 하는 작업으로 대체 뭘 할 수 있는데? 그건 그냥 태만이야. 창작자에겐 작업만이 유효하지.”
“바로 그런 태도, 점검해봐야 하지 않을까? 일이 인간의 활동에서 최우선 순위가 된 배경을 생각해 보라고. 일의 성취도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문화는 그 결과물을 이용하고 싶은 자들이 설계한 교묘한 장치야.”
“또 음모론 나온다. 난 작업이 좋을 뿐이야. 괜히 시비 걸지 마.”
“작업이 좋다……. 그게 진정 너 자신의 생각일까?”
다이어리 시즌이다. 스타벅스에 빈스 가랄디 트리오가 흐르고, 오늘 더플 코트를 개시했고, 이달에 마감할 일이 밀려 주말 내내 일했고, 해가 지면 한잔하고 싶고, 꾸준히 조금 더 나은 작업을 하고 싶고, 하지만 쉬고 싶고, 이번 겨울엔 홋카이도의 눈을 보고 싶다. 무슨 일이든 타래를 가만히 짚어 나가면 왼쪽 다리로는 오르막을, 오른쪽 다리로는 내리막을 걸어야 하는 지경이 된다. 달력이 7월부터 6월까지였다면 대수롭지 않게 보냈을 ‘연말’을 맞이하며 갖가지 생각이 다사다난하게 든다.
-
심플하게 산다도미니크 로로 저/김성희 역 | 바다출판사
방대한 인맥 네트워크 사회에서 아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마음을 둘 곳은 없다. 책은 이러한 시대의 모순을 극복하고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자고 말한다.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 [기사] 그냥 하기
- [기사] 아름다움은 쓸데없음에
- [기사] 안경 대탐험
- [기사] 외모로 책 고르기

-
글ㆍ사진 | 이기준(그래픽 디자이너)
에세이 『저, 죄송한데요』를 썼다. 북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
-
물욕 없는 세계
<스가쓰케 마사노부> 저/<현선> 역
13,500원(10%
 + 5%
+ 5% )
)
-
-
심플하게 산다
<도미니크 로로> 저/<김성희> 역
10,800원(10%
 + 5%
+ 5% )
)
-
-
닥터 슬럼프 완전판 1
<토리야마 아키라> 글,그림
10,800원(10%
 + 5%
+ 5% )
)
PYCHYESWEB03









































 + 5%
+ 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