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연재종료 > 이라영의 정치적인 식탁
특수한 사람
걷지 않는 다리, 보지 못하는 눈, 말 없는 목소리에도 이야기가 있는 법이다
예술 작품이 장애를 재현하는 방식에서 정작 장애’인’이 주체가 되지 못한다. 그보다는 ‘장애를 극복한 서사’를 통해 비장애인은 제 삶의 위로와 교훈을 얻으려 한다. (2017.09.19)
- 글ㆍ사진 | 이라영(예술사회학 연구자)

조세 리페랭스Josse Lieferinxe, <성 세바스티아노의 묘를 찾은 순례자들>. 가운데 인물은 한 쪽 다리가 의족이다. 그는 ‘순례자’다. 우스꽝스럽거나 비천하지 않게 장애인을 묘사한 작품은 드물다.
TV에서 양말 신기를 도와주는 보조기구 광고가 나왔다. 처음에는 ‘별 게 다 있네’ 생각하다가 이내 깨달았다. 관절염이 있거나 고도 비만인 경우는 다리를 접고 몸을 숙여 손으로 양말을 신는 그 간단한 행동조차 어렵다는 사실을. 약 15년 전 엄마는 오십견 때문에 한창 팔과 어깨가 아프고 제대로 구부리거나 꺾을 수 없었다. 식구들이 아무도 없는 시간 뒤에서 지퍼를 올리는 원피스를 혼자 입기 위해 온몸을 비틀다 그만 울어버렸다. 인간이 온전히 제 몸으로 일상을 모두 해결하는 시기는 생각보다 길지 않다.
어린 조카와 외식을 하면서 아이의 몸을 기준으로 외식 공간을 살피다 보니 비로소 내 눈에 들어온 사실이 있었다. 식당이라는 공간은 대부분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한국 식당에서는 바닥에 앉아 먹는 식당이 많은데 휠체어를 탄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오지? 아니다. 일단 집 밖에 나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어서 식당까지 오지도 못한다. 맛집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외식산업이 아무리 다양해져도 장애인들의 외식 기회는 적다. 아주 기본적인, 먹고 이동하는 자유가 가로막혀 있다. 장애인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의 공공장소는 보행보조기를 끌고 다니는 노인, 유모차가 필요한 어린아이처럼 교통약자가 등장하기 어려운 곳이다. 더욱이 오늘날은 ‘민폐’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차단하는 태도를 마치 세련됨으로 착각하진 않나 싶다. 우리는 조금씩 침투하고 기대며 서로 섞이고 살아가기 마련인 것을.
자주 가는 카페에서 십여 명의 사람들이 가끔 모임을 한다. 테이블을 끌어다가 이어 붙이며 둘러앉는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곧 시끄러워지겠구나 생각했다. 어느 순간 왜 이렇게 조용하지 싶어 고개를 들어보니 그들은 입을 열지 않고 손을 바쁘게 움직일 뿐이었다. 수화를 사용했다. 단순한 친목은 아니고 정기적으로 어떤 회의나 공부를 하는 모임처럼 보였다.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주문을 할까. 한번도 생각지 못한 질문이 찾아왔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청각장애인들은 벽에 붙어있는 메뉴보다 ‘손에 쥘 수 있는’ 메뉴판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자신이 주문할 메뉴를 손가락으로 지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또 질문이 찾아왔다. 그럼, 청각 장애나 언어 장애가 있다면 전화로 배달 주문은 어떻게 할까. 몇 년 전에 이를 위한 스마트폰 앱이 나왔다. 기술의 진보는 사회의 취약한 면을 위해 쓰일 때 빛이 난다.
나는 대체로 오른손잡이지만 몇 가지를 왼손으로 한다. 예를 들어 식사할 때 가끔 젓가락질을 왼손으로 한다. 그러면 누군가가 ‘젓가락질을 왼손으로 하네’라면서, 어릴 때 고쳐준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라고 한다. 아마 왼손 사용은 ‘가정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하나 보다. 또 나는 덧니가 하나 있다. 어떤 사람은 덧니를 보고도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된 탓이라고 했다. 이렇게 극히 사소한 부분을 놓고도 어떤 부정한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니 사회적으로 ‘장애’라고 아예 규정된 몸에 대한 의식이 부정적인 것은 이루 말할 나위가 없다.
자식으로 장애아를 낳으면 임신 중에 뭘 잘못 먹었나 생각한다. 물론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의 배경에는 장애를 ‘원죄’와 연결짓는 의식이 깔려있다. 부정한 음식을 먹었기에 죄를 가진 몸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한다. 장애는 예로부터 ‘조상의 죄’나 ‘전생에 지은 죄’로 여기는 ‘문화’가 있었다. 예를 들어 『장화홍련전』에서 장화를 호수에 빠뜨린 허 씨의 아들 장쇠는 그에 대한 벌로 호랑이에게 물려 양쪽 귀와 팔 한쪽, 다리 한쪽을 잃는다. 부모의 죗값을 치른 셈이다. 그래서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집안의 수치처럼 여기며 장애인 가족은 죄인의 심정을 갖곤 했다. 문학을 기준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한국전쟁 이후로 ‘장애-죄’라는 인식이 그나마 조금씩 바뀌었다. 전쟁을 통해 후천적 장애인이 된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 때문인지, 영화를 기준으로 보면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 장애가 더 자주 재현된다.
 |
드라마 <파고>의 시즌 1과 3에 청각장애인 킬러가 등장한다. 많이 나오지 않아도 인상이 강하게 남아 배우의 필모그래피를 찾아보다가 발견했다. 그는 실제로 청각장애인이었다. 날씬한 배우를 온갖 특수분장의 힘으로 뚱뚱하게 만들어서 ‘뚱뚱한 여자’를 연기하게 만들듯이, 대부분 장애인 연기도 비장애인이 하다 보니 그가 실제로 청각장애인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예술 작품이 장애를 재현하는 방식에서 정작 장애’인’이 주체가 되지 못한다. 그보다는 ‘장애를 극복한 서사’를 통해 비장애인은 제 삶의 위로와 교훈을 얻으려 한다. 물론 노인만이 노인 연기를 하지 않듯이 당연히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연기할 수 있다. 장애를 연기하는 몸에 대한 찬사와 실제 장애라고 규정된 몸에 대한 시선 사이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생각해보자는 뜻이다.
대체로 소설에서 장애인들은 직업이 없고, 타인에게 멸시의 대상이거나 자기 혐오가 강하다.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정신적 존재로 비장애인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한다. 남성의 몸과 달리 여성 장애인의 몸은 섹슈얼리티의 대상이 된다.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면이기도 하겠으나, 비장애인 작가가 장애인의 몸을 대상화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작가 자신이 장애가 있고 장애인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김미선이 1996년 발표한 『눈이 내리네』는 결이 다른 소설이다. 장애인 부부의 일상과 장애 여성의 글 쓰고 싶은 욕망을 다룬다. 그 후 김미선이 보여준 작품에서 그는 ‘장애’라는 몸에 대한 사유를 점차 발전시켜간다.
 |
몸에 대한 오만함은 늙은 몸, 장애가 있는 몸, 덜 자란 몸을 멸시한다. 최근 소설 『몸의 일기』를 읽으며 생각했다. 화자는 지적인 이성애자 남성이다. 게다가 잘 생겼다고 한다. 아마 작가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몸을 썼을 것이다.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이 몸의 일기를 쓴다면, 여성이 몸의 일기를 쓴다면, 성소수자가 몸의 일기를 쓴다면, 장애인이 몸의 일기를 쓴다면....... 직업, 젠더, 장애 정도에 따라 몸은 다른 역사를 만들어간다. 걷지 않는 다리, 보지 못하는 눈, 말 없는 목소리에도 이야기가 있는 법이다.
장애 학생들이 바리스타로 일하는 카페에 들른 적 있다. 강원도교육연수원에 약속이 있어서 갔다가 알게 되었다. 나도 어릴 때 보아왔던 강릉오성학교 학생들이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다. 오성학교는 강릉의 공립특수학교다. 늘 학교 버스로 이동하는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주칠 일이 없는 ‘특수’ 학생이었다. 마주치지 않으니 타인의 삶을 잘 모르고 살아간다. 저상버스는 물론이고 공연장의 수화통역사, 안내견과 함께 카페에서 홀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특수하지 않은 환경에 자꾸 노출되다 보면 ‘정상’이니 ‘일반’이니 하는 개념들이 바뀌기 마련이다. 특정 지역 주민들을 악마화 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 풀어야 할 숙제이다. 더불어 창작자는 늘 재현의 윤리를 고민해야 한다.
카페라떼 하나 주세요. 고교 과정을 마칠 때가 된 듯 보이는 젊은 남성이 큰 소리로 또박또박 내가 주문한 음료를 재확인했다. 카페라떼 하나요? 잠시 후 내 자리로 성큼성큼 걸어와 ‘카페라떼 나왔습니다’라고 높은 톤으로 말하며 음료를 주었다. 아무것도 특수하지 않다.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관련태그: 정작 장애, 비장애인, 장애, 성 세바스티아노의 묘를 찾은 순례자들


- [기사] 인간이 인간을 먹을 때
- [기사] 분리된 입
- [기사] 밥 때문에 죽는 여자들
- [기사] 나바호 타코를 먹으며

-
글ㆍ사진 | 이라영(예술사회학 연구자)
프랑스에서 예술사회학을 공부했다. 현재는 미국에 거주하며 예술과 정치에 대한 글쓰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은 책으로 『여자 사람, 여자』(전자책), 『환대받을 권리, 환대할 용기』가 있다.
PYCHYESWEB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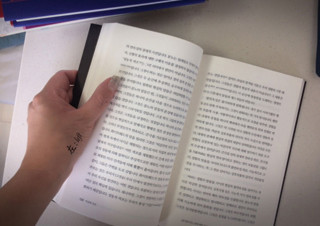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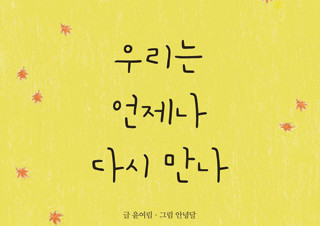











 + 5%
+ 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