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록의 완성자 레드 제플린(Led Zeppelin)
“록은 비틀스로 시작해서 레드 제플린으로 완성된다!”
금속성의 강렬한 사운드를 말하는 이른바 헤비메탈은 레드 제플린이 그 사운드를 결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헤비메탈의 형식미를 완성한 그룹’으로 평가받으며 그들이 활동당시 내놓은 9장의 앨범은 모조리 ‘헤비메탈의 교과서’로 남아 있다. 사실 지금도 강한 소리를 추구하는 젊은 밴드들은 잘하든 못하든 레드 제플린의 명곡들을 마치 당연한 통과의례인양 연주하고 노래한다.
- 글 | 이즘
 |
| 레드 제플린(Led Zeppelin, 1975년 시카고 공연) [출처: 위키피디아] |
록 하면 떠오르는 전설의 인물은 누구인가. 비틀스가 있고, 롤링 스톤스가 있고, 핑크 플로이드도 있지만 록의 헤비 파워를 과시했고 예술적 금자탑을 이룩한 밴드라면 많은 팬들은 압도적으로 레드 제플린(Led Zeppelin)을 손꼽는다. 전설적인 DJ 전영혁씨는 지금도 널리 회자되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록은 비틀스로 시작해서 레드 제플린으로 완성된다!”
이유도 만천하가 안다. 무엇보다 네 멤버 로버트 플랜트(보컬), 지미 페이지(기타), 존 폴 존스(베이스, 건반), 존 보냄(드럼)의 출중한 실력 때문이다. 과거 밴드 ‘송골매’를 이끈 라디오 DJ 배철수는 레드 제플린을 가리켜 “그룹 네 멤버의 역량이 워낙 뛰어나 뒤에 나온 전 세계 음악인들이 연주력을 쌓는데 결정적이었던 밴드”라고 설명한다. “우리 송골매도 레드 제플린의 완벽한 연주와 노래를 듣고 그들처럼 세련된 음악을 하겠다는 꿈을 키웠다!”
아닌 게 아니라 당대든 후대든 밴드의 기타리스트들은 지미 페이지를 자신들의 스승으로 삼았고, 보컬은 무조건 로버트 플랜트처럼 불러야 했다. 베이스 연주자들은 존 폴 존스 되기를 꿈꾸었고, 드럼 스틱을 잡은 사람들은 존 보냄처럼 중량감 넘친 연주를 절절히 원했다. 기타 베이스 드럼 노래 모두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 각 파트의 연주자 넷 모두가 ‘록 연주의 길잡이’, 이를테면 후대 음악가들에게 ‘역할 모델’이 된 셈이다.
국내 헤비메탈의 시작으로 평가받는 그룹 ‘시나위’에서 노래하다가 나중 국내 최고 인기가수가 된 김종서는 레드 제플린을 ‘나를 음악으로 인도한 뮤지션’으로 규정한다. 현재도 ‘시나위’를 이끌고 있으며 서바이벌 프로그램 ‘탑밴드’의 심사위원인 신대철은 “명곡 「Stairway to heaven」으로 레드 제플린은 하드록 음악계의 비틀스와 같은 존재임을 증명했다”고 찬사를 보낸다.
따라가려고 해도 수많은 록 지망생들은 역부족, 재능결핍을 절감했다. 재미와 겉멋은 곧 포기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얼마 전 멤버인 로버트 플랜트의 실토로도 이 점을 넌지시 확인할 수 있다. “레드 제플린의 일원이 된다는 건 하룻밤의 파티에 참여하는 정도의 종류가 아닙니다. 재킷이나 걸치듯이 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레드 제플린은 진정으로 헌신하고 깊게 빠져들어야 하는 곳이었지요!” 멤버들에게는 헌신과 몰입이었을지 몰라도 지망생들한테는 그에 앞서 천부적 재능과 기량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한번 「Stairway to heaven」을 들어보자. 마치 짧은 교향곡을 연상시키는 이 곡에서 네 멤버들은 노래 최고에다 기타 잘 치고 베이스 안정되고 드럼이 클라이맥스에서 불을 뿜는 천재적 역량을 발휘한다. 한번 들어도 잊지 못하고 아무리 오래 들어도 물리지 않는, 감동의 아리아가 따로 없다. 수년전 드라마 <천국의 계단>은 이 곡에서 제목을 따왔고 결국은 이 곡의 연주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까지 했다.
그들의 음악은 언제나 정점이었다. 20세기 록의 명작으로 남아있는 이 곡 하나로도 입증되지만 록 팬들은 「Babe, I'm gonna leave you」, 「Whole lotta love」, 「Immigrant song」, 「Since I've been loving you」, 「Rock and roll」, 「Black dog」, 「Over the hills and far away」, 「Trampled under foot」, 「Kashmir」, 「In the evening」, 「I'm gonna crawl」 등의 레드 제플린 골든 레퍼토리를 테이프가 닳도록, LP가 지글지글 소리가 날 정도로 반복해서 듣곤 했다.
단지 그들의 연주가 중량감 있고 세련된 것을 넘어 빼어난 리듬감 그리고 특히 멜로디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록 팬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음악에 홀리고 만다. 한마디로 귀에 잘 들어온다. 심지어 지난 1974년 당시 제럴드 포드 미국대통령의 어린 두 딸은 TV <딕 카벳 쇼>에 출연해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레드 제플린”이라고 말해 떠들썩한 화제를 낳았다. 백악관에서도 레드 제플린의 헤비메탈이 울려 퍼진 셈이다.
금속성의 강렬한 사운드를 말하는 이른바 헤비메탈은 레드 제플린이 그 사운드를 결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헤비메탈의 형식미를 완성한 그룹’으로 평가받으며 그들이 활동당시 내놓은 9장의 앨범은 모조리 ‘헤비메탈의 교과서’로 남아 있다. 사실 지금도 강한 소리를 추구하는 젊은 밴드들은 잘하든 못하든 레드 제플린의 명곡들을 마치 당연한 통과의례인양 연주하고 노래한다.
너무나 음악을 잘했기에, 음악지망생들이라면 무조건 그들을 챙겨야 했기에 그들의 앨범은 팔릴 수밖에 없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앨범을 판 가수’는 대중음악에 문외한인 사람들도 아는 것처럼 비틀스와 엘비스 프레슬리다. 미국 음반협회(RIAA)는 2006년에 미국 내 판매량을 기준으로 비틀스가 1억6850만장으로 1위, 엘비스 프레슬리가 1억1650만장으로 2위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럼 두 영웅 다음의 3번 타자는 누구인가. 이것은 예측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주인공은 영국의 레드 제플린이었고 그들의 음반 총 판매고는 자그마치 1억750만장으로 집계되었다. 2위 엘비스와 별 차이가 나지 않는 어마어마한 수치의 기록. 그 유명한 밴드들인 이글스, 핑크 플로이드, 퀸, 아바, 롤링 스톤스 그리고 엘튼 존, 빌리 조엘, 마돈나가 모두 레드 제플린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들의 누적 판매고는 9천만 장에도 못 미쳤다. 레드 제플린은 「Stairway to heaven」이 수록된 앨범 <Ⅳ>(원래 제목이 없으나 네 번째 앨범이라서 4집으로 불린다) 하나가 2200만장이라는 가공할 판매그래프를 그려냈다.
헤비메탈로 등식화되고 있지만 레드 제플린은 결코 그런 스타일로만 일관하지 않는다. 이 대목이 중요하다. 블루스 냄새가 지배하는 가운데 「Going to California」 같은 포크, 「Kashmir」와 같은 인도 풍 음악도 있고 , 「Battle of evermore」는 컨트리 터치가 드러나고 「D'yer mak'er」 같은 곡은 의외로 레게음악이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왕성한 식욕(?)을 보였다고 할까. 골수팬들은 그래서 “레드 제플린을 결코 헤비메탈 밴드가 아니다. 그들은 록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해낸 그룹이다”라고 주장한다. 레드 제플린의 팬이 많고 지금도 세력이 막강한 것은 이러한 다양성도 큰 몫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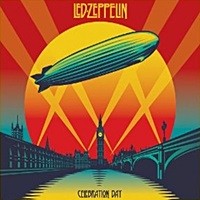 |
또 하나 이게 있다. 레드 제플린은 1980년 드러머 존 보냄이 만성 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하자 미련 없이 그룹을 해산했다. 1968년에 ‘뉴 야드버즈’라는 이름으로 시작한지 12년만의 일이었다. “우리의 귀중한 친구를 잃었고, 우리 스스로가 분리될 수 없는 사이를 절감하기에 우리는 현재 상태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존 보냄 없는 레드 제플린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앨범만 냈다하면 수천만장이 팔리는 인기 절정의 상황을 의식했다면 솔직히 드러머를 바꿔서라도 팀은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한 구석에 있었을지 모른다.
레코드회사도 그걸 원했을 게 틀림없고 또 딴 밴드들은 다들 그렇게 했다. 하지만 레드 제플린은 친구에 대한 우정을 끝끝내 지켰다. 상기한 것처럼 재결합 때마다 드럼 스틱은 제이슨 보냄이 잡지 않았던가. 록 팬들은 그들이 보여준 의리, 끈끈한 정 때문에도 레드 제플린에 목을 맨다. ‘한번 레드 제플린 팬은 영원한 레드 제플린 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언젠가 로버트 플랜트는 이렇게 자랑했다. “우리는 결코 1등이 아니다. 하지만 어떤 2등 밴드보다 우리가 낫다!” 결국 자신들이 최고라는 이야기. 이 말을 하지만 허풍이라고 여기는 록 팬들은 거의 없다. 비틀스가 있지만 1970년대로 범주를 정한다면 부동의 1위는 레드 제플린이라고 굳게 믿는다.
아마도 이렇게 결론내리는 게 합당할지 모르겠다. ‘그들은 비틀스가 꽃피운 록을 더 강하게 정교하게 세련되게 다듬었다!’고. 실제로 로큰롤 명예전당은 “그 이전 시대에 비틀스가 그렇듯 레드 제플린은 1970년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밴드”라고 기록하고 있다. 록의 완성형이기에 그들의 앨범은 해산한지 30년이 넘었어도 신세대의 손에 쥐어지며 다수대중의 청각을 사로잡는다. 레드 제플린이라는 밴드를 가진 것은 음악역사의, 그리고 실로 우리 뮤직라이프의 선물이다.
글/ 임진모(jjinmoo@izm.co.kr)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관련태그: 레드 제플린, Led Zeppelin, Stairway to heaven, 헤비메탈


-
글 | 이즘
이즘(www.izm.co.kr)은 음악 평론가 임진모를 주축으로 운영되는 대중음악 웹진이다. 2001년 8월에 오픈한 이래로 매주 가요, 팝, 영화음악에 대한 리뷰를 게재해 오고 있다. 초기에는 한국의 ‘올뮤직가이드’를 목표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힘썼으나 지금은 인터뷰와 리뷰 중심의 웹진에 비중을 두고 있다. 풍부한 자료가 구비된 음악 라이브러리와 필자 개개인의 관점이 살아 있는 비평 사이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
-
Led Zeppelin - Led Zeppelin IV
Led Zeppelin
14,300원(18%
 + 1%
+ 1% )
)
-
-
Led Zeppelin - Celebration Day
49,820원(19%
 + 1%
+ 1% )
)
PYCHYESWEB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