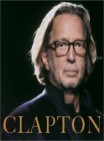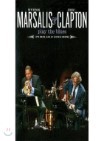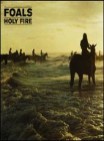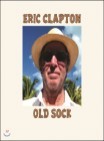칼럼 > 음악 > 주목, 이주의 앨범
살아있는 전설의 여유 있는 음악 이야기-에릭 클랩튼, 포올스, 자이언티
감사와 경배, 그리고 헌사의 연속, 에릭 클랩튼(Eric Clapton) 멋스러워진 댄스 록 세계로의 초대, 포올스(Foals) 작사, 작곡, 프로듀싱을 진두지휘하는 ‘수퍼 루키’의 탄생, 자이언 티(Zion. T)
‘기타의 신’ 에릭 클랩튼이 신보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신곡 두 곡과 함께, 자신의 삶과 음악의 기반이 된 곡들을 재해석하여 수록하였는데요,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거장의 관록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앨범, < Old Sock >을 만나보세요. 국내에서도 점차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영국의 5인조 인디 밴드 포올스의 앨범과 정식 데뷔 전부터 매력적인 음색으로 주목을 받은 자이언티의 정규 1집도 함께 소개합니다.
- 글 | 이즘
‘기타의 신’ 에릭 클랩튼이 신보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신곡 두 곡과 함께, 자신의 삶과 음악의 기반이 된 곡들을 재해석하여 수록하였는데요,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거장의 관록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앨범, < Old Sock >을 만나보세요. 국내에서도 점차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영국의 5인조 인디 밴드 포올스의 앨범과 정식 데뷔 전부터 매력적인 음색으로 주목을 받은 자이언티의 정규 1집도 함께 소개합니다.
에릭 클랩튼(Eric Clapton) < Old Sock >
21번째 정규 앨범 < Old Sock >은 고희를 바라보는 대가 에릭 클랩튼의 ‘음악 재발견’이다. 화이트 블루스의 정수를 만방에 떨친 일렉트릭 기타의 아이콘이지만 그가 좋아하는 음악이 오로지 블루스만은 아닐 것이다. 이번 작품에서는 자신의 음악적 토대이자 자양분이 되었던 모든 것을 한데 모아 토로했다. 블루스는 물론, 재즈, 레게, 스탠더드 팝과 경음악까지, 장르의 구분은 없다.
2000년대 이후 에릭 클랩튼은 음악 경력을 재정비하는 음반을 연달아 발표했다. 우선은 명인들과 함께한 ‘블루스 협업’이다. 비비 킹(B.B. King)과는 < Riding With The King >(2000)을 선보이며 화제를 모았고, 제이 제이 케일(J.J. Cale)과는 케일의 스타일을 그대로 따르며 < The Road To Escondido >(2006)를 함께하기도 했다. 그리고 블라인드 페이스(Blind Faith) 시절의 동료 스티브 윈우드(Steve Winwood)와 < Live From Madison Square Garden >라는 라이브 앨범을 발매하기도 했다. 로버트 존슨(Robert Johnson)에 대한 트리뷰트 앨범 < Me And Mr. Johnson >(2004)을 통해서 정신적 스승에 대한 존경과 감사 역시 잊지 않았다.
< Reptile >(2001)과 < Back Home >(2005)은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그대로 드러나는 앨범이었다. 형제애,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가족 앨범’이기 때문이다. < Clapton >(2010)에서는 스탠더드 넘버를 선보이기도 했고, 윈튼 마살리스(Wynton Marsalis)와 함께한 공연 실황 < Play The Blues: Live From Jazz At Lincoln Center >(2011)를 통해 재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들려줬다.
최근작의 키워드는 ‘장르 통합’이다. 반세기 가깝게 음악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에게 영향을 준 곡들을 재해석하고 헌정한다. 멀게는 블루스 뮤지션의 꿈을 꾸게 해주었던 로버트 존슨에서부터, 자신의 연주를 보고 꿈을 키워온 개리 무어까지 존경의 대상에 선배와 동료, 후배의 구분은 없다. 새로운 앨범 < Old Sock >은 이 모든 것을 요약한 편집(編輯)이다.
우선 신곡이자 첫 싱글로 커트된 「Gotta get over」는 공격적이고 스트레이트한 기타 리프에 에릭의 힘 있는 보컬이 어우러지는 곡으로, 오랜 동반자인 도일 브램홀의 작품이다. 데렉 앤 더 도미노즈의 활동 직전, 델라니 앤 보니(Delaeny & Bonnie)와 발표했던 < On Tour With Eric Clapton >과 클랩튼의 첫 앨범 < Eric Clapton >에서 델라니 브램릿(Delaney Bramlett)이 작곡한 곡들과 비슷한 인상을 전한다. 더욱이 베테랑 소울 싱어 샤카 칸(Chaka Khan)이 백 보컬로 참여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신곡인 「Every little thing」 역시 브램홀이 클랩튼의 가족을 위해 쓴 곡이다. 유려한 멜로디의 팝이지만, 앨범 전체의 기조인 레게리듬은 곡의 주재료다. 후반에는 여자 아이들의 코러스가 등장한다. 주인공은 클랩튼의 세 딸인 줄리(Julie), 엘라(Ella), 소피(Sophie)의 목소리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행복으로 현재의 삶 그대로를 노래한다.
「Further on down the road」는 타지 마할(Taj Mahal)의 초기 명작 < Giant Step >에 수록된 곡이다. 털사 크루(Tulsa crew)인 제이미 올드애이커(Jamie Oldaker), 칼 래들(Carl Radle) 그리고 딕 심스(Dick Sims)와 미국 투어를 할 당시 처음으로 접한 작품이라고 한다. 블루스 기타리스트로서 솔로 앨범을 기획할 당시에 절대적 영감은 원곡 그대로의 레게리듬으로 되살렸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스탠다드 넘버 「The folks who live on the hill」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버전인 페기 리(Peggy Lee)의 감성에서 착안했다. 예닐곱의 당시에는 듣지 못했던 그녀만의 새로운 기교는 감성어린 목소리로 스며들어있다. 행크 스노우(Hank Snow)의 「Born to lose」는 캐나다에 뿌리를 둔 클랩튼의 본능적 끌림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올드 스쿨 컨트리의 팬인 그는 레이 찰스(Ray Charles)의 버전을 접한 후 자신의 곡으로 소화해야겠다는 확신으로 작업에 임했다고 한다.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조우한 미국의 블루스 거장 제이 제이 케일(J. J. Cale)과의 협업은 이번에도 존재한다. 클랩튼 대부분의 앨범에 등장하는 그의 작품은 크림(Cream)시절 화염을 내뿜으며 몰아치는 록 기타에서 ‘슬로우핸드 블루스’라는 일상일대의 방향 전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수록곡인 「Angel」 역시 케일에 대한 오마쥬를 레이드백(laid-back) 스타일로 그려냈다.
빌리 할리데이에 대해서 큰 감흥이 없던 에릭 클랩튼은 나이가 들고서야 그의 엄청난 팬이 되었다고 한다. 오로지 연주에만 몰두했던 ‘기타의 신’은 세월이 흘려보내며 편견을 넘어섰고, 새로운 이해를 통해 「All of me」라는 곡을 재창조했다. 곡의 크레딧에 이름을 올린 폴 매카트니(Paul McCartney)와의 듀엣과 그의 베이스 연주는 위대한 거장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또 하나의 듣는 재미다.
팬들의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개리 무어의 「Still got the blues」 일 것이다. 록 팬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을 일렉트릭 블루스의 명곡이다. 이번 앨범에서는 원곡과는 완전하게 동떨어진 재즈적 접근의 어쿠스틱 버전으로 재탄생 되었다. 의도는 뚜렷하다. 그에 대한 에릭 클랩튼의 존경을 담음과 동시에, 어떤 방식으로도 해석해도 완벽한 명곡임을 알리려는 의도다.
데이빗 보위가 건네준 타이틀 < Old Sock >은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깨우침을 한데 엮은 음악 이야기다. 자신을 있게 해준 음악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노래하고 연주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서야 시대를 껴안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Guitar God」은 평생을 듣고 즐겨온 ‘내 안의 음악’을 다시금 자신만의 손맛으로 재창조하고 있다. 위대한 노장의 선율에는 안정감이 넘친다. 그 때문에 과거의 음악을 들추어내며 비교하는 작업은 무의미하다.
젊을 때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고 위로만 올라가려고 한다. 은인이나 감사해야 할 것들에 대해 놓치게 된다. 이제 그는 순수했던 어린 시절이 주는 의미를 깨우칠 나이가 됐다. 에릭 클랩튼은 명과 암이 교차한 인생을 모두 지나쳐왔다. 감사와 경배, 그리고 헌사의 연속이다. 이것이야말로 오로지 오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음악적 경지다.
2013/04 신현태 (rockershin@gmail.com)
포올스(Foals) < Holy Fire >
2013년 7월에 열리는 안산 밸리 록페스티벌의 라인업에 영국의 5인조 밴드 포올스의 이름이 올랐다. 이들의 인지도는 아직 유럽을 주 무대로 하는 인디 밴드에 속하지만 한반도에 상륙할 만큼 마니아적 인기는 단단하다. 발매하는 앨범마다 차트 10위 안에 오르는 도약력이 음반을 구매하는 인디 팬들의 애정을 반증할 뿐만 아니라 2009년의 2집 < Total Life Forever >를 기점으로 국내에서도 이들의 지지 세력이 팽창하고 있다.
포올스가 마니아에게 애정을 받는 이유는 독특한 음악 색에 있다. 이 퀸텟은 포스트 펑크 밴드인 토킹 헤즈 풍의 댄서블한 리듬으로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면서 신시사이저를 통해 신비로운 아우라를 창조한다. 2000년대 초반 포스트 펑크의 부활을 이끈 프란츠 퍼디난드의 춤추기 좋은 그루브와 현재 이매진 드래곤스 등을 통해 인디 계에서 재부상한 신스 팝 스타일, 두 요소를 연결하는 동시에 오묘하게 조합하고 있다.
「Bad habit」과 「Late night」, 「Moon」 또한 몽환적이며 현악 스트링까지 사용된 「Milk and black spider」는 풍부하면서도 탁하다. 분명 리듬과 선율이 뚜렷하던 전작 < Total Life Forever >과는 대비되는 명도이다.
갑작스런 변화는 언제나 위험을 동반하듯 기존 팬들이 이질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이를 미연에 방지시킨 것은 정교함. 1970년대 아트록의 명곡 「Epitaph」를 낳은 킹 크림슨의 리더 로버트 프립에 영향을 받은 이들은 자로 잰 듯 정교한 연주로 펑키(Funky) 리듬을 보호했으며 영롱한 기타 톤과 상응하는 소리의 우드블럭 퍼커션을 첨가해 영리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싱글 「My number」는 변화와 정체성의 이상적인 공존을 선보인다. 클럽에서 마약을 한 것처럼 보이는 관객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뮤직 비디오의 한 장면처럼 직감적이면서도 환각적이다. 영국 차트 23위를 기록하며 그들의 싱글 성적을 갱신한 중독적인 이 곡은 안산 밸리 록페스티벌에서도 팬들을 마력에 빠뜨릴 것이다.
< Holy Fire >는 영국 앨범차트에서 2위를 기록해 그 기세를 멈추지 않는다. 호주와 아일랜드에서 각각 1위와 7위에 등극했으며, 2013년 2월에 시행된 NME 어워즈에선 앨범이 발매된 지 한 달 만에 첫 번째 싱글 「Inhaler」가 베스트 트랙 부문을 수상했다. 2011년 그래미 어워즈에서 올해의 앨범을 거머쥔 아케이드 파이어부터 시작해 2013년의 주인공 멈포드 & 선스까지 인디 밴드의 대세 속에서 포올스라는 또 다른 대항마가 본격적으로 출격했다.
2013/04 김근호 (ghook0406@hanmail.net)
자이언 티(Zion. T) < Red Light >
‘내 목소리가 맘에 든다면 주저 말고 Click Me, Click Click Me.’
수많은 자기 과시와 허세로 가득한 최근 신예들과는 달리, 자이언 티(Zion. T)는 인기를 구걸하지 않았다. 3분이 채 되지 않는 고고한 데뷔곡 「Click Me」는 진솔한 자기소개서였고, 그 속에서 배어나오는 매력에 대중들은 매혹되었다. 전례 없는 독특한 보컬 톤과 본토의 느낌이 물씬 배어나오는 그루비한 리듬감을 지니고 있던 그의 재능은 프라이머리(Primary)를 만나 만개했다. 「씨스루」와 「만나」 등의 히트 싱글이 탄생했고, 이외 수많은 피처링 작업을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도 ‘수퍼 루키’로서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 Red Light >는 또 다른 형식의 「Click me」이다. ‘Groovy한 걸음 걸이의 skinny red’와 같은 자기 어필이 데뷔곡에 담겨있었다면, 본 앨범은 존재 뿐 아니라 자신이 지향하는 음악과 가치관을 어필한다. 관능적인 노랫말과 능청스러운 그루브, 다양한 보컬 운용으로 대표되는 그의 음악은 전형적인 소울 (Soul)이다. 그러나 마냥 복고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와 현대를 오가며 세련된 맛을 더하고 대중적인 감각을 발휘하여 접점을 마련한다. 「뻔한 멜로디」는 이러한 고민의 가장 훌륭한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한 템포 늦는 킥으로 그루브의 절정을 들려주는 「Doop」, 아르페지오 신디사이저 사용으로 몽환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Neon」 등은 솔로 앨범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정취이며, 자이언 티 표 팝 싱글의 계보를 이어가는 「Babay」와 「She」, 「도도해」 등은 앞선 활동에 익숙한 대중들의 만족을 고려하고 있다. 앨범 후반부의 인스트루멘탈과 「Neon」의 감독판 버전 배치는 앨범의 전체적인 유기성을 더욱 강화하며 다양한 요소들을 하나로 녹여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몇몇 대중들에게 작품은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다. 이제까지 자이언 티와 다른 뮤지션들의 협연에 익숙한 이들에게 앨범은 불친절하게, 또 독선적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 소울과 힙합, R&B와 팝 발라드 등에 대한 규정이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채 그저 ‘발라드’라는 이름 하나로 설명되는 한국 블랙뮤직의 현실은 < Red Light >에 대한 대중들의 공정한 평가를 힘들게 한다.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를 의식하여 싱글만은 의도적인 ‘발라드’로 정하거나, 혹은 그들의 가치관을 변경하여 음악노선을 틀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이도 저도 아닌 모호한 결과물만을 낳고 있을 뿐이다.
자이언 티의 매력은 바로 이 점에 있다. 그는 시류를 쫓아가지 않고, 시류가 자신을 쫓아오도록 만들었다. < Red Light >는 소울 뮤지션으로서의 정체성과 대중적 압박이라는 쌍방향적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 속에서 유유히 자신만의 길을 걷는 작품이다.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주저앉고 마는 다른 뮤지션들과 달리, 자이언 티는 그 접점을 슬기롭게 찾아냈다. 「Click Me」가 발매된 지 정확히 2년째 되는 지금, 대중들은 ‘21세기 소울 스타’의 영리한 데뷔작을 수없이 클릭하고 있다.
2013/04 김도헌(foerver36@naver.com)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관련태그: 에릭 클랩튼, 포올스, 자이언티, Eric Clapton, Foals, Zion. T


-
글 | 이즘
이즘(www.izm.co.kr)은 음악 평론가 임진모를 주축으로 운영되는 대중음악 웹진이다. 2001년 8월에 오픈한 이래로 매주 가요, 팝, 영화음악에 대한 리뷰를 게재해 오고 있다. 초기에는 한국의 ‘올뮤직가이드’를 목표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힘썼으나 지금은 인터뷰와 리뷰 중심의 웹진에 비중을 두고 있다. 풍부한 자료가 구비된 음악 라이브러리와 필자 개개인의 관점이 살아 있는 비평 사이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
-
Delaney & Bonnie - On Tour With Eric Clapton
Delaney & Bonnie
14,300원(18%
 + 1%
+ 1% )
)
-
-
Eric Clapton - Back Home
<Eric Clapton>
18,900원(19%
 + 1%
+ 1% )
)
-
-
J.J.Cale & Eric Clapton - The Road To Escondido
13,400원(19%
 + 1%
+ 1% )
)
-
-
Eric Clapton - Eric Clapton
<Eric Clapton>
17,500원(19%
 + 1%
+ 1% )
)
-
-
Eric Clapton And Steve Winwood - Live From Madison Square Garden
Eric Clapton And Steve Winwood
22,600원(19%
 + 1%
+ 1% )
)
-
-
Eric Clapton - Me And Mr Johnson
<Eric Clapton>
18,900원(20%
 + 1%
+ 1% )
)
-
-
Eric Clapton - Reptile
<Eric Clapton>
18,900원(19%
 + 1%
+ 1% )
)
-
-
Foals - Total Life Forever 폴스 2집
13,400원(19%
 + 1%
+ 1% )
)
-
-
Eric Clapton - Clapton
13,400원(19%
 + 1%
+ 1% )
)
-
-
Taj Mahal - Giant Step/De Ole Folks at Home (2 On 1CD)(CD)
<Taj Mahal>
23,300원(0%
 + 1%
+ 1% )
)
-
-
Foals - Holy Fire (CD)
<Foals>
26,400원(0%
 + 1%
+ 1% )
)
-
-
Eric Clapton - Old Sock
17,800원(19%
 + 1%
+ 1% )
)
-
-
자이언티 (Zion.T) 1집 - Red Light
11,900원(20%
 + 1%
+ 1% )
)
PYCHYESWEB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