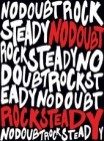칼럼 > 음악 > 주목, 이주의 앨범
감성의 프런트 맨, 열정의 프런트 우먼 - 뜨거운 감자, 노 다웃, 데이브 매튜스 밴드
“누가 달콤한 걸 싫어해.” 뜨거운 감자의 다섯 번 째 사색 11년 만에 정규앨범을 발표하며 돌아온 노 다웃(No Doubt)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한 데이브 매튜스 밴드의 정규 8집
이쯤 되면 ‘마성의 남자’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죠. 김C가 속한 밴드, 뜨거운 감자의 신보 소식입니다. 이번 앨범에는 기존의 음악들보다도 좀 더 사색과 고민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스스로 ‘작가’의 음악이라 이야기하는 뜨거운 감자의 음악세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 글 | 이즘
이쯤 되면 ‘마성의 남자’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죠. 김C가 속한 밴드, 뜨거운 감자의 신보 소식입니다. 이번 앨범에는 기존의 음악들보다도 좀 더 사색과 고민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스스로 ‘작가’의 음악이라 이야기하는 뜨거운 감자의 음악세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프런트 우먼인 그웬 스테파니로 유명한 밴드 노 다웃이 11년 만에 정규앨범을 발표하며 돌아왔습니다. ‘초심으로의 회귀’라는 수식이 어울리는 데이브 매튜스 밴드도 정규 8집을 발표하며 음악 마니아들 사이에서 호평을 얻고 있죠. 이번 주 역시 반가운 앨범이 많은 한 주네요.
뜨거운 감자 < Who Doesn`t Like Sweet Things. >
앨범의 심볼에는 두 가지 표정이 숨어있다. 바로 보기에는 엄지를 치켜들고 웃고 있지만, 거꾸로 보면 괴로운 듯 인상을 찡그린다. 엄지손가락까지 바닥으로 내렸다. 앨범 제목도 중의적이기는 마찬가지다. < Who Doesn`t Like Sweet Things. > 문장의 의미만큼 중요한 것은 마침표다. “누가 달콤한 걸 싫어해?”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달콤한 걸 싫어해.” 하는 혼잣말이다. 5집 타이틀에 뜻에 대해서는 밴드 리더인 김C의 말을 잠시 빌린다. “우린 단것에 익숙하고 길들어 있지 않나. 통념적인 의미에서 길들고 싶지 않다는 의미다.”
처음에는 정규 앨범치고는 곡수가 좀 적다고 생각했다. 「Bless me(2집 수록곡)」와 「여의도의 꽃들은 좋겠네(1집 수록곡)」는 리메이크이니 신곡은 총 6곡인 셈이다. 하지만 이내 곡 수로 앨범의 체중을 재려한 경솔을 후회한다. 각 곡마다 사색과 세공이 가득 차있다. 이번 5집을 소개하며 김씨는 ‘우리는 작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대중이 원하는 것에 맞추기 보다는 새로운 것을 제시하면서 만든 이의 ‘의식’을 담았다는 선언이다.
그가 들려주는 「레밍」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자. 레밍은 쥐의 일종으로, 직선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종종 길을 잘못 들면 강이나 바다에 뛰어 들어 집단 자살을 하게 된다. “멍하니 걸어가도 바쁘게 걸어가도 / 정해진 길이라면 절대로 / 어차피 누구나 끝으로 가겠지” 그가 레밍을 보는 시선은 뭇사람들처럼 어리석음에 대한 조롱이나 단순한 경계가 아니다. 결코 낯선 풍경이 아니기에 레밍을 보는 그의 마음은 복잡하다. 레밍의 떼거리 근성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고 적에 집단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습성이라고 한다. 조금 더 깊이 알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내면도 그와 마찬가지로 부산스러워진다.
사랑과 앎은 뗄 수 없는 관계다. 한 철학자는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된다”고 하였다. 이런 이치는 “사랑하면 알게 되고 / 알면은 보이게 되고 / 보이는 건 아는 거고 / 아는 건 사랑인거지” (「‘꽃이 있어 나비 온다’는 우리의 생각이다」 중에서)에도 고스란히 녹아있다. “갈 때 까지 가다가 지치면 돌아오면 돼”라고 말하는 「그러지 않을 수 있었는데 (Error)」에도 상징으로 도배를 하거나 비틀거나 젠체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소견을 전한다. 이런 관조들은 일관되게 흘러 리메이크곡에도 상통한다. 「Bless me」는 도대체 무언지도 모르면서 조바심에 주먹을 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 이야기를 노래하고, 「여의도의 꽃들은 좋겠네(1집 수록곡)」는 이쪽저쪽으로 지나가는 사람(다리)과 자동차가 있는 도심 풍경을 전한다.
이런 굵직한 주제는 흐트러짐 없이 우리에게 도달한다. 이는 음성의 힘이 크다. 외모와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의 닮은꼴이라고 생각됐던 목소리는 이제 우리에게 또렷하게 분별된다. (이는 방송의 역할도 클 것이다.) 「팔베게」의 신경질적인 외침도, 「자화상」의 차갑고 낮은 소리도, 「‘꽃이 있어 나비 온다’는 우리의 생각이다」 의 한층 상기된 목소리도 한 마디씩 정확하게 박힌다. 마치 내레이션처럼 극적인 효과가 부가되면서 보컬의 표현력도 한층 깊어졌다.
멤버가 둘이다 보니 전자악기의 비중이 대폭 늘었다. 하지만 어색하게 옆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맞붙어 자연스럽다. 전자악기와 인간이 만드는 소리는 둘이 손을 꼭 잡고 상승해 ‘알람’을 울린다. 「팔베게」는 하이라이트에서 연출되는 슬로우 비디오처럼 ‘느림’과 ‘비움’으로 가득 채운 극적인 여백을 구축한다. 특히 「자화상」은 앨범의 백미다.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전자비트가 보슬비처럼 잦아드는 찰나, 숨이 턱 막히면서도 긴장은 풀려 편안해진다. 이는 그동안 뜨거운 감자의 곡에서는 찾기 힘들었던 감각으로 김씨의 솔로 곡에서 사용한 ‘덥’과도 연이 깊다.
| |||||||||||||
글 / 김반야(10_ban@naver.com)
노 다웃(No Doubt) < Push And Shove >
마지막 정규앨범 < Rock Steady >를 발매했던 것이 2001년. 노 다웃(No Doubt)은 오랜 시간동안 가게 셔터를 올리지 않았다. 또한 솔로로 나섰던 보컬 그웬 스테파니(Gwen Stefani)의 정규 활동 역시 2006년 이후로 잠정 휴업을 지속해왔으니, 세간에서 이들의 해체설이 나돌 만도 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밴드는 공식적으로 해체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다.
휴화산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한 것은 2009년 무렵이었다. 섬머 투어 2009(Summer Tour 2009)이라는 이름 아래 이들은 다시 무대 위에 올라섰고, 또 하나의 베스트 앨범 < Icon >을 내놓으며 디스코그래피의 수직선을 연장했다. 새 작품의 작곡에 온전한 시간을 쏟았던 2010년이 지난 이듬해 2011년, 레코딩 세션을 차려놓은 스튜디오로 밴드는 마침내 입성하게 된다.
 |
리듬 파트의 촘촘한 분절과 멜로디 파트의 완만한 연결이 공존하는 「One more summer」또한 흥미롭지만 우선적으로 시선이 머무는 트랙은 앨범과 동명인 「Push and shove (Feat. Busy Signal & Major Lazer)」다. 댄스 리듬과 스카 사운드, 랩 라인과 발라드 라인이라는 서로 다른 특성이 혼재되어있음에도 곡은 놀라우리만큼 집중도를 유지한다. 각각의 요소를 적재적소에 배치시킨 탄탄한 짜임새 덕분으로, 싱글이 가지는 특 장점인 동시에 컨템포러리적 접근에 있어서도 녹록치 않은 밴드의 감각을 반증하고 있다.
한 바탕 강렬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부드러운 트랙들이 여유로움을 환기한다. 보컬 연기가 돋보이는 「Easy」와 팝 친화적 사운드를 바탕으로 한 「Gravity」는 이러한 흐름의 선상에 있는 곡들. 그러나 뒤로 갈수록 남은 트랙들이 비슷한 느낌으로 중첩되는 탓에 음반의 후반부는 연성의 분위기에서 크게 못 벗어나고 있다. 스카 리듬이 심어놓은 「Sparkle」을 제외하고는 딱히 이렇다 할 트랙이 보이지 않아 지루감이 유발된다.
11년 만에 재개한 활동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신보는 결점을 충분히 상쇄시키고도 남는다. 무엇보다도 간만에 빚어낸 이 결과물은 팝과 록의 절묘한 혼합을 기다리던 기존의 팬들과 댄스 사운드에 길들여진 새로운 음악 팬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갖가지 요소들을 고루 가지고 있다. 마샬(Marshall) 앰프가 대오를 갖춘 야외 스테이지에서도, 화려한 스텝이 오가는 댄스 플로어 위에서도 < Push And Shove >의 트랙들은 어색함 없이 잘 어울린다. 복귀 앞에 놓인 시간과 세대의 간극을 밴드는 그 누구보다도 매끄럽게 채워 넣는데 성공했다.
| |||||||||||||
글 / 이수호 (howard19@naver.com)
데이브 매튜스 밴드(Dave Matthews Band) < Away From The World >
색소폰 주자 르로이 무어(LeRoi Moore)의 추모를 위해 만들어진 전작 < Big Whiskey And The GrooGrux King >은 ‘울며 웃는 얼굴’의 커버 이미지와 상통하는 침울한 기운이 감지되었지만 풍성하고 웅장한 소리를 담아낸 작품이었다. 새로 공개된 정규 8집 < Away From The World >에서는 ‘답답한 개인의 공간’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인간의 심정을 그대로 나타냈다. 더 우울하고 어두워진 감정의 표현 그리고 안정과 절제의 소리가 공존한다.
“거친 잡음은 우리의 야망과 타오르는 에너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 앨범으로 우리는 큰 족적을 남길 것이다”-데이브 매튜스(Dave Matthews)
음악에 대한 넘치는 자신감은 이들의 가장 큰 힘이다. 이런 올곧은 태도를 견지하며 밴드는 다시금 출발선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회귀 본능을 원조해줄 길라잡이로 낙점된 인물은 초기 사운드를 정립해준 명 프로듀서 스티브 릴리화이트(Steve Lillywhite)다. 12년 만의 재회도 의미가 크겠지만, 무엇보다 동료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불가피한 멤버 변동에 따른 조화와 적응 그리고 중심을 다잡는 것도 밴드의 중요한 과업이었다.
 |
인도주의적 사랑을 노래하는 「Mercy」는 차분한 기운을 유지하는 가스펠 풍의 작품이다. 진화와 멸종 그리고 생태계라는 주제 의식 속에서 혼돈과 평화를 담아냈다는 「Gauch」는 곡의 스타일과 완성도에 있어서 중심이 된다. 「Rooftop」는 팀워크 과시용 트랙이다. 록을 기반으로 컨트리, 블루스, 포크, 재즈, 클래식, 펑크(Funk) 등의 다양한 장르로 통하는 소리의 집합을 유기적으로 배합해내는 위용을 뽐낸다.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미국적 정서와 맞아떨어지는 것이 팀의 이미지이자 음악적 특색임을 잘 나타내는 곡이다. 「Belly full」은 스킵 성으로 남기기엔 아름다운 코드 워크와 유려한 멜로디가 있는 곡이지만 짧은 러닝타임이 아쉽다.
사실 데이브 매튜스 밴드의 한국 내 인지도는 처량할 정도다. 1991년 결성 이후 음악 활동의 중심이었던 루츠 록이라는 장르의 인기와 그 성과는 자국인 미국으로 국한되었다. 이 한계점은 이들의 과거이자 현재, 그리고 미래가 될 개연성이 크다. 더욱이 밴드의 특성상 임프로비제이션(즉흥연주)이 두드러지는 복잡한 구성과 전개의 곡들이 주되기 때문에 음악 초심자들에게는 다소 거리감이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기타, 베이스, 드럼이라는 기본 편성 위에 색소폰과 바이올린의 조합은 시너지 효과 이상으로 작용한다. 겹겹이 쌓여있는 다층의 구조는 더 큰 음악을 구성한다. 이런 확장된 사운드와 고급스러운 분위기 형성을 통해 자신들을 차별화시키며 여타 밴드들과의 경계선을 확실히 긋는다. 더욱이 이들은 ‘제2의 그레이트풀 데드(Grateful Dead)’라고 칭해질 만큼 라이브에 정통한 ‘공연 특화형 밴드’다. 스튜디오 앨범에서 느낄 수 없는 현장감을 담아낸 라이브 음반이 더 인기 있는 기형적 셀링을 기록하기도 한다. 이는 공연을 통해 팬들과 함께 한다는 소통의 참의미를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이기도 하다.
| |||||||||||||
글 / 신현태 (rockershin@gmail.com)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관련태그: 뜨거운 감자, 노 다웃, 데이브 매튜스 밴드


-
글 | 이즘
이즘(www.izm.co.kr)은 음악 평론가 임진모를 주축으로 운영되는 대중음악 웹진이다. 2001년 8월에 오픈한 이래로 매주 가요, 팝, 영화음악에 대한 리뷰를 게재해 오고 있다. 초기에는 한국의 ‘올뮤직가이드’를 목표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힘썼으나 지금은 인터뷰와 리뷰 중심의 웹진에 비중을 두고 있다. 풍부한 자료가 구비된 음악 라이브러리와 필자 개개인의 관점이 살아 있는 비평 사이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
-
뜨거운 감자 2집 - New Turn
뜨거운 감자
11,900원(20%
 + 1%
+ 1% )
)
-
-
Dave Matthews Band - Everyday
17,500원(19%
 + 1%
+ 1% )
)
-
-
Dave Matthews Band - Under The Table And Dreaming
17,500원(19%
 + 1%
+ 1% )
)
-
-
뜨거운 감자 4집 - The Journey Of Cultivating A Potato Field (감자밭을 일구는 여정)
11,900원(20%
 + 1%
+ 1% )
)
-
-
뜨거운 감자 - Sound Track : 시소
11,900원(20%
 + 1%
+ 1% )
)
-
-
Dave Matthews Band - Big Whiskey & the GrooGrux King (Digipack)(CD)
<Dave Matthews Band>
25,800원(0%
 + 1%
+ 1% )
)
-
-
No Doubt - ICON
No Doubt
20,800원(19%
 + 1%
+ 1% )
)
-
-
No Doubt - Rock Steady (CD)
<No Doubt>
29,200원(0%
 + 1%
+ 1% )
)
-
-
No Doubt - Tragic Kingdom (SHM-CD)(일본반)
<No Doubt>
31,000원(0%
 + 1%
+ 1% )
)
-
-
No Doubt - Push And Shove (Deluxe Editiion)
18,800원(18%
 + 1%
+ 1% )
)
-
-
Dave Matthews Band - Away From The World (Digipack)(CD)
<Dave Matthews Band>
29,400원(0%
 + 1%
+ 1% )
)
-
-
뜨거운 감자 5집 - Who Doesn’t Like Sweet Things.
11,900원(20%
 + 1%
+ 1% )
)
PYCHYESWEB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