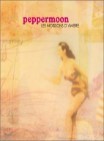칼럼 > 음악 > 주목, 이주의 앨범
인터넷과 TV가 만든 스타들
페퍼문(Peppermoon) , 제니퍼 허드슨(Jennifer Hudson) , 라디오 디파트먼트(The Radio Dept)
각각 미국 오디션 프로그램인 <아메리칸 아이돌>, 그리고 인터넷 ‘마이스페이스’를 통해 이름을 알리고 콘서트의 기회까지 얻게 된 제니퍼 허드슨과 프랑스 출신의 ‘페퍼문’.
각각 미국 오디션 프로그램인 <아메리칸 아이돌>, 그리고 인터넷 ‘마이스페이스’를 통해 이름을 알리고 콘서트의 기회까지 얻게 된 제니퍼 허드슨과 프랑스 출신의 ‘페퍼문’.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재능을 검증받고 알리는 일이 가능한 건 바로 ‘인터넷’과 ‘TV 프로그램’의 영향 때문이겠죠. 제니퍼 허드슨과 페퍼문의 2집, 라디오 디파트먼트의 베스트 싱글과 미공개 곡을 포함한 컴필레이션 음반을 소개합니다.
페퍼문(Peppermoon) <Les Moissons D> (2011)
 |
음반을 내놓기 전부터 ‘마이스페이스(Myspace)’에 올려놓은 자작곡들이 인기를 얻었고, 자연스레 콘서트도 하게 됐다. 2006년에는 스웨덴의 중견 인디 록 밴드 피터 비욘 앤 존(Peter Bjorn And John)의 오프닝 무대에 서기도 했고, 이듬해에는 마이스페이스에서 ‘차세대 유망주(Next Big Thing)’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모든 게 데뷔 전 일이었다.
2009년 데뷔 음반 <Nos Ballades (우리의 발라드)>가 ‘넷심’을 획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동명 타이틀곡이 방송 매체를 통해 제대로 소개되기도 전에 마이스페이스에서만 10만 건이 넘는 재생횟수를 기록했다.
페퍼문의 인기 요인은 부담스럽지 않은 음악에 있다. 달콤한 프렌치 팝과 인디 포크 음악을 퓨전시킨 사운드는 컴퓨터로 작업을 하거나, 수다를 떨 때, 서핑과 쇼핑을 할 때도 안성맞춤이다. 모니터에 몰입하는데 방해가 안되면서, 귀를 즐겁게 감싸준다. 오래 듣다 보니 춘곤증이 오는 것처럼 살짝 졸리기도 하다. 봄날의 따사로운 햇살을 닮았다.
이번에 발표한 2집도 마찬가지다. 팀을 이끌고 있는 키보디스트 피에르 파(Pierre Faa)는 세르쥬 갱스부르가 일궈낸 모던 샹송에 대한 추억을 되살린다. 고색창연한 정통 샹송에서 벗어나 때론 낭만적이고 때론 퇴폐적이며 때론 몽환적인 프렌치 팝을 주조해냈다. 보컬리스트 아이리스(Iris)의 재잘거림은 세르쥬 갱스부르의 여인들이었던 제인 버킨, 브리지트 바르도를 연상시킨다. 갱스부르가 곡을 써 준 프랑스와즈 아르디, 프랑스 걀의 이미지도 중첩된다.
아이리스의 나른한 보컬과 허스키한 남성의 목소리가 어우러진 「Le bonheur, ca fait mal (행복은 고통을 준다)」는 세르쥬 갱스부르가 딸 샤를로트와 함께 부른 「Lemon incest」를 떠올리게 한다. 19세기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들의 화풍처럼 생동감 넘치는 보컬이 인상적인 「Impressionnisme (인상주의)」도 낭만적인 모던 샹송의 모습이다.
하지만 파리에만 머물지는 않는다. 포크와 챔버 팝, 시부야케이 등 다양한 요소들을 끌어들여 현재와 조우한다. 「Cocoon (누에고치)」는 케렌 안의 우수에 젖은 포크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고, 「C'est la pluie qui Veut Ca (그것을 원하는 것은 비)」는 핀란드 전통 하프 칸텔레(Kantele)가 차가움을 선사한다.
인터넷을 통해 스타가 됐지만, 세상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오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편함을 추구하다 보니, 노래들이 밋밋하다. 드라마틱한 전개가 전혀 없다. 사람사는 세상이지 않는가.
글 / 안재필(rocksacrifice@gmail.com)
제니퍼 허드슨(Jennifer Hudson) <I Remember Me>(2011)
 |
나는 나를 기억해. 시카고의 극장을 돌아다니며 노래하던 10년 전 사진을 꺼내어 회상한다. 전작 <Jennifer Hudson>가 트렌디함으로만 메워졌다면 <I Remember Me>에서는 현재의 사진과 음악적 시발점의 일부분을 합성했다.
‘알앤비의 제왕’ 알 켈리 작곡의 「Where you at」, 단선의 피아노 루프가 인상적이며 펀치의 강약을 목소리로 재현해내는 「I remember me」, ‘소울의 여왕’ 아레사 프랭클린(Aretha Franklin)의 환영을 맞이하는 「Believ」. 니나 시몬(Nina Simone)의 1965년 작 「Feeling good」은 진한 소울의 울림과 금관악기의 강렬함으로 펼쳐냈다.
데뷔작에 참여했던 니요(Ne-Yo), 하비 메이슨 주니어(Harvey Mason Jr.), 팔로 다 돈(Polow da Don) 등도 여전히 함께 하고 있지만, 알 켈리(R. Kelly), 알리샤 키스(Alicia Keys), 스위즈 빗츠 (Swizz Beats) 등의 등장에 시선을 빼앗긴다. 제니퍼 허드슨의 가슴 깊숙이 덮여져 있던 굳건한 사운드를 소환해 내는데 협력한 동료들이다.
오랜 시간 축적해 놓은 음악적 잔향까지 12곡에 완전한 형태로 인화해내지는 못하지만, 트렌드를 반영함과 동시에 자신의 뿌리를 일부분 투영해 내는 데는 성공했다. 복잡한 인생의 사진들 속에서도 본인의 포트레이트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어서가 아닐까. 새로운 ‘시카고의 디바’는 점차적으로 변화하며 진중함을 강화하고 있다.
글 / 박봄 (myyellowpencil@gmail.com)
라디오 디파트먼트(The Radio Dept) <Passive Aggressive> (2011)
 |
스웨디시라고 해서 무조건 켄트(Kent)만을 떠올리라는 법은 없다. 같은 곳의 공기를 마시며 자란 이 인디 밴드는 올해로 활동 10년째를 맞는 중견 뮤지션이다. 이 앨범은 드림 팝을 지향하며 오랜 기간 꾸준히 자신들만의 길을 걸어온 증거로 내밀만한 베스트반이다. 여태껏 내놓았던 대표곡과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싱글의 B면들을 차곡차곡 모아 정리해 놓았다.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이들의 특징은 역시 다듬어지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거친 소리를 재현하려 했다는 것에 있다. 첫 곡인 「Why don't you talk about it」부터가 노이즈를 잔뜩 먹은 기타가 포문을 여는 형국이다. 이어지는 「Where damage isn't already done」에서도 그 소음은 걷히지 않은 채 몽롱한 신시사이저와 무감각한 목소리가 온몸을 이완시키며 정신을 산란시킨다. 「Annie Laurie」은 과도하게 울리는 보컬이 어쿠스틱 기타 하나에 의지하며 마치 지하실에 갇혀 부르는 듯한 고독함과 모호함을 뒤섞어 놓는다.
처음 접하는 이라면 이런 첫인상만으로도 지독하다는 느낌을 줄 듯 싶다. 그래도 이어폰을 차마 뽑지 못하는 것은 그 와중에도 귀를 휘감는 팝 감각 덕분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팝 밴드’라는 캐치프라이즈를 내밀 수 있었을까. 그 와중에 느껴지는 곡간의 급격한 온도변화는 머리카락이 곤두 설 만큼 찌릿함을 가져다준다. 거듭되는 릴리즈 행렬 속에서도 무게중심을 신시사이저, 기타, 비트 등으로 분산시켜 놓았던 준비성이 한데 모아놓음으로서 큰 빛을 발하고 있다.
언뜻 들으면 펫 샵 보이즈(Pet Shop Boys)의 「Being boring」이 떠오르는 「This past week」는 그나마 제정신으로 들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곡이다. 왜곡이 적고 명확한 멜로디가 굳건히 러닝타임을 떠받힌 덕분이다. 그래도 휘파람 소리를 닮은 소리의 파편은 여전히 공상과 현실의 경계에 있다. 첫 번째 시디의 후반부를 장식하는 가장 최근 싱글인 「Heaven's on fire」 역시 경쾌한 펑키 리프의 삽입으로 ‘들리는 노래’를 구현하며 찌뿌드드했던 몸을 흔들 스테이지를 마련해준다.
이렇게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과감한 선곡으로 부여되는 ‘듣는 재미’는 모음집이 주는 진부함을 상쇄시킨다. 두 번째 시디 역시 희뿌연 사운드로 그 심상을 종잡을 수 없게 만드는 「Liebling」으로 시작해 멜로디컬한 「Peace of mind」로 갑작스런 평화를 맞이한다. 이어 어쿠스틱의 질감을 전달하는 「What you sell」을 지나 「Closing scene」에서 다시금 최면을 걸며 마무리 된다. 50여분간의 여행을 마친 뒤 초점 없는 시선 끝에 떨어지는 건 겨우내 메마른 마음을 적시는 위안이라는 점이 독특하다.
켄트의 스웨디시 감성, 펫 샵 보이즈의 댄서블함, 엠지엠티(MGMT)의 사이키델릭이 한데 모여 있다. 물론 각자만큼의 밀도를 감지하기는 어렵지만, 결코 겹치지 않는 자신들만의 패러럴 월드를 단단히 구축했음을 피력한다. 무엇보다 음악의 건조함과는 달리 이성이 작용하기 전에 내 몸의 세포가 더 먼저 반응을 일으키는 감수성 본위의 작품이라 더욱 색다르다. 봄 날씨가 일으키는 우울작용으로 끝없는 침잠을 겪는다면 이 시디 두 장이 그대들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 감히 예언하고 싶다.
글 / 황선업(sunup.and.down16@gmail.com)
 제공: IZM
제공: IZM(www.izm.co.kr/)
관련태그: 페퍼문

-
-
The Radio Dept. - Passive Aggressive: Singles 2002-2010
16,300원(19%
 + 1%
+ 1% )
)
-
-
Peppermoon - Les Moissons D'Ambre
13,400원(19%
 + 1%
+ 1% )
)
-
-
Jennifer Hudson - I Remember Me
13,400원(19%
 + 1%
+ 1% )
)
PYCHYESWEB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