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예스 책꽂이 > 고전, 낯설게 읽기
윗사람을 풍자하여 백성들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자
올바른 정치 위해 시를 모으다
고전이 고민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지표와 이상의 별이 되고, 인간과 세계를 성찰하는 거울이 되게 하고, 한 편의 예술작품을 올바로 이해하고 감상하는 시금석이 되게 하고, 시와 인간과 자연을 사랑하는 시심(詩心)이 일게 하고, 때로는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촛불을 밝히는 공감을 불러일으키게도 하련다.
연재를 시작하며
고전?! ‘인류에게 빛이자 별이어서 누구나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극히 소수를 제하고는)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 고전이 아닐까. 이상과 현실 사이의 틈이 크레바스를 넘어 바다 수준이다. 왜? 어렵기 때문이다. 재미없기 때문이다. 올바로 안내해주는 글이 드물기 때문이다. 접근하는 방식이 고리타분하여 고증과 주석에 머물기 때문이다. 오늘 나의 삶과 동떨어져 있거나 현재와 대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인을 알았으면 고쳐야지, 암! 그래서 핵심을 잡아 쉽게, 재미있게 쓰며 올바로 안내하련다. 화쟁기호학, 서발턴 이론, 상호텍스트성 이론과 같은 새로운 방법론을 동원하여 고증과 주석을 넘어서서 새롭게, 낯설게, 비판적으로 해석하련다. 고전 그 자체에 담긴 진리에 충실하되, 21세기 오늘에 발을 디디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빛을 줄 수 있는 의미들을 찾으련다.
그래서 고전이 고민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지표와 이상의 별이 되고, 인간과 세계를 성찰하는 거울이 되게 하고, 한 편의 예술작품을 올바로 이해하고 감상하는 시금석이 되게 하고, 시와 인간과 자연을 사랑하는 시심(詩心)이 일게 하고, 때로는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촛불을 밝히는 공감을 불러일으키게도 하련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길더라도 어두운 하늘에 별이 빛나는 한, 아무리 지치고 고단한 몸이라도 잠깐 쉬어갈 길섶과 잠시나마 기댈 언덕이 있는 한, 그 여정은 의미로 가득하리라.
올바른 정치 위해 시를 모으다
외국인이 우리에게 한국문화와 예술에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개 한글, 석굴암, 팔만대장경, 국악, 판소리 등을 거론한다. 그러면 E. T.와 같은 외계인이 지구 문명에서 자랑할 만한 것을 묻는다면? 나는 ‘사랑’과 ‘예술’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사랑은 그렇다 치고 도대체 예술이 뭐기에?
남아 있는 것 가운데 인류 최초의 예술은 동굴벽화와 암각화다. 그들은 자신이 사냥하였거나 사냥하고픈 동물을 동굴 벽이나 바위에 그리거나 새겼다.
이런 동굴벽화나 암각화를 넘어서 예술이 무엇인지, 어떤 예술이 좋은 예술인지, 예술작품을 어찌 창조하면 좋은지라고 기록한 책, 그리하여 모든 예술을 하는 이들의 별이 된 것은 무엇일까. 서양에선 아리스토텔레스의 포에티카(poetica), 곧 우리가 『시학(詩學)』으로 번역한 책이고, 동양에선 공자의 『시경(詩經)』이다. 시에 관한 정의이지만, 당시에는 시가 예술의 정수라 생각하였고 시론이 소설론과 문학론, 더 나아가 영화이론으로 확장하였기에 여기서 ‘시’를 ‘예술’로 대체해도 좋다.
태초에 말이 있었고 노래가 있었다. 신에게 노래로 소망을 빌기도 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마음을 노래로 풀고 전하였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감탄하여, 임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나 의롭지 않은 것에 분노하는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 노래를 불렀다. 노래는 사람들을 울고 웃게 하였으며, 때로는 왕과 하늘마저 감동시켰다.
신문과 텔레비전이 없던 옛날에 임금은 어찌 백성들의 여론을 알 수 있었을까. 시와 노래에는 백성들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 있다. 그러니, 천자는 시를 채집하는 관리인 채시관(采詩官)을 두어 백성들이 부르는 시가를 모으도록 하였고[采詩], 그렇지 않으면 관료들이 백성들의 풍속을 관찰한 것을 시로 진술하거나[陳詩], 시를 바치게 하였다[獻詩]. 천자는 이들 노래를 듣고 백성들의 여론을 파악하여 자신이 정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았다.
주나라 좌구명(左丘明)이 『좌씨전』을 쓰기 위해 춘추시대(春秋時代) 8국의 역사를 나라별로 적은 책인 『국어(國語)』 「주어 상(周語 上)」 편과 반고(班固: A.D. 32~92)가 전한(前漢)의 역사를 편찬한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내를 다스리는 자는 이를 열어서 물길을 열고,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말을 펴서 말길을 연다. 때문에 천자가 다스림에 대해 알고자 하면 공경대부에서 선비에 이르기까지 시를 바치게 하였다.”
“예로부터 시를 모으는 관리가 있어서 임금은 이로 백성들의 풍속을 관찰하고 다스림의 잘하고 못한 득실을 따져 스스로 바로잡았다.”
고대시대에 군주가 할 최고의 일은 황하의 홍수를 다스리는 일이었다. 전설적인 군주인 우(禹, B.C. 2070년경)로부터 내려오는 치수(治水)의 방법은 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흐르는 대로 물길을 터주는 것이었다. 그렇듯 백성들이 임금과 관료들에게 가진 불만과 비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를 펴서 말길을 열고, 그 방편으로 백성들의 불만과 비판, 혹은 태평성대의 즐거움을 마음껏 노래하게 한다. 그리고는 공경대부에서 선비에 이른 자들은 이를 시로 지어 바친다. 또, 시를 수집하는 관리인 채시관을 두어 시를 모으게 한다. 그러면, 왕은 그 시를 듣고 시에 나타난 백성들의 마음을 읽고 자신이 정치를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그 득실을 따져, 잘못한 것이면 스스로 바로잡았다.
공자가 이렇게 하여 모아진 3,600편의 시가 가운데 305편을 골라 편찬한 노래집이 바로 『시경』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시경』은 서주(西周) 초기에서 춘추(春秋) 중기에 이르는 약 500여 년간의 노래를 모아 편찬한, 요새로 치면 ‘애창 가곡 및 대중가요 선집’이다.
지금 우리가 서점에 가서 볼 수 있는 『시경』은 원래 공자가 편찬한 책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한나라 때 『모시(毛詩)』 『노시(魯詩)』 『제시(齊詩)』 『한시(韓詩)』 등 사가(四家)로 부르는 4종의 주석본이 있었다. 다른 주석본은 다 사라지고, 조(趙)나라 사람인 모형(毛亨)과 모장(毛 ), 두 모공(毛公)이 주석한 본만이 남았는데, 그것이 바로 『모시』다. 우리가 지금 『시경』으로 읽고 있는 것은 실은 이것을 가리킨다.
『모시』의 맨 앞머리에 자하(子夏)의 작(作)이라는 「대서(大序)」가 있고, 각 시의 앞머리에는 자하와 모공의 합작이라는 「소서(小序)」가 있다. 「대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과 견줄 수 있는 시론을 펴고 있고, 「소서」는 일종의 시에 관련된 내용의 간략한 소개 및 비평이다.
백성을 깨우쳐 성정이 바른 세상을 이루다
공자는 『시경』을 편찬한 후, “시 3백 편을 한마디로 포괄하여 말한다면 생각하는 데 삿됨이 없는 것이다”라 하였다.03 공자는 3,000여 편의 시를 모아 305여 편으로 정리하고 보니, 내용도 소재도 다르지만 그들 시에 공통적인 시정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무사(思無邪)’, 세 글자로 요약한 것이다. ‘생각함에 삿됨이 없는 것[思無邪]’을 풀어서 말하면, 시의 목적이 인간의 성정(性情)을 바르게 하는 데[性情之正] 있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성정을 바르게 할 것인가. 이를 놓고 『논어(論語)』에서 시에 대한 공자의 언급과 『모시』 「대서」 등을 중심으로 동양에서는 2천여 년 동안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다. 보수적인 입장과 진보적인 입장이 있는데, 전자를 상이풍화하(上以風化下)의 교화론(敎化論), 후자를 하이풍자상(下以諷刺上)의 간서론(諫書論)이라 한다.
교화론은 철학에서 플라톤, 미학에선 헤겔과 상통한다. 이들에게 세상이 어두운 것은 백성이 어리석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세상을 밝게 할 것인가. 이미 성정의 바름에 이른 군자들이 어리석은 백성을 잘 가르쳐서 깨우쳐야 한다. 이럴 때 시란 군자들이 어리석은 백성을 교화하는 방편이다. 헤겔이 예술을 정신을 담는 좋은 방편으로 본 것처럼, 이들에게 시는 도(道)를 싣거나[文以載道] 밝히는[文以明道] 방편이다. 기(氣), 현실 세계는 선과 악, 바른 것과 삿된 것,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이 공존하니, 보이지 않는 이(理), 선하고 바르고 아름다운 이치를 글에 담아 드러내고, 인간이 그 글을 접하여 이에 담긴 도(道)를 깨닫고 선에 이르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니, 시란 『모시』 「대서」에서 밝힌 대로, “부부의 도리를 조리 있게 하여 효(孝)와 경(敬)을 이루고, 인륜을 두터이 하고 교화를 아름답게 하여 풍속(風俗)을 좋게 고치는” 수단이었다. 이런 논의를 절대화한 것이 주희(朱熹)의 주석서인 『시집전(詩集傳)』이다.
『시경』 「주송(周頌)」 가운데 〈소자를 불쌍히 여기소서閔予小子〉란 시를 보자.
閔予小子 소자를 불쌍히 여기소서.
遭家不造 집안의 큰일 겪고
遭家在家 의지할 바 없이 괴롭나이다.
于乎皇考 오호 크신 아버님이시여!
永世克孝 영원히 효도를 할 수 있게 해주소서.
굳이 해석할 것도 없다. 불효자들은 이 시를 읽고 효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 영세무궁 효를 행하라는 것이다. 아래 시조를 보자. 어버이 살으신 때 섬길 일이란 다 하여라
지나간 後면 애닯다 어찌 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정철의 <훈민가(訓民歌)> 중 한 수다. 이것도 깊이 해석할 것도 없이 “돌아가신 후 후회하지 말고 어버이가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하라”고 강권하고 있다. 위의 『시경』의 시가 시적화자 스스로 효를 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훀다면, 정철의 시조는 저 높은 곳에서 백성들을 내려다보며 효를 행하라고 권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시조 4,500여 수 가운데 절반이 넘는 것이 이와 궤를 같이한다.
공자는 “제자들아, 너희는 왜 시를 공부하지 않느냐? 시는 성정쟀 바른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사물을 통찰하게 하고 어울리게 하고 바르지 못함을 원망하게 하며, 가까이로는 어버이를 섬기고 멀리로는 임금을 섬기게 하며 새와 짐승과 풀과 나무의 이름을 잘 알게 한다”라고 시의 효용에 대해 말하였다.
위와 같은 시를 읽으면 우리들은 부모님께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여야 한다는 마음이 일어난다. 국화를 ‘선비의 지절(志節)’로 노래한 시조나 ‘실존’으로 노래한〈국화 옆에서〉란 시를 감상하면서 국화란 사물의 본질을 통찰한다. 시를 읽으면 사물과 내가 가까워지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약하고 두들겨 맞고 사라지는 것들에 연민을 갖게 되니, 사물과 사람과 어울리게 된다. 시를 짓고 감상하면서 불효자나 간신, 탐관오리를 미워하게 된다. 그러니 시는 가까이로는 어버이를 섬기며 효를 다하게 하고, 멀리로는 임금을 섬기며 충을 다하게 한다. 아울러 새와 짐승과 풀과 나무의 이름을 잘 알게 된다.
교화론의 입장에 선 이들이 충효 이데올로기만 강조한 것은 아니다. 서양인들은 중국의 시를 대하고 놀랐다. 남녀가 7세가 넘으면 같은 자리에도 앉지 못하게 할 만큼 강력한 유교 이데올로기를 강요한 한나라 시대에도 남녀 사이에 노골적으로 사랑을 읊은 시가 너무도 많이 발견되는 것이다. 이 괴리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 또한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 한마디로 유교에서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은 지조와 정절을 가진 사람이다. 군자의 충과 여인의 정절은 서로 통한다. 또 여인이 그토록 오매불망 그리며 사랑하는 임은 언제든 임금님으로 바꾸어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에 여인이 임을 절절하게 그리는 노래를 충과 동일시하였고, 그 노래의 ‘임’을 ‘임금님’으로 해석하며 음미하였다.
采采券耳 도꼬마리 캐고 또 캐어도
不盈頃筐 바구니에도 차지 않네.
嗟我懷人 아, 아! 임 그리워
嗟彼周行 바구니조차 길에 놓치네.
陟彼崔嵬 저 높은 산에 오르려 하나
我馬崔嵬 말이 뱀에 물려 주저앉으니
我姑酌彼金嵬 에라! 저 금술잔에 술을 부어
維以不永懷 임 생각을 잊어나볼까.
陟彼高岡 저 높은 산마루에 오르려 하나
我馬玄黃 검은 말이 누렇게 되었으니
我姑酌彼玄黃 에라 쇠뿔잔에 술이나 따라
維以不永傷 이내 시름 잊어나 볼까.
陟彼玄矣 저 돌산에 오르려 하나
我馬玄矣 내 말이 병이 들고
我僕玄矣 마부까지 앓아누웠으니
云何玄矣 아, 아! 어찌하면 좋으랴.
위의 작품은 『시경』 「주남(周南)」 중 〈도꼬마리[券耳]〉다. 한 평범한 여인이 임을 간절히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다. 한 여인이 봄날을 맞아 나물 캐러 나왔다. 열매는 약으로, 잎은 나물로 먹는 도꼬마리 풀을 뜯지만, 임 생각이 간절하여 뜯다 말고 멀리 바라보며 한숨을 짓고, 나물을 캐러 도꼬마리 풀에 손을 기울이지만 임이 몹시 그리워 먼 산만 바라본다. 그러니 하루 종일 캔들 바구니가 어찌 채워지겠는가. 돌아오는 길에 멍하니 임 생각을 하는 통에 반쯤만 채운 바구니조차 길에서 놓친다.
그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임 찾아가고자 행동으로 나서서 말을 타고 높은 산을 넘어 임 계신 곳으로 달려간다. 하지만, 말이 달리다 뱀에 물려 주저앉으니, 제정신으로는 버틸 수 없어 술에 의지하여 잊으려 한다.
또 그리고 그리다가 말을 타고 달리니 검은 말이 누렇게 되도록 기진하였다. 그새 금잔으로 술을 먹던 가세는 기울었다. 허기진 그리움에 나물도 캐지 못하는 여인네가 과연 무엇을 하여 가산을 챙기겠는가. 금잔 대신 쇠뿔잔에 술을 마시며 잊으려 한다. 다시 또 세월이 흘러 돌산을 넘어가려 하지만 말은 병들고 마부마저 앓아누웠다. 생략되었지만 가세는 더욱 기울어 아마 술 한잔 먹을 형편도 되지 않았을 듯하다. 그러니 여인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임께 달려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
시경의 시 가운데서도 임을 그리는 마음과 그에 따른 형편을 참 절절하게 묘사한 시다. 평범한 여인이 임을 그리는 이 노래를 두고 주희는 “주나라 문왕(文王)이 조회를 가거나 정벌을 나갔을 때, 혹은 감옥에 유배되었을 때 문왕의 아내 후비(后妃)가 문왕을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라고 하였다. 여인의 그리움을 임금에 대한 충으로 대체한 것이다.
윗사람을 풍자하여 백성들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자
하이풍자상의 간서론(諫書論)은 교화론과 대립되는 시론을 전개한다. 이들이 볼 때 세상이 어두운 까닭은 위에 있는 위정자들이 올바로 다스리지 못하였거나 부조리하고 부패하여 백성들을 지나치게 착취하고 억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세상을 바르게 하는 방법은 하늘의 마음을 닮은 백성들이 부조리와 부패를 일삼는 윗사람들을 풍자하고 비판하여 견제하는 것이다. 『시경』의 언급을 보자.
왕도(王道)가 쇠멸함에 이르러, 예절과 의리는 없어지고 다스림과 가르침은 사라졌으니, 나라마다 다스림이 다르고 집마다 풍속이 다르다. 이에 변풍(變風)과 변아(變雅)를 짓는구나. 국사는 득실의 자취를 밝히고 인륜이 사라졌음을 슬퍼하고 가혹한 형벌로 다스림을 애달파하여 성정(性情)을 읊어 윗사람의 잘못을 풍자하고 세상이 변하였음을 널리 알리니, 이는 옛 풍속을 그리워함이다. 때문에 변풍(變風)이 정(情)에서 일어나 예절과 의리에 머문다. 정에서 일어남은 백성의 본성이고 예절과 의리에 머묾은 선왕의 은택이다.
|
지금처럼 대통령이 독재를 행하고 관료들은 부패하고 국민 대다수가 욕망과 돈을 좇아 돈 몇 푼에 사람을 살해하는 일이 난무하는 시대를 생각하자. 그럴 때 예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유가의 이상 정치, 곧 인덕을 근본으로 하는 왕도(王道)가 쇠멸하여 왕은 폭정을 행한다. 예절과 의리는 땅에 떨어져 사람들 사이에 예의를 지키지도 않고 의리란 없이 서로 욕심과 이기심만 내세운다. 올바른 다스림과 가르침도 사라졌으니, 나라마다 다스리는 원칙이 없어 정치가 다르고, 가정마다 예절의 원칙이 없어 집집마다 풍속이 다르다.
『시경』의 노래는 풍(風)과 아(雅)와 송(頌)으로 나뉜다. 풍은 풍자하는 노래란 뜻도 있지만, 풍요(風謠), 곧 백성들의 민요를 가리킨다. 아는 바른 노래, 궁전의 공식적인 노래다. 송은 제사지낼 때 신을 찬양하거나 조상들의 은덕을 찬송하는 것이다. 태평성대를 노래하던 풍은 사라지고 부조리를 풍자하는 변풍이 유행한다. 아는 바른 노래인데 세상이 타락하였으니 변아를 짓는다.
조선조에 사관이 목숨을 걸고 연산군이 폭정을 휘두른 행적을 사초(史草)에 적지 않았는가. 폭군을 내쫓지는 못해도 그 행적과 정치의 득실을 적어 견제하려는 뜻이었다. 어무적(魚無迹)이라는 시인은 연산군에게 상소를 올리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하는 마음을 시로 읊었다.
왕이 그릇된 정치를 할 때 사관은 그 행적을 적어 역사로 기록하고, 시인은 노래를 불러 여론을 만든다. 그렇듯, 사관은 왕과 윗사람들이 행한 정치의 잘하고 못한 자취를 낱낱이 적어 후대에 평가를 받게 하며, 인륜이 땅에 떨어졌음을 슬퍼하고, 작은 죄에도, 혹은 죄가 없는데도 백성들을 가혹한 형벌로 다스리는 것을 애달파하고, 이처럼 슬퍼하여 올바른 도리를 추구하려는 성정(性情)을 시로 읊어 왕과 관료들의 타락을 풍자하고 세상이 변하였음을 널리 알린다.
이 모든 것은 요순시대에 나라를 잘 다스려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드리며 <격양가>를 부르던 옛 풍속을 그리워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하늘과 같은 백성들의 본성인 정(情)에서 세상을 바르게 하려는 시심(詩心)이 일어나 변풍을 만들며, 태평성대의 요임금과 순임금과 같은 선왕의 은택을 감사하며 당시의 올바른 예절과 의리를 가슴에 품게 된다. 『시경』 「위풍(魏風)」 중 〈큰 쥐야[碩鼠]〉를 보자.
碩鼠碩鼠 큰 쥐야, 큰 쥐야
無食我黍 내 기장일랑 먹지 마라.
三歲貫女 삼 년 동안 너와 알고 지냈거늘
莫我肯顧 나를 즐겨 돌아보지 않으니
逝將去女 가리라, 장차 너를 버리고
適彼樂土 저 낙토로 가리라.
樂土樂土 낙토여, 낙토여,
爰得我所 그곳에서 내 살 곳 찾으리.
碩鼠碩鼠 큰 쥐야, 큰 쥐야,
無食我麥 내 보리일랑 먹지 마라.
三歲貫女 삼 년 동안 너와 알고 지냈거늘
莫我肯德 내게 기꺼이 은덕을 베풀지 않으니
逝將去女 가리라, 장차 너를 버리고
適彼樂國 저 낙토로 가리라.
樂國樂國 낙토여, 낙토여,
爰得我直 그곳에서 내 곧게 살리라.
碩鼠碩鼠 큰 쥐야, 큰 쥐야,
無食我苗 내 벼싹일랑 먹지 마라.
三歲貫女 삼 년 동안 너와 알고 지냈거늘
莫我肯勞 나를 어여삐 여겨 달래지도 않으니,
逝將去女 가리라, 너를 떠나
適彼樂郊 저 국경 밖 낙토로 가리라.
樂郊樂郊 국경 밖 낙토여, 낙토여
誰之永號 누가 게서 길게 부르짖으랴!
작은 쥐가 쌀을 축내는 동물이라면, 큰 쥐는 탐관오리다. 탐관오리는 3년 동안 백성들이 열심히 일하고 조세도 제대로 갖다 바쳤건만 백성들의 삶과 사정을 무시하고 극심하게 수탈을 한다. 백성들은 참다 참다 못하여 그 땅을 떠나 수탈이 없는 낙원으로 가서 올바르게 살겠다고 선언한다.
본디 백성들은 거의 농민이라 땅에 뿌리를 두고 사는 이들인데 얼마나 수탈이 심하면 그 땅을 떠나겠노라고 외치고 있는 것인가. 그곳에서 올바르게 살고, 길게 부르짖지도 않으리라고 말하는 것은 거꾸로,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고, 매일매일 절규하며 사는 삶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큰 쥐’를 ‘쥐박이’로 바꾸면 어떨까? 이 시는 언제 어느 나라에서건 위정자를 풍자하는 시로 읽힐 수 있다.
간서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305편의 시 가운데 반이 넘는 160여 편의 시가 백성들의 민요인 풍(風)이라는 것, 위의 시처럼 윗사람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시가 다수라는 점을 들어 공자의 뜻이 간서론적 입장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조선조에서 지금 같으면 보수이념의 수장이라 할 만한 주희는 비판할 수 없는 절대권위로 군림하였다. 당연히 교화론이 유일한 시론이었다. 간서론과 같은 주장을 하면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몰려 죽음도 각오해야 했다. 간서론은 고려시대에 이규보에게서 싹이 보이다가 근대의 싹이 움트기 시작한 18~19세기에나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무릇 시의 본령은 부자와 군신, 부부의 윤리에 있다. 혹은 윤리의 실행을 즐거워하는 뜻을 선양하기도 하고, 성정이 바르지 못함을 원망하고 성정의 바름을 그리워하는 뜻을 이끌어 도달하게도 한다. 그다음으로는 세상의 그릇됨을 근심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겨 늘 힘이 없는 사람을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진휼하고자 방황하면서 불쌍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차마 버리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뒤에야 비로소 시가 되는 것이다. 단지 자신의 이해만을 주관하는 것은 시가 아니다.
다산 정약용은 시의 본령이 부자와 군신, 부부의 윤리를 세우는 데 있다는 교화론의 시론을 인정한다. 하지만 다산은 이에 더하여 당대 세계 모순에 대한 비판,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에 대한 고통과 그들을 구원하려는 마음이 진정한 시심(詩心)을 이루며 이것이 있어야만 비로소 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시인은 타락한 시대에 타락을 고발하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사르트르(J. P. Sartre)의 참여문학론과 상통하지 않는가.
다산은 세상이 그릇된 것을 근심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어, 힘이 없는 자를 구제하고 가난한 자들을 진휼(賑恤)하려는 마음, 그들을 어떻게 돕고 구제할 것인가 번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시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가 볼 때 출세나 입신양명 등 이해관계에 충실하여 쓰는 시는 시가 아니다.
이처럼 다산의 입장에서는 시대의 모순과 통치자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것이 성정의 바름을 추구하는 것이자 시의 본령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지 않으면 시가 아니며, 시국이 잘못됨을 가슴 아파하지 않고 풍속이 타락함을 분노하지 않으면 시가 아니며, 올바른 것을 아름답다 하고 그릇된 것을 비판하고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는 뜻이 없다면 시가 아니다.” 이처럼 혼돈의 시대를 치열하게 살았던 다산은 『시경』의 논지를 부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대의 대안으로서 간서론의 정당성을 펴고 있다. 봉건사회가 서서히 붕괴되고 서민의식이 성장한 탓이지만, 19세기 조선조에 간서론에 힘을 입어 상층을 풍자하는 시가 빈번히 나타난다.
힘 있고 강포한 이 용한 사람 치지 마라
은돈 많이 두고 가난한 이 빼앗지 마라
하늘이 취한 것 깨시면 재앙 면키 어려우니.
(4736번)
며칠을 굶어 몇백 원어치 빵을 훔친 이가 돈도 없고 ‘빽’도 없어 17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그런데 그를 감옥에 보낸 자들은 수억 원을 뇌물로 받고 성접대를 받았어도 감옥은커녕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 그러지 않아도 배가 터질 지경인 부자들의 세금을 감한 것이 20조 원이 넘는다. 그런 오늘의 맥락에서 위 시조를 읽어보자.
위 시조는 대략 19세기 말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악정음(雅樂 正音)』 「속편 상(續篇 上)」에 실린 것이다, 시조가 홀로 독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가창되는 장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떻게 공식적인 검열을 통과하여 시조집에 실렸을까 의아할 정도로 상층의 권력층과 부자계층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힘이 있고 사납고 포악한 이, 곧 권력을 가진 상층의 지배층을 이른다. 이들의 권력행사를 통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나운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층의 권력을 가진 사납고 포악한 이들이여 착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 은화를 많이 쌓아둔 부자들도 가난한 사람의 재물을 빼앗지 마라. 하늘이 취하였는데 이에서 깨어나시면 너희들은 재앙을 면하기 어렵다. 이 시조의 한문 제목은 악이 선을 범하지 말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삼키지 않음이라는 뜻의 〈無以惡凌善 無以富呑貧〉이다.
이는 도덕과 정의를 추구하는 자의 희망일 뿐, 실제 현실은 여기서 ‘無’ 자를 제외한 것이다. 곧, 악이 선을 능멸하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탐하는 부조리한 세계다. 시적 화자는 권력층이 하층민을 억압하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부조리한 세계를 하늘이 취한 것으로 규정한다.
악한 권력층과 부자계층에 대해 정의가 서게 되면 재앙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상층에 대해서는 경고요, 하층에 대해서는 절대 선으로서 하늘을 긍정하는 것이자 정의를 향한 비전이다. 어떤 고통과 억압이 있더라도 기댈 언덕이 있는 한 삶은 덜 곤고한 법, 한국의 민중은 하늘에 기대어 현실의 고통을 달랠 수 있었다. 하늘은 늘 절대 선의 세계다. 이 시조는 그런 하늘이 올바로 자리하지 않는 데 대한 분노 및 좌절과 하늘에 대한 기대감을 동시에 품고서 이를 시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관련태그: 고전

PYCHYESWEB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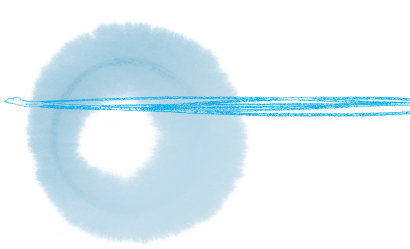

















 5%
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