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예스 책꽂이 > 허지웅의 테크노아포리즘
트위터는 세상을 바꾸는가?
트위터를 보면 하루에 두세 번씩 빼놓지 않고 올라오는 글이 있다. “트위터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다만 인류의 생활권이 확대된 꼭 그만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늘어났을 뿐이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세상은 단 한 번도 사용자와 노동자라는 시장의 기본전제를 벗어난 경험이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기술은 이 기본전제 혹은 원칙의 강화을 위해 종사해왔다. 생각해보시라. 우리는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경쟁해왔다.
트위터를 보면 하루에 두세 번씩 빼놓지 않고 올라오는 글이 있다. “트위터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트위터는 혁명이다” “세상을 바꾸는 건 트위터가 아니라 트위터러다” 기타 등등 아멘. 심지어 “제 트위터는 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이에요” 같이 아이돌적인 립서비스를 흘리거나 겨우 쌀로 밥 짓는 말을 늘어놓으면서 심오한 도(道)라도 깨운친 양 행동하는 유명 트위터 유저들도 쉽게 눈에 띄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게 대체 뭔 소리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사실 신기술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말은 오래된 수사다.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7층 컴퓨터부품 매장에서 4메가 메모리 모듈을 12만 원에 살 수 있었던 그때, 사람들은 ZIP DRIVE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 말했다. 다음에는 PC통신, 또 그다음에는 인터넷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TCP-IP와 WWW 프로토콜을 이용한 인터넷 브라우저 시대의 개막이었다. 컴퓨터 바탕화면에 전화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두근두근하는 심정으로 넷스케이프를 실행하던 시절이다. 크리넥스 티슈 박스를 옆에 두고 옆집 누나라는 제목의 사진을 클릭하면 이미지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출력되는 데 10분이 걸렸다. 나는 단 한 번도 온전한 모습의 옆집 누나를 구경한 적이 없고 언제나 가슴팍까지밖에 볼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넥스 박스는 정기적으로 바닥이 났다. 나는 정말 건강한 소년이었다.
▶▶시간이 흘러 초고속 인터넷이 자리잡았고 제로보드를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 환경이 활성화됐으며 포털 사이트에서는 카페라는 공간이 각광을 받았다
▶▶그리고 드디어 블로그 시대가 도래했다. 1인 미디어라는 그것 말이다. “블로그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세상을 덮었다. 유행에 뒤지지 않으려고 나모 웹에디터 같은 것을 이용해 홈페이지를 만들던 사람들이 하루 만에 블로그로 갈아탔다. 나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실제 블로그는 많은 것을 가능케 만들었다. 미디어 환경은 1인 미디어라는 새로운 생태계에 적응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았다.
|
▶▶그래서? 그래서 정말 PC통신은, 인터넷은, 블로그는 WEB2.0은 세상을 바꾸었나? 침을 튀기며 온갖 현란한 수사로 PC통신을 인터넷을 블로그를 칭송했던 사람들은 지금 모두 어디에 있나. 트위터에 있다. 그 안에서 이제는 “트위터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가운데 대다수가 30대 후반, 40대 이상의 ‘아저씨’들이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그들은 본인이 바꾸지 못한 세상을 신기술이 대신 바꾸어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그 위에 윤리적인 층위의 상징을 몇 번이고 거듭해서 덧씌우고 급기야 그것을 숭배하기 시작한다.
“아 블로그! 아 트위터! 이 신기하고 신성한 신기술들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안쓰러운 일이다. 신기술은 우리를 구원한 적이 없다. 세상을 바꾼 일도 없다. 이 좁은 나라에서 아이폰4 예약판매 수 시간 만에 십수만 명이 몰리는 광경을 “세상이 바뀌었다”고 표현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스마트폰 시장의 활성화로 삼성이 전과 달리 소비자 눈치를 보는 것을 “세상이 바뀌었다”고 표현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그러나 사실이 아니다. 다만 인류의 생활권이 확대된 꼭 그만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늘어났을 뿐이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세상은 단 한 번도 사용자와 노동자라는 시장의 기본전제를 벗어난 경험이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기술은 이 기본전제 혹은 원칙의 강화을 위해 종사해왔다. 생각해보시라. 우리는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경쟁해왔다. 이제는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구매를 하기 위해 다시 경쟁을 해야 한다. 과열되는 경쟁은 스펙터클의 방식으로 상징화돼 매체를 통해 전파되고, 이는 다시 “와, 신기술이 세상을 바꾼다”는 감탄사를 만들어낸다. 이 거짓 수사에 안주하는 건 자유지만 최소한 그것이 허상이고 거짓이라는 건 알아두어야 한다.
▶▶ 신기술은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 그것은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단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이 기술들이 한시적으로 우리를 반영하고 어느 한때를 기록한다는 점이다. 이 아까운 시간에 당신은 트위터가 바꾸는 우리 세상을 상상하며 자위할 것인가, 혹은 트위터라는 도구에 담길 당신의 말과 행동을 염려하고 공들일 것인가. 선택은 자유다.

PYCHYESWEB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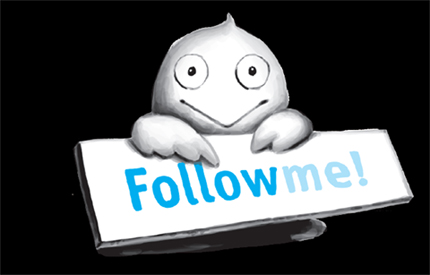

















 5%
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