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붉은 속살의 유혹, 찬바람 불면 홍합이 그립다
홍합, 회로도 먹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홍합하면 일단 홍합탕부터 떠올린다. 이해한다. 한국인에게 있어 국물은 유전자 깊숙이 뿌리박힌 인이나 같다. 그래도 창조적인 미각의 소유자라면, 아니 가정에서 가족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색다른 홍합요리에 도전해보면 어떨까. 지금부터 홍합이라는 흔하디흔한 소재로 미식쇼에서는 어떻게 요리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 글 | 김용철

제철을 맞은 홍합이 탐스럽게 붉다
미식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다. 식재료, 요리의 수준, 먹는 자세, 경험, 분위기, 건강, 식기, 낯선 음식을 거부하지 않는 오픈마인드 등이다. 하지만 이 모든 요소도 여유가 없다면 진정한 미식을 행하지 못한다. 음식의 맛이란 본디 음미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시간적 여유는 필수다. 음식을 주문하자마자 빨리 달라고 닦달하는 사람은 미식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헌데 이 시간적 여유가 꼭 식탁에서만의 얘기는 아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음식의 기본이 되는 재료는 자연에서 얻는다. 자연은 우리가 음식점에서처럼 재촉해도 서두르는 법이 없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때가 되어야 나온다.
그렇지만 성미 급한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서 자연의 맛을 찾고자 한다. 제대로 맛이 들기도 전부터 말이다. 제철 별미를 남보다 빨리 먹는다고 그게 미식일까? 대게, 굴 등은 봄이 기웃거릴 무렵 더 맛있다. 물론 홍합도 마찬가지다.
찬바람이 불면 선술집마다 홍합탕을 서비스로 내준다. 우리들이 홍합탕을 가장 많이 먹는 시기는 아마도 12월이 아닐까 싶다. 음주 기회도 많거니와 홍합 물량이 쏟아져서 그렇다. 그런데 이 시기의 홍합을 잘 살펴보면 한 가지 특색이 있다. 대부분의 홍합살이 흰색을 띄고 있다. 이상한 일이다. 홍합은 살이 붉어 홍합인데 하얗다니, 이름값을 못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다. 홍합은 어릴 땐 숫놈이었다가 자라면서 성전환을 한다. 색상도 흰색에서 점차 붉어진다. 그러니까 흰색 홍합은 숫놈, 붉은색 홍합은 암놈인 셈이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색상의 변화만 있는 게 아니고 맛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더란 말이다.
홍합은 암놈이 숫놈보다 세배는 맛있다. 단지 이렇게만 말하고 끝난다면 실감을 못할 수 있다. 맛이 어떻게 다른지 정도는 설명을 해야 맛객답지 않겠는가. 해서 직접 실험을 해보았다. 실험을 위해 홍합회를 준비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홍합은 붉게 물든다. 맛도 흰 홍합에 비할 바 아니다.
홍합회는 조금이라도 싱싱하지 않으면 먹어서는 안 된다.
때문에 산지에서나 맛보는 게 가능하다.
홍합도 회로 먹느냐고, 혹 놀라지는 않았는지. 물론이다. 홍합도 생식이 가능하다. 단 절대 신선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호기심에 시장에서 파는 홍합을 가져다가 날로 먹지는 말기를 바란다. 탈이 날수 있다. 혀도 아리아리 저릴 것이다. 물론 바다에서 갓 건진 놈도 아린 느낌이 있지만 능이버섯보다도 훨씬 약한 정도다. 단맛 뒤에 감도는 이 정도의 씁쓰름함 정도는 즐길 줄 알아야 어른이다.
자, 맛을 보겠다. 숫놈(흰색)은 말 그대로 담백한 수준이다. 하지만 암놈(홍색)은 구수하고 단맛까지 흐른다. 농액(濃液)적인 식감은 맛과 영향을 품고 있는 게 분명하다. 결론이다. 홍합은 붉은 게 흰색보다 더 맛있다. 12월이 되면 홍합이 생각나지만 사실 홍합은 해를 넘기면 더욱 맛있다. 홍합은 3월부터 산란기에 들어가는데 뭐든 산란 직전의 것이 가장 맛있는 법이다. 그래서 봄이 오기 전까지는 절정의 맛으로 향한다.
홍합도 어디서 나느냐에 따라 팔자가 엇갈린다. 유럽의 홍합은 레스토랑에서 품격 있는 요리로서 선보인다. 한국의 홍합은 선술집의 국물서비스용에 머물고 있다. 그렇다고 유럽의 그 홍합과 한국의 홍합이 종자가 다르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국내에서 양식되는 홍합은 대부분 유럽 등지에서 들어온 외래종이니 말이다. ‘섭조개’로 불리는 재래종 자연산 홍합(털격판담치)은 귀한 존재라 언감생심이다.
많은 사람들이 홍합하면 일단 홍합탕부터 떠올린다. 이해한다. 한국인에게 있어 국물은 유전자 깊숙이 뿌리박힌 인이나 같다. 그래도 창조적인 미각의 소유자라면, 아니 가정에서 가족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색다른 홍합요리에 도전해보면 어떨까. 지금부터 홍합이라는 흔하디흔한 소재로 미식쇼에서는 어떻게 요리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갯가재는 쏙으로 불리기도 한다
먼저 갯가재부터 냈다. 갯가재는 일명 ‘쏙’이라고 불린다. 아주 싱싱한 것은 횟감으로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된장국, 찜, 간장게장처럼 장으로 담가서 먹는다. 신선도가 좋아 미식쇼에서는 생식을 택했다. 대가리와 껍질을 제거한 살덩이를 폰즈소스에 담가서 냈다.

청어과메기
청어통과메기도 나갔다. 두 달여 건조한 게 아니라 만족도는 약간 떨어지지만 그래도 꽁치과메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다. 보통 미역이나 김에 싸서 초장과 마늘 등을 곁들이지만 미식쇼에서는 색다르게 먹었다. 올리브유에 소금과 능이버섯소스를 첨가해서 찍어 먹었다. 송로버섯처럼 동물성 향이 좋은 능이와 청어과메기와의 궁합은 기대 이상이다.
드디어 홍합이 나올 차례다. 다른 곳에서는 홍합이 서비스국물용으로 쓰일 만큼 천대받지만 미식쇼에서는 당당히 메인의 위치를 차지할 정도로 대접을 받는다.

홍합 속살이 탱글탱글 먹음직스럽다
첫 번째 홍합요리는 샤브샤브다. 따끈한 국물과 탱탱한 알맹이를 즐길 수 있는 요리다. 갓 익힌 홍합은 보드랍고 적당히 간도 배어있다. 문제는 갓 익힌 홍합이라고 하더라도 점차 식으면서 알맹이도 줄어들고 보드라운 식감도 살짝 퍽퍽하게 변해간다는 점이다. 최상의 시각미와 식감, 맛을 먹는 내내 유지할 수는 없을까 궁리하다 홍합샤브샤브를 떠올렸다.
팔팔 끓는 다시마육수에 홍합을 소량씩 익혀서 먹으면 그만이다. 채소나 버섯을 곁들이면 더욱 좋다. 껍데기가 벌어지면 먹어도 된다는 신호이다. 누군가 홍합은 반숙으로 먹었을 때 가장 맛있다고 말한다. 그래서였을까. 홍합이 이렇게 맛있는지 미처 몰랐다는 참석자도 있다.

맛객표 홍합꼬치
내가 최근 감탄한 또 하나의 홍합요리는 카다케스 홍합꼬치이다. 이 요리의 레시피는 『피카소의 맛있는 식탁』이라는 책을 보다 발견했다. 그렇다고 요리법을 그대로 따라하진 않았다. 나는 베이컨도 없고 월계수잎도 없었다. 그렇다고 딱 감이 오는 이 요리를 포기할 맛객도 아니다. 에스파냐 요리라고 해서 꼭 에스파냐 식으로만 하라는 법은 없다. 난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요리를 하니 한국의 식재료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해서 집에 없는 식재료인 월계수잎은 빼고 대신 대파를 넣었다. 또, 베이컨 대신 국산돼지고기를 넣었다. 자, 그럼 요리를 만들어보자.
잘 씻은 홍합을 오븐에 굽거나 냄비에 넣고 익힌다. 홍합이 벌어져 적당한 크기로 홍합살이 수축되면 살과 껍데기를 분리해서 살점은 홍합육수에 담가둔다.
간장에 설탕을 약간 넣고 끓여 식혀둔다. 비계가 약간 있는 돼지고기를 준비하여 70% 정도 익도록 삶고 꼬치에 들어갈 크기로 자른다. 이것을 식혀둔 간장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담가 간이 배도록 한다.
대파를 4cm 정도 크기로 썰어 꼬치에 꿰고 돼지고기와 홍합을 취향대로 꿴다. 완성된 꼬치에 마늘올리브유를 듬뿍 바른다. 마늘올리브유는 빻은 마늘에 올리브유를 넣고 소금과 빻은 후추로 간을 해서 만든다.
휴대용 가스레인지 불을 중불보다 살짝 약하게 줄이고 석쇠를 올려 홍합꼬치를 약 10여 분간 굽는다. 구워진 홍합꼬치를 접시에 담고 레몬을 반달모양으로 썰어 한쪽에 놓는다. 레몬은 장식의 의미도 있지만 꼬치를 살짝 레몬에 문질러 먹으면 풍미가 새롭다.
이게 바로 카다케스 홍합꼬치를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맛객 홍합꼬치’다. 맛이 어떠냐고? 거짓말 조금도 안 붙이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맛이다. 대파에서 느껴지는 감미로움과 향긋한 풍미, 불맛 나는 고소한 돼지고기, 부드러운 질감에 감칠맛 나는 홍합, 이 모든 것들의 조화로움. 이것이 홍합꼬치구이가 지니고 있는 미각이다. 어린이들 밥반찬이나 간식으로, 아빠들 술안주로도 아주 그만이다. 요즘처럼 장바구니 물가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보니 그마나 저렴한 가격대인 홍합이 소중하게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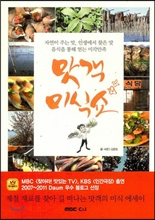

- 맛객 미식쇼 김용철 저,사진 | 엠비씨씨앤아이
예약 대기자 1000여 명, 맛객 미식쇼! 이 생경한 이름의 쇼는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이들이 기다리는지 궁금증이 일 것이다. '맛객 미식쇼'는 한 달에 두 세 번, 맛객 김용철이 제철 자연에서 찾은 재료들로 소소하지만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다. 『맛객 미식쇼』에는 그의 요리 철학과 미식 담론이 담겨있다. 사람들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주는 맛, 인생에서 찾은 맛을 나누며 행복을 느낀다고 믿는다. 그래서 맛객의 요리를 접한 사람들은, 맛은 몰론이고…
| |||||||||||||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
글 | 김용철
저자 맛객객 김용철은 만화가이자 맛스토리텔러. 45권이 넘는 아동만화를 펴낸 만화가. 그의 작품 ‘배낭 속 우산’은 초등학교 3학년 국어 국정교과서에 실려 있다. 하지만 그는 1,000명이 넘는 예약 대기자가 있는 ‘맛객 미식쇼’를 펼치는 맛객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궁극의 미각은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데 있다”는 철학을 지닌 맛객은 수년에 걸쳐서 전국을 돌며 제철 식재료와 지역의 향토음식에 심취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맛과 향, 음식이 주는 행복을 전하고자 맛객 미식쇼를 기획, 연출하고 있다. 맛객의 음식은 돈을 위한 요리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요리다. 아직 최고의 요리는 아니지만 최고의 재료를 선택한다는 맛객. 그래서 맛객의 요리를 접한 사람들은, 맛은 물론이고 감동과 행복까지 안고서 돌아간다. 맛객은 오늘도 자연에서 나는 제철 재료를 찾아 길을 떠나고, 길 위에서 접한 재료들을 한 아름 챙겨들고 올 것이다. 우리가 맛객의 미식쇼를 기대하고 있는 한. MBC 「찾아라! 맛있는 TV」, MBC 「슈퍼블로거」, KBS1 「인간극장」 ‘맛객 길을 떠나다’(5부작) 출연, KBS2 「생생정보통」 ‘미남이시네요’ 코너...에 고정 출연하였다. Daum에 개설한 그의 블로그 ‘맛있는 인생’은 누계 방문자 수가 1,000만 명이 넘고 수차례 우수 블로그로 선정되었다. 전작으로 『맛객의 맛있는 인생』이 있다.
-
-
피카소의 맛있는 식탁
<에르민 에르셰> 저/<이세진> 역
16,200원(10%
 + 5%
+ 5% )
)
-
-
미식견문록
<요네하라 마리> 저/<이현진> 역
10,800원(10%
 + 1%
+ 1% )
)
-
-
식전 食傳
<장인용> 저
16,200원(10%
 + 5%
+ 5% )
)
-
-
한국인의 밥상
<KBS 한국인의 밥상 제작팀>,<황교익> 공저
13,500원(10%
 + 5%
+ 5% )
)
-
-
맛객 미식쇼
<김용철> 저,사진
13,500원(10%
 + 5%
+ 5% )
)
PYCHYESWEB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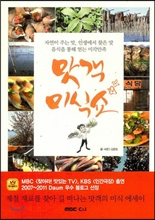












 + 5%
+ 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