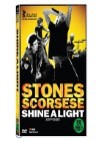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기민한 로큰롤 밴드 - 롤링 스톤스 50주년
시대의 ‘트렌드 체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로큰롤 밴드’가 아닌 ‘역사상 가장 기민한 로큰롤 밴드’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데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자신들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리듬 앤 블루스와 로큰롤의 밑그림을 고수하면서 갖가지의 색채와 작법을 구사했고 매번 각기 다른 패러다임을 도입하려했다. 롤링 스톤스를 단순히 로큰롤 밴드로 한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운드의 너른 스펙트럼으로 장식된 이들의 행적이야말로 시대 흐름의 흔적이자 팝 음악의 또 다른 실록이기 때문이다.
- 글 | 이즘
스마트 폰, 참으로 신기한 물건이 아닐 수 없다. 전화나 문자 등 기존 휴대전화의 기능은 물론이고 인터넷과 카메라, 여기에 신문과 도서, 영화까지 세상의 모든 걸 손바닥 만 한 몸체로 몽땅 담아낸다. 주위를 둘러봐도 온통 스마트폰 천지, 이만하면 하나의 시대 트렌드라고도 할만하다.
느닷없이 스마트 폰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런 ‘스마트’한 세상에 웬 고릴라 한 마리가 느닷없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우락부락한 얼굴에 긴 혀를 늘어뜨린 그 모습이 참으로 위협적인데, 가만 보자. 어쩐지 낯이 익다. 두툼한 두 입술과 그 사이로 쑥 내민 긴 혓바닥이 어디선가 많이 본 것인데 흡사 존 파셰(John Pasche)가 디자인했던 롤링 스톤스의 빨간 입술 로고(The tongue-and-lips)와 닮지 않았는가.

고릴라는 바로 50주년 베스트 앨범을 출시하며 위대한 밴드 롤링 스톤스(Rolling Stones)가 내놓은 광고 캐릭터다. 그런데 이 녀석, 단순히 그런가 보다하고 넘어갈 녀석이 아니란다. 여기에는 밴드의 장난스런 유머가 담겨있으니 이것이 곧 핵심 포인트, 밴드의 공식 사이트에 게시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고릴라를 비춰보면 휴대전화 속에서 불쑥 살아나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세계 50개 도시의 유명 건축물을 비춘 화면 속에서도 나타나 난장을 피우니, 이를 기획한 발상이 참으로 기발하다.(서울 광화문에서도 나타난다고 한다!)
눈앞의 입체 영상에 신기해하다가 문득 롤링 스톤스 네 할아버지들의 나이가 떠오른다. 두 중심멤버 믹 재거(Mick Jagger)와 키스 리처드(Keith Richards)는 예순의 마지막 해를 보내는 1943년생이고 맏형인 드러머 찰리 와츠(Charlie Watts)는 둘보다 두 살이 많다. 숫자상으로는 무릇 시대감각에 뒤처지는 나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여전히 트렌드의 중심에서 노익장을 과시한다. 그렇게 보내온 이력이 50년, 딱 반세기의 장구한 세월이다. 무엇이 이들의 무한 질주를 가능케 했을까. 구르는 돌의 원동력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쯤 되면 궁금증이 솟는다.
돌이켜보면 밴드의 행보는 언제나 당대의 유행과 궤를 같이하고 있었다. 1960년대 영국의 브리티시 블루스(British Blues)부터 시작해 비틀스를 위시로 한 브리티시 인베이전(British Invasion), 이후의 조류인 사이키델릭의 혼란 속에서도 롤링 스톤스라는 두 단어는 빠진 적이 없었다. 그런가하면 하드 록의 강렬함이 세상을 지배하던 1969년 말은 이들의 완력이 정점에 자리한 전성기였고 펑크(funk)와 디스코가 뒤흔든 1970년대에는 댄스 록의 일인자로서 자신들의 위상을 증명해냈으니 롤링 스톤스는 매번 시대의 가운데에 서있던 셈이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로큰롤 밴드’가 아닌 ‘역사상 가장 기민한 로큰롤 밴드’라는 말로도 이들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있어 남다른 면모를 보인 밴드였다. 특히 이들의 디스코그래피에서 가장 특이한 역작이라 할 수 있는 1967년의 < Between The Buttons >는 비치 보이스의 < Pet Sounds >와 비틀스의 < Revolver >로 귀결되는 사이키델리아의 기조를 포착해낸 것이었으며, 밴드에게 또 다른 전성기를 안겨주었던 1970년대의 걸작 < Some Girls >와 < Emotional Rescue >는 당대에 성행했던 조지 클린턴(George Clinton) 식의 펑크(funk) 문법과 디스코 라인의 전개 방식을 흡착한 결과물이었다.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데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자신들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리듬 앤 블루스와 로큰롤의 밑그림을 고수하면서 갖가지의 색채와 작법을 구사했고 매번 각기 다른 패러다임을 도입하려했다. 롤링 스톤스를 단순히 로큰롤 밴드로 한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운드의 너른 스펙트럼으로 장식된 이들의 행적이야말로 시대 흐름의 흔적이자 팝 음악의 또 다른 실록이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밴드가 드러낸 한계점 또한 여기에서 기인한다. ‘세계 최고의 밴드’라는 위명(偉名)을 가졌음에도 이들의 뒤에는 ‘2등 밴드’라는 애석한 꼬리표가 함께 해왔다. 앞서 제시했던 이들의 이력에서 알 수 있듯 롤링 스톤스의 위치는 선발주자보다는 대체로 후발주자에 가까웠다.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던 브리티시 인베이전에서의 성과는 비틀스의 성공을 힘입었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구체적으로 앨범을 예로 들면 1967년의 사이키델릭 작품 < Their Satanic Majesties Request >의 경우 비틀스의 매그넘 오퍼스 < Sgt. Peppers' Lonely Hearts Club Band >의 기세를 급히 좇은 것이기 때문이다.
비틀스 시대 이후에도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밴드는 창조를 통한 표출보다는 흡수를 통한 자기화라는 가공 과정에 근접한 모습을 보였다. < Exile On Main Street >으로 마무리되는 황금기 이후에 나타났던 팝 친화적인 시도 역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서 비판의 칼날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엄밀히 말해 이들은 트렌드 세터(Trend-setter)가 아닌 트렌드 체이서(Trend-chaser)였다.
롤링 스톤스의 성공은 그러나 트렌드 체이서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스스로를 철저히 가두는 높은 성벽을 쌓기보다는 외부의 다른 공간들과 맞닿길 원했고, 본류의 큰 강만을 따르기보다는 여러 갈래의 시류를 끌어오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다른 목소리를 듣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고 다른 사운드로 접근하는 것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기성세대와 미디어의 질타가 빗발쳤던 1960년대에도 이들은 히피의 불량함으로 온 몸을 장식하며 전면에 나섰고, “로큰롤은 죽었다”며 비난을 던지던 펑크 세대의 분노 속에서도 보란 듯이 디스코와 댄스 록을 들고 나섰다.
결국 시대와의 오랜 호흡, 세대와의 끝없는 소통이 장수의 비결이었고 질주의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가능했기에 1962년생의 거대한 공룡 밴드는 50년간 살아남을 수 있었고, 롤링 스톤스라는 제국은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로큰롤 밴드’라는 별칭 속에는 반세기간 멈추지 않고 달려온 이들에 대한 감출 수 없는 경외가 담겨있다. 동시에, 이는 범백(凡百)의 밴드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름 난 이들조차 쉽게 넘보지 못하는 영예의 결과물이다.
여전히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다. 신곡으로 가득 채운 정규 앨범을 발매함과 동시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무대 앞으로 팬들을 끌어 모으고, 젊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협업하며 다양한 결과물을 내놓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키스 리처드는 영화 < 캐리비안의 해적 > 시리즈에 출연하며 배우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하기도 하고 믹 재거는 TV 쇼에 등장해 사그라지지 않는 인기를 몸소 증명해 보이기도 한다. 게다가 SNS로 연결된 인터넷 공간 속에서도 이들의 움직임은 멈춤이 없다.
2006년 뉴욕 비콘(Beacon) 극장에서의 콘서트를 담은 다큐멘터리 < 샤인 어 라이트 >를 제작하며 영화감독 마틴 스콜세지는 멤버들의 옛 인터뷰 영상들을 공연 사이사이에 삽입했다. 그 중 유독 많이 등장했던 질문은 바로 저 밴드의 수명에 관한 질문이었다. 필름 속에서 스물을 갓 넘긴 앳된 믹 재거는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다며 말하고, 중년에 접어드는 키스 리처드는 운이 다하면 끝나지 않겠냐며 짓궂은 미소를 짓는다. 그러나 그 뒤에 나타나는 대답은 모두 똑같았다.

그렇게 50년을 달려왔다. 롤링 스톤스에게 있어 음악은 세상과 대화하는 방식 그 자체였다. 이들은 이 대화를 단 한 번도 멈추려 하지 않았다. 매 순간 시류와 조우하기 위해 노력했고 시대와 호흡하기 위해 애썼다. 그렇게 세상의 중심으로 자신들을 밀어 넣었고 스스로를 바꿔왔다.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서 반세기 동안이나 돌멩이들을 구를 수 있게 한 원동력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글 / 이수호 (howard19@naver.com)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관련태그: 롤링 스톤스, Rolling Stones, 로큰롤, 믹 재거, 키스 리처드, 고릴라, 샤인 어 라이트


- [블로그] 베를린영화제의 롤링 스톤즈
- [블로그] 롤링스톤스
- [블로그] Rolling Stones- Like A Rolling Stone, Miss You

-
글 | 이즘
이즘(www.izm.co.kr)은 음악 평론가 임진모를 주축으로 운영되는 대중음악 웹진이다. 2001년 8월에 오픈한 이래로 매주 가요, 팝, 영화음악에 대한 리뷰를 게재해 오고 있다. 초기에는 한국의 ‘올뮤직가이드’를 목표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힘썼으나 지금은 인터뷰와 리뷰 중심의 웹진에 비중을 두고 있다. 풍부한 자료가 구비된 음악 라이브러리와 필자 개개인의 관점이 살아 있는 비평 사이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
-
Rolling Stones - Between the Buttons (UK Version)
Rolling Stones
20,800원(19%
 + 1%
+ 1% )
)
-
-
Rolling Stones - Emotional Rescue (2009 Remastered)
Rolling Stones
20,800원(19%
 + 1%
+ 1% )
)
-
-
Beach Boys - Pet Sounds
13,400원(19%
 + 1%
+ 1% )
)
-
-
Rolling Stones - Exile On Main Street (스탠다드 버전)
17,800원(19%
 + 1%
+ 1% )
)
-
-
Rolling Stones - Their Satanic Majesties Request
<Rolling Stones>
23,700원(0%
 + 1%
+ 1% )
)
-
-
Rolling Stones - Some Girls (Deluxe Version)
22,600원(19%
 + 1%
+ 1% )
)
-
-
샤인 어 라이트
<마틴 스콜세지>,<롤링 스톤즈>
9,900원(0%
 + 1%
+ 1% )
)
PYCHYESWEB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