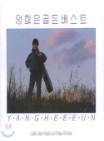참 달게 또 쓰게 양희은 노래와 함께 살아온 40년
난소암으로 3개월 시한부 인생 선고받기도
제 노래가 우리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무언지 모를 가슴속의 응어리를 풀어주고 쓰라린 마음을 해소해주었다고 봅니다. 제 노래로만 말하자면 팬들은 틀에서 벗어나는 싱그러움을 느꼈던 것 같구요. 한마디로 타성에 젖지 않는 모습이었던 거겠지요
- 글 | 이즘
|
양희은의 노래들과 함께 우리는 참 달게도 또 쓰게도 살았다. 양희은 스스로가 말한다. “제 노래가 우리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무언지 모를 가슴속의 응어리를 풀어주고 쓰라린 마음을 해소해주었다고 봅니다. 제 노래로만 말하자면 팬들은 틀에서 벗어나는 싱그러움을 느꼈던 것 같구요. 한마디로 타성에 젖지 않는 모습이었던 거겠지요!”
틀에서 벗어나는 싱그러움은 ‘서정성’이요, 가슴속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것이 뜻하는 의미는 ‘시대성’이다. 양희은은 서정성과 시대성이라는, 대중가요를 한때의 유행가에서 때로 오랜 세월 면면히 흐르는 전설로 탈바꿈해주는 이 두 가지 축과 함께 40년의 활동기록을 써왔다. 하지만 가수 데뷔 40년을 수놓은 그 어떤 노래들도 양희은 자신의 삶(아니 우리 삶)의 실제 이모저모와 동떨어진 것들은 없다.
|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내 나이 마흔 살에는」, 그리고 가장 최신작인 「당신만 있어준다면」, 영화 < 선생 김봉두 >에 나왔던「내 어린 날의 학교」는 음악이란 무엇보다 먼저 남의 이야기 아닌 아티스트 자신의 독백이라는 기본을 말해준다. 강산이 네 번 바뀌는 긴 세월 동안 양희은은 그렇게 자신의 나이 듦과 그사이 본 세상을 고백하듯, 다만 한편으로는 달게 다른 한편으로는 쓰게 노래로 삶을 그려낸 것이다.
어떤 쪽이든 따지고 보면 모든 게 ‘사랑’이었다. 언제나 양희은의 노래에는 마치 세상을 모두 자기 팔 안에 안고 감싸려는 포용과 연민의 숨결이 흐른다. 그의 음악이 대중 공감을 자극하는 것도 거기에 복류하는 인간적인 측면일 것이다. 양희은도 “내 노래는 물이다. 물처럼 어떤 그릇에 담든 모양이 변한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불러도 손색없는 게 매력이다.”라며 자신 음악의 인간적 보편성, 보통성을 강조한다.
7월19일부터 8월14일까지 서울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무대에 오르는 작품 < 어디까지 왔니? >는 양희은 음악이 품은 서정성, 시대성 그리고 그의 인생을 압축한 ‘휴먼 뮤지컬’이다. 낭랑한 음악들이 있고 1960년대와 1970년대가 있고, 그 시절을 껴안고 살아온 한 여자의 스토리가 있다. (제목 ‘어디까지 왔니?’는 양희은이 1981년 발표한 앨범의 제목이다)
우리 국민이 기꺼이 양희은과 그의 노래에 긴 생명력을 수여한 것도 서정이든 시대정신이든 인간미든 변치 않은 진실함 때문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아침이슬’이 우리 국민의 삶과 생각에 가장 영향을 끼친 노래가 되고 노래방의 엔딩 레퍼토리가 되어 그날의 마침표가 될 수 있겠는가. 스스로의 말처럼 양희은이 타성에 젖지 않는 모습을 유지하는 것도 그 투명하고도 시린 노래들이 우리 가슴속에 고이 저장되어있기 때문 아닐까.
|
어떤 순간에도 양희은은 음악적이다. 설령 지금의 젊음이 미디어의 진행자로 인식할지 몰라도 그를 아는 사람한테 양희은은 방송인에 앞서 영원한 뮤지션이다. 누적된 히트곡만을 다시 일깨워 추억을 자극해도 충분한 마당에 그는 여전히 신곡을, 새 앨범을 고집하는 자세가 증명한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의 옛 노래만을 찾아도 그래도 새 노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과거의 복제는 가수로서 끝이지요!”)
그의 음악에 대한 천착은 음악을 통해 일군의 우리 시대 음악작가를 굴착해내는 부가적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 하나를 봐도 명백하다. 먼저「아침 이슬 」과 「금관의 예수」,「상록수」, 「늙은 군인의 노래」의 김민기는 역사 그 자체이고 고 이주원(「한사람」,「내님의 사랑은」, 「네 꿈을 펼쳐라」)은 양희은이 활동하지 않았어도 언제나 가요수요자의 가슴에 저장된 감동의 노래를 잇달아 써내며 ‘포스트 김민기’ 시대의 최강 콤비플레이를 축조했다.
이어서 하덕규(「한계령」, 「찔레꽃 피면」), 이병우(「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그리고 김의철(「저 하늘에 구름따라」, 「망향가」) 등이 양희은의 목소리를 통해 음악이미지를 구축했다. 그는 작곡가들의 작품을 풀어낼 줄 아는 빼어난 역량의 소유자다. 그리하여 음악 대중들은 창조자들 이상으로 그 음악을 명쾌하게 해석한 ‘위대한 전달자’ 양희은을 사랑했다.
|
그토록 오랜 세월 노래를 들었어도 어찌해서 그의 노래들은 다시 접할 때마다 싱그러운 느낌이 드는 걸까. 양희은은 미국의 존 바에즈가 그렇듯 소프라노 음역으로 조금의 장식, 과잉, 변형, 멋 부림 없이 있는 그대로의 순수 창법을 구사한다. 치솟을 때든 옆으로 퍼질 때든 언제나 그의 목소리는 티 없이 맑고 영롱하다.
이 ‘단순’과 ‘순수’가 사람들이 양희은 노래에 결코 질리지 않는 비결일 것이다. 남자들 판이었던 1970년대 초중반 포크 음악 무대에서 통기타를 맨 거의 유일한 여가수로, 당대의 여학생들을 또 나중의 아줌마들을 움켜쥐는 ‘여성시대’를 개척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가창의 기본인 무가공 자연창법에 기인한다.
1952년생으로 1971년에 음악계에 등장했으니 딱 40년 캐리어에다가 나이도 환갑을 목전에 두고 있다. 처자식을 버린 아버지에 대한 미움으로 살아온 어린 시절, 난소암으로 3개월 시한부 인생 선고받은 것 등 파노라마 같은 그간의 인생을 다 나열하기는 힘들다. 막연하게 셈해서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애청곡 숫자와 기구한 역정을 가지고 그는 여기까지 왔다. 그처럼 달고도 쓰디쓴 인생이 없기에 더욱 그 음악에 우리는 공감한다.
-글 임진모(jjinmoo.izm.co.kr)
 제공: IZM
제공: IZM(www.izm.co.kr/)


-
글 | 이즘
이즘(www.izm.co.kr)은 음악 평론가 임진모를 주축으로 운영되는 대중음악 웹진이다. 2001년 8월에 오픈한 이래로 매주 가요, 팝, 영화음악에 대한 리뷰를 게재해 오고 있다. 초기에는 한국의 ‘올뮤직가이드’를 목표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힘썼으나 지금은 인터뷰와 리뷰 중심의 웹진에 비중을 두고 있다. 풍부한 자료가 구비된 음악 라이브러리와 필자 개개인의 관점이 살아 있는 비평 사이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
-
양희은 - The Best Album : Memories
양희은
17,800원(19%
 + 1%
+ 1% )
)
-
-
양희은 - 양희은 35 : 양희은 35주년 앨범
11,000원(19%
 + 1%
+ 1% )
)
-
-
양희은 - 골든 15
양희은
11,900원(21%
 + 1%
+ 1% )
)
-
-
양희은 - 골든 베스트 18
양희은
11,900원(21%
 + 1%
+ 1% )
)
PYCHYESWEB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