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연재종료 > 서진의 뉴욕 서점 순례
내 사무실은 119번가 할렘에 있다. 임대료가 싼 방을 찾다보니 꽤 북쪽까지 와 버렸다. 할렘에는 흑인들이 많이 살지만 생각처럼 위험하지는 않다. 센트럴파크도 열 블록 아래에 있다. 같은 블록에 걸어 다니는 동양인은 중국음식 배달부를 빼고는 나 혼자뿐이다. 가끔, 계단에 앉아 있던 흑인들이 ‘헤이 브로.’ 하며 인사를 건넨다. 그럴 때마다 나는 손사래를 치고 걷는다. 눈치 채지 못하게 조금 더 빨리…….
|
이곳의 집들은 1900년 초반에 지어진 것들이라 낡고 오래되었다. 모든 건축물은 역사적 유물로 보호받고 있어서 외부를 마음대로 고치지도 못한다. 사무실은 그중 우아한 대문 석조 장식이 있는 붉은색 벽돌집 3층이다. 이곳의 모든 집은 3층이고, 앞쪽에는 현관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뒤쪽에는 정원이 있다. 사무실이라고 해봤자 침대가 있는 방과 책상이 있는 거실뿐이다. 이곳에서 일만 하기 때문에 나는 이곳을 집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나에겐 집이란 오직 하나, 지구 반대편 우리나라에 있는 곳으로, 소설만 끝난다면 빨리 돌아가고 싶은 곳이다. 현관에는 층별로 벨이 달려 있다. 그 벨을 울리는 사람은 1층에 사는 집주인 로렌스나, 아마존닷컴에서 오는 무거운 책을 날라주는 배달부뿐이다. 바로, 그날 새벽까지는 말이다.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딩동, 딩동. 나는 한참 아거시 서점에서 훔쳐온 종이를 읽고 있었다. 내가 읽고 있는 것은 『도서관을 태우다』의 원고 일부였다. 아거시 서점의 한구석에 난쟁이가 쓰러져 있었고, 책상 위에 제본을 하려던 원고의 일부를 한 장 슬쩍해 왔다. 무언가를 훔쳤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벨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나가는 사람이 장난친 거겠지. 집주인 로렌스는 아홉 시에 잠드는 인간이니까 이 시간에 벨을 누르지 않아……. 벨 소리가 난 뒤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다.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벌써 떠났을 시간이다. 멀리서 앰뷸런스가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거실 창문을 통해 현관에 누가 왔는지 살펴보았다. 창문을 열지 않고서는 바로 아래까지 볼 수 없지만 대충 현관 주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원고를 읽는다. 그러나 아무래도 집중을 할 수 없다. 나는 현관으로 나가보기로 한다.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계단이 삐걱거린다. 복도가 어두워 발을 잘못 디딜 뻔했다. 묵직한 나무로 만든 현관문의 구멍을 통해 누가 있는지 재차 확인해본다. 역시 아무도 없다. 찰칵, 하고 고리를 푼 뒤에 문을 열었다. 끼이익, 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와 동시에 어둠 속에서 뭔가가 튀어 나왔다. 문을 닫을 시간도 없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타격을 받고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날카로운 칼이 가슴을 살짝 찌른다. 조금이라도 더 움직인다면 피가 날 것이다.
“소리를 낸다면 그것이 마지막으로 내는 소리인 줄 알아.”
여자의 목소리다. 그것도 한국말이다. 그녀의 등 뒤에 전등이 있어서 자세히 볼 수가 없다.
“아픈 척 하지 말고 천천히 일어나보시지. 자, 네 방으로 천천히 올라가, 이 도둑 양반아.”
나는 엉거주춤 일어나 계단을 올라갔다. 여전히 날카로운 칼날이 등을 찌르고 있었다.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면서 여자의 목소리가 낯익다고 생각했다. 어디선가 분명 들어본 목소리다.
“꼼짝 말고 그대로 앉아 있어. 난 성미가 꽤나 급해서 말이야. 휙, 하고 칼이 제멋대로 날아갈 수도 있거든.”
방으로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다. 그제야 그 여자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맙소사, 그녀는 프린티드 매터(Printed Matter Inc.) 서점(「그녀를 만난 곳과 헤어진 곳」)에서 본 그레이스 윤이 아닌가?
“어…… 어떻게, 여길 알고 찾아왔지?”
“자, 자, 질문은 좀 나중에 하시구요.”
그녀는 책상 위의 원고를 매만진다.
“좋아, 237페이지, 238페이지, 239페이지…… 여덟 페이지 확보했군. 이건 압수야. 네 것도 아니니까 불만은 없겠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그녀는 원고를 읽어 내려간다.
“이 책에 관한 걸 들어본 적 있어? 아거시 서점에서 뭔가 들어본 거라도? 나오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야?”
그레이스는 소파로 달려와 멱살을 잡는다.
“남의 집에 몰래 들어온 건 아무 잘못이 없는가 보지?”
그때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왼쪽 뺨이 얼얼해졌다.
“이것 봐, 정신 차려. 이걸 얼마 정도 읽은 거야?”
내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종이를 찢는다. 가로로 두 번, 세로로 마구잡이로 찢더니 싱크대에 던진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다. 연기가 나오기 시작하자 물을 틀어서 재로 만든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다.
“당분간 여기서 신세를 질게. 소파에서 잘 테니까 신경 쓸 것 없어.”
***
반즈 앤 노블(Barnes & Noble)에서 윌리암 깁슨(William Gibson)을 만나다
|
나는 반즈 앤 노블 서점의 문을 열었다. 그 문은 뉴욕에서 아마도 사무실 다음으로 자주 연 문일 것이다. 육중한 문을 열기 싫어 다른 사람의 뒤를 따라가거나 안내원이 열어주기를 기다리곤 했다. 이곳은 내게 서점이라기보다는 도서관이다. 최근에 나온 책이라면 이곳에 없을 리가 없다. 새로 나온 소설을 살펴보기 위해, 자료를 찾기 위해, 그리고 남은 약속 시간을 보내기 위해 수시로 드나들었다. 그중 가장 크고 교통이 편리한 유니언 스퀘어점에 자주 드나들지만 링컨 센터나, 어퍼 이스트 렉싱턴가, 웨스트 빌리지에 있는 반즈 앤 노블도 가끔씩 들렀다. 우리나라에도 교보서점·영풍문고 등의 대형서점 체인이 있지만 미국 내에 지점 800곳을 거느린 반스 앤 노블과는 비교할 수 없다.
|
|
반즈 앤 노블은 각각으로 봐서는 서점이지만 미국 전체로 봐서는 맥도날드 같은 거대한 유통회사다. 그리고 그 역사는 바로 뉴욕에서 시작되었다. 뉴욕대학(NYU)의 학생이던 레너드 리지오(Leonard Riggio)가 재학 시절 학교 서점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5번가의 작은 서점 반즈 앤 노블을 1971년 인수하면서 말이다.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15만 권의 책을 보유하면서 메가스토어의 원형을 만들었다. 맞은편에 특별 세일점을 하나 더 오픈해서 하드커버를 40% 싸게 파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구사하기도 했다. 초기에는 대학교재를 전문으로 했지만 점점 그 영역을 일반 서적으로 확장하고 1987년 달튼(B. Dalton) 북체인을 인수하면서 현재와 같은 대형 체인 서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보더스(Borders)가 업계 2위의 체인 서점이지만 반즈 앤 노블에 따라가지는 못한다.
|
반즈 앤 노블의 헤드쿼터에 해당하는 이 서점은, 새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예전에 있던 건물을 개뛁해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다른 건물과 비교해서 특별한 것은 없다. 단지 시원하게 뚫려 있는 높은 천장이 맘에 든다. 전체가 4층으로 된 이 서점은 서점이라기보다는 도서관이라는 느낌이다. 전 층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도서 백화점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제 사람들은 도서관에 가기보다는 쇼핑몰 근처에 있는 반즈 앤 노블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는 것이다. 3층 카페에는 책을 읽는 사람들로 꽉 차 있어서 언제나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야 할 정도다. 스터디를 하는 사람, 딱히 갈 곳이 없는 홈리스도 이곳에 오면 모두가 공평하다. 심지어 카펫으로 된 서점 바닥에 드러누워 책을 읽기도 한다. 4층에는 200석 정도 규모의 이벤트 공간이 있다.
|
오늘, 내가 이곳을 찾아온 이유는 윌리암 깁슨(William Gibson)을 만나기 위해서다. 그는 『뉴로맨서(Neuromancer)』라는 소설로 ‘사이버 펑크’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SF소설의 선구자다. 이후에도 여러 과학 소설을 내고 있지만 요즘은 미국의 정치, 사회를 비판하는 책을 쓰고 있다. 그는 현재 미국 사회의 현실이 공상과학 소설보다 괴이하다고 여기는 것 같다. 오늘은 새로 나온 책 『Spook Country』를 읽으러 왔다. 나는 이 자리에서 스티븐 킹, A.M 홈즈, 폴 오스터, 조나단 새프란 포어의 낭독회도 참여했다. 그들을 선망하기보다는 시기 어린 눈길로 쳐다보며 언젠가는 나도 저 자리에 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작가는 실제로 보면 보통 사람보다 더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사람일 경우가 많았다. 책날개에 인쇄된 작가 사진은 보통 5년이나 10년 전에 찍은 것들이라 현재의 모습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다. 작가의 명성에 맞게 시작하기 30분 전인데도 이벤트 홀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나는 맨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Spook Country』를 미친 듯이 읽었다.
***
“그 원고는 네가 쓸 소설의 일부야. 『도서관을 태우다』 말이야. 앞으로 삼 년 반이 더 걸리겠지만 결국 너는 소설을 완성해.”
그녀는 창문을 열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나는 그때까지도 그레이스의 말이 무슨 말인지 감도 못 잡고 있었다.
“그 책이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너는 상상도 못할걸. 미리 원고를 본다면 내용이 달라져 버려. 그러면 미래가 바뀌지. 얼마만큼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잊어줘.”
나는 웃음이 나왔다.
“음……. 이건 무슨 터미네이터 이야기 같은데. 네가 미래에서 온 사람이라도 돼? 지금 내가 신고를 하면 가택침입죄로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어. 지금까지 한 짓은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 그만 나가줄래? 그리고 3년 반이나 더 걸린다니, 말이 돼? 마감 날짜를 벌써 한 달을 넘겼다고.”
그녀는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버린 뒤에 창문을 쾅, 하고 닫았다.
“지금 마감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세상의 책을 구하는 게 먼저야.”
***
|
윌리암 깁슨은 동네 아저씨처럼 평범했다. 깐깐하게 보일 정도로 야윈 볼을 가지고 있었지만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낭독회는 우리나라에서 유명작가들이 하는 강연회 같은 ‘문학 하는 어려움’이나 ‘이 글을 쓸 때 고생했던 점’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따위의 말은 없었다. 읽고 싶은 페이지 서넛을 읽고 사인을 하는 게 다였다. 반즈 앤 노블의 작가 행사는 매일 이런 식으로 유명작가, 신인작가들이 심플하게 책을 읽고 사인을 해 준다. 따로 작가가 준비를 할 것도 없고 독자들도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도서상품권이나 공짜 책을 주지 않아도 관심 있는 사?들은 오게 마련이다. 나는 그의 신간을 들고 줄을 서서 기다렸다. 그는 일일이 독자들과 악수를 하고 근사한 말들을 책에 적어 주었다. 마침내 나의 차례가 왔다.
“50년 뒤에는 책이 모조리 사라지게 된답니다. 지금 레코드판이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그의 미소는 가까이서 보니 더 으스스했다.
“그때가 되면 나는 죽을 게 확실하니까, 불행 중 다행이네요. 그런데 어디에서 오셨지요?”
나는 한국에서 왔다고 대답한다. 이름을 말하니 슥슥 사인과 함께 뭔가를 적어준다. 나는 머뭇거리면서 말한다.
“윌리암 깁슨 선생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책은 제3차 세계대전에 관한 겁니다. 맞지요? 미래에서 온 친구가 말해줬습니다.”
그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완전히 외계인이라도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뒤에서 줄을 섰던 사람이 기침을 해댔으므로 나는 연단에서 내려왔다. 그 전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쪽지를 건네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나는 책을 펼쳐 보았다. 그곳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하여, 윌리엄 깁슨’이라는 사인이 적혀 있었다. 책을 계산하지 않고 서가에 그대로 꽂아둔 채로 밖으로 나왔다.
|

-
-
웰컴 투 더 언더그라운드
<서진> 저8,550원(10%
 + 5%
+ 5% )
)
제12회 한겨레문학상 수상작. “상징과 해석의 공간” 뉴욕을 배경으로 일어나는 이야기로서, 미국으로 이민 간 주인공 김하진을 중심으로, 스물네 시간 움직이는 따뜻한 방인 ‘지하철’과 끝없는 이동과 전진만 가능한 세계인 ‘언더그라운드’를 그리고 있다. 영상문법인 되감기와 빨리감기, 녹화하기, 건너뛰기 등으로 시간과..
PYCHYESWEB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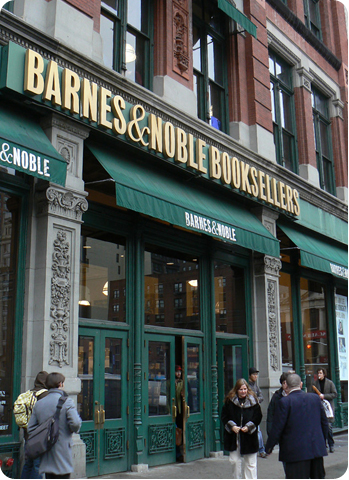











 + 5%
+ 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