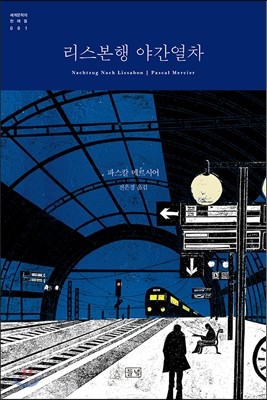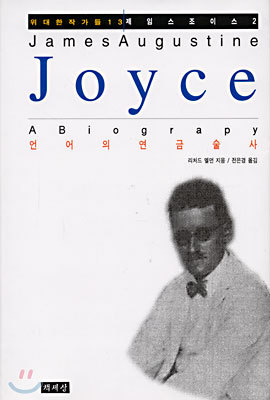칼럼 > 연재종료 > 김연수의 文音親交 프로젝트
고통에 가득 찬 질문과 계속 전진할 뿐인 여행의 이야기
파스칼 메르시어의 『리스본행 야간열차』와 호드리구 레아웅의 <Alma Mater>
여행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연민을 느끼는 이유는 뭔가? 그들이 외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내적으로도 뻗어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 글 | 11
지브랄타, 혹은 지브롤타. 어느 쪽이 정확한 표기법인지 여전히 모르겠으나, 암튼 그 해협을 제외하자면, 이베리아 반도에 대해서 내가 아는 바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나는 여러 번 리스본에 대한 꿈을 꾼 적이 있었다. 빨래를 내건 긴 장대들이 좁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골목이 있는 풍경이었다. 다음날, 나는 인터넷을 뒤져 리스본의 사진을 찾았다. 리스본은 그런 곳이 아니었다. 사진 속의 리스본 거리에는 노란색 트램이 있었고, 경사진 좁은 골목 멀리로는 바다가 보였다. 밑에는 이런 댓글이 붙어 있었다. “28번 트램을 세 번 정도 왕복으로 탔던 기억이…. 너무나 그리워요. 죠르제 성도 눈에 선하구….” 아래의 질문을 떠올리게 하는 댓글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들만 경험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걸까?
28번 트램이라니. 그토록 매력적인 댓글이라니. 나는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나머지 부분들을 당장 경험하기 위해서 리스본행 야간열차를 탔다,기보다는 구글 어스를 실행시켜 검색창에 ‘Lisbon’이라고 쳤다. 그렇게 해서 나는 리스본 중심가인 코메르시오 광장에 가게 됐다. 광장 앞 바다에서 본 리스본 중심가는 물 위에 뜬 궁전과 같았다. 성곽이 있는 언덕에서 내려다보면 리스본 시가지는 붉은 지붕들의 물결이었다. 이 글을 쓰기 위해서 나는 다시 구글 어스를 실행시키고 코메르시오 광장으로 갔다. 거기서 부두를 따라 동쪽으로 가니 산타 아폴로니아 역이 나왔다. 그다지 크지 않은 역이지만, 제네바에서 출발해 프랑스 이룬에서 야간열차로 한 번 갈아타면 스물여섯 시간 만에 이 역에 도착할 것이다.
소설 『리스본행 야간열차』의 주인공 라이문트 그레고리우스가 일단 제네바로 가겠다고 결심한 까닭은 빗속에서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났기 때문이었다. 그 여인은 다리 난간에 기대 편지를 읽다가 분노를 못 이겨 그 편지를 던져버린다. 그리곤 난간 위로 솟구치는 듯해 그레고리우스는 우산과 책을 집어던지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그녀는 몇 초 동안 무표정한 얼굴로 책에 빗물이 배어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다 두어 걸음 다가와 그레고리우스 쪽으로 몸을 굽히고, 외투 주머니에서 사인펜을 꺼냈다. 그리고 그의 이마에 숫자를 몇 개 적었다.
“죄송해요. 이 전화번호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종이가 없어요. 전…, 저는 이 번호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날아가는 편지를 본 순간…, 적어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레고리우스를 따라 그의 직장인 학교까지 온 그녀의 모국어는 ‘포르투게스’. 교실에 앉아 그의 수업을 듣고 있던 그녀는 어느 순간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사라졌다. 그리고 15분 뒤, 그레고리우스는 결심했다. 지금 당장 교실을 나와 그녀를 찾아보기로. 하지만 그는 그 포르투갈 여자 대신에 아마데우 이나시오 드 알메이다 프라두라는 포르투갈 사람이 쓴 책 『언어의 연금술사』를 발견한다. 서점 주인이 대신 번역해준 문장이 바로 위의 저 질문이었다. 그레고리우스는 그날 당장 포르투갈 교본을 펼쳐들고 그 책을 번역해본다. 그러다가 그가 문득 포르투갈어로 만들고 싶은 문장은 “정말 뛰어내리려고 했나요?”였다.
이 아름다운 소설은 질문의 책이면서 동시에 여행의 책이다. 자기 자신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여행을 떠나게 된다. 편견으로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떠나지 못한다. 떠나고 싶다면 오직 질문만이 필요할 뿐이다. 왜 여행은 질문 그 자체가 되어야만 하는가?
여행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연민을 느끼는 이유는 뭔가? 그들이 외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내적으로도 뻗어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계발할 수 없고, 스스로를 향한 먼 여행을 떠나 지금의 자기가 아닌 누구 또는 무엇이 될 수 있었는지 발견할 가능성도 박탈당한 채 살아간다.
이 책은 그런 식으로 구성됐다. 하나는 질문의 이야기, 다른 하나는 여행의 이야기. 결국 그 두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다. 소설 속에서 그레고리우스는 『언어의 연금술사』를 조금씩 번역하는 동시에 그 책을 쓴 의사 프라두의 삶을 뒤쫓는다. 『언어의 연금술사』에는 위에 인용한 문장과 같은 철학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문장이 가득하다. 소설이 끝나갈 무렵 『언어의 연금술사』는 모두 번역될 텐데, 그때쯤이면 타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것인지 독자들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정말 뛰어내리려고 했나요?
프라두의 삶이 고통스러웠던 까닭은 1926년의 쿠데타에서 1972년의 카네이션 혁명에 이르는 기나긴 독재 때문이었다. 비밀경찰에 시달렸던 포르투갈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라곤 3F, 즉 축구(football), 종교(fatima), 파두(fado)였다. 파두는 리스본과 쿠임브라의 음악으로 ‘숙명’이라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이다. 내가 이 파두에 숙명적으로 빠지게 된 건 마드레드쉬라는 그룹의 음악을 듣고서였다. 그들은 파두를 현대적으로 혁신시켰다. 그 마드레드쉬를 만든 피아니스트가 바로 호드리구 레아웅이다.
레아웅의 앨범 <Alma Mater>에 수록된 ‘A Tragedia’와 ‘Espelhos’는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준다. 질문의 이야기는 고통에 가득 차 있다. 프라두에게 닥친 첫 번째 질문은 “죽어가는 비밀경찰의 우두머리가 왔을 때, 과연 그를 치료해서 살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를 죽이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두 번째 질문 역시 그와 비슷하다. 저항조직이 비밀경찰에 발각됐을 때, 조직은 그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비상한 기억력의 여자 에스테파니아 에스피노자를 죽이려고 한다. 과연 그녀를 죽여야만 할까? 이 질문 역시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인생과 마찬가지로 이야기는 고통에 가득 찬, 하지만 결국 빛을 보게 될 여행이다. 그 빛의 이야기를 읽기 위해서 나는 ‘Espelhos’를 들으며 다시 구글 어스를 실행시킨다. 거기다 ‘Cape Finisterre’라고 친다. 라틴어 ‘Finisterrae’에서 온, ‘땅끝’이라는 뜻의 지명. 중세시대부터 순례의 마지막 지점으로 ‘세상의 끝’. 거기서 그레고리우스는 어부들에게 삶이 만족스러운지 물었다. 어부들은 그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다가 큰 소리로 대답한다.
“만족하냐고? 다른 삶도 모르는 걸!”
어부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그칠 줄 모르는 웃음바다로 변했다. 그레고리우스도 얼마나 흥겹게 웃었던지 눈물이 흐를 지경이었다. 그가 어느 어부의 어깨에 손을 얹어 바다 쪽으로 돌려세우고는, 돌풍에 대고 소리를 질러댔다.
“계속 직진! 오로지 직진!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가 바로 프라두가 에스테파니아 에스피노자와 함께 간 곳이었다. 여행이 끝나는 거기서 프라두는 그녀에게 배를 타자고 했다. “브라질 벨레이나 마나우스로, 아마존으로 가는 게 제일 좋겠어. 덥고 습기가 많은 곳으로. 색깔과 냄새와 끈적거리는 식물들과 열대우림과 동물들 이야기를 쓰고 싶어. 난 지금까지 언제나 정신에 관한 글만 썼어.” 라고 말했다. 이 소설이 이처럼 아름다운 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레고리우스가 어부와 바다를 바라보며 질러댄 소리처럼 인간에 대한 이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계속 직진! 오로지 직진! 거기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관련태그: 파스칼 메르시어, 리스본행 야간열차, 호드리구 레아웅

-
-
리스본행 야간열차 1
<파스칼 메르시어> 저/<전은경> 역
9,000원(10%
 + 5%
+ 5% )
)
-
-
리스본행 야간열차 2
<파스칼 메르시어> 저/<전은경> 역
9,000원(10%
 + 5%
+ 5% )
)
-
-
리스본행 야간열차 세트
<파스칼 메르시어> 저/<전은경> 역
18,000원(10%
 + 5%
+ 5% )
)
-
-
Rodrigo Leao - Alma Mater
13,400원(18%
 + 1%
+ 1% )
)
KBS FM"세상의 모든 음악", "전영혁의 음악세계" 등을 통해 소개되며 많은 음악 팬들이 듣기 원했던 아름다운 음악. 하지만 수입/라이센스반을 통틀어 국내에는 처음으로 발매되는 명작! Rodrigo eao"Alma Mater" Rodrigo Leao/ Alma Mater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그룹 마..
PYCHYESWEB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