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인 작가와의 만남, 어떠십니까? -『파라다이스 가든』 &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한해가 저물어가는 무렵, 여러 가지로 읽은 책을 정리해보려 한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신인 작가의 작품을 돌아보는 것이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무렵, 여러 가지로 읽은 책을 정리해보려 한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신인 작가의 작품을 돌아보는 것이다. 처음 만날 때는 생소한 이름이었지만, 작품의 뒤안길에서도 잊히지 않는 향기를 가득 남기는 그들, 그들과의 만남을 기억해보는 것은 독서 건강에 그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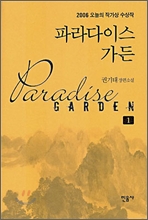 그 만남 중에서 유독 인상 깊었던 것이 권기태의 『파라다이스 가든』과 조영아의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다. 전자는 ‘오늘의 작가상’ 수상작(『백수생활백서』와 공동수상)이며 후자는 ‘한겨레문학상’ 수상작이다. 굵직굵직한 문학상 수상작인 셈인데, 그것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것은 아니다. 사실 상을 받든 말든 그것이 책 읽는 사람과 무슨 상관인가? 기억은 상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작품이 지닌 그 맛이 독특하기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만남 중에서 유독 인상 깊었던 것이 권기태의 『파라다이스 가든』과 조영아의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다. 전자는 ‘오늘의 작가상’ 수상작(『백수생활백서』와 공동수상)이며 후자는 ‘한겨레문학상’ 수상작이다. 굵직굵직한 문학상 수상작인 셈인데, 그것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것은 아니다. 사실 상을 받든 말든 그것이 책 읽는 사람과 무슨 상관인가? 기억은 상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작품이 지닌 그 맛이 독특하기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기묘하게도 두 작품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소설의 길에 올라섰다. 먼저 권기태의 『파라다이스 가든』은 판타지를 꿈꿔야 하는 길을 선택했다. 소설은 판타지여야 한다. 골룸이 나오는 그런 장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것을 추구하는 기나긴 모험으로서의 판타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꿈을 좇는 아이처럼 소설도 판타지를 추구해야 하는데 『파라다이스 가든』이 그것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파라다이스 가든』은 ‘유토피아’를 꿈꾼다. 말 그대로 이상향인데 그것 때문에 묘사하기가 쉽지 않다. 두 권에 걸쳐 만들어지는 ‘유토피아’라는 것이 단어로 만들어지는 순간, 왠지 세속화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요약해보자면,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울려 노는 그곳이다. 작품에서는 수목원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의미한다.
작품에서 그것이 출현하는 계기는 돈에 미친 사람들의 암투로 나타난다. 『파라다이스 가든』의 부잣집 형제는 기업의 운영을 두고 미친 듯이 싸운다. 돈이면 뭐든 되는 세상이니 핏줄이고 뭐고 다 때려잡자는 그런 논리다. 주인공 김범오는 애매하게 그 사이에서 엉뚱한 역할을 맡게 된다. 그중에는 자신이 그리워하는 ‘수목원’을 파괴해야 하는 역할도 있다. 본의는 아닐지라도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이 상황에서, 현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림 속에서, 김범오는 유토피아를 위해 뛰어나가고 유토피아를 지키고자 활약한다.
이것이 좀 생뚱맞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렇다. 시키는 대로 했으면 돈도 벌고 좋았을 텐데 뭐 하러 사서 고생을 하는가 싶기도 하다. 하지만, 어찌하랴. 돈은 유토피아를 만들어주지 못하는데…. 그런 탓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넘어서, 판타지 정신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우직하고 밀어붙이는 『파라다이스 가든』에 눈길이 한 번 더 간다. 아니, 두 번 가나? 아니면 세 번?
그에 비하면 조영아는 살포시 웃음을 짓게 하는 소설을 선보였다. 13세 소년의 눈으로 본 가난한 가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약간 과장해 보자면, 이 작품은 읽고 나서 입이 떡 하니 벌어지게 한다. 과연 이게 신인작가의 작품인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간지럽게 하기 때문이다.
 소설의 배경은 가난하지만, 이야기는 ‘우울’하지 않다. 분위기는 슬프지만, 이야기는 춤을 추게 한다. 그 옛날의 한국 소설과 다르다. 조영아의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는 맛깔스러운 글과 에피소드로 별을 보려면 어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가난도 마찬가지다. 가궳이 있어야 그 반대의 것을 알 수 있을 테니까 가난은 가난일 뿐 그것이 불편하기는 할지언정, 나 죽이라고 울부짖어야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별을 보려면 어둠이 필요하다는 사실! 이 작품은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다, 아주 자연스럽게.
소설의 배경은 가난하지만, 이야기는 ‘우울’하지 않다. 분위기는 슬프지만, 이야기는 춤을 추게 한다. 그 옛날의 한국 소설과 다르다. 조영아의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는 맛깔스러운 글과 에피소드로 별을 보려면 어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가난도 마찬가지다. 가궳이 있어야 그 반대의 것을 알 수 있을 테니까 가난은 가난일 뿐 그것이 불편하기는 할지언정, 나 죽이라고 울부짖어야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별을 보려면 어둠이 필요하다는 사실! 이 작품은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다, 아주 자연스럽게.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는 기본기가 탄탄한 것도 매력적이다. 에피소드들이 적당하게, 톱니바퀴 맞물리듯 오밀조밀하게 채워져 있다. 지루한 곳이 없다. 이야기 구성상 흥미진진하다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읽는 것이 무미건조한 것도 아니다. 덕분에 평화로운 기분으로 잔잔하게 읽어갈 수 있다.
또한, 주인공을 어린이로 내세운 작품 중에서는 간혹 무늬만 어린이일 뿐, 하는 말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른일 때가 많은데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도 매력이다. 그렇다. 어린이가 주인공인데 너무 조숙해서 어린이의 신분을 깜빡하게 한다면, 정말 큰일이다. 그건 책 덮어야 하는 문제인데 이 작품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요즘 소설은 너무 독창적인 나머지, 새로운 세계를 제시하고 그것에 동참하라고 주문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는 겸손하다. 그 겸손함, 그리고 능숙함이 사람을 당황하게 할 정도로 그윽하다. 작품을 보고 정말 신인이냐고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다면, 올해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를 봤을 때가 아닌가 싶다.
한국 소설이 재미없다고 하지만, 그건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믿는다. 재미없다고 하지 말고 재미를 붙여보자. 그 방법 중 하나가 신인 작가의 첫 작품을 시작으로 그들의 행보를 꾸준히 지켜보는 것이다. 우직한 권기태와 재치 만점인 조영아는 파트너로 삼을 만하다. 가는 길이 심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PYCHYESWEB02












































 5%
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