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예술가들은 하고 싶은 걸 해야 합니다
혹시 카를로 메노티의 <시집가는 날>이라는 오페라를 아시는 분 계신지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위해 주최측에서 의뢰한 작품입니다.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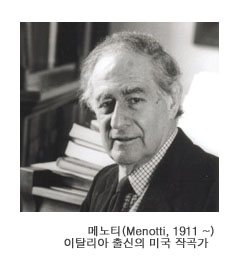 혹시 카를로 메노티의 <시집가는 날>이라는 오페라를 아시는 분 계신지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위해 주최측에서 의뢰한 작품입니다.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비평가들은 악평을 퍼부었고 메노티도 그 반응에 실망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이 작품을 자기 레파토리에 올리고 계속 수정, 공연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전 그 뒤로 이 작품에 대한 소문은 들어본 적 없습니다. 얼마 전에 구글링을 해봤지만 나오는 건 바이오그래피 중간에 삽입된 제목뿐이더군요.
혹시 카를로 메노티의 <시집가는 날>이라는 오페라를 아시는 분 계신지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위해 주최측에서 의뢰한 작품입니다.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비평가들은 악평을 퍼부었고 메노티도 그 반응에 실망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이 작품을 자기 레파토리에 올리고 계속 수정, 공연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전 그 뒤로 이 작품에 대한 소문은 들어본 적 없습니다. 얼마 전에 구글링을 해봤지만 나오는 건 바이오그래피 중간에 삽입된 제목뿐이더군요.
이 해프닝은 우스꽝스럽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논리에 따른 것이니까요. “중국애들은 <투란도트>가 있고 일본애들은 <나비부인>이 있어! 우리도 이런 유명한 이탈리아 오페라가 하나 있어야 해! 푸치니는 죽었으니 메노티를 데려오자!” 그래서 메노티를 불러온 주최측에서 원했던 텍스트는 <심청>이나 <춘향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메노티는 그 기계적인 요구에서 간신히 빠져나와 <시집가는 날>을 선택했던 거죠.
그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왜 <투란도트>와 <나비부인>에 집착해야하는 건데?”라고 물었습니다. 하긴 그래요. 중국이나 일본이 노골적인 서구인들의 오리엔탈리즘으로 범벅이 된 이 작품들을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맞는 말이죠.
그런데도 웃기는 건 여전히 우린 <투란도트>나 <나비부인>을 부러워하고 중국인들이나 일본인들에게 이 작품은 여전히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동양 오페라 가수들이 <나비부인>을 통해 데뷔했습니다. 장예모가 연출한 자금성의 <투란도트>가 벌어들인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오리엔탈리즘이 어쩌니 하고 반박을 해도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 메노티 버전 <심청>이나 <춘향전>을 원했던 올림픽 주최자들의 심정을 이해해요. 여전히 바보스러운 행동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저 같으면 어쨌겠냐고요? 흠... 글쎄요. 저 같으면 다른 텍스트를 주었을 겁니다. 보다 현대적인 것으로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건 김기영의 <하녀>입니다. 괜찮은 오페라 소재 같지 않습니까? 메노티의 멜로드라마티스트적 감성에도 비교적 잘 맞을 거고 쓸데없이 한국적 정서를 찾느라 함정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투란도트>나 <나비부인>처럼 장식적이지는 않지만 1980년대 말에 그딴 걸 원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었어요. 그런 촌스러운 아이디어를 떠올린 사람들은 반성하고 구석에서 손들고 서 있어야 합니다.
 그 동안 세상은 조금 더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계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조금 세련되게 바뀌었지요. 얼마 전에 피나 바우쉬와 부버탈 무용단이 한국을 소재로 한 <러프 컷>이라는 작품을 국내에서 상연했는데, 그건 정말 멋진 작품이었습니다.
그 동안 세상은 조금 더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계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조금 세련되게 바뀌었지요. 얼마 전에 피나 바우쉬와 부버탈 무용단이 한국을 소재로 한 <러프 컷>이라는 작품을 국내에서 상연했는데, 그건 정말 멋진 작품이었습니다.
<시집가는 날>과는 달리 <러프 컷>이 제대로 뽑혀져 나온 건 그 작품을 만든 예술가가 주최측의 요구에서 자유로웠고 작품을 끌어갈만한 자발적인 예술적 영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최 측에서는 여전히 바우쉬를 간접적으로 조종하려 했습니다. 휴전선으로 끌고 가서 분단 민족의 비극을 체험시키고 바우쉬가 그걸 작품에 반영하길 바랐죠. 현명하게도 바우쉬는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그 사람의 작품을 남한 사회에 대한 자신과 동료들의 인상으로 채웠습니다. 결국 예술가들이란 하고 싶은 걸 해야 합니다. 푸치니가 <투란도트>나 <나비부인>을 중국과 일본에서 의뢰받아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마가렛 드래블의 신작 소설 『붉은 왕세자빈』 이 한국에 번역출간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작품은 혜경궁 홍씨의 삶과 『한중록』이 큰 비중을 차지하죠. 드래블은 비교적 저명한 영어권 작가이기 때문에 이 결합은 국내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재미있군요. 지나치게 포스트모더니스트식 장난이 많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 정도면 괜찮아요. 2백년 가까이 구천을 떠돌던 유령이 저승에서 무얼 익히고 무엇을 배우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얼마 전에 마가렛 드래블의 신작 소설 『붉은 왕세자빈』 이 한국에 번역출간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작품은 혜경궁 홍씨의 삶과 『한중록』이 큰 비중을 차지하죠. 드래블은 비교적 저명한 영어권 작가이기 때문에 이 결합은 국내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재미있군요. 지나치게 포스트모더니스트식 장난이 많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 정도면 괜찮아요. 2백년 가까이 구천을 떠돌던 유령이 저승에서 무얼 익히고 무엇을 배우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무엇보다 편한 건 이 두 세계의 교류가 전적으로 자발적이었던 겁니다. 드래블에게 『한중록』을 억지로 넘겨준 뒤 제발 이 소재를 바탕으로 끝내주는 영어 소설을 써달라고 안달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드래블과 이 소설의 주인공 할리웰 박사에게 『한중록』은 그냥 독립적이고 훌륭한 문학작품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금 낙천적으로 본다면 그건 슬슬 우리의 문화가 세계 문화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증거겠죠. 국내 문학 작품의 번역과 소개의 중요성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고요.

PYCHYESWEB03















































 5%
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