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예스 100호를 맞이해, 커버를 장식했던 17인의 작가에게 상상의 우주를 열어준 책을 물었습니다. |

올여름엔 에어컨디셔너를 거의 켜지 않았습니다. 활짝 열린 창을 커튼으로 가려두고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고 보면 실내 온도가 34도까지 올라가 있곤 했습니다. 워낙 더운 날을 보내서인지 여전히 한낮 기온은 30도 가까이 올라가는데 이제 제법 서늘해졌다고 느낍니다. 느낌만은 아니고요, 처서 지나고 바로 선선해져서 이제는 밤 기온이 20도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처서매직(處暑magic), 처서매직입니다. 절기가 고스란한 것을 보니 지구에 사는 인간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이 무덥기 전의 일입니다만 나는 이번 여름에 고양이를 잃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매일을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고양이와 시간을 보내세요. 병원에서 느닷없이 그런 조언을 받고 돌아와 보름도 되지 않아 겪은 일입니다.
고양이를 먼저 보내고 석 달 동안 외출하지 못했습니다. 내 고양이가 마중 나오는 고양이였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를 잃고 보름 지난날, 체육관에 가려고 운동화를 챙겨 집을 나섰다가 되돌아왔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도 고양이가 마중 나오지 않는다, 그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혀서 그날 이후로 외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팟캐스트를 녹음하러 여의도를 오갈 때 말고는 집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넉 달로 접어드는 요즘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숭아와 토마토를 사러 시장에도 가고 시위하러 광장에도 가고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도 갑니다. 집을 나서는 일도 돌아오는 일도, 전만큼 어렵거나 두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사정이 조금 달라집니다.
밤에 자다가 거실로 나가면 내 고양이가 이런저런 모퉁이에 슥 몸을 비비며 다가오곤 했는데 이제 그게 없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양이가 사용하던 밥그릇도 물그릇도 장난감도 방석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그가 없습니다. 사방에 털이 있는데 만질 수 있는 몸은 없습니다. 때문에 나는 서양 괴담에 등장하는 반시처럼 울면서 거실을 돌아다닙니다. 15년 동안 대답해 온 존재가 이름을 불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이 정도로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고통스럽다 못해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잠에서 깬 밤엔 그래서 결국 화가 난 채로 아침을 맞습니다. 여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이번 여름에 슬펐고, 아팠습니다.
아프니까 아프다고 쓰고, 슬프니까 슬프다고 쓰는 것을 꺼리는 마음이 내게 작게 있습니다. 몇 해 전에 그렇게 쓴 글을 ‘TMI’라고 부르는 말을 들은 적 있기 때문입니다. ‘Too Much Information’이란 무슨 말일까요? 맥락 없는, 아무런 관련 없는, 누구도 청하지 않은, 불필요한, 그래서 알고 싶지 않은 정보를 이르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짐작하는 것처럼 누구든 편의적으로 얼마든지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말이라서, 요즘은 알아봤자 내 삶이 나아지지도 않고 기분만 잡치고 가라앉게 만드는 이야기도 이 말의 영역에 들어가 버린 듯합니다. 이를테면 타인의 고통, 슬픔 같은 것도 말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면 고통도 슬픔도 분노도, 투 머치한 정보가 되는 세상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슬픔과 아픔은 정보가 아닙니다.
어쩌면 정보가 아니라서, 누군가는 기어이 기분을 잡쳤다고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 나는 서글픕니다.
내 고양이는 내가 품에 안고 있을 때 마지막 숨을 쉬었습니다. 그즈음 늘 고양이를 안고 지냈기 때문에 겪을 일이었고 모든 게 후회뿐인 와중에 한 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일입니다. 매일을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보내라는 조언을 받은 뒤로는 그렇게 지냈습니다. 안아서 밥과 약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가슴에 얹은 채로 드러누워 재우고. 그렇게 많이 만지며 지내는 바람에 고양이를 잃고도 수일간 손바닥에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게 점차로 희미해지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 되었지만 말입니다.
비올레트는 그걸 겪지 못했습니다. 비올레트의 일곱 살 먹은 딸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삽시에 일어난 화재에 휘말렸고 비올레트는 딸의 몸이 불에 타 흔적 없이 사라진 뒤에야 연락을 받았습니다. 비올레트가 묘지지기로 묘지에 딸린 집에서 살기로 한 이유는 그 묘지에 딸의 이름을 새긴 묘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죽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묘지에 묻힌 죽은 사람들을 자신의 이웃이라고 칭한 이유는 그래서였을 것입니다. 소설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을 어떤 이야기라고 소개하면 좋을까요. 상실에 관한 이야기, 애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통한 한 사람의 아픔에서 여럿의 노래와 시로 번져가는 이야기입니다. 점잖은 사람들이 보기엔 입을 벌리고 부정할 사랑 이야기이자, 사랑 아닐 수는 없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들로 기어코 우리를 뒤흔들고 끌어안는 이야기, 그래서 말하자면 숱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삶이라는, 너무나 많은 고통이며 사랑이 어째서 정보일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는 비올레트가 다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이름이지만 딸을 대신하는 이름은 아닙니다. 세상에 다시 없을 이를 잃은 비올레트는 상실은 상실대로 새겨 두고 사랑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사랑하기에, 죽음에서 삶으로 나아간다.”고, 그러므로 사랑해야 한다고 스스럼없이 권하는 이 소설을 나는 요즘 자주 생각합니다.
여름에 고양이를 잃으면서 나는 내 삶에 다시는 없을 개성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고양이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그를 만질 수 없습니다. 그게 가장 고통이었고 화였던 밤들을 지나 이제 오늘입니다.
언제고 그가 마중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무 때나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 시간도 곧 다른 시간으로 이어지겠지요.
아시다시피 말입니다.
*황정은 소설가. 팟캐스트 <책읽아웃> 진행자. 소설집 『일곱시 삼십이분 코끼리열차』, 『파씨의 입문』, 『아무도 아닌』, 장편소설 『百의 그림자』, 『야만적인 앨리스씨』, 『계속해보겠습니다』, 연작 소설 『디디의 우산』 등을 썼다. 만해문학상, 신동엽문학상, 대산문학상, 한국일보문학상, 이효석문학상, 김유정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젊은작가상 대상 등을 받았다. |
추천기사
비올레트, 묘지지기
출판사 | 엘리

황정은(작가)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해란(포토그래퍼)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취미 발견 프로젝트] 책상 위 나만의 작은 미술관 | 예스24 채널예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7/5/e/e/75ee22bee770b6b032d04a654225c2fa.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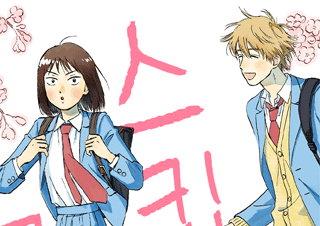

![[큐레이션] 시가 잘 안 써질 때 읽은 신간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5/20250520-62d37b17.jpg)
![[송섬별 칼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몽땅 ①](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5/20250507-df966cd9.png)
![[큐레이션] 고만고만한 책을 뛰어 넘는 법](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22-b5b7e1c2.jpg)
![[리뷰] 불행한 결혼은 필연인 것, 『크로이체르 소나타』](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3/20250314-25deae01.jpg)
![[송섬별 칼럼] 내 뼈를 보고 싶어 했을지가 궁금하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3/20250312-56db4c82.png)



dkrlrha3131
2025.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