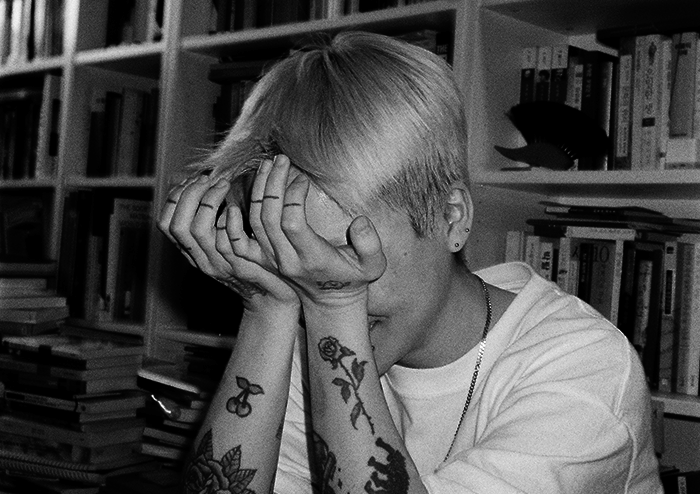작년 휴가를 포틀랜드에서 보냈다. 굳이 이유를 대자면, ‘맥주’ 때문이었다. 한국에도 소규모 양조장들이 늘어나고, 놀랍게도 ‘맛있는’ 맥주를 파는 곳이 줄줄이 생겨나고 있음에도, (유명한 박물관도 미술관도 없고, 그 흔한 타워도 하나 없는) 포틀랜드에 갔다. 그렇다면 ‘맥주 맛’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퇴근 길에 홀로 단골 맥주집에 들러 안주 없이 쿨하게 딱 한잔 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것, 혹은 옆 자리에 앉은 처음 보는 사람과 서슴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가 되는 것 따위를 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른다. 이곳에서는 눈치 보이고 어려운 일이, 그곳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짧은 휴가 동안만이라도 ‘힙’한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고 싶었던 거다.
 |
 |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놀라웠다. 저자가 5년 동안 연구하고 관찰하여 만든 [힙스터 체크 리스트]와 [힙스터가 좋아하는 것들]의 항목 중에 꽤 많은 부분들이 내 관심사와 겹쳐졌다. 모르는 사이 저자한테 관찰 당한 사람 중 한 명이 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읽는 내내 자조적인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7년 전, 밴드에 관한 기사를 읽다가 처음 접한 ‘힙스터’라는 단어에 호기심을 갖게 된 저자는 왜 사람들이 힙스터를 비웃고 조롱하는지, 왜 어느 순간 허세부리는 젊은이를 지칭하는 것처럼 되어버렸는지를 추적한다. 포틀랜드가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힙한 도시가 된 사연과 함께 미니멀리즘과 결합해 탄생한 일본 특유의 힙스터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다. 한국의 힙스터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장소가 바로 ‘홍대’인데, 90년대부터 젊은 사람들이 즐기는 하위문화의 본거지였기 때문이다. 현재는 근처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 중이지만, 여전히 홍대는 힙스터들의 무대다. 왜 유독 한국에서 힙스터가 조롱거리가 되는지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회 현상들을 토대로 조목조목 분석한다.
모든 것이 링크 하나로 순식간에 확산되는 시대에, 힙스터만의 고유한 문화는 점점 더 존재하기 힘들 거다. 하지만 크래프트 문화를 사랑하고, 확고한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사는 포틀랜드 힙스터처럼, 고향으로 돌아가 지역 사회를 살리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일본의 힙스터처럼, 한국의 힙스터들도 한국을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좋은 것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힙스터’라는 저자의 말대로, 다양한 취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더 풍부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책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 한다.
누가 나에게 본인은 힙스터라고 생각하느냐고 묻는다면, 주저 없이 ‘네’라고 대답할 것이다. 힙스터가 아니면 누구도 힙스터에 신경 쓰지 않는다. ---111쪽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나 역시 힙스터라고 말할 수 있다. 힙스터가 아니라면 이토록 이 책을 열심히 읽었을 리 없다.

최지혜
좋은 건 좋다고 꼭 말하는 사람









![[이다혜 칼럼] 원작으로부터 가장 멀리, 원작에 한없이 가까이](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1/20251110-8236456d.jpg)
![[김미래의 만화절경] 어제 뭐 먹었어?](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0/20251027-5031a641.png)

![[더뮤지컬] <멤피스> 글래디스, 잘못된 나를 버릴 줄 아는 어른](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18-d2e3516d.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