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 금요일, 임진아 작가가 <채널예스>에서 작업하기 좋은 카페를 소개합니다. ‘임진아의 카페 생활’에서 소개하는 특별한 카페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

가기로 마음먹자마자 집 앞에서부터 노란색 카펫이 길게 깔리는 카페가 있다. 카페에 다다르면 이 근처에 열린 곳은 여기 하나뿐인 것처럼 마음이 환해지는 곳. 집에서부터 걸어서 가도 좋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 더 좋은 곳. 카페 고잉홈이다. 핸드 드립과 모카포트로 천천히 커피를 내어주는, 비가 와도 볕이 가득 들어차도 언제 가도 좋은 카페.
카페 고잉홈의 내부는 온통 노란색이다. 노란색의 둥근 카운터와 조명과 간판, 그리고 내부에 알맞게 자리한 부드러운 나무 가구는 전체적으로 온화한 빛을 낸다. 마음 속에 조도 하나를 설정해둘 수만 있다면 여기를 따라 하고 싶을 만큼 다사로운 기운이 감돈다. 하지만 마음의 조도를 내 멋대로 정할 수 없는 노릇이니 나를 움직여 원하는 조도를 찾아갈 수밖에.
한 동네에 같이 살다가 서울 근교로 이사를 간 친구에게 새로운 동네에 잘 적응을 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대뜸 카페가 너무 없다고 한숨을 푹 쉬었다. 서울에 카페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대답하면서 질문 하나를 던졌다.
"만약에 카페 딱 하나만 집 앞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멋대로 카페를 옮긴다는 건 엉뚱한 일이지만, 그런 식으로 가짜 궁리를 해보면 평소의 투정은 내 마음 읽기 시간으로 금세 바뀐다. 친구는 오래 고민하지 않고 곧장 카페 두 곳을 말했다. 그중 한 곳은 우리가 함께 갔던 카페 고잉홈이었다. 친구에게 카페 고잉홈은 생각하는 시간이 주어졌던 곳이자 모처럼 곰곰해질 여유를 준 곳이었다고 한다. 이사간 동네에는 그런 카페가 아직은 없다는 말이 되기도 했다.
많고 많은 카페들이 나의 일상에 저마다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 그려볼 수 있었다. 친구 말마따나 카페 고잉홈은 나에게도 그런 곳이었다. 갈 때마다 내 마음 속의 여러 문 중에서 매번 같은 문을 열리는 곳. 이곳의 흐름에 맡긴 채 모처럼 멈출 수 있는 곳. 영감이란 게 피어나는 순간이 있다면 바로 이런 장소에서의 시간이 아닐까.
눈 앞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기 위해 '눈의 근육'을 기르며 자신만의 우아한 도구 하나를 매일 감각하며 사는 사람의 에세이 『우아한 언어』에는 카페 고잉홈에서 번번이 만났던 순간이 그려져 있다.
"자신이 움직이면서 더 많은 것을 보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멈춰 서서 다른 이의 속도를 관찰하고 있으면 담아두고 싶은 장면이 생기기도 한다."
어쩌면 혼자 카페에 앉아 있는 순간은 나의 하루 중 가장 사진을 닮은 시간이 아닐까. 빠른 영상마냥 흐르는 하루에서 잠시나마 사진이 되는 순간.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처럼 '멈춰 있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지 않아도 되는' 순간. 한 장의 사진처럼 두고 두고 보고 싶은 장면 하나가 이럴 때 남는다. 이런 사진들이 차분히 모일 때면 저도 모르게 찬찬히 단단해진다.
카페 고잉홈은 셋이 가도 둘이 가도 또 혼자 가도 언제나 오늘의 이곳을 만나는 곳이다. 마치 매일 다른 식으로 어질러져 있는 나의 거실방에 형광등이 아닌 작은 노란 조명 하나를 켜둘 때의 아늑함 같다. 아무리 어질러져 있는 테이블이라도 노란 조명 하나 켜면 푸근하고 친숙한 나의 풍경이 되는 것처럼, 카페 내부에 들어간 순간 어떤 식으로도 이곳만의 온기를 머금게 된다. 우리들이 카페를 찾는 이유는 아마 이것이 아닐까. 이런 나라도 들어가 앉으면 잠시나마 여기 같아지는 것.
차분한 테이블에 앉아 바깥의 동네 풍경을 바라보며 피스타치오 초코칩 쿠키를 입에 넣고서 나무 수저로 아이스 두유 라테를 휘휘 젓고 있다 보면, 지금 가장 관찰하고 싶은 풍경은 바깥이 아니라 이곳의 온기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카페 고잉홈의 자리는 모두 바깥을 향하게 앉는 바 형태의 자리이지만, 다녀온 기억에는 바깥이 아닌 내부의 따뜻함이 가득 서려 있다.
카페 고잉홈의 SNS 계정에 들어가면 적혀 있는 짧은 문구 하나.
"기댈 곳 하나 보태는 마음"
손님으로서는 고마운 한 줄이 아닐 수 없다. 기대도 된다는 건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인지. 이는 손님을 향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네에서 거처 없이 지내는 고양이들을 향한 말이기도 한 것 같다. 카페에 앉아 있다 보면 어린이 손님도 오고, 동네 개 손님도 오고, 장을 보던 사람, 일부러 찾아오는 다른 동네 사람, 근처 회사 사람, 바로 근처에 사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오지만, 그중에서 가장 당연한 듯 여길 찾는 손님은 고양이 손님이다. 길에서 지내는 고양이에게 당연한 공간이 되어 준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른다. 고양이에게 건네줄 밥만큼은 떨어지지 않게 준비해두고, 고양이의 그림이 찍힌 작은 쿠키의 판매금은 고양이들의 밥을 사는 데에 쓰인다. 쿠키에는 작은 집 속에서 단잠을 자는 고양이가 그려져 있다. 거처가 없는 고양이들에게 작은 집이 되어 주는 쿠키. 카페 고잉홈에 가면 꼭 사 오는 쿠키다. 이 세상의 모든 거처가 없는 동물 친구들에게 당연한 평온이 깃들기를 바라게 된다.
길에 사는 고양이들을 매일 신경 쓰기로 결심한 사람은 마음 하나를 매일 바깥에 둔 채 살아간다. 그러기로 결심한 사람에게는 매일의 걱정이 자리하고, 또 그 걱정은 내일도 계속될 거란 걸 알고 있다. 가슴 아프게 만드는 무언가가 일상에 뾰족하게 자리 잡혀 있어서 때론 맹렬해지기도 하는 사람이 내어주는 온기. 다정하고 싶은 것에 다정해지자고 다짐한 사람은 끝없이 맞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이 꾸리는 공간은 누구에게나 한결같은 빛을 내어 준다.
비 오는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양이 손님이 밥을 먹으러 카페 고잉홈 앞에 왔다. 허겁지겁 밥을 먹던 고양이 곁에 작은 비닐봉지에 싼 밥을 두는 사장님을 보고 나는 눈이 동그래졌다. 여기는 고양이 밥도 포장을 해주는구나. 밥을 먹고 눈을 조금 붙이던 고양이는 이제는 가야 할 때라는 듯이 벌떡 일어나서 비닐봉지를 입에 물었다. 밥을 먹을 때 봤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무는 모습에 내 눈은 더 커졌다. 고양이는 지켜보는 사람 손님들을 아랑곳하지도 않고 비닐봉지를 꽉 문 채로 새끼들이 있는 임시 보금자리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나는 왠지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사장님을 쳐다봤는데, 사장님은 한시름 덜었다는 표정으로 다시금 할 일에 손을 뻗고 있었다. 기댈 곳 하나 있다는 건, 나를 포함한 모든 작은 존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어준다.
카페 고잉홈은 수요일에 쉬지만 가끔 휴무일에도 열린다. 다만 카페에 막 도착한 고양이에 한해서. 단 하나의 마법을 쓸 줄 안다면 아마도 카페 고잉홈 사장님은 고양이에게 쉬는 날 알려주기 마법을 쓰고 싶지 않을까. 혹은 자신에게 모여든 고양이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마법. 그런 마법을 희망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멋대로 여기면서 카페 고잉홈을 찾는다. 가려고만 하면 마음 안에 길게 깔리는 노란색은 그간 나의 평소에는 좀처럼 드리우지 못했던 따스한 조명이기도 하고, 잊지 않고 마주하고 싶은 세상이기도 하고, 동네에 다정한 지붕이 있음에 안심하는 마음이기도 하다.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바라보고자 하는 이에게 눈의 근육이 자라나듯이, 매일 슬픔을 마주하면서 동시에 다정함을 잃지 않은 채 나아가는 이에게는 온기의 근육이 자라나지 않을까. 그 근육에 색이 있다면 분명 노란색이지 않을까.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우아한 언어
출판사 | 위즈덤하우스

임진아(일러스트레이터, 작가)
살면서 느끼는 것들을 그리거나 쓴다. 일상의 자잘한 순간을 만화, 글씨, 그림으로 표현한다. 지은 책으로는 『사물에게 배웁니다』, 『빵 고르듯 살고 싶다』, 『아직, 도쿄』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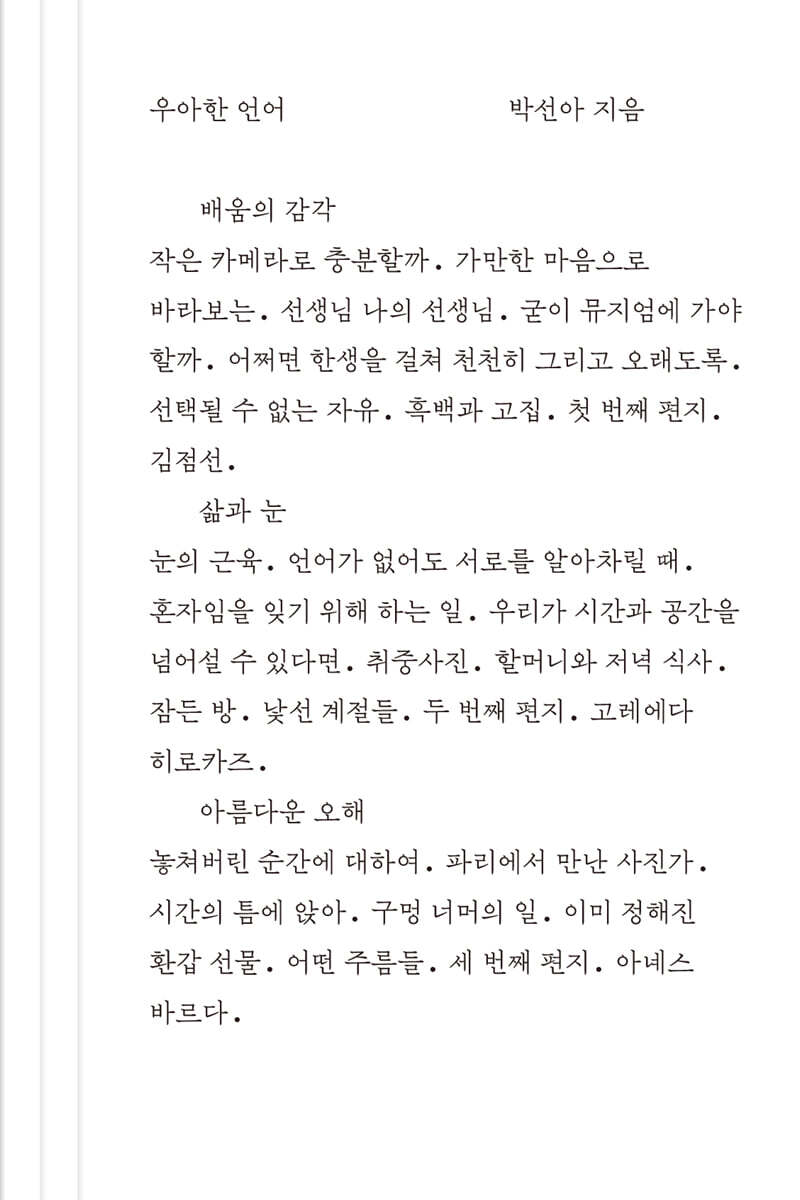
![[임진아의 카페 생활] 커피에게로 달려가기 - 언와인더리 | YES24 채널예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9/f/5/5/9f55a0670d41654ee5e90258808c00bd.jpg)
![[임진아의 카페 생활] 다시 만난 느긋한 순간 - 아이들모먼츠 | YES24 채널예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9/6/5/0/96501cdd9b319b1324eb4a2f3cd86123.jpg)
![[임진아의 카페 생활] 이제는 초록이 된 마을에서 봄을 느끼자 - 호핀치 | YES24 채널예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c/0/d/e/c0de36457209b449b4dff2eefdda1385.jpg)









steal0321
2023.06.12
얄궂쟁이
2023.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