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은 죄가 없단 말이지

언니들, 제 가슴도 자유를 원한대요
바르셀로나 동쪽으로 길게 뻗어있는 지중해. 이 많고 많은 해변 중 어디를 가면 좋을지 지도를 한참 들여다본다. 우리가 바다를 고르는 기준은 무척이나 심플하다. 집에서 가까울 것, 관광지가 아닐 것. 바르셀로나 북쪽에 위치한 우리 집과도 가까운 바달로나Badalona. 지도로 보아하니 제법 큰 올드 시티가 눈에 띄고 대중 교통(R1 Badalona역)도 잘 돼 있다. 세상 참 좋아졌다. 가이드 북이나 블로그 검색 없이도 지도와 위성만 보아도 그곳이 어떤 분위기인지 감지할 수 있으니 말이다. 갈 때는 버스, 올 때는 기차를 타고 움직였는데 시내에서 한 시간 내외면 갈 수 있다.
바다에 가는 여정은, 사실 그 남자를 설득하는 험난한 산을 넘어야 한다. 가기도 전에 등산을 해야 하니 진이 빠질 수밖에. 샤워는 시도 때도 없이 하면서 바다에 가는 건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그가 눈을 뜰 때부터 짜증을 부리는 통에 바달로나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 둘 사이에는 한랭 전선이 흘렀다. 버스에서 내리라는 시늉도 눈짓으로, 아침 먹으러 들어간 식당에서도 말없이 빵만 뜯어 먹는다. 싸우고 나면 여행이고 내 영혼의 반쪽이고 다 싫다. 반대로 사이가 좋을 때면 시궁창에 갇혀 있어도 서로를 보듬을 수 있다.
다행히 바달로나 해변이 묵은 감정의 때를 씻겨 주었다. 바르셀로네타Barceloneta나 시체스Sitges 해변과 달리 소박한 정경이 맘에 든다. 그 남자도 랜덤으로 얻어걸린 바달로나가 싫지 않은 모양인지 먼저 바다에 들어가자고 한다. ‘거 봐, 오면 좋아할 거면서. 튕기기는.’ 바달로나에는 그 흔한 비치 의자 대여점도 없다. 평일 바다를 차지한 어린아이들과 틴에이저 사이에서 돗자리를 깔고 우산을 그 위에 펼쳤다. 그늘이 없는 해변에서는 돗자리와 타월 그리고 파라솔이 해변 필수 품목이다. 커다란 파라솔을 사기는 부담스러워 우산 하나를 챙겨 온 게 도움이 쏠쏠하다.
“양산을 준비했더라면 UV 차단도 될 텐데……” 여행의 꼼수만 늘어난다.
방학을 맞이한 이 동네 학생들은 죄다 바다로 놀러 온 모양이다. 한 팀이 빠져나간 자리에 금세 다른 무리가 찾아온다. 녀석들이 이방인인 걸 눈치채고 ‘치노’라고 놀리지나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이 동네 사람으로 인지한 모양이다. 현지인 틈으로 무리 없이 녹아들고 싶은 작은 바램이 있다. 래시가드 말고 비키니를 입고, 거한 아이스박스에 한 상을 차려 오는 대신 은박지에 돌돌 싸맨 보까디요(스페인식 샌드위치)로 점심을 먹는다. 그 나라 사람들의 방식으로 바다를 즐기고 싶었다. 그런데 이렇게 애를 써도 우리 피부가 태양에 취약한 건 어쩔 수 없나 보다. 스페인 태양을 과신하고 얼굴과 어깨에만 선크림을 발랐더니 다리에 작은 화상을 입고 말았다. 화상 연고를 가져와서 다행이지 욱신거리고 따끔한 열상에 병원으로 직행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한참 수영하다 토플리스의 여인과 물속에서 마주친 그 남자의 호들갑이 꽤나 귀엽다. 비키니 상의를 후루룩 벗어 버리고 선탠하는 것도 모자라 바다로 풍덩풍덩 뛰어드는 모습에서 해방감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치의 자유로움이 느껴졌다. 요즘 들어 브래지어를 하지 않고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바달로나 해변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음, 네 가슴이니까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아시아 여자라서 사람들이 많이 쳐다볼 거야.”
비키니를 벗겠다고 했더니 그 남자가 말리는 듯 아닌 듯 애매모호한 답을 꺼내 든다. ‘가슴 따위, 좀 드러내면 어때?’ 결국 가슴을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이지 내 가슴은 죄가 없는데 말이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가슴아. 내가 곧 스페인의 뜨거운 태양을 보여 줄게.
너나 나나 똑같은 가슴

남자들만 태양 아래서 이런 자유를 누려야 할까?
지중해와 도시 한 면이 고스란히 맞닿아 있는 바르셀로나, 해변이 보일 때마다 물에 들어가야 하는 그 여자가 이 도시를 선택한 것은 뻔한 속셈인데 어째서 나라는 인간은 또 당하고 만 것인가. 바다에 도착하기까지 그 여자와 나 사이의 갈등은 그저 둘 사이의 일이니 해변의 풍경이나 이야기하자.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과 눈이 시릴 만큼 반짝거리는 바다를 감상하며 해변을 둘러봤다. 같은 반 친구들로 보이는 남학생, 여학생이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바다를 즐기고 있다. 그저 물놀이가 신이 나는 초등학생부터 어깨에 잔뜩 힘을 준 고등학생까지 연령대 또한 다양하다. 해변에 앉아 잔뜩 심술을 부리고 있는 나와 달리 그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시종일관 하하호호 신이 나 있다. 그 유쾌함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질투가 난다. ‘이쯤 하고 그 여자와 화해를 해야 하나?’
고민에 빠져있던 순간, 상반신을 드러낸 채 물놀이를 하거나 선탠하는 여인네들을 발견한다. 고개를 돌려도 또 다른 토플리스 여성이 눈에 들어온다. 그저 내 가슴이나 저들의 가슴이나 똑같은 가슴이니 시선이 가면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바라보면 될 것인데 자꾸만 피하게 된다.
우리 사회는 남성과 여성의 젖꼭지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다르다. SNS에서 여성의 가슴과 유두는 차단하면서 남성의 그것에는 다른 검열 기준을 적용한 것은 여성의 가슴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드러낸다. 똑같은 신체 일부일 뿐인데 어째서 한쪽은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도록 길들여진 것일까? 나도 물에 들어가기 전 드러내는 가슴인데 그녀들도 좀 풀어 헤치면 어떠하며, 동물도 그렇지 않은데 이성의 가슴을 본다고 성적인 흥분을 느낄 리 없지 않은가? 감정의 교류 없이 상대의 외모만으로도 성적인 흥분을 느낀다면 발정 난 짐승과 다를 바 없다.
바르셀로나 도심에서 목격한 놀라운 풍경은 공원 벤치에서도, 도심 번화가에서도, 심지어 지하철 승강장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엄마들이었다. 아이에게 젖을 물린 엄마의 가슴을 보고 흥분을 느끼는 이는 없을 것이다. 엄마들이 모유 수유하는 동안 그 누구도 ‘아이가 젖을 잘 먹네요’ 혹은 ‘젖 먹이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라고 하지 않는다. 심지어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엄마가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위해 자신의 가슴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주변의 배려 때문이다.
상대방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드러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엄마는 배고픈 아이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서이다. 해변에서 가슴을 드러낸 이들은 자연과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이거나 남성과 여성의 가슴이 모양만 다를 뿐 똑같이 몸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다.
고개를 돌리지 말고 남자의 가슴을 쳐다보듯 여성의 것도 바라봐야 했지만 이런 풍경을 대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 해변의 중학생 남자 녀석들이 여성의 가슴을 보고 지들끼리 낄낄거린다. 녀석들의 자신과 다른 모양새에 대한 호기심은 오래가지 못했고 이내 고개를 돌려 친구들과 공놀이하기 바쁘다. 이 아이들도 계속 이런 환경에 노출되다 보면 더 이상 여성의 가슴이 시시껄렁한 화제에 오르지 않겠지.
http://ch.yes24.com/Article/View/33720
위 링크 하단에 댓글로 ‘2017년 기사 중 가장 좋았던 기사 1개’를 꼽아주세요!
해당 기사 URL과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1회 응모시마다, YES포인트 200원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클릭!

백종민/김은덕
두 사람은 늘 함께 하는 부부작가이다. 파리, 뉴욕, 런던, 도쿄, 타이베이 등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도시를 찾아다니며 한 달씩 머무는 삶을 살고 있고 여행자인 듯, 생활자인 듯한 이야기를 담아 『한 달에 한 도시』 시리즈를 썼다. 끊임없이 글을 쓰면서 일상을 여행하듯이 산다.









![[취미 발견 프로젝트] 몸 속부터 구석구석 건강하게 채우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26-198e08d9.jpg)
![[비움을 시작합니다] 정서적 ‘비움’을 찾고 싶은 사람들에게 ②](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29-7789ced1.jpg)
![[리뷰] 몸보다 오래 살아남은 기억에 관해](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09-2d5391b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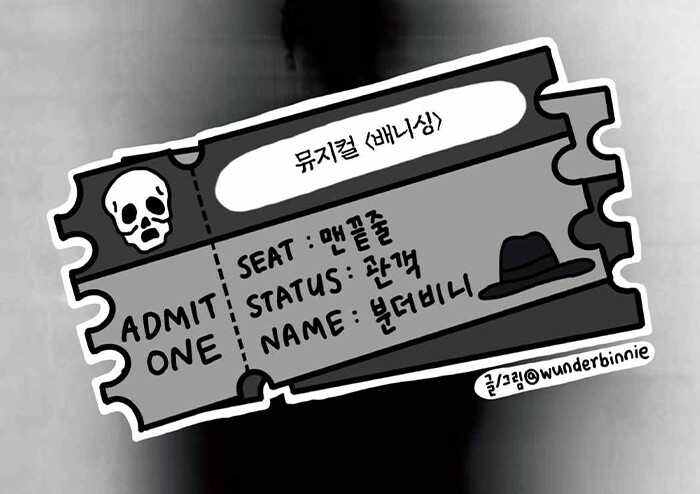
![[취미 발견 프로젝트] 더 단단해질 한 해를 위한 목표 세우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2/20241231-347d8b4f.jpg)


iuiu22
201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