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길 저 | 은행나무
‘강화길’이 ‘여자’의 ‘몸’에 대한 장편소설을 썼다고 했을 때, 나는 어쩐지 읽지 않아도 알 것 같다고 생각했다. 비이성적이고 극렬한 두려움이 공포의 실체라면 그 공포가 가장 활개치기 좋은 무대가 여자의 몸이고, 그런 공포를 가장 날카롭게 포착해 온 작가라면 당연히 강화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런 여자들의 마음”, 그러니까 “박탈감. 허탈감. 압박감. 강박. 어떻게든 허물을 벗고 싶다는 그 발버둥. 몸부림. 악다구니”(88쪽)를 나도 잘 아니까. 나는 여자이고, 마찬가지로 내 몸과 오래 불화했고, 그러면서도 개의치 않는 듯 위선을 떨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틀렸다. 『치유의 빛』은 그보다 훨씬 더 멀리 간다. ‘나의 몸’에서 출발한 이야기는 더 멀리, 학교로, 교회로, 치료원으로, 과거로, 미래로, 안진으로 간다. ‘우리의 몸들’이, 오래된 고통이 고여 있는 곳으로.
이야기는 서른두 살의 여성 ‘지수’에서부터 시작한다. 지수는 176cm의 키에 50kg의 ‘늘씬하고’ ‘모델 같은 몸’을 가진 여성이다. 하지만 그 늘씬한 몸은 나비 날개 모양의 작고 새하얀 식욕억제제로 지탱되는 몸이다. ‘먹지 않기’라는 극단적인 자기 통제가 늘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 거식과 폭식으로 이어지는 루틴은 지수의 신체와 정신을 갉아먹는다. 그러던 어느 날, 날개뼈 아래에서부터 정체불명의 통증이 시작되고 지수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 ‘안진’으로 향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중학교 동창의 이름을 전해 들으면서 모든 고통의 기원이 된 시간을 더듬게 된다.
우선, ‘안진’이 어떤 곳인가. 안진은 작가의 전작들 -「니꼴라 유치원」, 「다른 사람」, 『안진: 세 번의 봄』-에서도 이야기의 무대로 등장했던 가상의 소도시다. 이번 소설에서 안진은 만병통치약을 판다는 교회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이자, 오래된 수치가 봉인된 지점, 그리고 몸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려는 사람들이 다시 모여드는 곳이다.
열다섯 지수에게 안진은 최초로 타인의 시선을 인식해야 했던 곳이다. 그해, 지수는 갑자기 찾아온 미칠듯한 식욕과 함께 20cm 넘게 키가 자라고 육중해진 몸을 갖게 된다. “불룩한 뱃살과 두툼한 허벅지. 끝없는 허기와 무시무시한 식탐. 언제 어디서든 눈에 띄는 거대한 덩치. 덩어리”(21쪽)로 묘사되는 몸을 가진 소녀에게는 어딜 가나 경멸과 혐오의 시선이 들러붙는다. 그러나 해리아는 달랐다. 큰 키와 가늘고 쭉 뻗은 다리로 운동장을 질주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소녀 해리아는 그 시선을 ‘관심’으로 바꾸어 건넸다. 큰 키가 부럽다며, 수영을 가르쳐달라며 다가온 해리아의 손을 지수가 맞잡으면서 소녀들은 이후 자신의 삶을 뒤바꿀 끔찍한 사고에 함께 휘말리게 된다.
소설은 안진이라는 폐쇄적인 소도시에서 지수, 해리아, 해리아를 갈망하는 신아, 해리아에게 쏠린 관심을 빼앗고 싶었던 안지연, 그리고 이들의 체육선생인 김이영까지, 네 소녀와 한 여자를 둘러싸고 벌어진 갈망과 질투를 그리며 ‘그날의 사고’로 천천히 향해간다. 하필이면 몸이 가장 적나라하게 전시될 수밖에 없는 수영장에서 벌어진 탓에, 사고는 곧 몸의 기억으로 각인되고 이후 이들은 그날의 기억-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친다.
시간이 흘러 학교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은 ‘채수회관’이라는 이름을 내건 재생 수련센터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는 사람들. 어떤 경계에 서서 울부짖는 사람들. 내 몸을 내 몸처럼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곳을 지수도 찾는다. 날개뼈 아래부터 시작된 원인 불명의 통증을 치유하고 싶다는 지수에게 고통의 동료들은 말한다. 원인 불명의 통증에는 모두 최초의 기억이 있고, 그 기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그들에게 이런 믿음을 심어준 사람은 ‘벗’이라 불리는 인물이다. ‘벗’은 육체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치유의 빛’을 찾는 여정이라 설명한다. 그러나 정작 고통에서 벗어나 스스로 신이 된 ‘벗’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소설은 다시 묻는다. 너는 정말 자유로워졌니? 왜 너는 자유로워졌니?
끝에 이르러 소설은 진실인지 아니면 환상인지 분간할 수 없는 장면 하나를 선물처럼 남긴다. 지수, 해리아, 신아, 그리고 안지연이 물 속에서 서로의 등을 밀어주고 몸을 붙잡아주며 자유롭게 헤엄치는 순간이다. 그 안에서는 물 밖의 수치도 질투도 아무 상관 없어 보인다. 오직 함께 떠오르고자 하는 몸들만 있다.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기 전. 모든 것들이 뒤바뀌기 전. 나는 그 장면에서 어쩐지 조금 울고 싶어졌다. 물이 결국 핏빛으로 물들고 잠시의 해방이 곧 돌이킬 수 없는 속박으로 바뀌게 될 때, 그들이 느꼈을 절망을 떠올리게 됐기 때문이다. 영혼의 일부를 물속 어딘가에 영원히 가라앉혀야만 했던 슬픔을.
나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언제든 타인의 시선과 폭력에 침범당하는 영토. 내가 지켜야 할 집이지만 정작 나 역시 언제고 이방인처럼 떠돌아야 하는 고향. 너무나 취약하고 동시에 너무나 강력한 것. 『치유의 빛』은 몸에 관한 모든 이야기다.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 살아남는 기억에 관한 이야기다. 저 깊은 수심 아래에, 그것들이 고여있다.
* AI 학습 데이터 활용 금지

한소범(한국일보 기자)
1991년 광주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국문학과 영상학을 전공했다. 발표된 적 없는 소설과 상영되지 않은 영화를 쓰고 만들었다. 2016년부터 한국일보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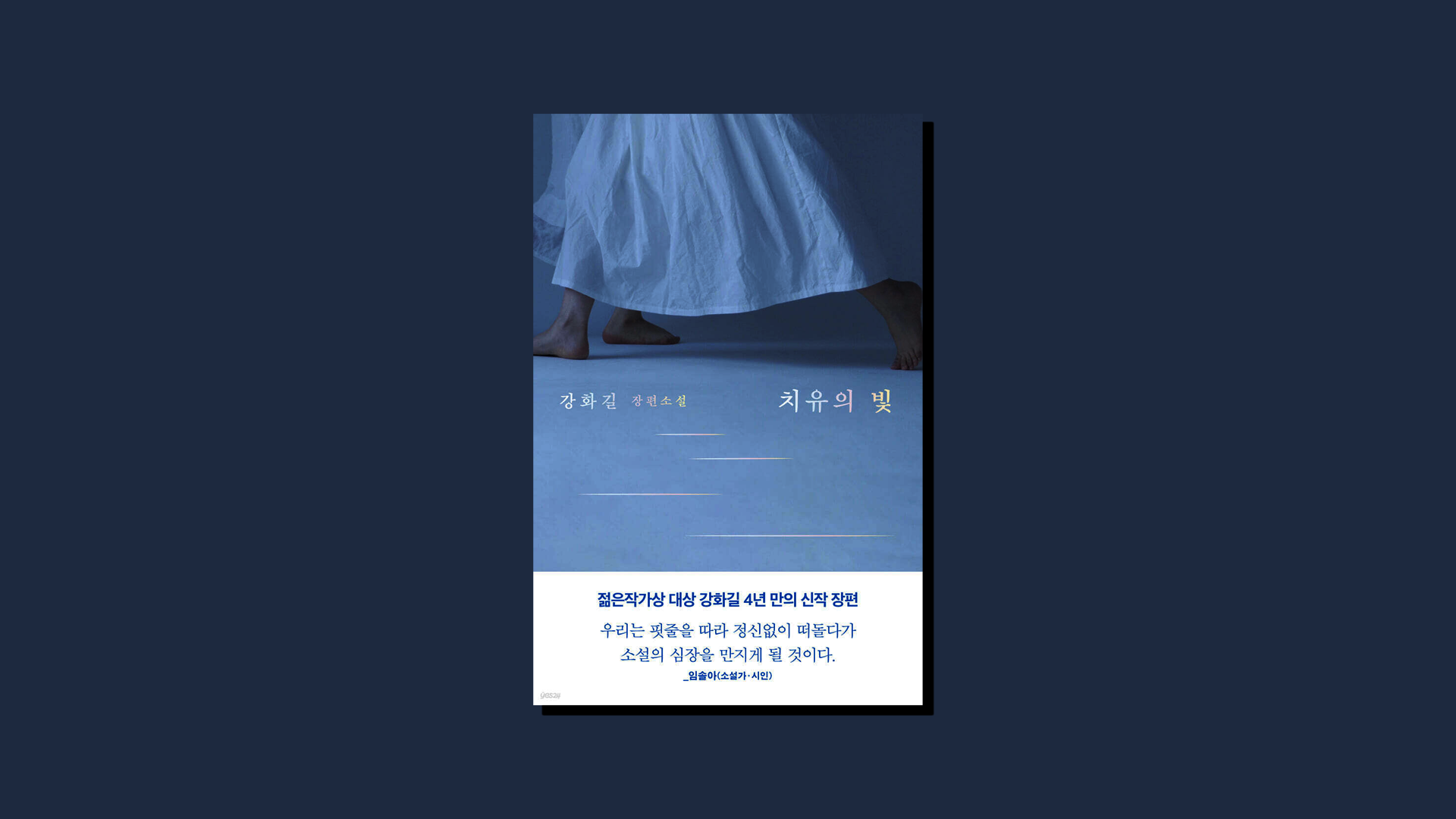
![[큐레이션] 꿈꾸고 싶고, 더 나아가 보고 싶은 이야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1/20251103-2cd19e89.jpg)
![[김승일의 시 수업] 시 창작의 방어술](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09-9a04de6c.png)
![[구구X리타] 영원이라는 불가능에 도달하기 – 내가 글을 쓰는 이유](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08-27b9652d.jpg)
![[에디터의 장바구니] 『계속 읽기』, 『김혜순 죽음 트릴로지』 외](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07-e6d95ade.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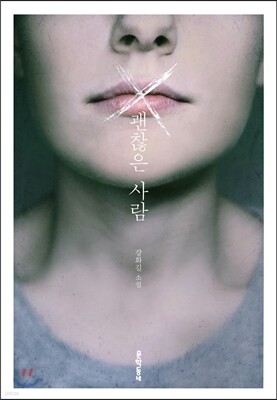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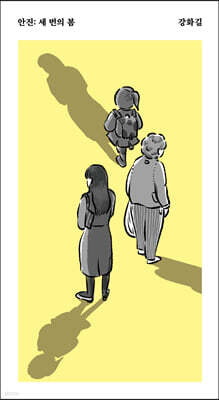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