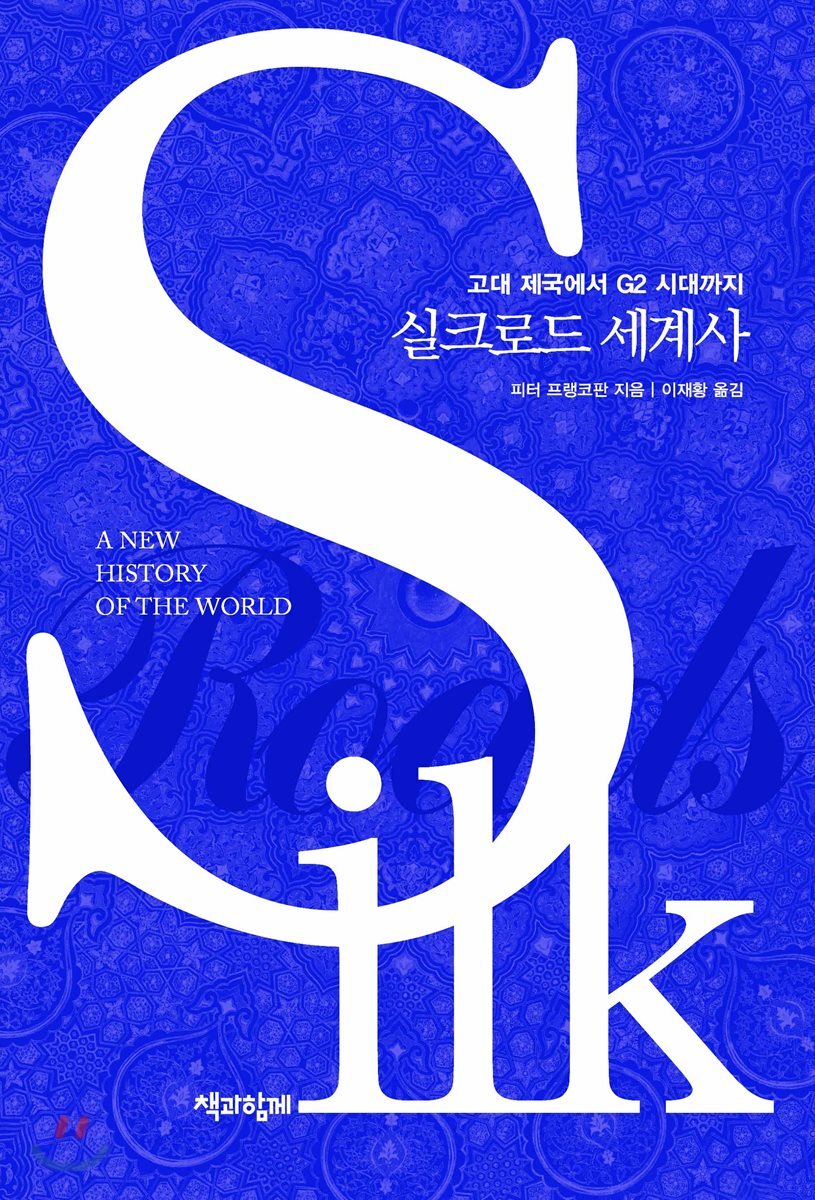 |
 |
세계사 책이니 당연하겠지만, 이 책 원서에는 ‘지중해’를 가리키는 ‘Mediterranean’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본래는 형용사여서 ‘Mediterranean Sea’가 되어야 지중해이지만, Sea를 생략하고 앞에 정관사를 붙여 명사화한 ‘the Mediterranean’도 지중해다. 이 말은 라틴어medius(가운데)와 terra(땅)를 합친 형태다. ‘가운데 땅’ 또는 ‘땅의 한가운데’라는 뜻이므로, 동양의 중국中國과 같은 개념이다. 그런데 옛 서양세계에서는 자기네가 인식하는 땅(세계)의 한가운데에 바다가 자리 잡고 있어 그 바다인 지중해에 이 이름을 붙인 것이다.
하지만 이 책 원서의 앞머리와 끄트머리에 나오는 일부 ‘Mediterranean’은 용법이 조금 다르다. 지중해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가운데 땅’을 가리킨다. 어디일까? 따로 떨어진 아메리카 대륙을 제외하고 아프로유라시아 대륙으로 시야를 한정해보자. 지중해 동안에서 히말라야 산맥에 이르는,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일대가 이 책에서 말하는 ‘가운데 땅’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유럽도 변방이고, 중국도 변방이고,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도 변방이다. 이 책은 그 ‘가운데 땅’ 지역을 중심에 놓고 세계의 역사를 살펴본다. 그 지역을 저자는 ‘세계의 중심’ 또는 ‘아시아의 등뼈’로 표현한다.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 지역이 낙후된 곳이라는 생각이 박혀 있다.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이 지역이 어떻게 세계사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사실 이 지역은 먼 옛날부터 동방과 서방이 활발하게 교류하던 곳이었다.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경제활동이 활발하다는 의미이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 강력한 정치체가 들어서고 문화가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 페르시아의 역대 왕조나 이슬람 왕조, 투르크계 왕조 등 강력한 제국들이 명멸했다. 몽골제국 역시 동쪽에서 출발하기는 했지만 이 지역을 아우르며 대제국의 바탕을 마련했다.
이 지역 중심의 세계사를 낯설어하는 것은, 저자도 서두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아온 탓이다. 우리가 배운 세계사는 그리스-로마를 시작으로 하는 서양 고전 문명과 그 이후의 서양 중세 기독교 세계, 그리고 대탐험 시대 이후 서양 열강의 식민지 개척으로 이어진다. 서유럽 문명이 줄곧 세계사의 주역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허구가 섞여 있다. 우선, 저자의 말마따나 서유럽은 그리스-로마의 상속자가 아니다. 후대에 사칭했을 뿐이다. 졸부가 신분 세탁을 한 셈이고, 우리 개념으로 하자면 족보를 위조한 것이다. 지금 서유럽이라 하면 이탈리아를 포함해서 생각하지만, 그 주력은 지중해권과는 별개의 문화권인 북서 유럽이다. 그리고 16세기가 되기 전에는 이들이 세계사를 주도한 적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었다. 대략 5세기 서로마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로마의 변방이었고, 7세기 이슬람 세력의 대두 이후에는 중앙에 버티고 선 이 세력을 상대하기가 버거웠다.
그러다가 팔자가 피기 시작한 것은 콜럼버스로 대표되는 대탐험시대부터다.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금은보화와 자원과 노동력을 수탈하면서 졸부가 되었다. 맨 먼저 탐험을 주도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등 두 이베리아 반도 국가가 수탈과 교역을 통해 풍요를 누렸고, 이어 영국과 네덜란드가 식민지 개척과 교역에 뛰어들었다. 프랑스 역시 뒤를 따랐다. 이들의 제국주의는 해외는 물론 유럽 안에서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전쟁을 불러왔고, 결국 20세기 들어 두 차례의 거대한 패싸움으로 기력을 소진하고 말았다. 이후 세계는 서유럽 문명의 종가라 할 수 있는 영국의 후계자인 미국과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들고나온 소련의 양강이 각축을 벌이다가 소련이 붕괴하면서 외형상 미국의 독주 체제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저자는 이 시점에서 ‘가운데 땅’의 재부상을 이야기한다. 근거는 석유를 비롯한 자원이다. 페르시아만 일대의 국가들은 이미 1970년대에 석유의 위력을 보여준 바 있지만, 석유 외에도 천연가스와 여러 가지 광물자원이 많고 그런 자원 부국이 페르시아만 일대를 넘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로까지 확대되었다. 자원 개발로 생겨나는 부는 자연히 정치적 발언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저자는 러시아,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상하이협력기구가 유럽연합의 대안이 될 가능성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현실은 아직 ‘가운데 땅’이 다시 세계사의 중심이 되리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암담하다. 이 지역의 주요 국가인 이란과 이라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세력에게 봉쇄와 침공이라는 형태의 학대를 당했던 휴유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은 소련과 미국에 잇달아 유린당했다. 통치자의 문제가 빌미를 준 경우도 있지만 강대국의 이익 추구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는 평가들이 있다. 이런 식의 수난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소련에서 갈라져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역사가 일천한 데다, 국부의 증대에 걸맞은 정치적 성숙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등 아직 졸부 티를 벗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지금 세계에 큰 문제를 던지고 있는 IS까지 생각하면 이 지역이 주도하는 세계사라는 것이 아직 요원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때 이 지역에 만들어졌던 교역로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저자의 말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는 듯하며, 오늘날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팁이 될 것이다.
이 지역을 중심에 놓고 세계사를 조망한 이 책은 말하자면 대안 세계사다. ‘새로운 세계사’라는 부제가 이를 압축해 보여준다. ‘실크로드’라는 제목은 이 책이 교류를 중심으로 한 세계사임을 암시한다. 실크로드는 그런 교류의 통로를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것이지, 둔황을 거쳐 동로마에 이르는 육상의 특정 교통로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따라서 서유럽 중심의 세계사를 비판하면서도 서유럽이 교류의 주역으로 등장한 15세기 이후에는 서유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그리고 이 시점이 되면 대서양 횡단로와 모든 바닷길이 중심 실크로드가 된다. 상당히 두꺼운 책이면서도 세계사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인 중국 등 동아시아에 대한 서술이 생각보다 적은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러고 보니 이 책에서는 진짜 ‘가운데 땅’에 밀려 지중해도, 중국도 모두 변방이 되어버렸다.
첨언 한 가지. 앞서 말한 대로 ‘실크로드’라는 말이 ‘육상의 특정 교통로’를 가리킨다는 선입견에 휘둘린다면 이 책이 고대와 중세에 치우쳐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이 두꺼운 책의 절반 가까이는 영국, 독일, 러시아(소련),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놓고 각축을 벌인 근현대사를 다루고 있어, 현대 세계의 모습이 형성된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무지막지한 이미지의 몽골제국이 영리한 통치술과 경제 정책으로 대제국을 완성하고 번영을 누렸다는 등 세계사의 상식을 뒤엎는 이야기들도 풍부하게 담고 있다.

이재황(번역가)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출판사 제공
출판사에서 제공한 자료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채널예스>에만 보내주시는 자료를 토대로 합니다.










![[리뷰] 웹소설의 유행은 패션입니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5/20250515-47aa41f3.png)

![[여성의 날] 여성이 여성에게 메아리로 전달하는 책](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3/20250305-9919a514.png)
![[여성의 날] 미친 말(crazy horse)과 미친 말(crazy talk)](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3/20250304-76bff588.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