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왜 비싼 와인만 마시죠?
잘 차려 입고 잘 갖춰 즐기는 것이 나쁜 건 아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과잉을 은근히 또는 노골적으로 강요하는 한국의 취미 문화에 반기를 든다. 와인잔이 없으면 어떤가. 그냥 맥주잔에 담아 마시는 것도 운치 있고 풍류가 있다. 와인 맛이 변하는 것도 아니잖은가. 무엇보다 넘치는 과잉에서 해방된 우리 마음이 더 즐겁게 와인을 마시게 해줄 테니.
2012.12.11

‘우리는 정말 와인을 즐기고 있는 걸까.’
대답은 별로 그렇지 않다는 쪽이었다. 와인은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호기심을 갖고 마셔보고 즐기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마치 와인은 알고 마시지 않으면 뭔가 뒤처진다는 강박관념이 사람들에게 미치기 시작했다. 요가와 퀼트를 배우듯, 와인도 교양의 일부로 기능하게 됐다. 우아하게 와인잔을 들고 와인에 관한 몇 가지 지식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담을 가지게 됐다. 내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이 어디 수십 명뿐이었을까.
나는 이런 잘못된 와인 문화에 일말의 책임을 느꼈다. 와인을 파는 데만 신경을 썼지, 즐겁게 마시는 법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다. 최근에는 사정이 많이 나아졌지만, 한국에서 와인은 여전히 ‘양주’ 대우를 받는다. 12년산은 명함도 못 내밀고 17년산은 되어야 선물할 수 있다는 양주 말이다. 양주는 한국의 비뚤어진 술 문화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낭비와 음성적인 접대, 외국 추종, 탈세, 과음 같은 골치 아픈 이미지들이 줄줄이 떠오른다. 와인도 자칫하면 그 대열로 갈 수 있다. 마트에 늘어선 대중적인 ‘착한’ 가격의 와인들이 활발히 팔리고 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오래된 빈티지의 고급 와인만이 행세하는 어두운 면모가 부각될 뻔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국은 고급 와인이 대세인 나라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과 바에서는 ‘시작가’가 6만 원이고, 그나마 마지못해 구색으로 갖추었을 뿐 10만 원짜리는 시켜야 하는 분위기다. 와인수입상의 리스트를 보면 정말 세계 최고급 와인은 다 들어있다. 이탈리아의 지인이 한국에 와서 한 레스토랑의 리스트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의 말인즉, “이런 와인들은 이탈리아나 프랑스 사람들도 평생 못 먹어보고 죽는 사람들이 7할은 넘을 것”이란다. 술에 쓴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허세를 절묘하게 꼬집어서 나는 한동안 아팠다.
보통 가격이 저렴한 와인을 우리는 ‘테이블와인’이라고 한다. 밥상에 올려두고 만만하게 한잔씩 마시는 술을 의미한다(물론 가격 불문하고 식사에 곁들여 마시는 와인을 통칭하기도 한다). 서양 와인의 대부분은 테이블 와인이다. 그냥 반주로 편하게 마시는 와인이다. 빈티지가 어떻고, 부케(와인이 숙성된 이후에 발생하는 향)가 어떻고 따지는 와인이 아니다. 이런 복잡한 와인 허세가 진짜 편하게 와인을 즐기는 사람들을 자꾸 불편하게 한다. 결국 와인을 와인답게 즐기는 사람들(양주 같은 독주 대신 가볍게 한두 잔 식사에 곁들이는)을 와인에서 멀어지게 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어떤 와인 예절이나 상식도 무시하라고, 당신 멋대로 즐기라고.
물론 와인 상식을 알게 되면 점점 와인의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재미가 있다. 어떤 학문이든 알면 알수록 흥미로워지듯이 말이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학문을 할 필요는 없듯, 와인을 마시는 이가 모두 상식을 풍부하게 알아야 한다는 억압은 떨쳐버려야 한다. 와인 종주국의 대중들도 대부분 와인 상식을 잘 모른다. 그냥 반주 삼아 한두 잔 마시는 걸 즐길 뿐이다.

한국은 마니아가 참 많다. 그러나 이것이 종종 과잉으로 흐른다. 가벼운 근교 산행에도 거의 히말라야 등반 수준으로 장비가 동원된다. 입고 있는 옷은 정장 한 벌 값을 웃도는 고급 수입 기능성 의류다. 동네 뒷산을 가는 이들도 일단 고가의 이런 장비와 의류를 사고 본다. 언젠가 설악산에 다녀왔다. 외국인에게도 유명한 산이라 꽤 많은 외국 등반객을 목격했다. 유심히 그들의 차림을 살펴봤다. 어느 누구도 전문 산악인 같은 복장은 하지 않았다. 트래킹 샌들 차림도 많았다(실제 설악산 비선대 코스는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그 정도의 신발로도 충분하다). 사계절용 수입 통가죽 등산화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풍경이었다.
잘 차려 입고 잘 갖춰 즐기는 것이 나쁜 건 아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과잉을 은근히 또는 노골적으로 강요하는 한국의 취미 문화에 반기를 든다. 와인잔이 없으면 어떤가. 그냥 맥주잔에 담아 마시는 것도 운치 있고 풍류가 있다. 와인 맛이 변하는 것도 아니잖은가. 무엇보다 넘치는 과잉에서 해방된 우리 마음이 더 즐겁게 와인을 마시게 해줄 테니.
지금 와인이 마시고 싶다면 마트에 가시라. 가장 싼 와인을 사서 그냥 편하게 따라 마시라. 오징어를 씹든, 과자를 곁들이든 그것은 당신의 자유다. 와인으로부터 해방, 그것은 당신에게 달렸다. 그리고 말하라.
“흥. 난 와인을 마실 뿐이라고.”


- 보통날의 와인 박찬일 저 | 나무수
와인을 술이라기보다 일종의 국물로 해석하는 서양 요리사 박찬일. 그가 한국인의 잘못된 와인 지식을 바로잡아 올바른 와인 상식을 알려주고 일상 속 ‘보통날에 와인 마시는 즐거움’을 전한다. 와인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와인에 대한 불편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와인을 마시는 법을 알려주는 이 책은 2007년 출간된 『와인 스캔들』의 완전개정판이다. 5년 동안 달라진 와인 정보와 더불어 작가의 장점인 요리와 와인 분야를 강화했다.
| |||||||||||||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16개의 댓글
추천 기사
추천 상품
필자

박찬일
기자로 일하던 중 이탈리아 영화에 매혹되어 3년간 이탈리아에서 와인과 요리를 공부했다. 시칠리아에서 요리사로 일하다 귀국해 셰프 생활을 시작했다. 요리에 어울리는 와인을 제대로 권할 줄 아는 국내 몇 안 되는 요리사다. 트렌드세터들이 모이는 청담동, 신사동 가로수길, 홍대 등의 레스토랑에서 이탈리아 음식 본연의 맛을 요리했다. 시칠리아 유학 당시 요리 스승이었던 주세페 바로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는 재료를 가지고, 가장 전통적인 조리법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요리를 만든다”는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산다. ‘동해안 피문어와 홍천 찰옥수수찜을 곁들인 라비올리’, ‘제주도 흑돼지 삼겹살과 청양고추’, ‘봄 담양 죽순찜 파스타’와 같은 우리 식재료의 원산지를 밝히는 명명법은 강남 일대 셰프들에게 하나의 유행처럼 번졌다.
지은 책으로는 『보통날의 와인』,『보통날의 파스타』,『박찬일의 와인 셀렉션》, 『지중해 태양의 요리사』,『어쨌든, 잇태리』,『추억의 절반은 맛이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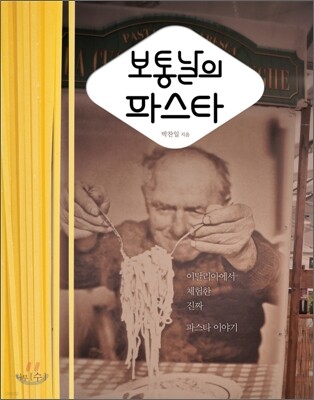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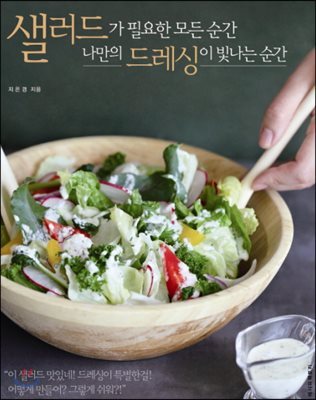

![[서점 직원의 월말정산] 7월의 즐길거리를 소개합니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31-ea87383d.jpg)
![[취미 발견 프로젝트] 여행을 떠나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02-9133ca15.jpg)

![[취미 발견 프로젝트] 독서하고 싶은 공간 만들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2/20250226-346177ac.png)
![[Read with me] 더보이즈 주연 “성장하고 싶을 때 책을 읽어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2/20241219-0fe5295b.jpg)







가비
2013.02.28
와인은 아직도 우리나라 이미지에는 비싼, 고급스런, 좋은 곳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집에서 가족들과 마시니 뭔가 분위기를 한껏 더 살려주어 좋았다는.. ^^
yiheaeun
2013.02.15
나랑
2013.01.02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