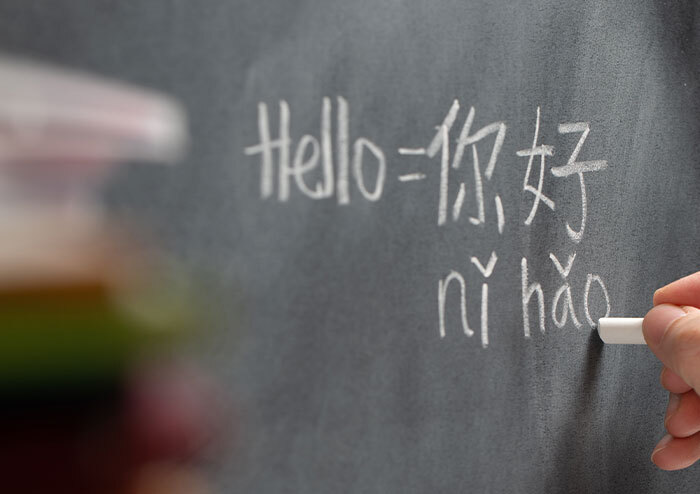
몇 달 전 드라마투르그이자 희곡 번역가인 타이완 지인이 내게 소설 번역 작업과 비교했을 때 희곡 번역 작업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특히 화어권 희곡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는 뭐가 있냐고. 당시 나는 ‘출간되는’ 희곡 번역본의 윤문 작업만 해봤을 뿐 상연을 목적으로 한 희곡을 번역해 본 적이 없었기에 그 궁금증을 풀어줄 수 없었다.
대신 나는 소설을 번역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었다. 당시 나는 한중 SF 여성 작가 앤솔러지인 『다시, 몸으로』의 번역고를 퇴고하고 있었고, 전에는 겪어본 적이 없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소설 번역과 희곡 번역은 전혀 다른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아예 상관이 없는 건 아니었다. 『다시, 몸으로』의 경우 출간과 동시에 오디오북 런칭이 확정되어 있었으니까. 이 글이 문자가 아닌 성우의 목소리로만 전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번역해야 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 골머리를 앓을 정도는 아니지 않냐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게는 너무나 큰 문제였다.
오디오북에는 주석을 달 수 없기 때문이었다.
참고로 다음은 올해 번역 출간되었던 『다시, 몸으로』와 『여신 뷔페』 속 본문과 관련 주석 중 일부를 가져온 것이다.
‘맛있는 사과’는 ‘뱀 과일(蛇果)’이라는 어휘로 음역되었고 나중에는 아예 특정한 품종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
[주석] 레드 딜리셔스 애플이 미국에서 중국 광둥성으로 처음 수출되었을 때, 포장지에 적힌 “Delicious Apple”을 보고 사람들이 ‘디리셔 과일(地喱蛇果)’이라고 불렀는데 후에는 뱀과일[蛇果]이라고 줄여서 부르게 되었다. 이에 ‘맛있는 사과’라는 뜻을 음역한 ‘뱀과일’은 ‘레드 딜리셔스 애플’을 의미하게 되었다. (『다시, 몸으로』 중 「내일의 환영, 어제의 휘광」에서)
내용으로 짐작건데 10시 방향이 본부인이었고 8시 방향이 불륜녀였다. 그런데 나는 본부인과 불륜녀 사이에 존재할 또 다른 당사자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 남자의 목소리든 여자의 목소리든. *
[주석] 2019년 5월 17일 타이완 입법원(국회)이 행정원에서 제출한 동성혼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타이완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혼을 법제화한 나라가 되었다. (『여신 뷔페』 중 「항아는 응당 후회하리라」에서)
강가 모래섬에서
[주석] 이 작품의 원제 ‘재하지주(在河之洲)’는 『시경』 「주남(周南)」편에 수록된 시 「관저(關雎)」의 “끼룩끼룩 우는 물수리, 강가 모래섬에 지어있네. 아름답고 현숙한 여성은 군자의 좋은 짝이로다.(關關雎鳩, 在河之洲, 窈窕淑女, 君子好逑)”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여신 뷔페』 중 「강가 모래섬에서」에서)
주석 없이 위의 맥락들을 독자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것도 고전 인용이나 역사 혹은 신화의 재해석이 잦은 화어권 문학을? 그러나 오디오북 제작은 확정된 일(이라고 쓰고 엎질러진 물이라고 읽는다)이었기에 의구심에 빠지기보다는 어떻게든 해내야 했고, 어찌어찌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면서 번역 작업을 마쳤다.
그리고 몇 달 뒤, 본격적으로 상연을 목적으로 한 희곡 번역 작업을 하게 되면서 나는 진짜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그날은 곧 낭독 공연으로 올려질 희곡 번역고를 다 함께 낭독으로 들어보는 날이었다. 눈으로 읽을 때는 별다른 이질감을 느끼지 못했던 대사들이 막상 귀로 들으니까 무언가 이상했다. 또 이날은 특별 게스트로 이번 낭독 공연의 연출을 맡은 연출가가 함께했는데, 낭독이 끝난 뒤 이런저런 질문을 했었다. 특히 인물의 대사나 행동에 대한 의문이 많았는데, 이러한 의문점은 사실 중국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이해와 맞닿아 있었다.
이때 나는 무슨 생각을 했더라. 이게 만약 소설이었다면 주석을 달아서 배경 설명을 해줬을 텐데, 종이 위에 문자로 인쇄되는 형식이었다면…….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의미가 없었다. 어차피 객석에 앉은 관객은 주석을 볼 수 없으니까.
아, 그 전에 이 낭독 공연을 잠시 소개하고 싶다. 전공 선생님들의 부름으로 작년부터 한중연극교류협회에서 일을 돕고 있는데, 한중연극교류협회에서 가장 중점적인 행사가 ‘중국 희곡 낭독 공연’이다. 당대 중국 희곡 중 좋은 작품을 선별해 번역하고,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에서 낭독 공연으로 올리고 있는데, 2025년을 기준으로 벌써 제8회가 되었다. (올해는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광인일기』와 『현실동화』 그리고 『날개 달린 두약』을 상연했다.)
몇 주 뒤, 전체 연습이 있는 날에 맞춰서 연습 장소를 찾았다. 같은 협회에 속한 번역가 선생님이 연습할 때 가면 배우들의 질문 폭탄을 받게 된 거라고 언질을 주셨는데, 다행히 별다른 질문을 받지 않았다. 내가 먼저 선수를 쳐서(?!) 1시간 넘게 설명했기 때문이었다. (이 작품이 소설이었다면 내가 달았을 법한 주석들을, 혹은 메모로 달아서 편집자에게 설명해 줬을 내용들을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하나 다 이야기했다.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실 투머치토커다.)
그리고 나의 일방적이었던 대화가 끝나고 배우들의 진짜 연습이 시작되었을 때, 나는 소설 번역과 희곡 번역의 가장 큰 차이를 깨닫게 되었다. 배우들의 목소리로 살아난 그 문장은, 내가 옮긴 문장이 맞지만 더는 내가 옮긴 문장이 아니었다. 그건 그냥 말이었다. 사람이 하는 말이자 극중 인물의 말이었고 가끔은 (연출적인 이유로 인해) 배우의 말이기도 했다. 또 무대 언어이기도 했다. 아무튼 내가 옮겼던 글에서 무언가가 더해졌거나 조금 변했거나 혹은 아예 무관해진 무언가였다.
내가 우리말로 옮긴(혹은 내가 쓴) 글을 종이에 담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전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날, 나의 깨달음이었다.
소설 번역이 저 문자를 이 문자(우리말)로 이어서 독자에게 전해주는 거라면, 희곡 번역은 저 문자를 이 문자로 이어서 저 사람과 이 사람이 이어지게 만드는 거였다. 여기서 저 사람과 이 사람은 배우일 수도 있고, 극 중 캐릭터일 수도 있지만, 절대 관객은 아니었다. 나는 관객에게 바로 닿을 수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묘하게 부담감이 줄어들었다. 나의 별것 아님에 안도하게 되었달까.
생각해 보면 연극에는 주석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게 많지 않은가. 배우가 있고, 무대가 있고, 의상이 있고, 사운드가 있고, 조명이 있다. 희곡을 문자 너머의 무언가로 만들어주는 수많은 이들이. 다음번에 지인이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희곡 번역의 어려움 대신 희곡 번역의 좋은 점을 말해줘야지. 여기는 오역이나 오탈자가 있어도 많은 이들이 함께 고쳐주는 곳이라고 말이다.
함께 읽기
『다시, 몸으로』
김초엽, 김청귤, 천선란, 저우원, 청징보, 왕칸위 저/김이삭 역 | 래빗홀
한중 SF 여성 작가 6인이 그려낸 몸이라는 소우주와 세계라는 대우주.
『여신 뷔페』
류즈위 저/김이삭 역 | 민음사
타이완 페미니스트 작가의 역사, 신화, 고전 문학 속 여혐 비틀기.
『날개 달린 두약』
구레이 저/김우석 역 | 연극과인간
그 시절 우리 어머니들의 리즈 시절은 이랬다.
『현실동화』
양샤오쉐 저/김이삭, 김우석 역 | 연극과인
죽음이라는 결말로 다시 쓴 현실 동화.
『광인일기』
루쉰 원저/좡자윈 편/장희재 역 | 연극과인
봉건 예교를 식인의 예교로 비판한 루쉰의 소설을 각색.
* AI 학습 데이터 활용 금지

김이삭
평범한 시민이자 소설가 그리고 번역가. 중화권 장르 소설과 웹소설, 희곡을 번역했으며 한중 작가 대담, 중국희곡 낭독 공연, 한국-타이완 연극 교류 등 국제 문화 교류에 힘쓰고 있다. 저서로는 『한성부, 달 밝은 밤에』, 『감찰무녀전』, 『천지신명은 여자의 말을 듣지 않지』 등이, 역서로는 『여신 뷔페』, 『다시, 몸으로』 등이 있다. 홍콩 영화와 중국 드라마, 타이완 가수를 덕질하다 덕업일치를 위해 대학에 진학했으며 서강대에서 중국문화와 신문방송을, 동 대학원에서는 중국희곡을 전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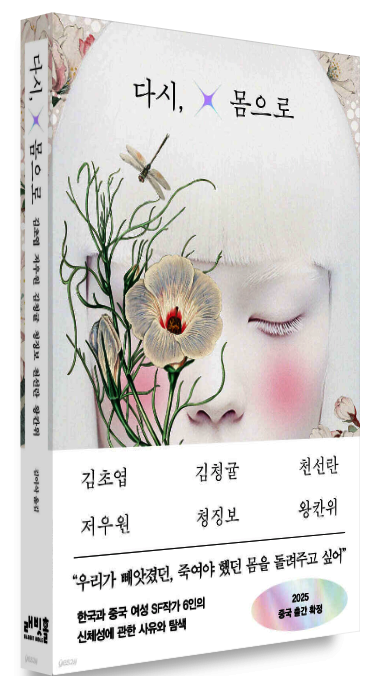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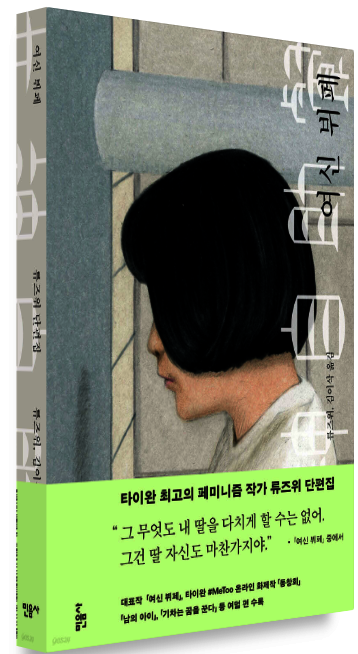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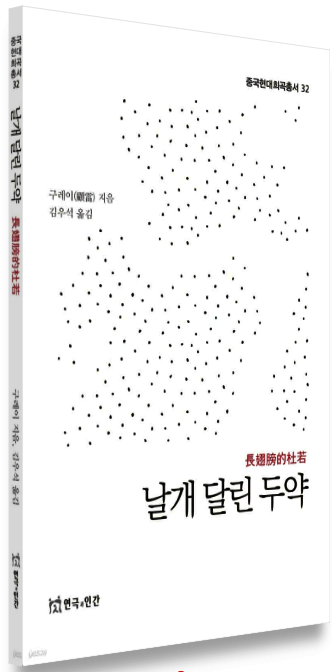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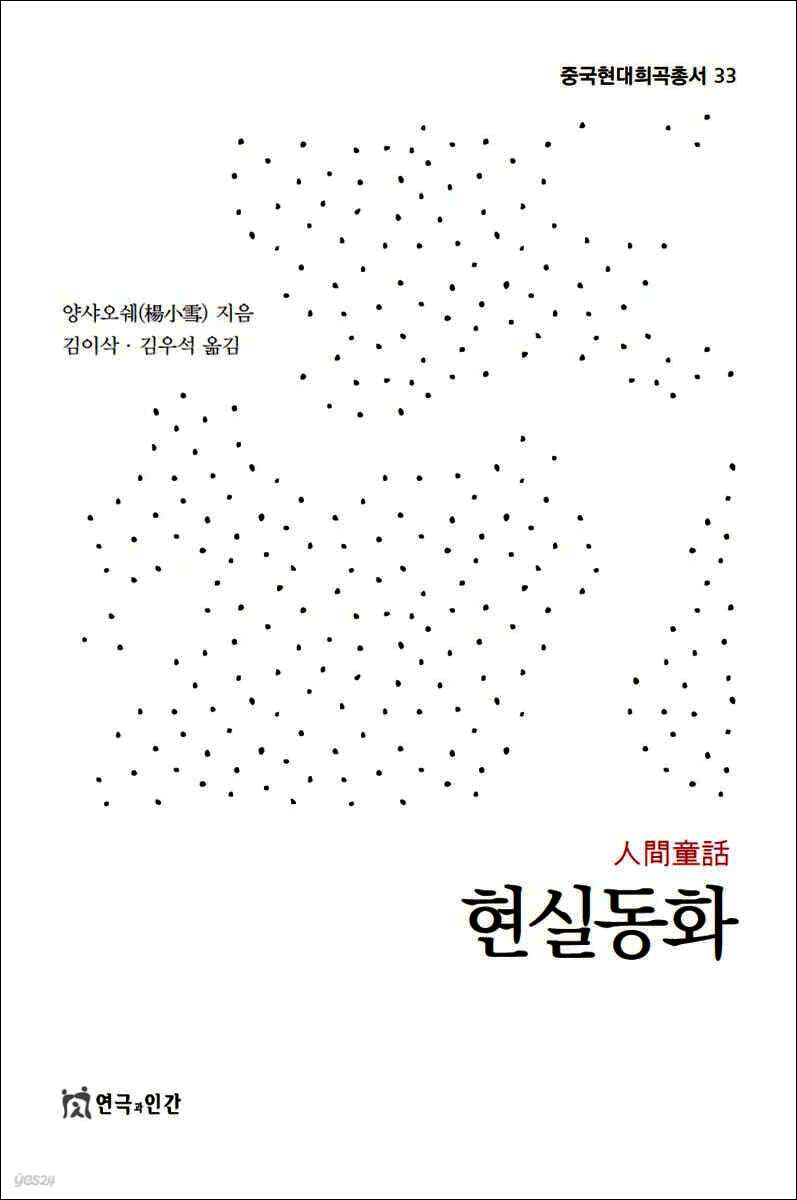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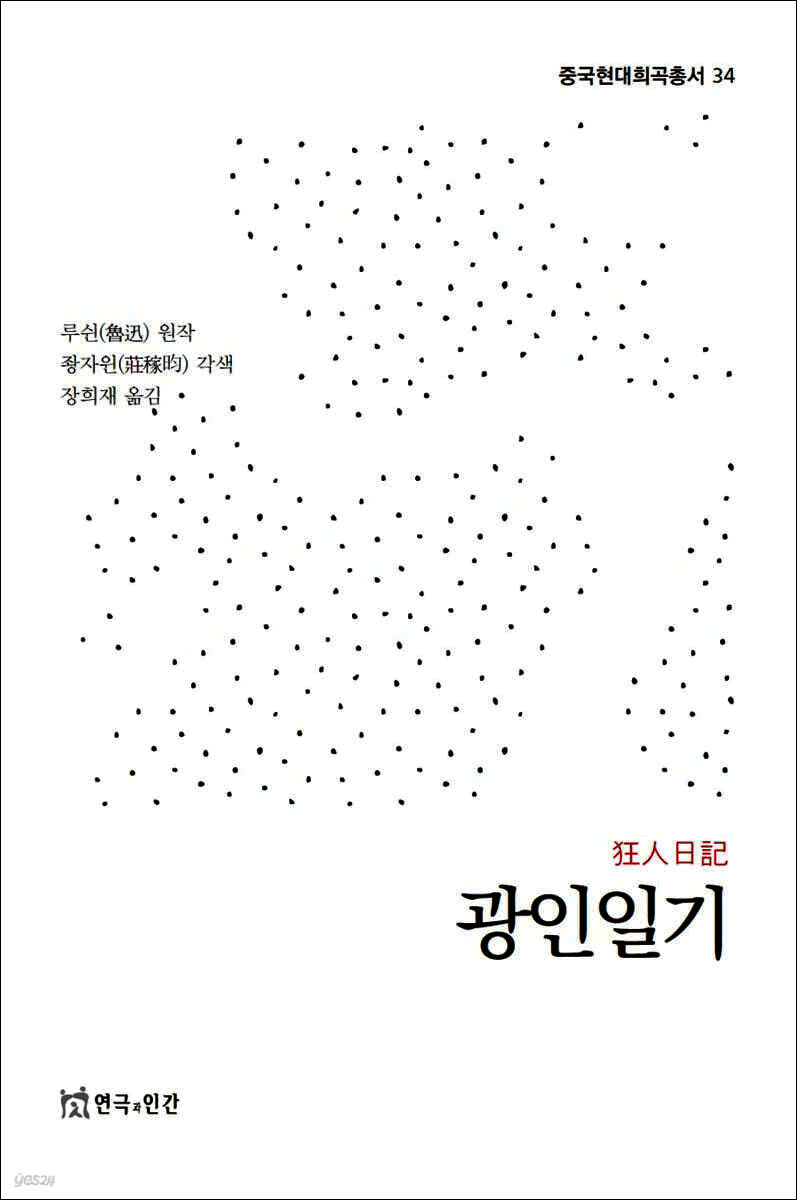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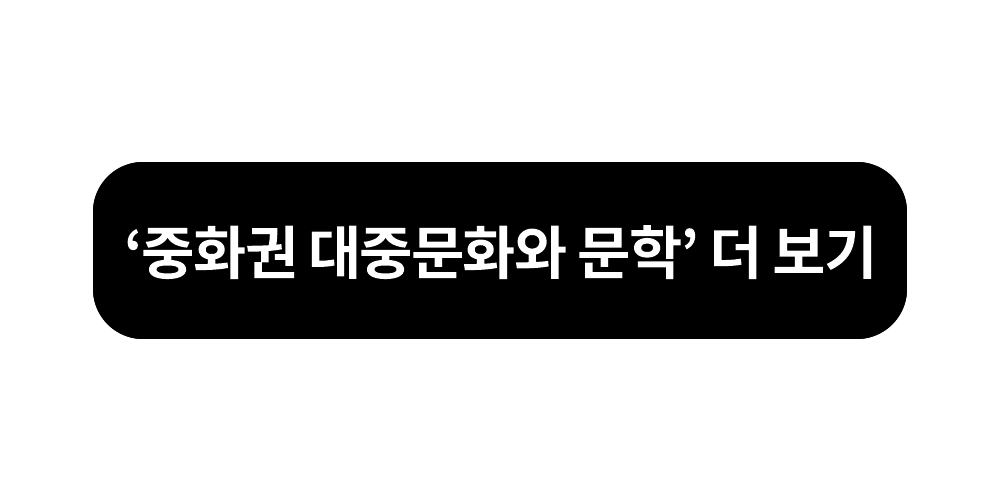

![[김해인의 만화절경] T만화 VS F만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08-36672f83.jpg)
![[인터뷰] 김초엽 “인간의 쓸모 없음이 인간의 고유성 아닐까”](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04-5ad1a15b.jpg)
![[리뷰] 희곡을 읽는 일](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03-3045c35e.jpg)
![[작지만 선명한] 희망을 그리는 가망서사의 책](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02-bf07a0ce.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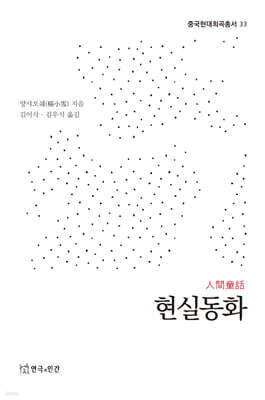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