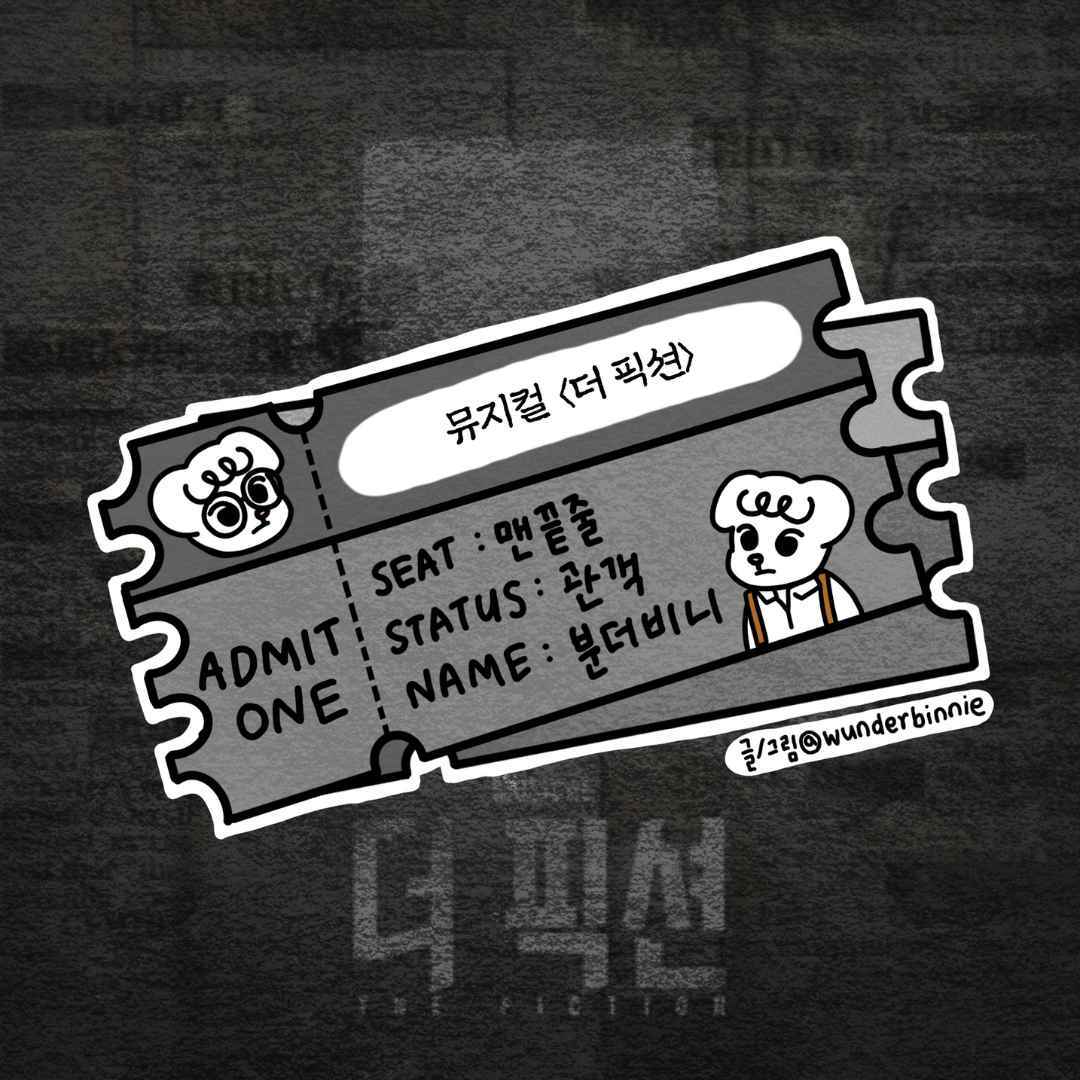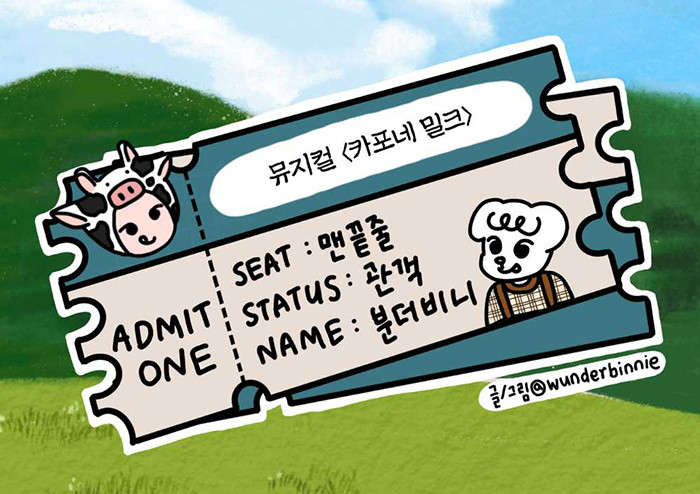제철에 진심인 사람이 보내는 숙제 알림장.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제철에 있습니다. 제철 행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나중에 말고 '지금 해야 하는 일'을 절기마다 소개합니다. |
 귀룽나무
귀룽나무
"이팝나무 꽃 좀 봐."
"조팝 아니야?"
"키가 크면 이팝이야."
입하는 내게 '이팝'으로 온다. 해마다 도심의 가로수로 늘어선 이팝나무에 하얀 꽃이 피기 시작하고, 그 아래를 지나던 사람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면 '아, 입하구나' 한다. 새하얀 눈꽃 치즈를 수북이 뿌려둔 것 같은 이팝나무는 이맘때 어딜 가도 시선을 사로잡는다. "저 꽃 좀 봐" 하고 멈춰서는 순간에 우리 삶은 조금 느리게 흐른다. 한 사람의 삶에서 그렇게 말한 순간들만 모아 편집해둔다면 그건 얼마나 아름다운 영상이 될까.
여름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절기 입하(立夏). 5월 초순을 여름의 문턱이라 부르기엔 이르지 않나 싶다가도 며칠 새 확연히 달라진 신록 앞에선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입하는 '맏이 맹' 혹은 '처음 초' 자를 써서 초여름이란 뜻의 맹하(孟夏), 초하(初夏)라고도 부른다. 초여름은 내가 가장 편애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매년 입하가 되면 오늘부터 초여름이라 불러도 된다고 허락을 받는 기분이다. '보리가 익을 무렵의 서늘한 날씨'라는 뜻의 맥량(麥凉) 혹은 맥추(麥秋)라 불리는 것도 반갑다. '아, 보리가 익는 계절이니 보리로 만든 맥주를 마시라는 뜻이군(아님)' 여기며 선조들의 뜻에 따르기 위해 야외에서 맥주 마실 자리를 찾아 헤맨다.
하지만 내게 입하가 한마디로 어떤 계절인지 묻는다면, 하얀 꽃의 계절이라 답하겠다. 이 무렵엔 하얀색 꽃들이 지천에서 피어난다. '입하얀꽃'이라 부르고 싶을 정도다. 짙은 초록 숲에서 이파리와 구분되게끔 밝은 하얀색 꽃을 피우고, 진한 향기로 꿀벌을 불러들이는 것은 나무의 오랜 지혜다. 인간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얀 꽃'이라 뭉뚱그리는 대신 그 아름다움을 향해 고개를 들고 일일이 이름을 불러주는 일.
 조팝나무
조팝나무
개천이나 공원에서 덤불을 이루며 좁쌀을 튀겨놓은 듯 작은 꽃을 피우는 건 조팝나무, 가로수로 쓰일 만큼 키가 큰 데다 길쭉한 모양의 꽃을 피우는 건 이팝나무다. 길 가다 향기가 너무 좋아 멈춰 섰는데 흰 꽃이 피어 있을 땐 높은 확률로 쥐똥나무나 때죽나무다. 향기와 달리 이름이 촌스러워 억울한 나무라는 설명에는 웃음이 새기도 한다. 둘 다 꽃이 아닌 열매가 쥐똥 혹은 반질한 머리의 스님들이 떼로 모여 있는 모습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 향기로는 찔레꽃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니 5월의 개천을 걷다보면 산책 나온 개만큼이나 자주 킁킁거릴 수밖에. 멀리서 보았을 때 하얀 꽃이 1층, 2층, 3층으로 나뉘어 핀 것 같다면 층층나무. 알아보는 순간 이름이 단박에 이해되는 모양새다. 층층나무과에 속하며 하얀 바람개비 같은 꽃을 피우는 건 산딸나무인데, 반전을 품고 있기도 하다. 누가 봐도 꽃잎이라 여길 하얀 부분이 실은 꽃이 아니기 때문이다.(제발 한 번씩 검색해서 봐달라는 이야기를 길게 썼다)
5월의 첫 날, 남편 강과 나는 캘린더 앱의 엇비슷한 날짜에 각자 '아카시아 소풍'이라고 써둔 것을 발견했다. 이게 뭐지? 하다가 둘 다 동시에 아아! 했다. 작년 이맘때 이사 오고 나서 뒷산에 올랐다가 한번은 처음 가보는 코스로 내려온 적 있다. 좁은 산길이 끝나고 마을길이 시작될 무렵, 비탈길 양 옆으로 호위하듯 늘어선 아까시나무를 보았다. 수령이 짐작 안 되는 높다란 나무는 우리를 배웅하듯 서서 꽃잎을 떨구고 있었다. 바닥에는 먼저 떨어진 꽃잎이 수북이 쌓여 말라가고 있었다. 자연스레 아까시 꽃이 만발한 비탈길을 상상하게 됐다. 재채기가 날 만큼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내년에는 꽃이 한창일 때 꼭 와보자, 하면서 저장해두었던 날짜. 동네에서 그런 장소를 몇 군데 안다. 입하 무렵이 제철인 장소들. 산 어귀에 있는 가구 공방 겸 카페에도 이맘때 아까시 꽃이 핀다. 그곳엔 오히려 꽃이 질 무렵에 가야 좋다. 테라스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거나 책을 읽다 보면 바람이 불적마다 꽃잎이 꿈결처럼 날리는 곳이니까. 동네 개천으로는 밤 산책을 나서야 할 때다. 어둠 속에서 더욱 짙게 퍼지는 꽃향기를 맡으며 걷다 보면 마음이 자꾸 달처럼 차오른다. 누구라도 불러내 같이 걷고 싶은 날씨.
 층층나무'5월에 피는 하얀 꽃'이라고 검색해보면 일찍이 꽃 사랑꾼들이 정리해둔 정보들이 차례로 뜬다. 그것을 다시 읽어보는 것도 이 무렵의 일이다. 작년의 나는 분명 알았는데 올해의 나는 다시 헷갈려 하는 이름들. 사진과 이름을 대조해가며 맞아! 하고 반가워하거나 틀린 답을 아쉬워한다. 그렇게 즐거운 오답노트를 만드는 것도 입하의 일.
층층나무'5월에 피는 하얀 꽃'이라고 검색해보면 일찍이 꽃 사랑꾼들이 정리해둔 정보들이 차례로 뜬다. 그것을 다시 읽어보는 것도 이 무렵의 일이다. 작년의 나는 분명 알았는데 올해의 나는 다시 헷갈려 하는 이름들. 사진과 이름을 대조해가며 맞아! 하고 반가워하거나 틀린 답을 아쉬워한다. 그렇게 즐거운 오답노트를 만드는 것도 입하의 일.
물론 하얀 꽃의 이름을 알게 된다고 해서 특별한 일이 생기지는 않는다. 그냥 어떤 꽃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될 뿐. 대신 마음의 한구석이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아주 조금 아름다워진다. 책갈피 사이에 넣어 잘 말린 꽃잎처럼. 평소엔 있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우연히 그 책을 펼쳐야만 '아 내가 이런 걸 끼워두었지' 겨우 발견하게 되는 꽃잎처럼. 그게 무슨 역할을 할까? 시간을 두고 지켜볼 일이다.
다만 자주 마주치는 하얀 꽃의 이름을 몇 개 익혀둔다면 초여름의 산책을 하다가 "와, 이 꽃은 뭐지" 궁금해하는 친구 곁에서 "찔레꽃이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지. 입하에는 그런 사람과 걷고 싶다. 절기가 뭐 어쨌다고, 하는 대신 하얀 꽃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오래 걸을 수 있는 사람과.
입하 무렵의 제철 숙제 '5월에 피는 하얀 꽃'을 검색해보거나 주변에서 만난 하얀 꽃의 사진을 찍어 이미지 검색을 통해 이름을 익혀보세요. 그 중 나를 가장 사로잡은 나만의 '입하 꽃'을 고르고, 그 꽃을 보러 가기에 좋은 장소도 알아둡니다. 이제 매년 입하엔 'OO 소풍'을 떠날 수 있도록요. |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김신지
기억하기 위해 기록하는 사람. 일상에 밑줄을 긋는 마음으로 자주 사진을 찍고 무언가를 적는다. 일상을 사랑하기 위해, 일을 더 잘하기 위해 기록을 다양하게 활용한다. 최선을 덜 하는 삶을 고민하는 사람. 이 정도면 됐지, 그럴 수 있어. 나에게도 남에게도 그런 말을 해 주려 노력한다. 너무 사소해서 지나치기 쉬운 것들을 좋아하는 게 취미다. 오늘을 잘 기억하면, 내일을 기대하고 싶어진다. 그런 마음으로 순간을 모은다. 언젠가 바닷가 근처 작은 숙소의 주인이 되는 게 꿈.






![[김신지의 제철 숙제] 봄이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 YES24 채널예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3/e/3/8/3e3821dfc46f6b0262c1cc68c42c02d5.jpg)
![[전종환의 제주에서 우리는] 영문법의 세계로 범민을 초대하다 | YES24 채널예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8/c/6/5/8c65ae92818dda75ca1acd04e819839b.jpg)
![[정대건의 집돌이 소설가의 나폴리 체류기] 등가 교환의 법칙 | YES24 채널예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3/8/f/b/38fb1d099c0d774a4bec12ebed253dd3.jpg)

![[서점 직원의 월말정산] 7월의 즐길거리를 소개합니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31-ea87383d.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