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로가 필요한 우리들의 이름, 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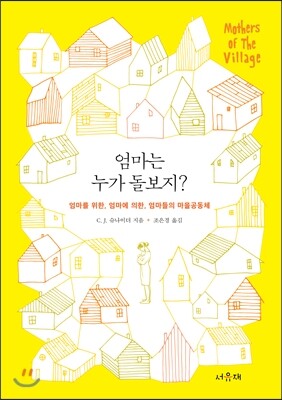 |
 |
한번은 아이 학교 엄마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다음 생 이야기가 나왔다. 남자, 나무, 풀, 바람, 미생물에 이어 다음 생 따위 생각조차 하기 싫다는 이도 있었다. 그중 압권은 아이가 셋인 엄마의 말이었다. “나는 울산바위로 태어나고 싶어. 한자리에 가만 앉아 발아래 눈 오고 비 오고 바람 부는 세상을 두고 시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 그래, 그래, 맞장구에 한바탕 박장대소가 잦아들고 난 후, 우리는 서로를 오래오래 연민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침묵했다.
결혼과 함께 대부분의 여자들이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엄청난 삶의 변화를 겪게 된다. ‘대부분’의 결혼한 여자들이 겪는 일이어서 외롭고 힘들어도 내색할 수조차 없다. 몸도 마음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난처하고 당혹스러운 시간을 온전히 홀로 지나가야 한다.
나도 그랬다. 가사와 육아에 비교적 적극적인 남편의 도움과 지지가 있었음에도 2년 터울의 오누이를 감당하기 힘들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일가친척은 모두 너무 멀리 있거나 먹고살기 바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내가 워킹맘으로 10년을 무사히 버틸(!) 수 있었던 건 단언컨대 ‘마을’ 덕분이었다. 둘째 아이가 아직 배 속에 있을 때 큰아이가 조금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인 걸 알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지금 살고 있는 성미산마을로 이사했고 공동육아어린이집을 거쳐 지금은 대안학교인 성미산학교에 두 아이를 보내고 있다.
얼마 전엔 종일 무슨 일인가에 시달린 끝에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로 퇴근해 집에 가던 중 큰아이와 같은 어린이집을 다녔던 아이의 엄마와 마주쳤다.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라고 묻는 그녀에게 나는 그저 웃어 보였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 저녁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막 집에 들어서던 남편이 조금 전 마주친 아이의 엄마에게 톡이 왔다고 말했다. “애들 데리고 저녁 먹으러 오래. 애들만 보내도 된대.” 그날 저녁 남편은 아이들을 데리고 그녀의 집에 가 저녁을 먹었고 나는 그녀가 내게 선물한 고요와 안식 속에서 쉴 수 있었다. 엄마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귀 기울여 주는 친구, 마음을 나누는 이웃이 있는 마을임을 나는 매일 온몸으로 느끼며 살고 있다.
그러니까 『엄마는 누가 돌보지?』는 마케팅 포인트니 타깃 독자니 손익분기니 출판사 이미지니 그럴싸한 가치나 명분, 전략 따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전히 내가 좋아서, 엄마인 내가 이 땅의 수많은 엄마들과 나누고 싶은 사심으로 펴낸 책이다.
저자인 슈나이더는 결혼 전 모험을 즐기며 자유롭고 역동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나 결혼 후 세 아이를 낳았고 육아에 지친 채,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우연한 기회로 공동체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육아에 있어 공동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게 된 저자는 전 세계의 엄마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한다. “아무도 엄마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고마워하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데 어떻게 엄마들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같은 대목에선 왈칵 눈물부터 나오고 “엄마로서 우리는 운명 공동체이다. 함께한다면 우리 엄마들이 겪는 어려움과 애통함을 좀 더 건강하고 나은 방식으로 헤쳐 나갈 수 있다” 같은 대목에선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마을’이라 하니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사실 모두 마을에 살고 있다. 이 책은 이미 마을에 살고 있는 당신이 당신의 현관을 여는 일, 마음을 나누는 이웃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되는지에 대한 귀띔이다. 모두를 돌보는 ‘엄마’야말로 가장 먼저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며 이 돌봄은 엄마들끼리의 공감과 연대로부터 온전히 시작된다.
엄마는 누가 돌보지?
출판사 | 서유재

김혜선(서유재 대표)
기획사를 거쳐 출판사에 입사한 후, 문예지와 문학, 인문, 어린이청소년 책의 편집과 기획을 했다. 백발 성성한 할머니 편집자를 꿈꾸며 오래오래 천천히 책과 함께하고 싶어 출판사를 차렸다. 책 서, 놀 유, 집 재, ‘서유재’에서 오늘도 책과 노니는 재미에 푹 빠져 산다.

엄지혜
eumji01@naver.com









![[더뮤지컬] <미세스 다웃파이어> 리디아, 어른의 조건을 묻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1/20251121-6158f2c7.jpg)
![[에디터의 장바구니] 『나의 오타쿠 삶』 『우리는 내륙으로 질주한다』 외](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26-a0d12f61.jpg)
![[비움을 시작합니다] 네가 변해야 모든 게 변한다 ①](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21-ebeed89d.jpg)
![[만리포X이희주] 완전한 여자](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5/20250526-24380e14.png)




gohigh33
2017.07.14
버시기
2017.07.14
떼미
2017.07.14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