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눕기의 기술
베른트 브루너 저/유영미 역 | 현암사 | 원서 : Die Kunst des Liegens
이 책은 독일 작가 베른트 브루너의 책입니다. 베른트 브루너는 독특한 키워드를 잡은 뒤에 그 주제에 따라서 각각의 분야를 넘나드는 방식으로 책을 써내려가는 작가라고 하죠. 이 책은 "침대에서 할 수 없는 일은 가치없는 일이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눕기에 대한 온갖 주제 이야기를 역사, 철학, 과학, 문학 등을 넘나들며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려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저녁이 되고 주말이 되면 누워서 퍼지게 되죠. 그러다보면 이래도 되나 하는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게으르다고 지탄받을까봐 눕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혹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며 면죄부를 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1/3은 누워서 생활하게 되는데 눕기라는 것이 얼마나 삶에 중요한가를 고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침상, 침대의 발전, 누워서 식사를 하기 위해 고안된 소파, 누워서 식사하는 레스토랑 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버무려 전달하고 있습니다.
 |
개인주의자 선언
문유석 저 | 문학동네
인천 지방 법원에서 부장 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법조인 문유석 판사의 저서 입니다. 한국 사회는 집단적 사고 속에서 개인의 특색과 견해를 고수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운 사회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우리 사회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글이 이 책에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필요성을 막힘없이 잘 읽히는 글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시절 사람들 앞에서 속독법 시범을 보이면서 죄책감을 보였던 흥미로운 에피소드들을 전한다든지, 자유롭게 글을 쓰며 떠돌아다니는 무라카미 하루키를 저자가 가장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처럼 인상적인 대목들이 많습니다.
왜 판사인데 대중을 상대로한 글쓰기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자는 "그건 내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다."라고 밝힙니다. 아닌게 아니라 이 책의 글을 보면 읽고 쓰는 것을 즐기는 사람 특유의 작은 신바람이 느껴집니다.
 |
한국대중음악사 산책
김형찬 저 | 알마
평론가 김형찬 씨의 책입니다. 이 책은 1960~1970년대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세세히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예전에 비슷한 주제를 다룬 『한국팝의 고고학』이라는 책을 관심있게 본적이 있습니다. 이 두 책을 비교하자면 『한국팝의 고고학』에 비해서 『한국대중음악사 산책』이 조금 더 스케치에 가깝고 도판들이 풍부하다는 것을 특징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찬 평론가는 자료 수집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고 책 날개에 적혀 있는데요, 아닌게 아니라 관련 사진이라든지, 잡지 기사, 광고, 은반 자켓까지 그림과 사진 자료가 정말이지 방대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술 넘겨보는 재미가 상당한 편입니다.
이 책 첫 장은 한국 통기타 음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파고들고 있고요. 이어서 쎄시봉과 청평페스티벌, 고고클럽, 그리고 트윈폴리오와 신중현을 거쳐서 유신정권 아래 대마초 파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나면 우리 대중음악사의 뿌리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책입니다.
Closing Poem
143회 - 이것이 시라고 생각된다면 by 황인찬 / 144회 - 가을 by 최승자
BGMs
오프닝 : Carcass (by NarcissCreativeLab)
내가 산 책 : 아침 공원에서 (by 심동현)
책, 임자를 만나다 : 우리가 함께라면 (by 좋은친구)
에디터스 통신 BGM : 나의 목소리 너의 메아리 (by 스프링 필드)
로고송 : 요조(YOZOH) / 캐스커(융진)
소리나는 책 : 일곱 번째 여름 (by 스프링 필드)
세리가 만난 사람 : 벚꽃의 거리 (by 심태한)
클로징 BGM : first kiss in the rain (by 스프링 필드)
이달의 Book Trailer

세상이 조용하다고 생각한 소녀가 있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원래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한 소녀는 나중에야 자신만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싶었던 소녀는 자신 대신 소리를 들어줄 귀가 큰 토끼 ‘베니’를 그리기 시작한다. 이 이야기는 자신이 만들어낸 토끼 ‘베니’와 함께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한 소녀에 대한 희망과 그림에 대한 것이다.
그녀가 잘할 수 있는 일은 그림을 그리는 일뿐이었다. 조금씩 자신의 그림을 알리고 유명해지기도 한 그녀는 자신 대신 많은 일을 해주는 토끼 ‘베니’에게 감사해하며 유쾌하게 살아간다. 그렇지만 몇 년 전, 그녀는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유전적 병인 이 병은 점점 시야가 좁아지는 병으로 결국에는 아예 보이지 않게 되며 아직까지 치료법도 없다고 한다. 세상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금씩 맺어가던 그녀는 이제 자신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것에 슬퍼하지만 그 안에서 다시 희망을 찾는다.
언제나 유쾌하고 웃음을 잃지 않는 그녀는 매일매일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행복하다고 한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많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한다. 빛이 완전히 사라져도 그녀는 계속 그림을 그릴 것이다.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그녀는 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다.


이동진
어찌어찌 하다보니 ‘신문사 기자’ 생활을 십 수년간 했고, 또 어찌어찌 하다보니 ‘영화평론가’로 불리게 됐다. 영화를 너무나 좋아했지만 한 번도 꿈꾸진 않았던 ‘영화 전문가’가 됐고, 글쓰기에 대한 절망의 끝에서 ‘글쟁이’가 됐다. 꿈이 없었다기보다는 꿈을 지탱할 만한 의지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삶에서 꿈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되물으며 변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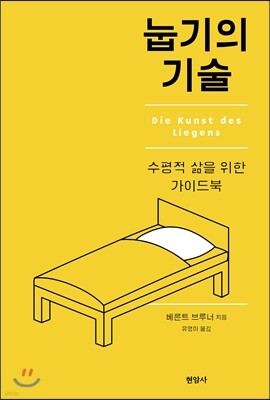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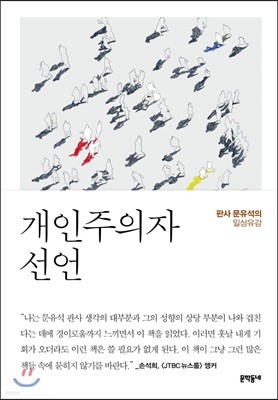

![[윤경희 칼럼] 인 메디아스 레스 II (사건의 한가운데서 II)](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18-ac1ea350.jpg)


![[취미 발견 프로젝트] 활기찬 일상을 위한 체력 단련](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5/20250530-1549a28e.jpg)
![10월 3주 채널예스 선정 신간 [가정살림/어린이]](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b/0/0/d/b00dfa4a009f8f91a3d3f53b118b3dc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