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권의 시대가 온다 두둥~!
1만 원권은 처음 발행된 1973년부터 34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나라 최고 고액권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물가가 12배, 국민소득은 무려 150배 이상 껑충 뛰어오르는 등 경제상황이 달라지면서 10만 원권 이상 자기앞수표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문제를 낳았습니다.
2008.05.23
고액권의 시대가 온다 두둥~!
오는 2009년에는 5만 원권과 10만 원권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2007년 5월 2일, 한국은행이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최고 액면금액인 1만 원은 현재의 물가나 소득수준 등 경제상황에 비춰볼 때 너무 낮아 액면가격이 5만 원, 10만 원인 고액권을 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만 원권은 처음 발행된 1973년부터 34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나라 최고 고액권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물가가 12배, 국민소득은 무려 150배 이상 껑충 뛰어오르는 등 경제상황이 달라지면서 10만 원권 이상 자기앞수표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문제를 낳았습니다.
화폐 대신 수표가 쓰인다는 것은 수표 발행, 지급, 정보교환, 전산처리, 보관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수표 대신 현금을 사용하려 할 때도 많은 양의 화폐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고액권 화폐를 발행하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수표 발행과 보관 등에 따른 연간 총 4,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1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의 제조 및 취급에 따른 연간 비용 2,800억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통지폐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1만 원권 가운데 40%(9억장) 정도가 고액권으로 대체돼 제조, 운송, 보관, 검사 등 화폐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 연간 4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고액권 발행으로 한국은행이 얻는 이익도 짭짤합니다. 이른바 1,700억원에 달하는 ‘주조차익(시뇨리지, seigniorage)’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시뇨리지는 중앙은행(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화폐를 시중에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합니다. 중앙은행의 수익으로 잡히는 이러한 주조차익과 지폐 인쇄비용 절감 효과는 곧 정부의 재정수입 증가로 이어집니다. 한국은행이 흑자를 내면 일정 비율의 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국가 재정으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앞수표를 발행해 사실상 한은을 대신해 주조차익을 챙겨온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고액권 발행으로 이윤이 줄게 됩니다. 현재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 시중은행은 수표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별단예금(special deposit)’ 형태로 보유하게 됩니다. 시중은행이 누려온 이윤은 자기앞수표 발행 후 수표 지급 제시 때까지 무이자로 별단예금에 현금을 묶어둬 챙긴 것인데, 실제로는 한국은행이 챙겨야 할 주조차익이 시중은행 몫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물론 고액권 발행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10만 원권 사용이 빈번해짐으로써 물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의견에서부터 현금자동입출기(ATM : Automated Teller Machine) 프로그램을 변환하는 데 수조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까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고액권 발행으로 무자료거래가 더 많아져 조세 수입이 줄 수 있고, 뇌물수수 단위가 커져 부패도 심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조차익
비이자성 부채의 발행, 이자율의 통제, 지불준비금의 조정을 통하여, 한 국가가 실물자원을 전용화할 때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주화를 주조함으로써 취할 수 있었던 ‘왕권(the crown)’의 특권에서 비롯된 용어이다.
1,000원이 100원으로 ‘리디노미네이션’
고액권 발행 논란이 일면서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란 용어가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눈치가 빠른 분들은 돈과 관련된 말이라는 걸 알아채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한마디로 화폐의 단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000원을 100원으로, 100원을 10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폐 단위를 바꾸게 되면 덩달아 화폐 호칭도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화폐 단위 ‘원’이 ‘환’으로 바뀌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1953년에 100원을 1환으로, 1961년 10환을 1원으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화폐 단위를 바꾸는 걸까요? 경제규모가 커졌으니 그에 맞게 돈의 단위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은 200조원을 넘습니다. 이렇게 나라살림 규모가 커지다 보니 거래되는 단위 숫자도 점점 커져서 거래나 계산을 할 때 불편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머지않아 ‘조’의 1만 배인 ‘경’ 단위의 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화폐 단위도 경제규모에 맞게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1,000원을 1환으로 바꾸게 된다면, 현재 3,800원 하는 물건의 가격이 3.8환이 되어야 하는데 은근슬쩍 끝자리가 올라 4환이 되는 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새 화폐로 교환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도 반대의 이유입니다.
리디노미네이션
화폐의 단위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시행될 때에는 ‘디노미네이션’이라고 불렀는데, 영어로 ‘denomination’은 화폐권 자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지금은 ‘다시 명명한다’는 뜻의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라는 말을 쓴다. 통화의 가치를 절하하는 평가절하(平價切下,devaluation)와는 전혀 다르게 모든 금액이 일률적으로 단위가 바뀌는데 불과해 다소의 심리적인 영향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
오는 2009년에는 5만 원권과 10만 원권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2007년 5월 2일, 한국은행이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최고 액면금액인 1만 원은 현재의 물가나 소득수준 등 경제상황에 비춰볼 때 너무 낮아 액면가격이 5만 원, 10만 원인 고액권을 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만 원권은 처음 발행된 1973년부터 34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나라 최고 고액권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물가가 12배, 국민소득은 무려 150배 이상 껑충 뛰어오르는 등 경제상황이 달라지면서 10만 원권 이상 자기앞수표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문제를 낳았습니다.
화폐 대신 수표가 쓰인다는 것은 수표 발행, 지급, 정보교환, 전산처리, 보관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수표 대신 현금을 사용하려 할 때도 많은 양의 화폐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고액권 화폐를 발행하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수표 발행과 보관 등에 따른 연간 총 4,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1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의 제조 및 취급에 따른 연간 비용 2,800억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통지폐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1만 원권 가운데 40%(9억장) 정도가 고액권으로 대체돼 제조, 운송, 보관, 검사 등 화폐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 연간 4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고액권 발행으로 한국은행이 얻는 이익도 짭짤합니다. 이른바 1,700억원에 달하는 ‘주조차익(시뇨리지, seigniorage)’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시뇨리지는 중앙은행(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화폐를 시중에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합니다. 중앙은행의 수익으로 잡히는 이러한 주조차익과 지폐 인쇄비용 절감 효과는 곧 정부의 재정수입 증가로 이어집니다. 한국은행이 흑자를 내면 일정 비율의 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국가 재정으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앞수표를 발행해 사실상 한은을 대신해 주조차익을 챙겨온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고액권 발행으로 이윤이 줄게 됩니다. 현재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 시중은행은 수표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별단예금(special deposit)’ 형태로 보유하게 됩니다. 시중은행이 누려온 이윤은 자기앞수표 발행 후 수표 지급 제시 때까지 무이자로 별단예금에 현금을 묶어둬 챙긴 것인데, 실제로는 한국은행이 챙겨야 할 주조차익이 시중은행 몫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물론 고액권 발행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10만 원권 사용이 빈번해짐으로써 물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의견에서부터 현금자동입출기(ATM : Automated Teller Machine) 프로그램을 변환하는 데 수조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까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고액권 발행으로 무자료거래가 더 많아져 조세 수입이 줄 수 있고, 뇌물수수 단위가 커져 부패도 심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조차익
비이자성 부채의 발행, 이자율의 통제, 지불준비금의 조정을 통하여, 한 국가가 실물자원을 전용화할 때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주화를 주조함으로써 취할 수 있었던 ‘왕권(the crown)’의 특권에서 비롯된 용어이다.
1,000원이 100원으로 ‘리디노미네이션’
고액권 발행 논란이 일면서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란 용어가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눈치가 빠른 분들은 돈과 관련된 말이라는 걸 알아채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한마디로 화폐의 단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000원을 100원으로, 100원을 10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폐 단위를 바꾸게 되면 덩달아 화폐 호칭도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화폐 단위 ‘원’이 ‘환’으로 바뀌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1953년에 100원을 1환으로, 1961년 10환을 1원으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화폐 단위를 바꾸는 걸까요? 경제규모가 커졌으니 그에 맞게 돈의 단위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은 200조원을 넘습니다. 이렇게 나라살림 규모가 커지다 보니 거래되는 단위 숫자도 점점 커져서 거래나 계산을 할 때 불편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머지않아 ‘조’의 1만 배인 ‘경’ 단위의 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화폐 단위도 경제규모에 맞게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1,000원을 1환으로 바꾸게 된다면, 현재 3,800원 하는 물건의 가격이 3.8환이 되어야 하는데 은근슬쩍 끝자리가 올라 4환이 되는 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새 화폐로 교환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도 반대의 이유입니다.
리디노미네이션
화폐의 단위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시행될 때에는 ‘디노미네이션’이라고 불렀는데, 영어로 ‘denomination’은 화폐권 자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지금은 ‘다시 명명한다’는 뜻의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라는 말을 쓴다. 통화의 가치를 절하하는 평가절하(平價切下,devaluation)와는 전혀 다르게 모든 금액이 일률적으로 단위가 바뀌는데 불과해 다소의 심리적인 영향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
16개의 댓글
추천 기사
추천 상품
필자

채널예스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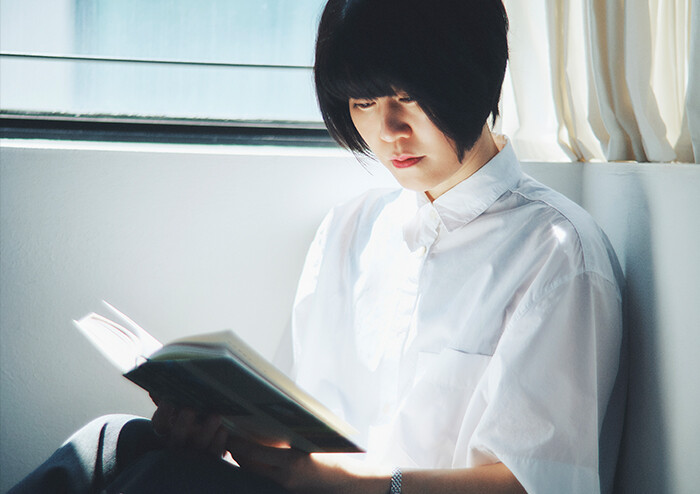
![[큐레이션] 맛과 과학의 상관관계](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3/20250327-5ba98236.jpg)
![[리뷰] 양자역학의 결정적 순간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2/20250219-ca893a1f.png)
![[리뷰] 가지 않은 길을 통한 비평](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1/20250108-c5a2d91c.jpg)
![[큐레이션] 스타트업에서 일 잘하는 방법](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2/20241203-ce01fc25.jpg)




prognose
2012.04.14
앙ㅋ
2012.04.02
별빛
2008.05.29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