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 목요일, 소설가 김중혁이 좋아하는 북커버를 소개하는 칼럼 ‘김중혁의 북커버러버’를 연재합니다. |
 『B컷 : 북디자이너의 세번째 서랍』 책표지
『B컷 : 북디자이너의 세번째 서랍』 책표지
가끔 추천사를 써달라는 제안이 들어와. 이런저런 내용의 책이 있는데, 읽어보고 추천의 글을 써줄 수 있냐는 거지. 읽어보고 내 맘을 움직이는 책이면 추천사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을 해. 빠른 판단이 중요하지. 거절은 빠르고 정중한 게 좋으니까. 재미있는 책이지만 내가 보탤 말이 별로 없는 책도 있고, 대중적인 관심을 받기는 힘들겠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내용의 책인 경우도 있어. 한번은 그런 적도 있어. 거절할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추천 글을 쓰게 됐는데, 와, 진짜 힘들더라. 몸을 쥐어짜는 느낌이랄까, 할 말이 없는데 계속 내 입을 비틀어 대는 기분이랄까. 그다음부터 정말 거절은 빨리 하게 됐지. 프리랜서로 살아가기 위한 생활의 지혜니까 적어두길 바랄게. 거절은 빠르고 정중하게. 정중하기 힘들면 빠르게라도.
추천사를 쓸 때면 늘 궁금한 게 있어.
'이 책 표지는 어떤 디자인으로 나오게 될까?'
추천사를 쓰는 시점에는 책 표지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완성되지 않은 책의 표지를 상상하면서 글을 쓰는 거지. 내가 추천의 글을 쓰는 동안 디자이너는 책 표지를 디자인하고 있는 거야. 함께 책을 만든다는 기분 좋은 동료 의식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추천의 글을 쓰는 동안에도 여러 종류의 표지가 만들어졌다가 사라질 생각을 하면 기분이 이상해지기도 해. 선택받지 못한 표지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
내가 추천사를 썼던 책 중에 『B컷 : 북디자이너의 세번째 서랍』은 의뢰를 받자마자 소리를 질렀어. 정말 원했던 책이거든. 사라진 B컷들이 어디 갔나 싶었는데, 다 여기 모여 있더라고. 추천사 청탁 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
제목처럼 B컷, 그러니까 시안이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본인들이 보기에 버리기 아깝다고 생각한 B컷들을 보여주고, 또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책은 무척 아름답기도 하고, 디자이너들의 작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많아. 북커버러버에게는 보물 같은 책이야. 디자이너 박진범 씨의 인터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한스미디어에서 나온 『수차관의 살인』이라는 책을 작업할 때, 앞서 이야기한 방식대로 시안을 여러 개 구성했는데 보고 있노라니 점점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냥 보내기는 아쉬워서 컴퓨터로 끄적거리다 수차 모양을 하나 만들어 세 개를 나란히 늘어놓다 보니 어딘가 그럴듯해 보여서 그걸로 시안을 완성시켰다. 그리고 출판사에는 그렇게 만든 시안 하나만 보냈는데 그날 바로 결정됐다. 담당 편집자도 하나의 시안이 무얼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던 것이다."
북디자인처럼 글을 쓰는 과정도 비슷할 때가 많아. 좋은 글을 써야지, 멋진 문장을 만들어 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글이 잘 써지질 않고, 그냥 생활에서 얻은 생각을 툭툭 다듬다 보면 의외로 마음에 드는 글을 건질 때가 많아. 스포츠 경기에서도 "어깨 힘을 빼라"는 말을 많이 하고, 이순신 장군도 그런 말을 했잖아. 반드시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고 요행을 바라며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가? 아무튼.
작가들은 종종 그런 생각을 해.
'아, 그때 그 표지를 선택했더라면 책이 조금 더 많이 팔렸을까?'
B컷이 A컷이 된 우주를 떠올려 보는 거야. 북디자이너들이 만들어 낸 수많은 디자인은 각각 자신만의 우주에서는 A컷이 될 거고, 한 권의 책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버전의 평행 우주를 그려볼 수 있을 거야.
예전에는 작가들의 육필 원고를 중요하게 생각했어. 작가의 초고가 고스란히 담겨 있고, 어떤 문장을 썼다 지웠는지 알 수 있으니까 말야. 나는 육필 원고를 볼 때마다 작가가 가려다가 가지 않은 길을 떠올려 봐. 썼다가 지운 문장을 되살리고, 그 문장들이 가려고 했던 세계를 상상해. 예술이란 건 수많은 우주를 만들어 낸 다음 그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고, 선택받지 못한 우주는 지워지는 게 아니라 예술가의 머릿속에서 또는 다른 우주가 탄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공간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나의 B컷도 소개할게. 『B컷 : 북디자이너의 세번째 서랍』의 책 소개 페이지에 가면 내가 쓴 추천사 A컷을 볼 수 있으니까 비교해서 봐도 좋아.
농담 삼아 책표지 평론가라는 얘기를 하고 다녔다. 평론을 할 만큼 안목에 자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표지 역시 평론이 필요할 만큼 책의 중요한 요소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였다. 표지는 작가와 독자가 처음으로 만나는 오작교이며, 출판사의 의지와 디자이너의 작품이 공존하는 장소이며, 최신의 디자인을 엿볼 수 있는 전시장이기도 하다. 책표지를 볼 때마다 디자이너들의 머릿속 서랍을 열어보고 싶었다. 이 책에는 한 권의 책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디자이너들의 고민과 근심과 기쁨이 모두 녹아 있다. 오랫동안 이런 책을 기다렸다.
추천기사

김중혁(소설가)
소설 쓰고 산문도 쓰고 칼럼도 쓴다. 『스마일』, 『좀비들』, 『미스터 모노레일』,『뭐라도 되겠지』, 『메이드 인 공장』 등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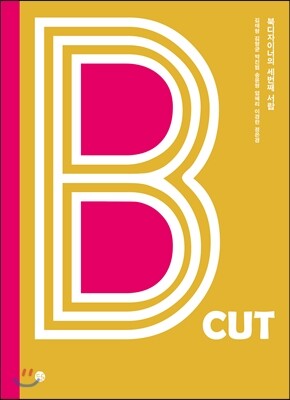

![[김중혁의 북커버러버] 우리는 환원한다 - 『책을 읽을 때 우리가 보는 것들』 | 예스24 채널예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1/0/0/8/10086866007ab272beb7ea8c3b6f12e5.jpg)
![[김중혁의 북커버러버] 폰트가 말을 한다면? - 『글자 풍경』, 『폰트의 맛』 | 예스24 채널예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2/0/9/f/209fa24682b40a667a251095ee6097f5.jpg)
![[김중혁의 북커버러버] 아득한 책의 표정 - 『그래픽 디자인 매뉴얼』 | YES24 채널예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e/6/2/e/e62e268a4430656e617bfa50058f143c.jpg)

![[인터뷰] 아침달 서윤후 김정현 “『겨울어 사전』 때문에 겨울이 기다려져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1/20251127-61e9439a.jpg)
![[요즘 독서 생활 탐구] 푸더바, 마이너한 소재를 메이저하게 소개하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1/20251104-111fa4d7.jpg)
![[취미 발견 프로젝트] 손으로 독서하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29-08dcde9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