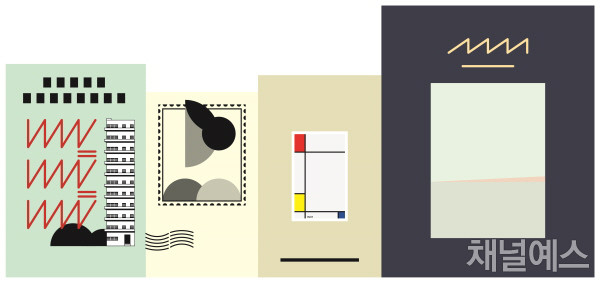
작년부터 여행을 꽤 많이 했다. 여행 재미의 반……의 반의 반……의 반쯤은 서점과 책 구경이다. 인간의 정신이 효율적인 육면체로 가공되어 나란히 꽂힌 자태는 설렘이다. 평소 디자인을 제안하는 입장인 나도 서점에서는 선택하는 주체가 되니 권력을 무소불위 휘두르는 쾌감 역시 쏠쏠하다. 외국에서 책을 고를 때는 내용을 파악할 재간이 없어 책의 외모와 허술한 짐작이 선택을 가르는 동력이다.
Heath Robinson, 『How to Live in a Flat』, Bodleian Library, 2015
밀라노의 아르마니리브리(Armani Libri)에서 샀다. 주로 예술, 디자인, 패션, 건축 분야의 책을 갖춘 곳이다. 장난스러워 보이는 표지에 눈길이 갔다. 사이언 20퍼센트에 옐로 15퍼센트쯤 섞은 듯한(이 대목에서 포토숍을 열어 색을 배합해 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한번 확인하려다 그만둔다. 도대체 누가 서점에서 책 고르면서 앱을 활용해 색을 배합해 보겠는가) 색상의 표지 맨 위는 저자명이 크게 검정색으로, 그 아래 공간은 세로로 대략 2:1로 나뉘었는데 왼쪽은 검정색 테두리와 그림자를 넣은 붉은 글자로 책 제목이, 오른쪽은 하얀 아파트 그림이 채우고 있다. 영단어 창고가 빈약한 나는 ‘Flat’이 어떤 형태의 주거 공간인지 몰랐는데 아마 아파트를 가리키나 보았다. “아파트에서 사는 법”. 책에는 아파트라는 좁은 공간에서 품위 있는 생활을 위해 분투하는 인간의 행태를 해학적으로 그린 다양한 드로잉이 실려 있었다. 그림에 호응하는 글인지 글에 호응하는 그림인지는 따져 보지 않았다. 그림에 스민 유머는 그 자체로 간직할 만했다.
Virginia Woolf, 『Tutto ci? che vi devo』, L’Orma Editore, 2014
피렌체의 외진 동네를 거닐다 우연히 발견한 독립출판물 전문 서점 블랙스프링(Black Spring)에서 샀다. 문인의 편지를 엮은 책이(라고 짐작한)다. 커버에 엽서 요소를 차용해, 주소를 적고 우표만 붙이면 바로 부칠 수 있다. 편지 모음집이 아니더라도 책에 두루 적용할 만한 아이디어다. 책 부치는 일은 별 일 아닌 듯해도 꽤 성가시다. 우체국에서 파는 서류 봉투가 있지만 조금 더 정성을 들여 반듯한 봉투를 구하려 들면 그게 또 일이 된다. 나만 해도 지인에게 책 부쳐 주기로 하고선 반 년이 지나도록 미루고 있다. 심지어 봉투를 사 두기까지 했는데도. 음, 이 정도면 커버 디자인으로 해결되기 힘든 영역이겠다. 아무튼 이탈리아어 책이라 한 줄도 읽지 못했다. 사실 ‘Tutto ci? che vi devo’가 제목인지 시리즈명인지도 모르겠다. 구글 번역기라는 신비로운 도구가 있건만 브라우저 창 하나 열어 몇 글자 검색하는 일조차 안 하고 있다.
Walter Benjamin, 『Recent Writings』, New Documents, 2013
베를린의 모토(Motto)에서 샀다. 거친 천으로 싼 아이보리색 하드커버. 몬드리안의 그림을 인쇄해 음각으로 접착했다. 표지 하단에 발터 벤야민의 문장이 먹박으로 찍혔다. “복제품은 메타 원본이다.” 저자명, 책 제목, 출판사명은 책등에 먹박으로. 속표지 하단에 ‘2013’이라고 선명하게 찍혀 있다. 아니, 벤야민이 죽은 지가 언젠데 2013년에 『Recent Writings』라는 제목을 단 책이 나오지? 예전에 나온 책을 복각했나? 누군가가 발터 벤야민의 (메타 원본으로서) 복제 인간 행세를 하는 걸까? 복각본이라면 벤야민의 글을 읽게 될 테고, 벤야민 도펠갱어의 글이라면 기획이 흥미로우니 일독할 만하겠다.
『Terasu』, Vol. 1: Early Hues, Terasu, 2016
도쿄의 도미가야 지역을 걷다 마루타 조이 앤드 프렌즈(Maruta Joy & Friends)라는 가게를 발견했다. 살짝 엿보니 옷이며 소품이며 책이며 에스프레소 머신이며 아웃도어 용품이 뒤섞여 있었다. 들어가니 직원이 커피를 권했다. 기꺼이 한 잔 받아들고 둘러보다 어떤 잡지에 시선이 갔다. 표지 사진이 좋았다. 인디고 색으로 염색한 거친 천을 씌운 하드커버에 후가공으로 접착한 사진이었는데 허공과 수면의 옅은 색조가 아름다웠다. 인화지의 광택과 금박 제호가 어울렸다. 책 속에 실린 사진은 전부 아웃도어 활동의 산물이었다. 다양한 종이를 활용한 편집이 돋보였다. 한 면만 코팅된 흰색 크래프트지에 중첩된 사진 효과가 멋졌다. 표지를 다시 봤다. 제호 밑에 ‘Early Hues’라고 적혀 있었다. 이른 시간대에 야외에서 볼 수 있는 색조가 주제일까? 아웃도어 활동에서 ‘Early Hues’라는 소재를 뽑아낸 제작진에 신뢰가 갔다. 숨찬 신체 활동이 아웃도어 활동의 유일한 방식일 리 없다. 조용한 사람들이 고요를 찾기 위해 비교적 덜 가공된 야외를 찾는 경우 역시 많을 터. 내면 활동에 초점을 맞춘 아웃도어 수요가 분명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런 잡지를 만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뜻으로 사기로 결정. 어떤 뜻에 동조해 그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원한다면, 구매가 그 세상에 이르는 길이다. 구매는 발언이다. 잡지를 계산대에 가져 가니 표지가 3종이라며 다른 두 가지를 보여 주었다. 저 멀리 동이 트는 산 속의 나무 사진에는 더욱 선명한 금박으로, 바다에서 눈 덮인 뭍으로 나오는 서퍼 사진에는 은박으로 제호를 후가공했다. 이런 선택을 마주하니 호사스러워 유쾌했다. 내 선택은……
“잠깐. 구매는 발언이라고? 지난번엔 안 그랬잖아.”
노바가 참견했다. 기억 난다. 『고구마구마』라는 그림책이었다. 표지에 그려진 여러 개의 고구마가 생김새도 가지가지로 고구마스러웠고 고구마 껍질 역시 보랏빛 감도는 갈색으로 참으로 고구마스러웠는데 거기에 살짝 겹친 노란 속살이 고구마스러웠고 몸뚱이에 몇 가닥씩 난 가느다란 털도 고구마스러웠다. 그림이 여간 고구마스럽지 않았다. 중간에 푹 삶은 고구마를 쪼개는 장면에서 펼쳐지는 진하고 차진 노란 ‘마육’에는 탄성이 나올 지경이었다. 진땀을 흘리며 그림책을 들여다보는 게 얼마만이었던가. 이런 책은 사 줘야 한다고 아우성친 마음과 달리 얌전히 그 자리에 올려 놓고 발길을 돌렸다. 그때 일을 말하는 모양이었다. 노바의 지적에 일리가 있었다.
“그날은 먼저 산 다른 책 때문에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변명했지만 속마음은 아마 ‘가진 자’의 나태였으리라. 한국에서 나온 책은 언제고 살 수 있으니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미루게 된다. 미루다 보면 결국 잊기 십상이다. 기간이 많이 남은 전시는 미루고 미루다 놓치고 마는 것과 같다. 여행지에서는 소비에 너그러워지는데다 언제 또 갈 지 모르니 웬만하면 사게 된다. ‘더 둘러보고 마지막 날 사지 뭐’ 하고선 잊은 물건이 한둘이 아니다. 그래서 더 선뜻 사게 된다. 반면 한국에서 책을 살 때는 디자인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내용을 보고 선택한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보니 디자인이 아니라 책 제목에 끌려 산 책이 딱 한 권 있다. 두유리드미(Do You Read Me?!)에서 산 『Why Grow Up?』. 왜 어른이 되어야 하는지 따지는 내용일까, 왜 반드시 어른이 될 필요는 없는지 항변하는 책일까? 3장에 등장하는 소제목은 논의를 어디로 이끌어갈 지 헤아리기 힘들다. Education. Travel. Work. Why Grow Up?.

이기준(그래픽 디자이너)
에세이 『저, 죄송한데요』를 썼다. 북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취미 발견 프로젝트] 손으로 독서하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29-08dcde92.jpg)
![[큐레이션] 책의 재킷](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25-7663977c.png)

![[큐레이션] 올록볼록한 책이 흥미로운 이유](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29-40ddd67d.jpg)
![[취미 발견 프로젝트] 함께라서 더 행복한 봄의 한복판에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28-2a252fb9.jpg)


leekijoon
2018.01.31
iuiu22
2017.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