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정신없이 땅을 파는 사람들이 떠오른다. 우리는 발굴을 통해 유해나 유물을 찾고, 다시 이를 통해 오래전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곳을 밟고 생활하였음을 알게 된다. 땅을 파고 또 파내야 과거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인지, 어린 시절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층이 쌓여 지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 그 흙은 다 어디서 오는 건데? 글쎄 하늘에서 오겠지……. 의심이 들면 그럭저럭 근거를 만들어 보완해 가며, 지구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생각은 어느새 나의 안에 굳은 믿음으로 자리하였다.
그런 생각을 안고 길을 걷다가 땅 위로 불쑥 솟은 풍납동토성을 만났을 때 이것은 왜 땅 아래 있지를 않고 바깥으로 불쑥 튀어나온 것이지? 어린이 시절을 통과하는 중이던 나는 두 가지 잔잔한 충격에 휩싸였다.
첫 번째는 꼭 백제대의 시간이 2000년대를 푹 찌르는 것 같아서. 옛날 성이 땅 아래 있지 않고 지금 지상에 이렇게 버젓이 서 있을 수가 있다니. 나의 머릿속에서 착실히 몸을 불리던 지구의 이미지가 홀홀 흩어져 버리는 순간이었다.
두 번째로는 토성의 생김새가 너무나 볼품없어서. 누군가의 안내가 없다면 나는 그것을 그저 야트막한 언덕 정도로만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언덕이라 쳐도 여전히 볼품은 없었던 것이, 토성은 둥글고 정다운 모양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던져둔 점토 같았다. 심지어는 가운데가 뚝 끊겨 그 사이로 2차선 도로가 나 있는 모양새였다. 마치 백제의 성이 내가 지금 현대의 서울에 머물 수 있으려면 이 정도 타협은 어쩔 수가 없다, 끊긴 지점은 보는 이가 상상의 눈으로 연결하여 보시오 하고 말하는 듯 뻔뻔하게도 보였다. 집과 집 사이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는 것 역시.
과거의 시간은 땅 아래 있어야 마땅하다는 굳은 믿음이 없었더라면 풍납동토성과의 만남이 이렇듯 충격을 주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하필 토성과의 조우가 나의 믿음을 깨어 버리며 이뤄진 탓에 절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된 것일지도.
 왼편 흙무덤이 바로 풍납동토성이다.
왼편 흙무덤이 바로 풍납동토성이다.
백제는 왠지 고구려나 신라보다 좀 한가한 느낌이다. 고구려를 생각하면 토벌 정복 확장 같은 말이 연이어 떠오르고, 신라를 생각하면 요것이 삼국통일을 하게 된다니 보통내기가 아닐 것 같은 인상이 든다. 그런데 백제 하면 아무래도 흥성한 문화…… 백제대의 사람들은 풍류를 아는 이들이었을 것만 같고 걸음도 느리게 걸었을 것 같다. 고구려와 신라에 비하자면 조금 지루한 듯도 한 느낌.
풍납동토성을 지날 때 괜히 속도를 늦추게 되는 건 어쩌면 내게도 백제 사람들의 기운이 전해지는 탓일까? 아니 어쩌면 그 기운이 내 피에도 흐르는 덕분?
나는 여전히 풍납동토성을 걸어갈 수 있는 곳에 살고 있다. 어린 시절과는 달리 지금은 풍납동토성의 존재 방식이 제법 마음에 든다. 지어졌을 당시에는 9미터에 이르는 높이였다지만 지금은 꼭대기까지 단숨에 뛰어 올라갈 수 있는 흙더미가 되어 버린 토성. 꼭 옛 시절을 그리워하는 동네 할아버지를 닮은 것 같다. 이것은 공원이다, 혹은 이것은 유적지다, 하고 단정 짓기에는 왠지 양쪽 모두 엉거주춤하게 되는 느낌도 좋다. 친구들이 동네에 놀러 온다면 데리고 갈 것인가? 이 자문에는 굳이…… 하고 말을 얼버무리게 된다는 점도 그렇다. 토성 근처를 지날 때마다 끊긴 지점은 연결하고 유실된 높이는 복원하여 그 위용을 상상하도록 만드는 점도, 마치 한껏 늘어놓은 자랑을 사람들이 다 거짓말로 여길까 봐 조바심을 내는 친구 같아서 재미있다. 토성 둘레에는 울타리가 없으므로 마음만 먹으면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등반 금지 표지판은 입구에만 박아 둔 것에도 웃음이 나온다.
이렇게 쓰고 보니 만만해서 마음에 든다는 말 같지만, 사실 만만함은 정말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만만해서 마음에 든다는 말이 맞기는 하다. 풍납동토성의 만만한 구석 덕분에 나는 토성을 두고 친구와 할아버지를 떠올려보거나 이것저것 이야기를 덧붙여 볼 수가 있게 되었다. 이야기의 옷을 덧입은 토성은 한곳에만 박혀 있지 않고 머릿속을 자유롭게 헤집으며 다닌다. 찻길로 끊긴 토성 두 덩이가 따로 움직이기를 원해 토성 1과 토성 2가 결국 결별하게 되고, 이 사건으로 일대가 영 혼란해질 수도 있고…… 이런 생각들을 어린 내가 믿던 지구처럼 천천히 뚱뚱해지도록 놔둔다면 언젠가는 이것들이 모여 한 편의 소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토성 곁을 지날 때마다 그 위에 상상 하나씩을 얹어 보다 문득 그럼 이게 정확히 언제 발견된 것일까 궁금해졌다. 찾아보니 1925년 7월 ‘을축년 대홍수’로 이 일대에 묻혀 있던 항아리 하나가 발굴되었고 이것이 풍납동토성의 시작이었다고. 그 이전까지는 3세기 중반 무렵으로 추정하던 백제 형성 시기도 이 발굴로 인해 기원전 199년까지 한층 끌어올려졌다고 한다.1 기원전…….
사실을 알고 나니 긴 세월 동안 토성에게 너무 건방지게 굴었던 게 아닌가 싶다. 물론 모두 나의 머릿속에서만 벌어진 일이지만, 왠지 토성은 다 알고 있을 것 같다…….
 백제의 나무.
백제의 나무.
찻길 때문에 토성이 끊긴 지점에는 내가 ‘백제의 나무’라고 남몰래 이름 붙인 상서로운 나무가 서 있다. 나뭇잎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땅에서 자란 덩굴잎이 아래서 위로 손을 뻗친 것인지, 나무는 기둥과 가지의 갈색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게끔 온통 초록 잎으로 뒤덮여 있다. 요즘 비가 부쩍 자주 온 탓에 우산을 쓰고 토성 옆을 지나칠 일이 많아졌는데, 물에 젖은 백제의 나무는 한층 더 상서롭다. 잎사귀 하나를 들고 속닥거리면 소원이라도 하나 들어줄 것 같은 모습이다. 나는 송파구에 위치한 또 다른 백제대 유적인 백제고분과 관련한 비밀도 한 가지 갖고 있는데, 일기장에만 쓰던 소원과 비밀 들을 백제의 나무에게 전하고 나면 나는 토성과 한층 더 지독하게 얽혀들 것이다. 토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슬퍼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어느 만만한 토성과의 조우는 세월이 흘러 이렇게 깊어지고 말았다.
1 토성 발굴 연도와 관련한 내용은 기사 「‘돈 먹는 하마’ 풍납토성 발굴 해법은」(매일경제, 2013.7.4.)을 참고하였다.
* AI 학습 데이터 활용 금지

정기현
2023년 문학 웹진 《Lim》에 「농부의 피」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걷고 뛰고 달리고 나는 존재들이 등장하는 소설집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을 썼다.






![[정보라 칼럼] 영화 감독들이 사랑한 SF 작가, 스트루가츠키 형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25-2f67d794.jpg)
![[이옥토 X 이훤] 보고 있는 것을 믿기 어려워하면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24-207bb1de.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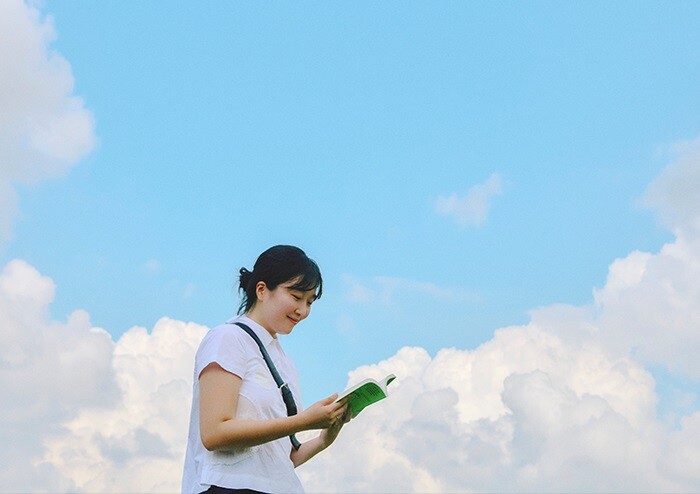



pka7806
2025.09.25
-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