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스포드 대학교
옥스포드 대학교
나는 오랫동안 모범생이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겼다. 학창시절 내내 모범생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틀에 박힌 모범생이지만, 소위 ‘글 쓰는 사람’은 모범생과는 거리가 멀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 한없이 자유롭게 사고하며 기존 질서에 반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진정한 글쟁이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사회의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저항하면서 술이며 약물에 중독되다가 자기 파괴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작가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읽었기 때문인 것 같다. 이를테면 다자이 오사무나 실비아 플라스 같은 사람.
천생 모범생인데 모범생 기질을 인정하기까지 하면 영원히 제대로 글 쓰는 사람이 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성실히 노력하는 모범생이라는 존재를, 재능을 타고난 글쟁이와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했다. 내가 읽은 소설 속 주인공들이 대개 모범생과는 거리가 먼 ‘자유로운 영혼’이었기 때문에, 모범생에 대한 서사란 재미없고 지루하여 읽을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모범생인 스스로를 긍정하게 된 것은 40대에 접어들고 나서부터다. 세월이 지나면서 나의 가장 큰 재능은 성실함과 꾸준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자유분방하기 그지없어 보이는 작가들도 읽고 쓰는 일에 있어서만은 지극히 성실한 모범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했다. 그리하여 이 책은 모범생에 대한 변명이자 ‘그 많던 모범생들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며, 평생을 모범생으로 살아온 사람의 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카를 라르손 <편지 쓰기>(1912)
카를 라르손 <편지 쓰기>(1912)
나는 오랫동안 우등생이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겼다. 정확히 말하자면 대학에서 우등생이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했다. 대학 4년간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었고 과수석으로 졸업했지만, 그런 사실이 밝혀지는 것도 입 밖에 내는 것도 부끄러웠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 연배만 해도 고등학교 때 우등생이었던 사실은 자랑할 만하지만 대학에서조차 우등생이라면 한심하게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었다. 대학에서의 진정한 지식은 강의실이 아니라 거리에서 얻는 것이며, 진정한 대학생활이란 강의실이나 도서관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선후배들과 친목을 쌓으며 ‘낭만’을 즐기는 것으로들 생각했다.
돌이켜보면 짱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가투(街鬪)로 대학시절을 보냈던 선배 세대, ‘386세대’라 불리는 그들의 대학생활에 대한 서사가 지식인의 표본처럼 캠퍼스에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던 것 같다. 강의실에서는 배울 것이 없다는 명제가 참이어야만 수업을 빠지고 시위에 나서는 것이 합리화될 수 있었던 엄혹한 시대의 논리가 나처럼 IMF 이후에 대학에 입학한 90년대 끄트머리 학번에게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일진대, “공부만 하는 대학생은 인생을 모르는 것”이라고 386선배들은 종종 이야기하곤 했다. “대학에서 배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변 사람들이 말할 때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렇게 해야만 ‘쿨하게’ 보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정말 대학은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4년을 투자해 50과목 144학점을 들었는데, 그 시간과 노력은 그저 스쳐 지나간 과거일 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
학자들의 이력서에서 “학부를 최우등(Summa Cum Laude)으로 졸업했다.”는 내용을 볼 때마다 궁금했다. 학자가 되지 않는다면 대학에서 공부 열심히 한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나? 공부가 업이 아닌 나의 ‘숨마 쿰 라우데’는 쓸모 없는 것일까? 법학이나 공학 같은 실용적인 학문이 아니라 인문학 전공자라 더더욱?
이 책은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작업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뇌가 아직 유연하고 젊음의 가소성이 최고치에 다다라 공부가 쉬이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던 시절, 공부가 남긴 흔적에 대한 이야기. 공부한 내용이 기억에 남지 않으면 헛되다고 흔히들 생각하지만, 대학 시절의 공부는 잊히는 과정에서 정신에 깊은 자국을 남기고 거기에서 졸업 후 이어질 고단한 밥벌이의 나날에 자그마한 위로가 될 싹이 움튼다. 그것이 공부의 진정한 쓸모라고 생각한다.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 도서관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 도서관
교양에 대한 책을 쓰고 싶다고 오랫동안 생각했다.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교양이 아니라 ‘교양이란 무엇인가?’를 손에 잡히는 실체로서 보여줄 수 있는 책. 이 책에서 주로 대학 시절의 교양수업과 대학 밖 사회에서 교양이라 여기는 인문학 수업을 돌아본 것은 그 때문이다. 교양이란 완벽한 지식 체계가 아니다. 자신의 세계를 공고히 하되 다른 세계가 틈입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교양이란 겹의 언어이자 층위가 많은 말, 날것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일, 세 치 혀 아래에 타인에 대한 배려를 넣어두는 삶의 태도이기도 하다.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대학 강의실에서 배웠다. 읽고 쓰고 생각하는 훈련과 함께. 캠퍼스에서의 배움은 음화(陰畵)처럼, 내가 무엇을 아느냐보다 무엇을 모르는가를 뚜렷하게 하고 자아의 음역대를 넓혀주었다. 그래서 이 책은 실용이라는 구호에 밀려 교양 강의가 축소되고 팬데믹의 영향으로 강의실이 망가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대학에 바치는 비가(悲歌)이기도 하다.
이 책을 쓰기 위해 오래된 강의 노트와 교재를 다시 펼치면서 그때 그 선생님들이 어린 우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입시와 팬데믹이라는 길고 긴 터널을 거쳐 갓 대학생이 된 독자들께는 타라 웨스트오버의 책 『배움의 발견』 중 한 구절을 들려주고 싶다.
그 학기에 나는 진흙이 조각가에게 몸을 맡기듯, 나 자신을 대학에 맡겼다. 나는 내가 다시 만들어지고 내 정신이 새로 짜여질 수 있다고 믿었다.
_타라 웨스트오버, 김희정 옮김, 『배움의 발견』(열린책들)에서
 레오니드 파스테르나크 <시험 전날 밤>(1895)
레오니드 파스테르나크 <시험 전날 밤>(1895)
특정 종교의 교리에 심취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부모에게서 탈출해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새로운 삶을 찾은 타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대학생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 새내기 대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어떤 질문이든 주저하지 말고 던져보라고. 그것이 대학에서 그대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권리이니.
 3월 출간 예정
3월 출간 예정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곽아람(작가, 기자)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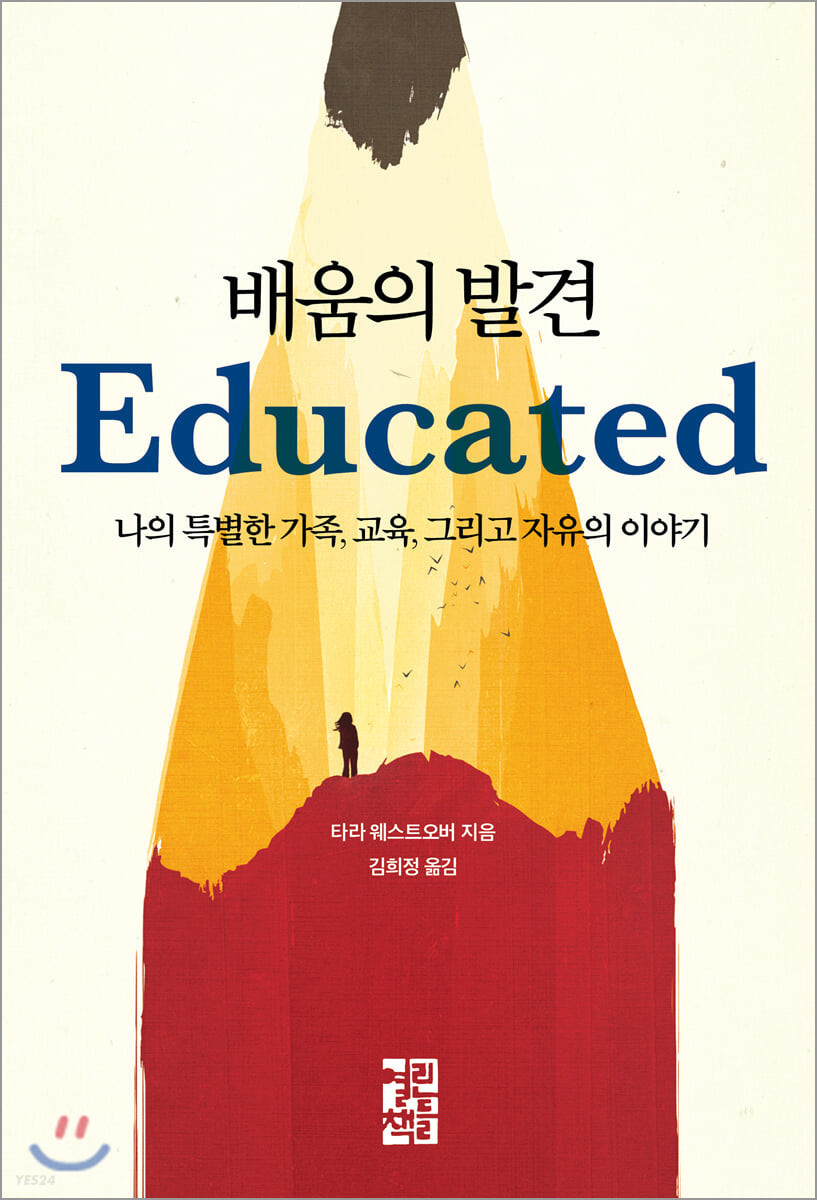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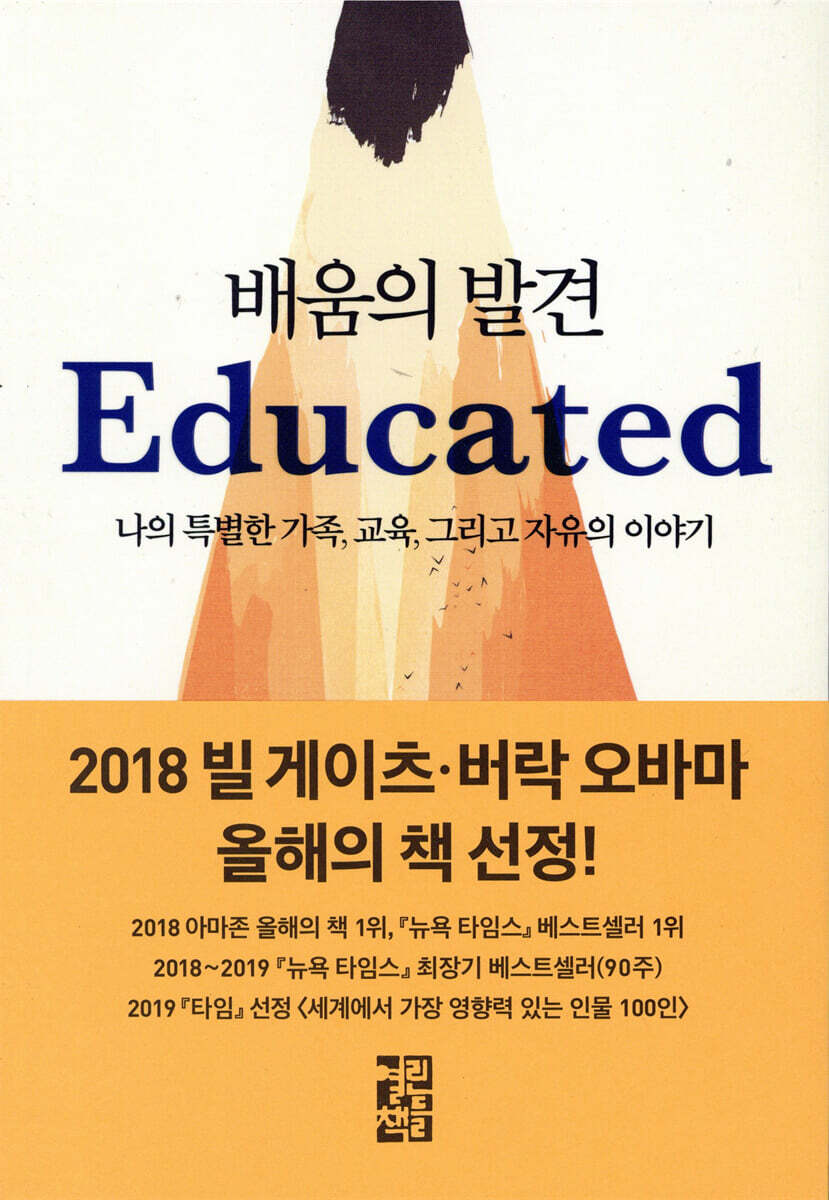





![[취미 발견 프로젝트] 독서하고 싶은 공간 만들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2/20250226-346177ac.png)

![[Read with me] 김나영 “책을 통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1/20250109-f468d247.jpg)
![[이벤트 종료] 새로워진 채널예스 기대평을 작성해주세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1/20241126-81642dcc.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