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 책을 좋아하던 때를 이야기해 볼까. 아무래도 책이 가까웠던 것 같다. 아빠는 대교출판에 다녔다. 출처를 모르고 읽었던 모든 어린이책과 성인책이 아빠가 가져온 대교출판 책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엄마는 ‘아이북랜드’라는 책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내 방에는 작은 베란다가 딸려 있었고 거기에는 엄마가 자전거에 싣고 배달할, 책이 서너 권씩 든 부직포 가방이 쪼르르 줄 세워져 있었다. 나는 거기서 끌리는 책을 골라 읽었다. 등이 간지러운 공주님 이야기, 에리히 캐스트너의 꼬마 탐정 에밀 이야기, 기차 할머니, 깡통소년, 수학을 엄청나게 잘하지만 친구 사귀기는 너무 어려웠던 남자애 이야기, 파루미라라는 이름의 거대 기린이 아기를 돌보는 이야기, 진로 탐방 방학 숙제 때문에 모델교습소에 등록한 아나스타샤 이야기 등.
아파트 단지에는 ‘이동도서관’이라는 이름의 봉고차가 왔었다. 좁은 차 안이 책으로 가득했고, 일주일 동안 읽을 책을 고르는 일이 어떤 일보다 중요했다. 주말에는 동네의 오래된 도서관에 가기도 했다. 도서관에 가던 날을 떠올리면, 한눈에 봐도 묵직해 보이는 짙은 갈색의 나무 책장이 떠오른다. 책배의 종이가 온통 누렇던 책들. 오래된 서가 사이사이에 숨듯 앉아서 주로 소년소녀 명랑소설을 읽었던 것 같다. 쌍둥이는 못 말려, 플롯시는 오늘도 따분해 같은 제목의 소설들. 안톤과 꼬마 흡혈귀 시리즈. 인기짱 패션짱 같은 시리즈도 재밌어서 몸서리치며 읽었다. 학교에서도 도서관을 사랑했다. 중학교 도서관에서는 로알드 달을 읽었고, 고등학교 도서관에서는 에쿠니 가오리와 오쿠다 히데오를 읽었다.
도서관에 관한 기억은 인생 전반에서 매우 적지만 강렬하다. 그토록 좋은 느낌을 주는 곳이 있다는 것이 다행일 정도로. 그러나 좋은 기억이 곧 전부 기쁜 기억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그 기억들 속에는 미묘하게 슬펐던 감정도 책갈피처럼 끼워져 있다. 고등학교 이학년 때, 친했던 친구가 시 외곽의 크고 좋은 도서관에 함께 시험공부를 하러 가자고 제안해 줬던 적이 있다. 친구와 같이 숲이 우거지고 건물 모양이 멋진 곡선으로 이루어진 곳에서 산책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책을 구경하다가 이야기를 나눌 때는 못내 기쁘다가, 이상하게 도서관의 구내식당에 들어가면 좀 서글퍼졌다. 내가 궁금한 감정은 이런 것이다. 도서관에 가면 왜 둘이서 가도 혼자인 것 같은지. 왜 그곳만은 둘이 가는 것보다 혼자 가는 것이 더 마음이 평온해지는지.
그 감정이 무엇인지 여전히 모르겠다. 도서관에 책 읽으러 간 게 아니라 공부를 하러 갔을 때 (나에게만) 느껴지는 이상한 외로움인지, 아니면 도서관 식당에만 흐르는 미묘한 한기가 외로움과 비슷해서 착각한 건지. 그래서 훗날 정이현 작가의 단편소설 「삼풍백화점」을 읽다가 도서관에서 취업 준비를 하던 주인공이 도서관 매점에서 라면을 먹으려다 말고 백화점식당으로 비빔냉면을 먹으러 나섰을 때, 그가 느꼈을 이상한 외로움을 알 것 같다는 착각이 들었다. 정작 나는 취업 준비를 위해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현실의 경험과 소설 속 묘사가 꼭 같지 않더라도 나는 거기에서 나를 본다.
감자와 당근으로만 이루어진 도서관 식당의 멀건 카레라이스는 딱 한 번 시도하고 말았다. 늦은 점심으로는 김치사발면을 먹거나 포카리스웨트를 뽑아 마셨다. (……) 그렇게 닷새째 되는 날이었다. 구내 매점에서 사발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나무젓가락을 반으로 쪼개는 데 불현듯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도서관은 너무 추웠다.
-정이현, 「삼풍백화점」, 52쪽 (『오늘의 거짓말』, 문학과지성사, 2007)
그리고 최근, 도서관에 출퇴근하는 시인의 에세이를 편집하는 동안, 나는 이 책이 출간된 후에 꼭 도서관에 가야지 생각했다. 도서관을 이렇게까지 자신의 공간으로 만드는 사람이 부러워졌기 때문이다.(『일기시대』에는 문보영 시인이 그린 도서관 평면도와, 커다란 나뭇가지로 연결된 상상 속 도서관 그림도 들어 있다.) 그중 한 꼭지인 「도서관은 이렇게 생겼다 2」에는 문보영 시인이 외로움에 대해 말하는 부분이 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도서관에서 사람을 사귀지 않고, 아는 사람과 도서관에 가지 않는다. 여기서만큼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오로지 혼자이고 싶다. 그런데 내 방에서 혼자인 것과,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인 것은 다른 외로움이다. 둘 다 혼자인 것은 맞지만, 도서관에서의 외로움은 함께 하는 외로움이고, 내 방에서의 외로움은 혼자 하는 외로움이다. 전자가 있어야 후자도 견딜 수 있기에 도서관에 간다.
-문보영, 『일기시대』, 147~148쪽
누군가가 표현하는 외로움에 대한 각기 다른 장면들을 보며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 나는 그때 왜 그렇게 쓸쓸하고 알쏭달쏭하게 외로웠을까? 도서관을 좋아하면서도 그 좋은 기억이 외로움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은 퍽 신기하다. 혹은 외로움의 농도가 섞인 좋음이기 때문에 그 기억이 더 특별해지는 걸까.
2021/5/2
산책길에 우연히 정독도서관에 들어갔다. 등나무 아래서 잠깐 쉬기나 할까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입장까지 하게 되었다. 도서관이 주는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정말이지 오랜만에 느꼈다. 큐알체크를 하고 1층 문학서가에 들어가 빈자리에 앉으면 되었다. 가방을 내려놓고 서가를 하염없이 구경하다가 읽을 책을 골라 다시 자리로. 홀로 앉을 수 있는 책상 옆에는 창문이 있었고 창문 너머로 초록잎이 어느새 무성해진 나무에 바람이 스치며 사락사락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좋은 곳에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다. 들고 돌아온 책은 더글러스 케네디의 『마음을 읽는 아이 오로르』였다. 어쩐지 옛날에 읽던 그런 책들이 읽고 싶었다. 책등의 끝과 표지 네 귀퉁이가 전부 해져서 날긋날긋했다. 찢기고 낡은 책. 그런 것에서 이상하게 안도감을 느낀다. 책은 원래 이렇게 찢기고 낡지. 그렇게 찢기고 낡아도 여기에 있지. 도서관에는 언제나 책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좋았다.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김화진
2021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나주에 대하여」가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나주에 대하여』, 연작소설 『공룡의 이동 경로』, 장편소설 『동경』, 단편소설 『개를 데리고 다니는 남자』, 『개구리가 되고 싶어』 등이 있다. 『나주에 대하여』로 제47회 오늘의작가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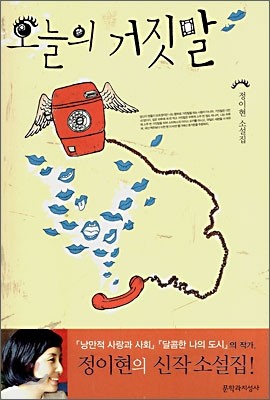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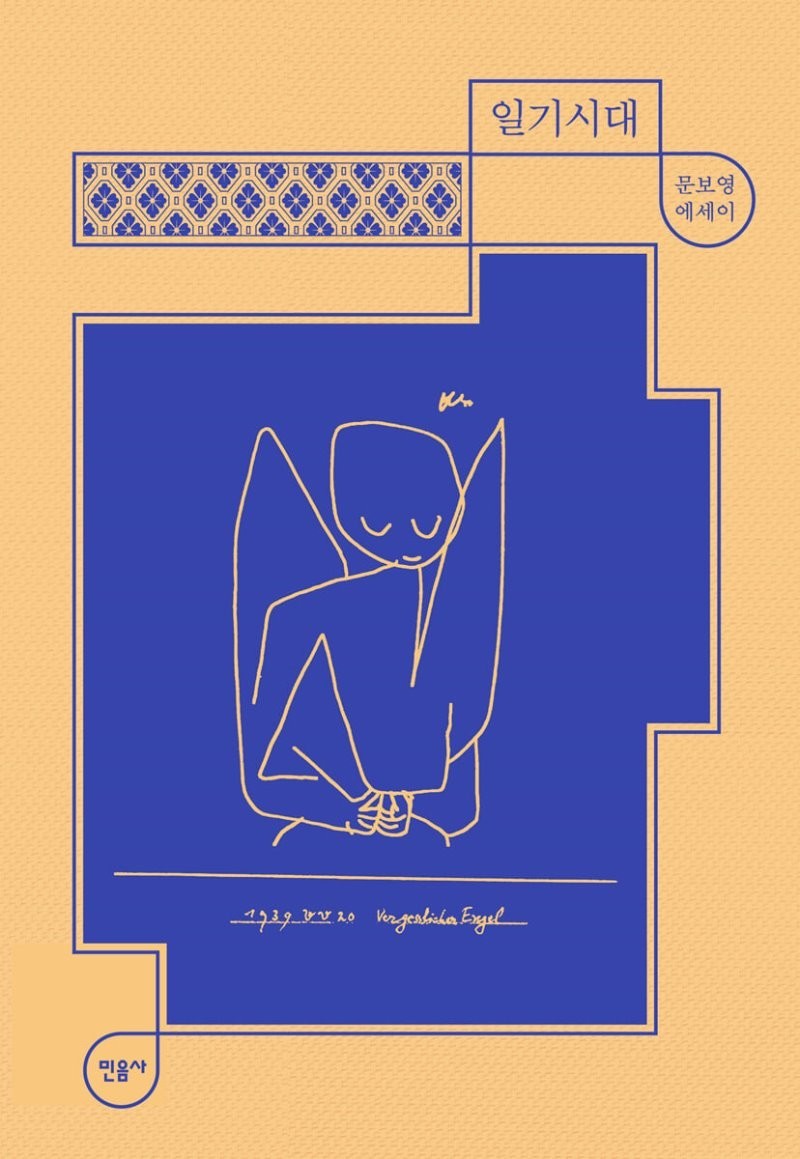
![[김화진의 선택 일기] 출판사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e/5/1/8/e518dd213bf364fbad26b2d6e8e00c14.jpg)
![[김화진의 선택 일기] 알맞게 도착하는 책들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2/e/0/5/2e0577c05575f65fae3f2819dc5fdda5.jpg)
![[김화진의 선택 일기] 문학을 쓰기, 말하기, 남기기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f/c/8/3/fc8399d8258addc6581e06347b4b7e46.jpg)

![[큐레이션] 방문을 굳게 잠그고 읽어야 하는 시집](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1/20251110-700ed945.jpg)
![[큐레이션] 꿈꾸고 싶고, 더 나아가 보고 싶은 이야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1/20251103-2cd19e89.jpg)
![[취미 발견 프로젝트] 11월이라니 갑작스러운데, 2025년 취소해도 돼?](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0/20251030-b2d627fe.jpg)
![[Read with me] 더보이즈 주연 “성장하고 싶을 때 책을 읽어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2/20241219-0fe5295b.jpg)
![[Read with me] 강동원 “세상에 없는 이야기를 좋아해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2/20241206-50501154.jpg)









sjh019618
2022.02.11
글을 읽으면서 책 좋아하던 저의 어렸을 때가 생각나서 재미있었어요
특히 이동식 도서관! 처음으로 이동식 도서관에 들어섰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요
basara10
2021.06.01
도서관에 갈때의 혼자가 주는 외로움이 좋다는걸 나도 그랬는데 ...
어린시절 책은 안다는 것은
영혼이 절대 배고플리 없는 식량 같은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