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세요’라는 말을 많이 주고받는 요즘이다. 전염병 시대, 가까운 사람의 안녕을 비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 하지만 두 권의 책을 읽은 후 나는 ‘건강’이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쓰게 됐다. 『천장의 무늬』와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를 통해, 나는 처음으로 건강을 권하는 이 사회를 낯설게 바라보았다.
고백하건대 나는 ‘건강 모범생’으로 살아왔다. 모범생이면 모범생이지, 건강 모범생은 뭐냐고? 내 삶을 보면 알 수 있다. 자라서 책을 열심히 파는 서점 직원이 될 아이는 어린시절 사고 한번 안 치고 집에서 열심히 책만 읽었다.(그래 내 얘기다.) 소셜 활동도 필요하기에 고무줄 놀이도 곧잘 하고 피구에 흥미를 보였으나, 주변 친구들처럼 축구를 하다가 팔이 부러졌다더라 하는 일상적인 상해도 입지 않았다. 게다가 우리 아빠는 ‘조심해라’는 잔소리를 달고 사는 사람. 덕분에 나는 화장실에 가서도 미끄러져 다칠 것을 걱정하는 어른으로 자랐다.
그렇게 조심조심 살아왔으니 아픈 감각을 잊고 살았던 것 같다. 그런데 건강이라는 게 개인의 노력만으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병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오며 그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내 역사를 구구절절 이야기한 이유는, 내가 ‘건강’이라는 관념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하기 위해서다. 나도 모르게, 나는 늘 건강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해왔던 게 아닐까.
그랬기 때문에, 『천장의 무늬』를 쓴 이다울 작가를 만났을 때, 나는 문득 ‘건강한 사람’의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게 아닐까. 병과 함께한 일상을 기록한 작가님에게 물었다. 이 책이 어떤 독자에게 전해졌으면 하냐고. 순간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해보지 않은 건강한 사람’이나 ‘작가님과 비슷한 통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떠올렸던 것 같다. 그러나 작가님의 다음 말을 듣고 내가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을 가르고 있었던 걸 알았다. 작가님은 말했다. “누구나 작든 크든 아파본 경험이 있잖아요.”
모두의 경험을 듣고 싶다는 작가님의 말을 듣고, 비로소 아팠던 날들을 떠올렸던 것 같다. 감기를 달고 살아 소아과를 들락날락거렸던 일, 갑자기 체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던 새벽. 왜 잊고 있었을까. 나 역시 언제든 아플 수 있고 취약한 존재라는 것을. 병의 외부인이 아니라 연루된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픈 경험을 특수한 것이 아닌, ‘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아닌, 공통된 이야기로 묶인 존재로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 후 질병, 돌봄, 노년에 대한 책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을 읽으며, 나는 작가님과의 만남을 종종 떠올렸다. 그 전환의 순간이 내게 가져다준 변화를 떠올리며. 그리고 다음 문장에 밑줄을 그었다.
“‘돌봄위기’ 언설에서 ‘위기’의 주어가 되고 있는 주체들 모두를 ‘나’와 연루시키는 감각이 없기에 이 위기는 ‘위험한 계기’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나의 전 생애’에 걸친 문제로, ‘내 삶의 위기’로 감각하고 지각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회인식이 바뀔 수 있는가?”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 봄날의책, 2020, 20-21쪽.
우리는 모두 아플 수 있는 존재인데, 현재 아픔을 겪는 이들을 ‘개인적인 불행’이나 예외상태로 몰고 있는 게 아닐까?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진지하게 돌봄이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 건강함에서 한 발짝도 빠져나오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늙고 병들 우리의 노년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걸까. 우리는 모두 병에 취약하며 언젠가는 돌봄이 필요하다. 이 단순한 사실을 놀랍게 받아들이며, 나는 비로소 ‘건강 모범생’을 졸업했다.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
출판사 | 봄날의책
천장의 무늬
출판사 | 웨일북

김윤주
좋은 책, 좋은 사람과 만날 때 가장 즐겁습니다. diotima1016@yes24.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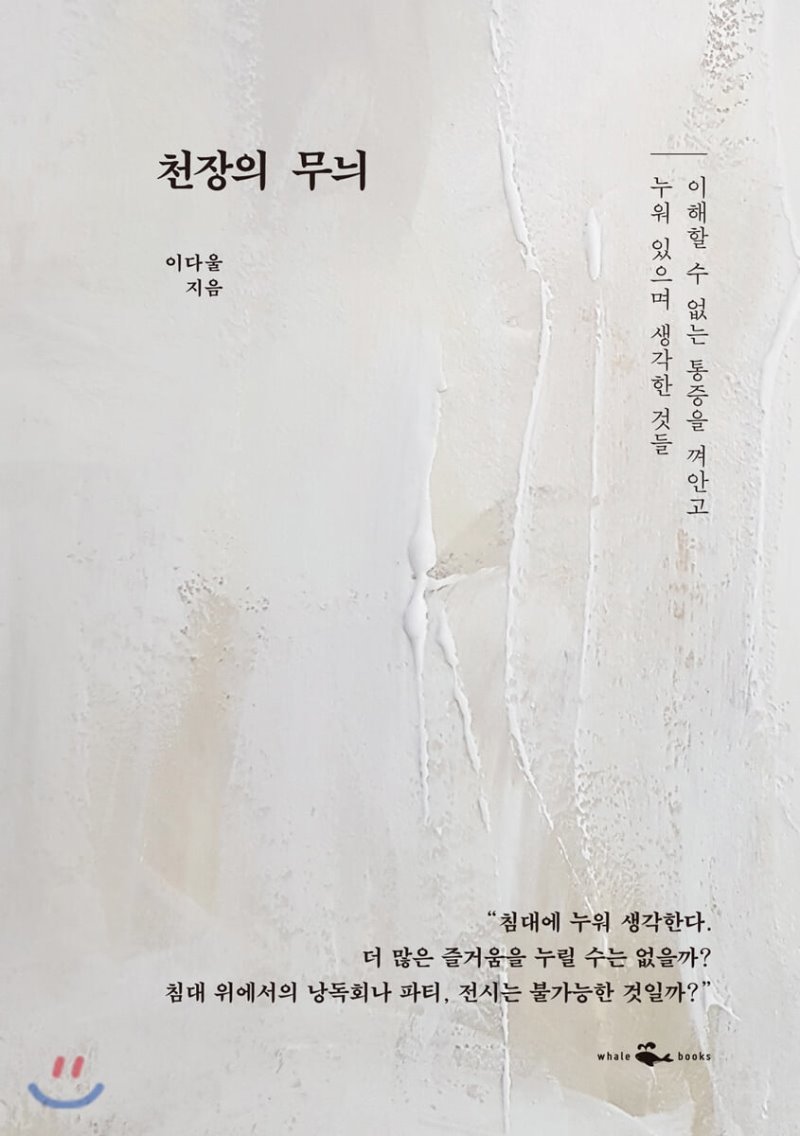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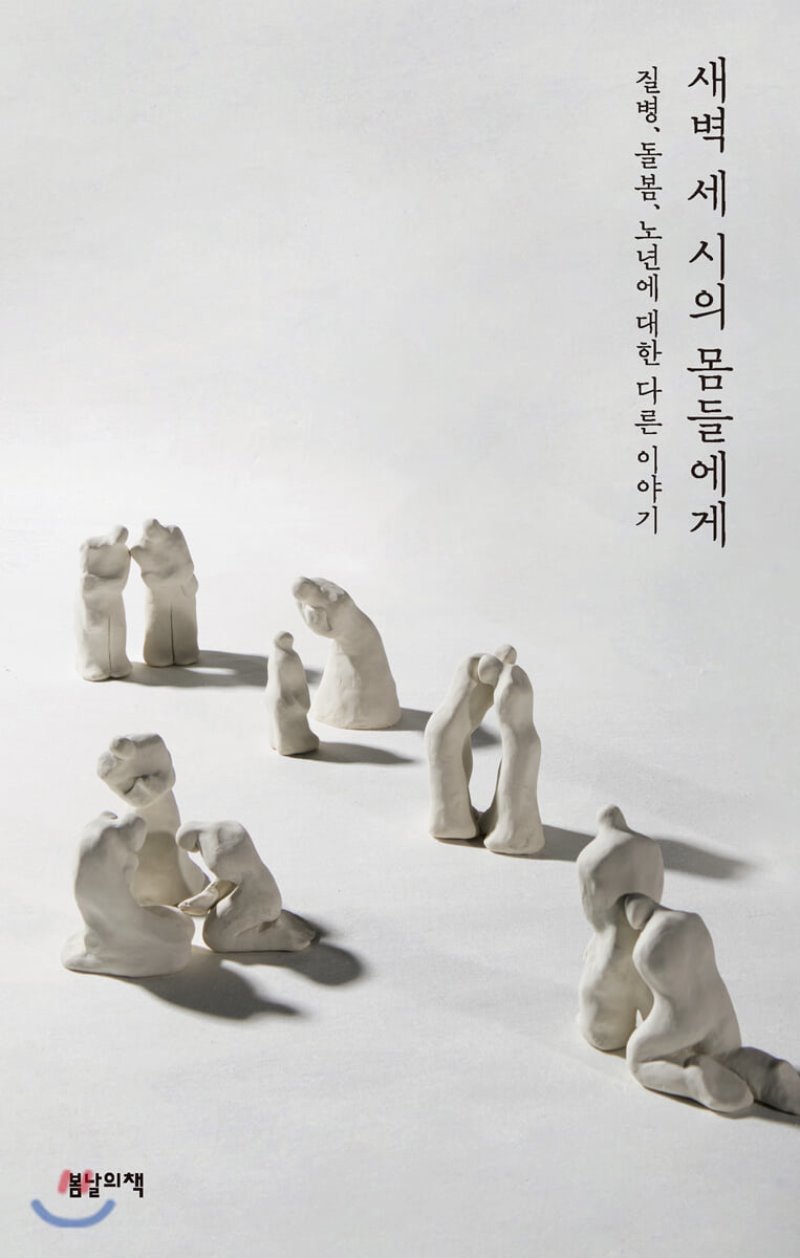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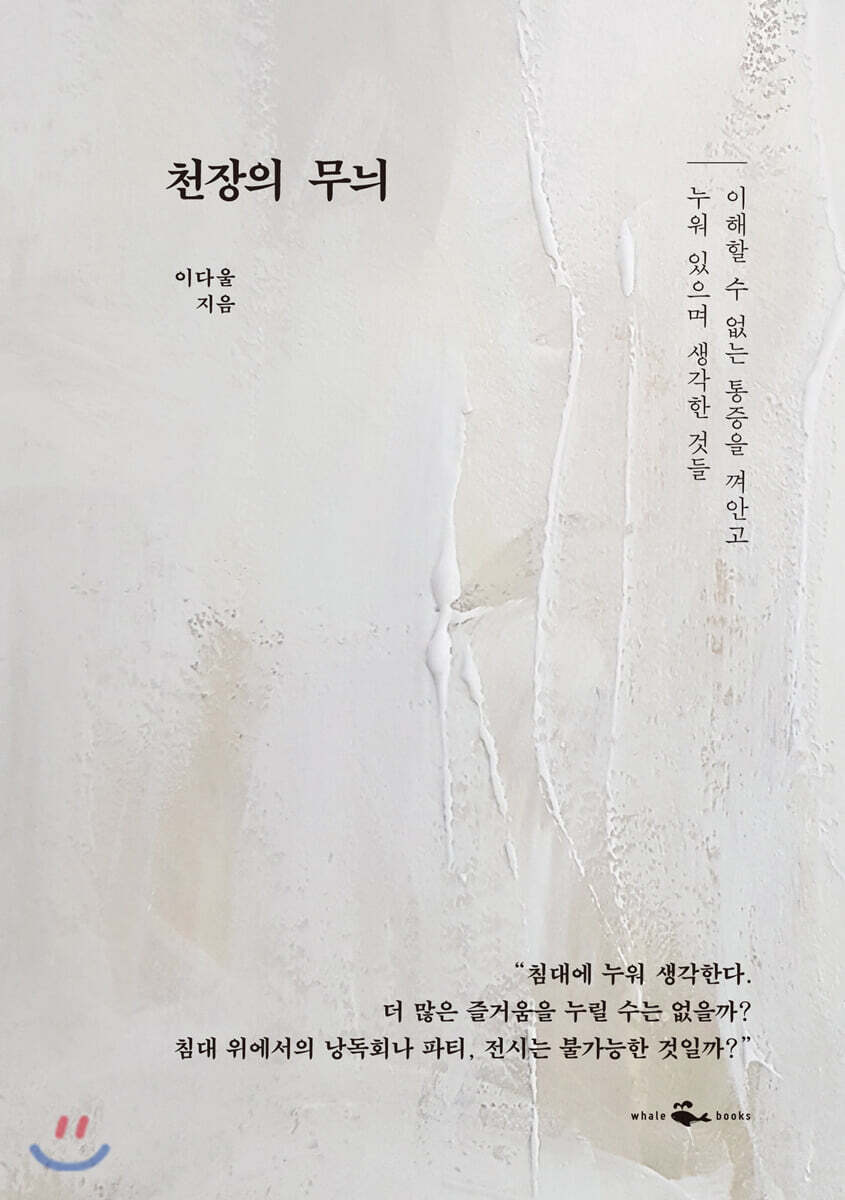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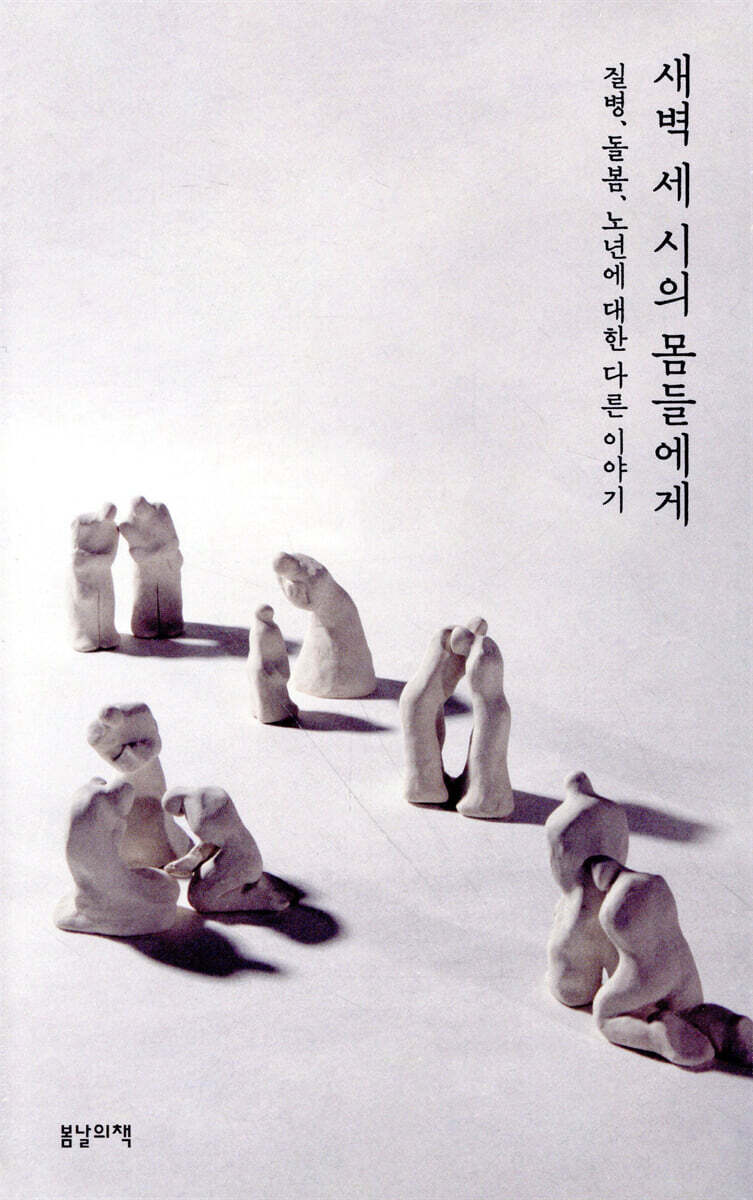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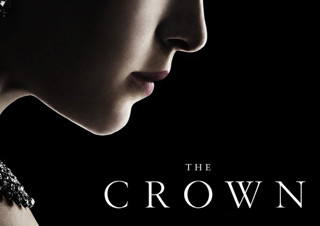



![[취미 발견 프로젝트] 활기찬 일상을 위한 체력 단련](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5/20250530-1549a28e.jpg)
![[이벤트 종료] 새로워진 채널예스 기대평을 작성해주세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1/20241126-81642dcc.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