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경험을 잣대 삼아 세상을 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때 나의 정서와 과거의 나날들을 빗대어 느낍니다. 타인과 말이 오갈 때. 시선이 나눠질 때. 우리는 소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 그건 세상에 나와 당신만 있다면 비교적 쉬운 일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각각의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을 갖습니다. 의견이 모아지면 뉘앙스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비교적 비슷한 사람들의 의견이 만들어내는 분위기. 그런데 이 뉘앙스라는 것이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정확히 정의할 수 없지만 각자의 눈짓으로 알지? 하고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참 매정합니다.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으나 뉘앙스를 맞추지 못했으면 냉정히 부정당하기 때문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주위를 부유하고 있는 공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속으로 스며듭니다. 그 분위기가 지금의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 과연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할 순간을 잃은 채 그대로 섞입니다. 마치 내 뒤에 등을 떠미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분위기를 뚫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만이 최선인양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누군가의 친구라는 이름으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언니라는 이름으로 타인에게 우리를 감싸고 있는 분위기로 어서 들어오라고 생각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야. 보통으로는 살아야지. 이 정도는 해야 해. 보통의 기준. 사는 방식에 대한 옳은 기준. 이것보다는 이렇게 사는 게 더 낫다는 기준. 이 기준은 대체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합의된 걸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가 괜찮은 사람이면 좋겠다는. 지금처럼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주위의 시선들에서 벗어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관계라는 것이 형성됩니다. 관계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나는 타인의 요구와 시선과 요청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비교적 그 세계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뉘앙스와 분위기의 시공간을 적절히 넘나드는 통로의 문에서 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은 나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관계로 가까이 다가갈 때도 있고, 어느 날은 그 관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온전히 나로 서 있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어느 날은 의무를 부여하는 관계로부터 강제 호출을 당하기도 합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말로 말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는 이런 거 갖고 싶지 않아?”
“난 대체 네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사는 게 더 편하지 않아?”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건 당연한 일이건만. 이제는 내가 선택한 것을 유연하게 표현할 수 있는 센스가 생길 만도 하건만. 그러건만. 저는 또 왜 내가 이걸 설명해야 하지. 아니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라는 문제 속에서 눈동자만 굴립니다. 속 시원하게 이렇게 살아도 돼. 뭐가 문제야?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나는 그거 갖고 싶지 않아,라고 단호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나는 지하철의 저 여자가 메고 있는 샤넬백이 정말 갖고 싶지 않은 건지, 이렇게 사는 게 타인과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잘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를 타인에게 이해시키고 싶습니다. 그것이 소통의 시작이니까요. 소통은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이니까요. 그러나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끝끝내 답을 못하고 있는 이런 내가 어느 이의 시선에는 에고가 강한 걸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결국 답을 내리지 못하는 고구마 답답이 한 얘기로군요. 무튼, 그렇다고 저의 사정을 설명해보지만 어쩐지 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대체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풀어놓는 거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야 드디어 왜 이런 이야기를 끌어놓았는지 설명해보겠습니다.
『샤넬백을 버린 날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는 사회적 시선과 타인이 내게 원하는 것에서 우물쭈물하고 단호히 거부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사이다처럼 해결해줍니다. 저자는 자신의 삶으로 사회의 분위기에 강제로 순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멋지게 아우라를 뽐내며 살 수 있다고 증명해 보입니다.
증명, 그것은 우리에게 용기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하는.
-
샤넬백을 버린 날,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최유리 저 | 흐름출판
“진정한 행복은 사회가 정해놓은 암묵적 약속에 순응하지 않는 것에 있었다.”라고 말한다. “나를 찾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죄책감에 함몰되지 말고, 부디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용기를 전한다.
샤넬백을 버린 날,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출판사 | 흐름출판

김경애(흐름출판사 편집자)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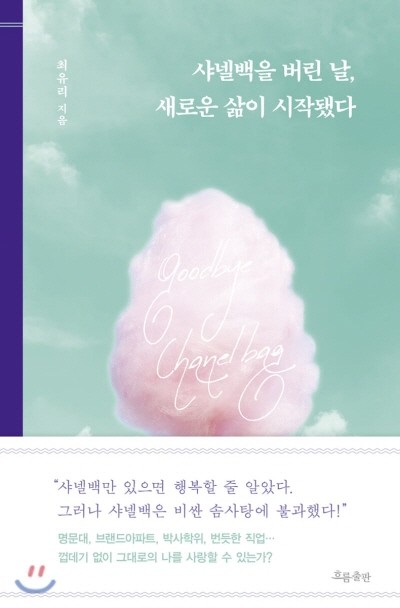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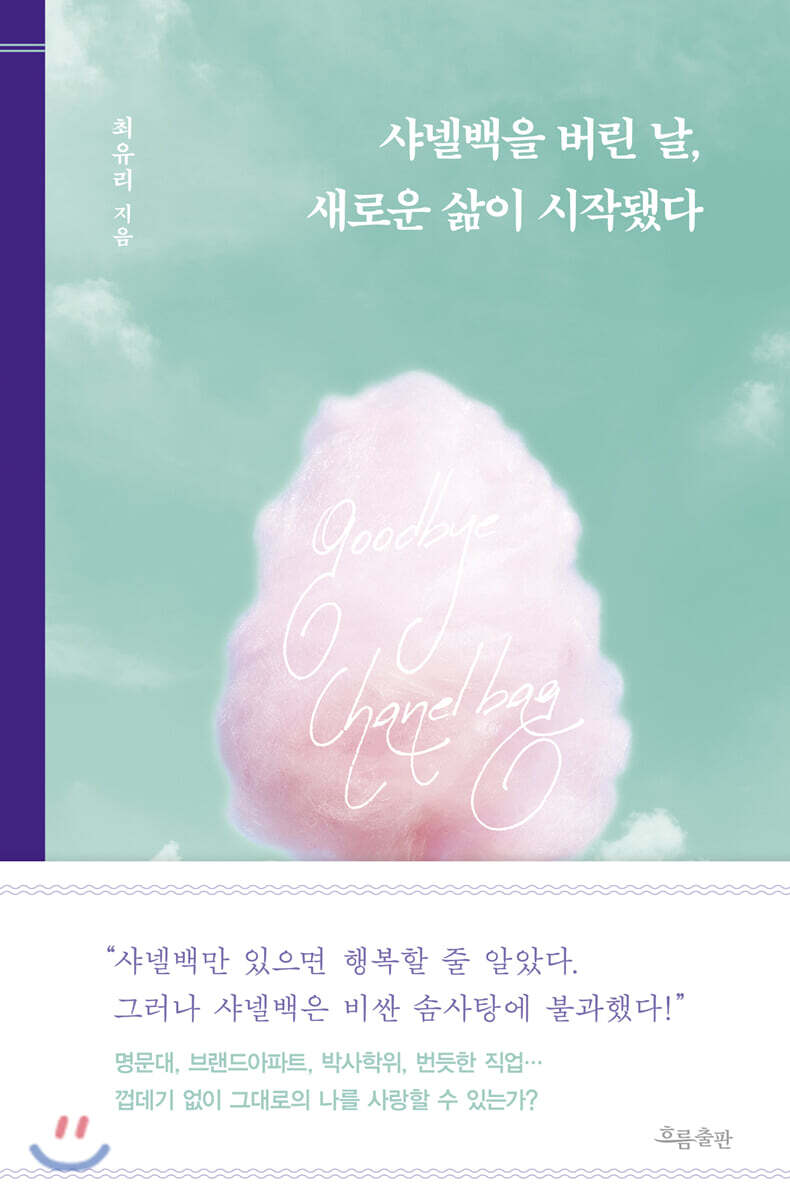




![[김미래의 만화절경] 몸과 몸뚱이와 몸짓](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25-17ec346e.jpg)
![[큐레이션] 문제 해결사로 성장하는 자기 계발 로드맵](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1/20250123-9fb4abd4.png)
![[리뷰] ‘다음’을 기약하는 ‘지금’ 그리고 ‘다행’이 이기는 삶](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2/20241226-1b193bdf.jpg)
![[큐레이션] 노동에 지친 사람들을 위한 필독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2/20241205-f1224690.jpg)
![10월 3주 채널예스 선정 신간 [가정살림/어린이]](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b/0/0/d/b00dfa4a009f8f91a3d3f53b118b3dc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