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가을은 쾌청한 하늘과 유난히 고운 단풍을 선물하며 무더위와 미세 먼지에 지쳐 있던 우리에게 그래도 이만하면 한국이 살 만하지 않으냐고, 아니 인생이 살 만하지 않으냐며 슬쩍 말을 거는 느낌이었다. 단풍은 짙게 물들어 가지만 햇살은 따사로운, 아마도 그해 가을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웠을 어느 하루, 운전을 하던 중 라디오에서 맨해튼 트랜스퍼의 「Let’s Hang On」이라는 곡이 나왔다. 이미 어떤 일에도 감동할 준비가 되어 있던 나는 이보다 더 완벽한 순간은 없을 거라며 감격했고, 이 곡을 들려준 라디오 디제이에게 감사 문자라도 보낼 기세였다. 집에 오자마자 유튜브에서 맨해튼 트랜스퍼를 찾았다. 맨해튼 트랜스퍼는 1970년대에 결성되어 80년대에 전성기를 누린 재즈 보컬 그룹으로, 우리나라에선 「Java Jive」나 「Boy from New York City」 등이 한때 큰 인기를 끌었다.
아마도 미국 뉴욕이나 시카고의 호텔 라운지에서 펼쳐졌을, 붉은색 드레스에 커다란 링 귀고리를 한 여성 보컬 두 명과 턱시도를 입은 남성 보컬들이 어깨춤을 추며 화음을 만드는 무대를 보다가 “이 장면에 정확히 어울리는 단어가 있는데…”라며 중얼거렸다.
‘퀸터센셜(quintessential)’은 번역하다가 곧잘 만나는 단어다. 필수적인, 본질적인의 ‘에센셜(essential)’에 5번째라는 뜻인 ‘퀸트(quint)’가 붙은 단어로, 제5원소를 의미하기도 하나 보통은 ‘전형적인, 정수의, 진수의’ 의미로 쓰인다. 그저 typical이 아니라 perfectly typical 해야 한다. 대체로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물, 시대, 장소, 사람의 ‘전형성, 본질, 대표성’을 강조할 때 들어가면 안성맞춤이다.
마르시아 드상티스의 『프랑스와 사랑에 빠지는 인문학 기행』 을 번역할 때도 이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 저자는 영화 <아멜리에> 뒤에 ‘quintessentially Paris’라는 말을 덧붙였고 나는 “지극히 파리다운 영화 <아멜리에>”라고 옮겼다.
아직은 출간되지 않은, 스포츠 팬을 주제로 한 책에서 포틀랜드의 한 청년을 묘사할 때도 이 단어가 나왔다.
“낡고 헐렁한 갈색 코듀로이 셔츠를 입고 안에도 셔츠를 겹쳐 입는다. 그가 자기만의 개성을 위해 사용하는 유일한 아이템은 모직 베레모다.” 저자는 이렇게 설명한 후 이 룩이 ‘quintessential 1990s Portland’라고 했고, 나는 고민하다가 “1990년대 포틀랜드 대표 길거리 패션”이라 옮겼다.
사람을 나타낼 때도 쓰이지만 최근엔 1990년대 음악이라든가 뉴욕의 대표 식당 등 어떤 장소나 시대의 특징을 묘사할 때 자주 등장하는 느낌이다.
1990년대 중반에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미국 캘리포니아로 어학연수를 갔다. 당시 어울리던 친구들이 간다기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유학원에서, 아무 데나 괜찮아 보이는 학교를 골라서 간, 참으로 대책 없는 연수였다. 한국의 캠퍼스에서도 적응하지 못해 외톨이 문학소녀로 살던 내가 샌타바버라 해변으로 간다고 해서 샌타바버라적인 성격으로 변신할 리 만무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미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연수가 실패라는 것을 직감했다. 일단 학원비와 생활비가 생각보다 너무 비쌌고 당시 부모님 사업도 잘되지 않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송금을 부탁할 때마다 죄송하기 그지없었다. K마트에서 신용 카드를 잃어버렸고 아마도 미국인일 한 작자가 그 카드로 2,000달러가 넘는 전자제품을 샀다(분실 신고를 한 덕분에 내가 지불하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해변에 갔다가 친절한 남자를 만나 한참 이야기를 했고, 영어가 늘었으니 오늘 하루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순간, 그는 포르노 잡지를 보여 주며 자기 트레일러로 가자고 했다.
1학년 1학기 학점이 그렇게 나쁘지만 않았다면, 그래서 어학연수가 아니라 교환 학생으로 왔다면 나는 캠퍼스에 딸린 학원이 아니라 캠퍼스에서 공부할 수 있었을 것이고, 부모님에게도 당당했을 것이라며 매일 후회했다.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하고 후회하는 나의 패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캘리포니아의 햇살과는 상반되는 칙칙한 생각에 빠져 샌타바버라 주립대학교의 도서관과 캠퍼스를 배회하다 후문 근처 골목의 중고 음반 가게에 들어가 산 음반이 바로 그 유명한, 1990년대를 대표하는 앨라니스 모리셋의 첫 앨범 <재그드 리틀 필(Jagged Little Pill)>과 그린데이의 <두키(Dookie)> 앨범 두 장이다.
아마 그 시절 팝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이 음반이나 노래를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앨라니스 모리셋의 앨범엔 「Ironic」과 「You Oughta Know」, 그린데이의 앨범에는 「Basket Case」와 「She」 「Burnout」 등이 실려 있다. 나는 이 두 앨범의 곡 순서를 지금도 기억한다. 파나소닉 CD플레이어에 이 음반 두 개를 번갈아서 넣고 공원에 누워서, 자전거를 타면서 듣고 듣고 또 들었기 때문이다.
영어도 배우지 못하고, 친구를 사귀지도 못하고, 괜히 다른 지역으로 옮겨 더욱 외로움에 몸부림치다 9개월 만에 돌아왔던,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학연수가 지금까지 내 몸에 남긴 선명한 자국은 그 음반과 노래들이다. 그 안에는 공원에 누워 이파리 하나 물고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보던 20대 초반의 내가 있다. 이제는 라디오에서도 잘 나오지 않는, 추억의 히트곡이 된 노래들을 들으며 중얼거린다. “너무나 전형적이고 너무나 완벽하게 1990년대다. ‘quintessential’ 하다. 1990년대 자체다.” 속절없이 어설프고 가끔 사무치게 그립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 말이다.

노지양(번역가)
연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KBS와 EBS에서 라디오 방송 작가로 일했다. 전문번역가로 활동하며 《나쁜 페미니스트》, 《위험한 공주들》, 《마음에게 말 걸기》, 《스틸 미싱》, 《베를린을 그리다》, 《나는 그럭저럭 살지 않기로 했다》 등 60여 권의 책을 번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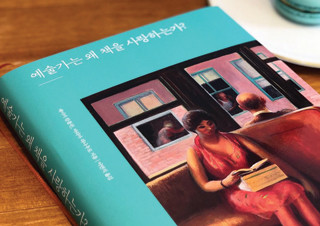
![[더뮤지컬] 너와 나, 우리의 이야기…뮤지컬 <렌트> 프레스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1/20251114-59edf841.jpg)
![[에디터의 장바구니] 『계속 읽기』, 『김혜순 죽음 트릴로지』 외](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07-e6d95ade.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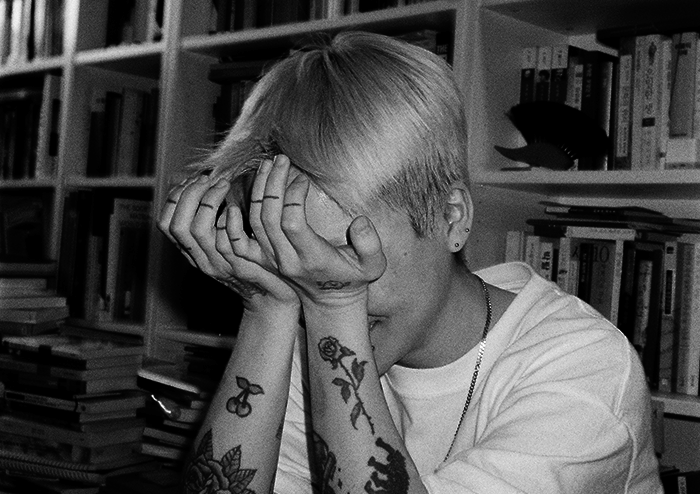

![[큐레이션] 문제 해결사로 성장하는 자기 계발 로드맵](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1/20250123-9fb4abd4.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