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 목요일, <채널예스>에서 소설가 문지혁의 에세이 ‘소설 쓰고 앉아 있네’를 연재합니다. |
 언스플래쉬
언스플래쉬
"영감을 어디서 얻으세요?"
'작가라면 누구나 듣게 되는 질문 리스트' 같은 것을 만든다면 아마 위쪽 다섯 순위 안에 반드시 이 질문이 들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기대하시나요? 영감을 얻을 만한 구체적인 장소나 시간? 특별한 행동 혹은 의식? 참고도서나 데이터베이스의 존재? 아무도 예상 못 한 자신만의 묘수?
누군가가 이렇게 대답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 저는 음악을 듣습니다. 뭐 대단히 특별한 건 아니고요, 리 코니츠의 10인치 음반을 턴테이블에 올려놓는 거죠.* 일종의 의식이랄까요.
이런 대답이라면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대단히 특별한 취향을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는 방식으로 에둘러 우쭐거리고 있다는 점만 빼면 말이죠.
이런 대답은 어떤가요.
— 책상 앞에 앉아 영감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이 또 있을까요? 나는 여행을 떠납니다. 빈 가방을 들고요. 돌아올 땐 뭐든 거기 가득 채워서 오리라는 기대를 품고서 말이죠.
마찬가지로 납득은 가지만 다소 지루한 대답이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작가와 영감에 관한 클리셰 사전' 같은 책이 있다면 거기 실려 있을 것 같은 대답이죠. 음악만큼이나 여행도 영감을 말할 때 흔히 동원되는 핑계 중 하나니까요. 실제로는 낯선 곳에 가서 빈둥거리다 돌아오는 게 전부라고 해도, 작가는 돌아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 이번 여행은 완전히 실패야. 하지만 하나 건진 것도 있지. 이제야 비로소 쓸 준비가 됐거든!
솔직히 말해 저는 이런 종류의 대답들이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감을 핑계 삼아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닐까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실제 대부분의 작가들은 그런 식으로 작업하지 않거든요. 적어도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렇습니다.
"영감을 찾는 사람은 아마추어이고, 우리는 그냥 일어나서 일을 하러 간다."
필립 로스의 장편 소설 『에브리맨』에 등장하는 이 유명한 구절은, 실은 화가이자 시각 예술가인 척 클로스가 이야기했다고 전해지죠. 저는 이 말이 매우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감'이라는 말은 근사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실제 일을 할 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일상과 비슷해요. 출근길마다 일을 위한 영감을 얻으시나요? 그럴 리가요. 회사에 들어가 자리에 앉을 때까지도 우리는 일하고 싶지 않은 마음뿐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프로페셔널이기에, 자리에 앉고 나서는 말없이 그날 해야 할 일을 시작합니다. 생각? 느낌? 영감? 그런 것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행위이자 의무를 다하는 일, 일종의 존재 증명이니까요.
글쓰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잭 런던의 말은 조금 더 공격적이니까 인용해 볼까요.
"영감이 떠오르기를 기다려선 안 된다. 몽둥이를 들고 쫓아가야 한다."
물론 이렇게만 말한다면 무책임한 일이 될 겁니다. 영감 따위 없으니까, 그냥 쓰세요. 불친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심지어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영감을 기다리거나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영감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것입니다.
영감은 있다. 그렇지만 글을 쓸 때 그걸 찾아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냐고요? 글을 '쓸 때'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글을 '쓰기 이전에' 영감을 찾아놓아야 합니다. 책상에 앉기 전에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어디에?
바로 우리 내면의 냉장고에요.
이제부터 소개하려는 것은 제 가설입니다. 아직 이름이 없으니까 '냉장고 이론'라고 해보겠습니다. 텔레비전의 요리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면 레시피를 잘 따라가다가도 간혹 의아한 순간이 생기기 마련이죠. 셰프 선생님이 냉장고를 열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재료를 꺼내며 이런 말을 할 때 그렇습니다.
— 여러분, 다들 냉장고에 이런 거 하나씩은 있으시죠?
'5분 만에 뚝딱 완성하는 요리' 같은 제목도 기만적입니다. 왜요? 셰프의 냉장고 속에는 필요한 모든 재료들이 구비되어 있거든요. 잘 세척되고, 손질되고, 소분된 채로요. 셰프 말대로 요리를 하려다가는 5분이 아니라 50분도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일단 마트부터 다녀와야 하잖아요. 화면 바깥, 현실에서의 우리 냉장고는 텅 비어 있으니까요.
글쓰기도 이와 똑같습니다.
소설가는 소설을 쉽게 쓸까요? 대부분의 소설가는 아니라고 말하겠지만,(그리고 그게 꼭 거짓이나 기만인 것만도 아닙니다. 쓰는 일은 언제나 고통스러우니까요) 분명 소설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보다는 쉽게 쓸 겁니다. 그게 근육이고, 숙달이고, 훈련과 연습을 통해 얻어지는 기술이니까요. 전문가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방금 전 우리가 본 셰프의 냉장고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레시피는 동일해요. 게다가 대부분의 레시피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비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냉장고에 무엇이 들어 있는가, 그리고 필요할 때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꺼내 쓸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영감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때론 한강을 건너는 버스 안에서, 누우려고 막 불을 끈 직후에, 지하철의 환승 통로에서, 욕실에서 샤워를 하거나 거리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그럴 때마다 아마추어는 영감을 흘려보내고, 프로는 영감을 붙잡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잘 씻어서 소분한 뒤 우리 내면에 있는 냉장고에 저장해 두는 것이지요.
제 생각에, 영감을 붙잡아 두기 위해 메모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툴이나 앱을 사용하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노트, 다이어리, 핸드폰, 녹음기, 노트북, 냅킨, 아니면 손바닥...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적어놓고, 나중에 알아보고, 이후 정리하고 분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주로 아이폰의 기본 메모장을 사용하는데요, 클라우드를 통해 태블릿이나 노트북과 거의 실시간으로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으로 먼저 아무렇게나 쓰고,(맞춤법 준수나 논리의 연결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태블릿이나 노트북으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다양한 영감들은 평소에는 냉장고 속에 잘 보관되어 있다가, 나중에 글쓰기를 해야 할 때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제목으로, 인물로, 문장과 메타포로, 사건과 플롯으로, 도입이나 결말로, 심지어는 표지 문구나 작가의 말로도 쓰입니다. 해당 영감이 글쓰기의 어떤 부분에 어떤 식으로 사용될지는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더 많은 영감을 채집하고 기록하고 보관하는 일입니다. 요리가 시작될 때 허겁지겁 마트에 가야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내면의 냉장고를 깨끗하고 신선한 영감으로 꽉꽉 채워놓는 일입니다.
*이것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 소설 『렉싱턴의 유령』 속 화자의 말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물론 하루키 선생님이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문지혁
2010년 단편소설 「체이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장편소설 『중급 한국어』 『초급 한국어』 『비블리온』 『P의 도시』 『체이서』, 소설집 『우리가 다리를 건널 때』 『사자와의 이틀 밤』 등을 썼고 『라이팅 픽션』 『끌리는 이야기는 어떻게 쓰는가』 등을 번역했다. 대학에서 글쓰기와 소설 창작을 가르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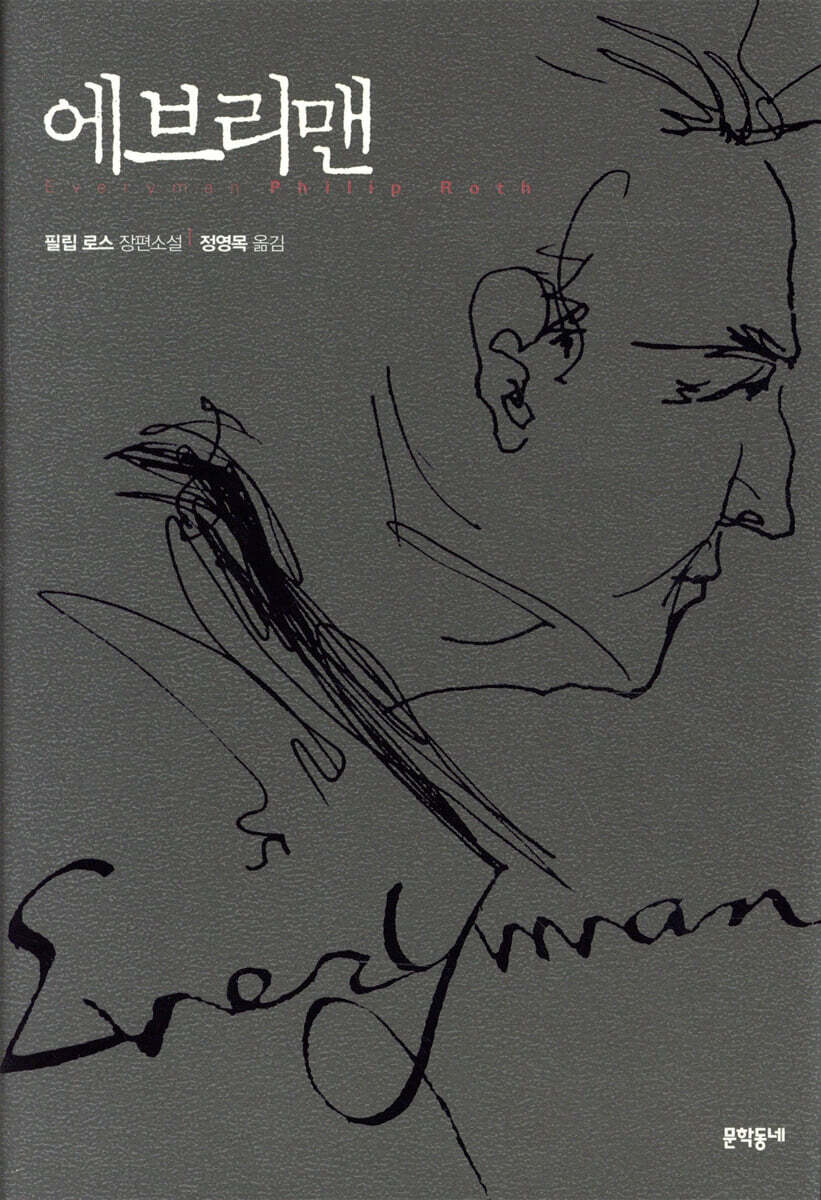

![[문지혁의 소설 쓰고 앉아 있네] 글쓰기에 관한 세 가지 오해 (2) | 예스24 채널예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5/5/0/1/5501731b040b8974c581827f40c7f8b7.jpg)
![[문지혁의 소설 쓰고 앉아 있네] 글쓰기에 관한 세 가지 오해 (1) | YES24 채널예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f/f/e/7/ffe7e41ab578704ce1ed0b8319fa3830.jpg)
![[문지혁의 소설 쓰고 앉아 있네] 소설을 쓰고 앉아 있는 사람 | YES24 채널예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0/4/2/f/042fed8f026465e9420529c1da7f1563.jpg)


![[취미 발견 프로젝트] 독서하고 싶은 공간 만들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2/20250226-346177ac.png)

![[Read with me] 더보이즈 주연 “성장하고 싶을 때 책을 읽어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2/20241219-0fe5295b.jpg)
![[이벤트 종료] 새로워진 채널예스 기대평을 작성해주세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1/20241126-81642dcc.jpg)






miju20
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