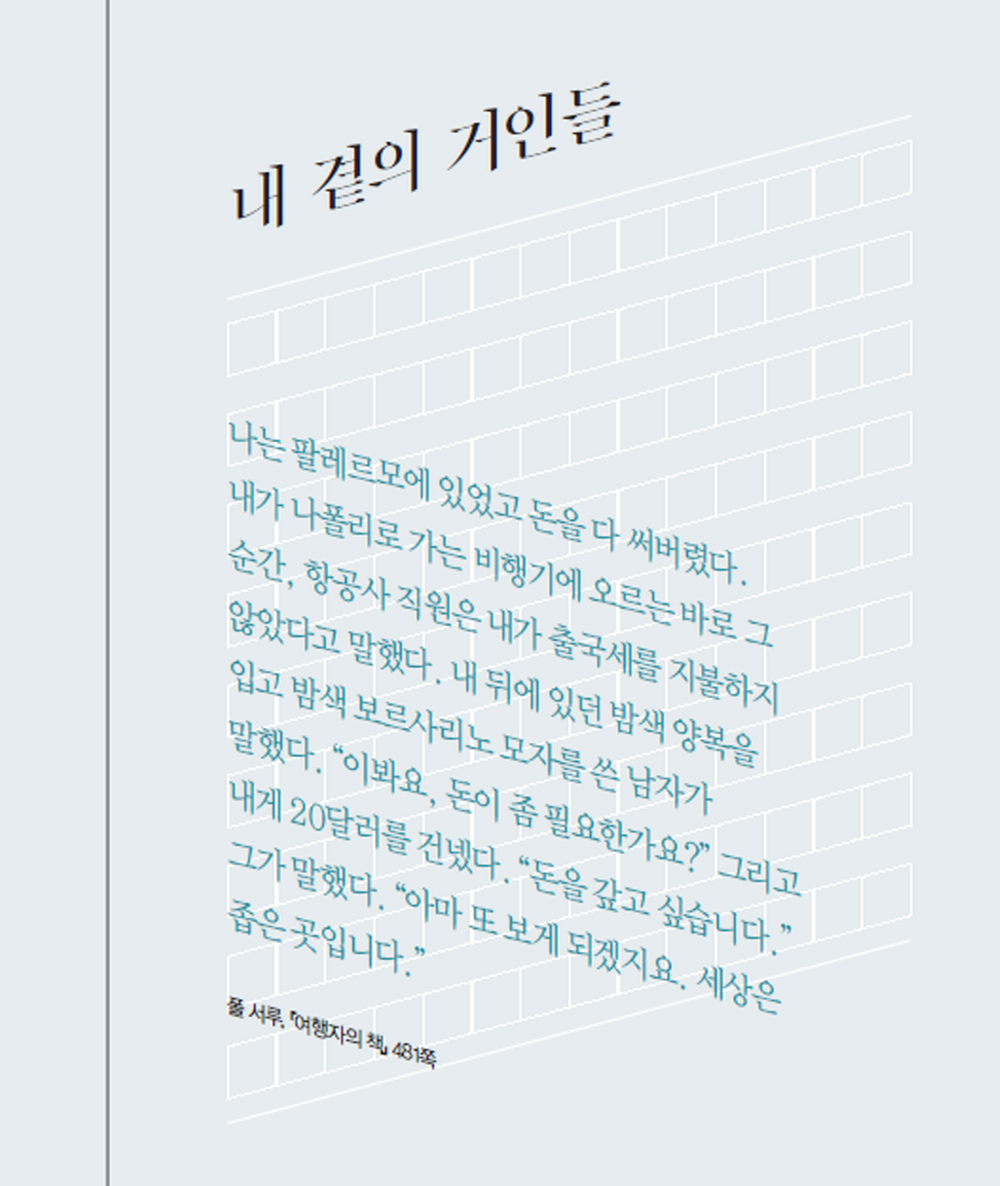
나는 팔레르모에 있었고 돈을 다 써버렸다. 내가 나폴리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는 바로 그 순간, 항공사 직원은 내가 출국세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 뒤에 있던 밤색 양복을 입고 밤색 보르사리노 모자를 쓴 남자가 말했다. “이봐요, 돈이 좀 필요한가요?”그리고 내게 20달러를 건넸다. “돈을 갚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다. “아마 또 보게 되겠지요. 세상은 좁은 곳입니다.”
- 폴 서루 『여행자의 책』 481쪽
굿모닝 썬, 이라니. 그것은 괴로운 밤의 뚱단지였다.
카피라이터를 의사나 변호사처럼 국가고시를 거치게 하는 거지. 그러면 9수 끝에 드디어 카피라이터가 되는 사람도 생기고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카피라이터 국가고시를 패스했다고 모교에 플래카드도 걸릴 거야. 무엇보다 오늘 같은 일은 없지 않겠어? 오래 고민하고 유레카를 외치며 찾아낸 카피 아이디어가 똥물을 뒤집어 쓴 날이었다. 함께 고생한 후배가 안쓰러웠던 나는 돌아오는 길, 그에게 쓴웃음이라도 만들어주려고 카피라이터 국가고시라는 싱거운 상상을 그렇게 늘어놓고 있었다. 후배는 희미하게 웃을 뿐 말이 없었다. 축 쳐진 그를 들여보내고 혼자 불 꺼진 사무실에 앉아 정지된 파도를 바라보던 중이었다.
모니터 바탕화면을 세계의 풍경으로 설정해 두었는데 그날 그게 어느 더운 나라의 바다였다. 화면을 클릭하면 그게 어느 나라인지 비치의 이름은 뭔지 알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클릭하면 책상 위로 파도가 쏟아져 들어와 서류며 책이며 만년필들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기라도 할까봐 두려웠을까.
카톡이 울렸고 들어가라는 유튜브 링크를 따라갔더니 굿모닝 썬, 이었던 것. 처음 듣는 노래가 파도만 환하던 그 밤의 마음 어딘가를 흔들고 있었다. 아직 퇴근을 안 하고, 카톡 답도 없고, 오늘 중요한 일 있다고 했었고, 그래서 일이 잘 안 됐나 보다, 실은 뭐 안 좋은 일이 겹쳐서 힘든 날이었는데 아빠가 훨씬 더 힘들겠지 싶었고, 내가 힘들 때 듣던 음악인데 아빠도 좋아할 거 같아서 들어보라고 보냄. 녀석은 알고 있었을 거다. 내가 가사를 찾아보며 여러 번 들을 거라는 걸. Ben Folds의 Still fighting it을 아들에게서 배웠다.
세월이 흐르고 감자튀김을 먹는 아들은 자라 20년 후 쯤엔 같이 맥주도 마시게 되겠지만 인생의 맑은 날과 비 오는 날 모두 우리는 싸우는 중일 거라며 어른이 된다는 건 누구나에게 엿 같은 거라고, 아비는 노래하고 있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제 힘으로 밥을 번다는 것이 아닐까. 세상에 나가 무슨 일을 하든 어른이 되어 밥을 번다는 건 때로 뜻하지 않은 똥물을 뒤집어쓰기도 하는 것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엿 같은 기분을 툭툭 털어버리고 다시 씩씩하게 싸움에 나서는 것임을, 무엇보다 내가 어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걸 나는 배웠다.
내가 하는 광고라는 일은 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15초라는 살인적으로 짧은 시간을 주매체로 하는 TV 광고든 유튜브나 네이버 같은 디지털 미디어에 노출되는 바이럴 콘텐츠든 그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려는 구체적인 작업이 광고다. 광고만 그럴까?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 오랜 인연이 되기도 하고 다시 만날 일 없는 한두 번의 스쳐가는 인연에 그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갖는다. 인상이라 하면 한순간 잘 보이면 될 일 같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다. 어떤 브랜드도 벼락치기로 좋은 인상을 만들 수는 없다. 나이키도 신라면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람도 그렇다.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해 평소 어떤 태도로 살아왔느냐 하는 것이 결국 한순간의 인상을 결정 짓는다.
광고 일을 하며 클라이언트와 모델로 셀럽이라 할 만한 분들을 많이 만났다. 인정하기 싫지만 광고는 우리 사회에서 을의 비즈니스다. 셀럽들에겐 그다지 존중의 태도가 필요하지 않은 일의 영역이라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카피라이터가 똥물을 뒤집어 써야 하는 일도 더러 생기게 되는 것인데,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카피라이터인 내게 오래도록 좋은 인상으로 기억되는 분들이 있다. 배우 김혜수 씨, 백종원 씨 같은 분들이 내겐 그렇다.
백종원 씨는 처음 만난 나에게 명함을 먼저 건네며 눈을 맞추고 인사했다. 아주 사소한 디테일이었지만 겸손하며 타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는 인상을 주었다. 김혜수 씨는 촬영 현장에서 어떤 요구에도 프로답게 흔쾌했을 뿐만 아니라 일이 끝나고 스탭들의 사인 요청에도 다정한 농담까지 얹어주는 세심함이 그녀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런 분들을 보며 진짜 어른이란 그렇게 타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는 것을 배웠다.
후배 K는 같이 일하다 헤어진 십년 전부터 스승의 날이면 내게 꽃을 보낸다. 처음 꽃을 보내며 K는 이렇게 썼다. “생각해보니까 스승의 날이 교사의 날은 아니더라고요. 하하하. 나한테 스승이 누군지 생각해봤죠.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렇구나. 모교의 은사만 스승은 아니지. 내 스승은 내가 발견하는 거로구나. K에게 나는 배웠다.
정치인들이 존경하는 인물로 이순신을 언급하는 걸 볼 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그가 이순신 같은 인물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어쩌면 그에게 중요한 건 이 시대의 이순신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조 같은 인물이 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게 아닐까? 무슨 노력을 통해 정운, 정걸, 나대용, 송희립처럼 이순신의 시대에 묵묵히 그리고 훌륭히 자기 일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바를 해냈던 분들을 닮아갈 수 있을까, 뭐 그런 게 아닐는지. 이 시대 일하는 우리가 스티브 잡스 같은 인물이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아니, 그런 사람과 같이 일할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혹여 그렇게 된다한들 그것은 반드시 좋은 일인가?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저 멀리 스티브 잡스를 바라볼 게 아니라 내 눈 앞의 동료,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 할 사람, 삼성전자나 구글이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있는 이 회사에서의 나, 가 아닐까?
다시 만날 인연은 아닐 것 같은 이에게조차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어깨 한번 으쓱 하고 20달러를 건네 준 밤색 보르사리노 모자를 쓴 남자가 말하고 있지 않는가, 세상은 좁은 곳이라고. 나를 성장시킬 나의 스승, 내 인생의 거인들은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다. 나 또한 이 좁은 세상 내 곁의 사람들에게 그의 스승, 그의 거인이 되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 싸우고 배우며 반드시 지금 여기서 행복해야 한다고, 나는 내 일과 삶에서 그렇게 배웠다.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이원흥(작가)
<남의 마음을 흔드는 건 다 카피다>를 쓴 카피라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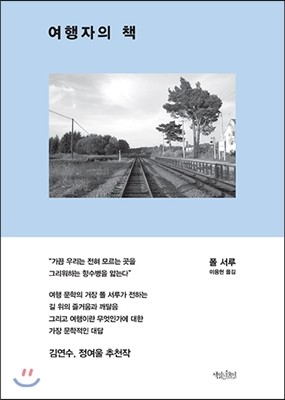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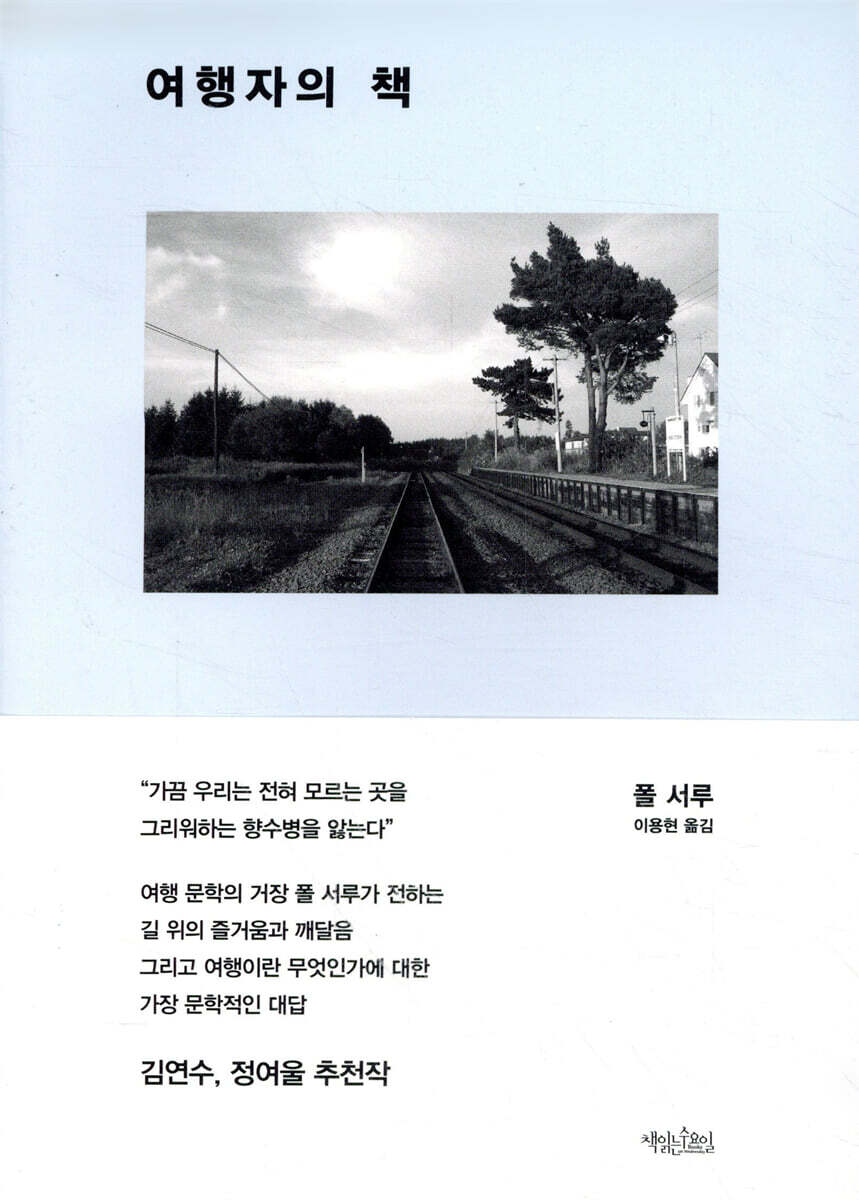
![[이원흥의 카피라이터와 문장] 고양이, 박완서, 그리고 맥주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a/3/2/b/a32b325db61886eaa77777ccb785ce23.jpg)
![[이원흥의 카피라이터와 문장] 신입사원이 된 딸에게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d/c/5/3/dc534210104bdfce4f07c105c3a75be0.jpg)
![[이원흥의 카피라이터와 문장] 걱정하는 자와 민주주의자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2/2/2/5/2225f23e2d4c588107bdc986121256e4.jpg)

![[인터뷰] 이병률 “저는 돌아오기의 달인인 것 같아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1/20251111-3048a535.jpg)









Summmmmmmer
2021.10.01
감사합니다.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