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무, <콜라 마시는 아이>, 출처 : https://alchetron.com/Sun-Mu
영화 <강철비> 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은 쿠데타를 피해 ‘북한 1호’와 함께 얼떨결에 남한에 온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짧은 식사시간이었다. 그들은 ‘북한 1호’의 응급처치를 맡은 남한 의사가 챙겨준 햇반과 인스턴트 음식을 먹으며 “이밥, 이밥!”이라고 환호한다. 남한 의사는 ‘이밥’이라는 말을 금방 알아듣지 못한다. 이런 상황은 후에 남쪽 철우와 북쪽 철우가 함께 수갑을 차고 국수를 먹는 장면에서도 반복된다. 북쪽 철우가 “깽깽이 국수가 참 맛있소.”라고 할 때 남쪽 철우는 ‘깽깽이 국수’가 무슨 말인지 몰라 그저 멀뚱멀뚱 바라볼 뿐이다. 반 세기 이상 분단국가로 지내왔기에 우리는 이제 서로의 말을 알아듣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북한 사람들은) 이밥에 고깃국 먹소!”라고 북쪽 철우는 말하지만 이는 지극히 일부의 식단임을 대부분 안다. 김일성은 이미 1950년대에 모든 인민이 이밥에 고깃국을 먹고 비단옷을 입을 수 있는 국가가 실현될 것이라 장담했다. 그의 목표는 여전히 달성되지 못했다. 영화 속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이밥’에 환호하다가 이내 북에 있는 가족들 생각에 서글퍼하듯이, 북한은 여전히 UN에서 지정한 식량부족국가이다. 미국 워싱턴의 국제식량정책연구소의 ‘2016 굶주림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전체인구의 41.6%가 영양실조 상태다. 21%였던 1990년에 비해 영양실조 인구가 두 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특히 기본적인 곡물생산이 부족하여 옥수수죽을 많이 먹는다니 ‘이밥’은 실로 귀할 것이다.
한때는 남한에서도 ‘이밥에 고깃국’은 잘 사는 집의 상징이었다. 맛없는 쌀인 정부미를 모르는 세대에게 이밥이란 단어도 낯설 것이다. 남한에서는 박정희가 그 이밥에 고깃국을 먹게 해줬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다. 박정희 덕분에 보릿고개를 넘겼다고 한다. 박정희가 일명 ‘통일벼’나 ‘유신벼’를 보급하며 쌀의 자급자족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한 품종을 강제하는 농정으로 인해 정작 농가는 빚더미 위에 올랐다. 기존의 쌀과 다른 쌀을 재배하기 위해 농민들이 융자를 안고 농기계를 마련하고 설비를 갖춰야 했기 때문이다. 70년대를 관통하며 농가 부채는 10년 사이 27배로 증가했다.
남한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하얀 쌀밥의 가치는 전과 달라졌다. 오늘날은 건강을 위해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식재료가 다양해진 시대에 탄수화물이 많은 밥 자체가 예전과 같은 위상을 갖지 못한다. 이제는 밥을 봉긋 솟은 무덤처럼 ‘고봉으로’ 올려 담는 시대가 아니다. 30년 전에 비하면 한국의 쌀소비는 반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육류 소비는 4배로 늘었다. 적은 양으로 고기맛을 볼 수 있는 고깃국보다는 육질을 직접 씹을 수 있는 요리를 많이 먹는다. 그러니 ‘이밥에 고깃국’은 남한에서 부의 상징이 아니다.
이제는 먹거리도 각종 수입산이 뒤섞였다. 식재료의 수입뿐 아니라 외국 요리를 한국 안에서 접할 기회도 많다. 서울에는 세계의 식탁이 모여있다. 한국 바깥도 마찬가지다. 나는 인구 5만이 안 되는 미국의 한 작은 도시에 살고 있지만, 이런 곳에서도 월마트에 가면 신라면과 너구리가 있다. 식료품점에서 파는 김치도 매운 맛과 덜 매운 맛으로 나뉘어 있다. 일본 식당에 가면 열 살 정도 되어 보이는 백인 아이가 젓가락으로 우동을 먹는 모습을 본다. 사람들은 지역과 국가 사이를 활발히 이동하고 그 이동에는 음식도 함께 따라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정작 가장 가까운, 유일하게 육지로 연결된 나라이며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북한의 식문화는 우리에게 낯설다. 가장 가까운 타자. 서울에서 미국 남부 가정식 요리를 먹을 수는 있어도 북한 요리는 잘 떠오르지 않는다. 가장 흔하게 먹는 냉면과 만두, 속초에서 먹었던 아바이 순대 등이 떠오르지만 정작 함흥에는 함흥냉면이 없다고 한다. 북한에 가본 적 없는 내게도 얼마나 많은 편견이 틀어박혀 있을까. 아무리 의식적으로 편견과 고정관념에 맞선다고 하지만 한계는 분명했다. 북한 음식 전문가이자 흔히 ‘최초의 탈북 여성 출신 박사’라는 수식어가 따라오는 이애란의 『북한식객』 에서 길거리 음식이라는 ‘두부밥’이란 음식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오, 북한도 길거리 음식이 있어?
 |
 |
『황석영의 밥도둑』 에는 작가가 북한에 갔을 때 김일성과 함께 언감자국수를 먹었고, 뜨끈한 온반을 먹었던 기억이 담겨 있다. 80년대 북한을 방문했고 『루이제 린저의 북한 방문기』를 남기기도 한 독일 작가 루이제 린저도 북한에서 김일성과 이 언감자국수를 먹었다고 한다. 황석영의 묘사에 따르면 거무튀튀한 면발이 차지고 쫄깃하다고 한다. 그 위에 갓김치를 올려놓은 국수의 맛은 어떤 맛일까. 감자전의 그 쫀쫀한 식감일까.
정부에서 식량을 일정하게 배급하는 북한의 식량배급제는 음식문화의 획일화를 가져오고 기존의 역사를 단절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식재료를 얼마나 배급받느냐가 곧 자신의 계급을 말해준다. ‘음식 권력’은 그렇게 형성된다. 매일 옥수수죽을 먹는 서민들이 다수인가 하면 북한의 고급호텔을 드나들고 해외를 방문할 수 있는 소수의 고위층은 전 세계의 산해진미를 맛볼 수도 있다. 식량문제에 시달리는 국가지만 그만큼 빈부격차도 크기 마련이다. 북한에서도 출신성분이 좋은 집 자녀들은 요리학교에 진학한다니 계층 간 식문화의 차이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북한이라는 가까운 타자를 바라보는 남한의 관음증은 이 먹거리에도 닿아있다. 예를 들어 김정은의 건강 이상은 그가 스위스 유학 시절 접한 에멘탈 치즈 때문이라고 하거나. 얼마 전 귀순한 북한 병사의 뱃속에서 옥수수가 나왔을 때도 예외가 아니다. 그의 몸은 순식간에 남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강냉이죽으로 식단이 채워진 북한의 빈곤한 실상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었다.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인권침해가 되지 않으려면, 그의 몸에서 나온 옥수수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확인하는 것 이상으로 북한의 식량문제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저 선정적인 관음증에서 그쳤다. 옥수수가 나왔대, 여기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다. 이러한 관음증을 마치 사회적 시선인 양 둘러댈 뿐이었다.
얼마 전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로 남한에 1박 2일 머물렀던 현송월 단장이 주문한 아메리카노 커피에도 이렇게 저열한 언론의 관음증이 흘렀다. 믹스 커피가 아니라 아메리카노를 달라고 했다! 오, 북한 사람인데 아메리카노를 마시다니, 마치 이런 시선이다. 그의 패션을 따라가며 요리조리 뜯어서 평가하듯이 ‘아메리카노의 맛을 아는’ 북한 고위층 여자를 한껏 구경하는 시선으로 가득하다.
단체로 반공영화를 관람하고, 남파 간첩들의 소지품을 전리품처럼 진열한 현장을 방문하고, 거기에 휴전선과 멀지 않은 지역에 살았던 나는 주기적으로 삐라를 주우러 다니는 등 철저한 반공교육을 받고 자랐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 부르며 통일을 당연한 과제로 여기도록 교육 받기도 했다. 반공정신도 통일에 대한 당위도, 실은 내게 깊이 침투하지 않았다. 간첩들의 소지품 중에서 내가 기억하는 건 고무처럼 보이는 가볍고 유연한 재질로 만들어진 휴대용 밥그릇뿐이다.

이라영(예술사회학 연구자)
프랑스에서 예술사회학을 공부했다. 현재는 미국에 거주하며 예술과 정치에 대한 글쓰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은 책으로 『여자 사람, 여자』(전자책), 『환대받을 권리, 환대할 용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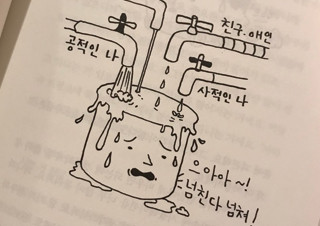


![[리뷰] 몸보다 오래 살아남은 기억에 관해](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09-2d5391b0.jpg)
![[큐레이션] 음식 안에 숨겨진 이야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2/20250227-a1edd852.png)
![[큐레이션] 자궁근종인의 식탁에는 고기가 없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2/20250213-acdded89.jpg)
![[리뷰] 멈추고 바라보는 연습](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1/20250123-0c8ad84b.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