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혼자 살고 있는, 살았던 사람들은 여행에서도 혼자가 편안하다. 외로운 것 말고, 편안한 것 말이다. 대학 이후 그 흔한 룸메이트도 없이 혼자만 살았던 나는 혼자가 아닌 여행을 떠날 때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곤 했다. “역시 혼자가 편하긴 편해.” 신경 쓸 사람 없이 원하는 대로 해도 상관 없던 내 일상이, 누군가와 조율을 하면서 생겨나는 이해 관계로 인해 방해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던 것 같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타인과 조율하는 방법을 잊고 있던 게다. 그런 내가 엄마와 파리로 여행을 떠났다. 단 둘이서.
이는 연인과의 여행과는 조금 다르다. 연인은 ‘연인이니까’ 잘 보이고 싶은 이성적인 감정이 밑바탕에 있는 여행이기에 상대에 맞추겠다는 전제가 늘 깔려 있다. 하지만 가족끼리는 ‘안이하다’는 태도가 기본적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 해 주겠지, 하는 안이함 말이다.
여행을 떠나 장시간 같이 있다 보면 조금의 불편은 생기기 마련이다. 형제 혹은 부모님과 여행을 떠난 주변 사람들이, "나 다음에는 혼자 갈거야" 하는 것만 들어보아도 가족과 여행을 떠난다는 건 생각보다 낭만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건, 당연히 같이 살던 그의 삶을 낯선 곳에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과 함께 그곳을 즐기고 싶어서이기도 하지만, 떠나는 길부터 잠드는 때까지, 온종일 함께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새로이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함께하는 여행은 그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별 생각 없이 가족이니까 안이하게 떠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벌써 세 번째다. 엄마와 둘이서 함께 유럽 행 비행기에 오른 것은. 6살, 16살, 26살의 내가 꼭 그만큼 10년씩 나이 들어가는 엄마와 떠났다. 6살의 나는 천진하고 똘망한 눈으로, 16살의 나는 사춘기 치기 어린 멋에 든 눈으로 엄마를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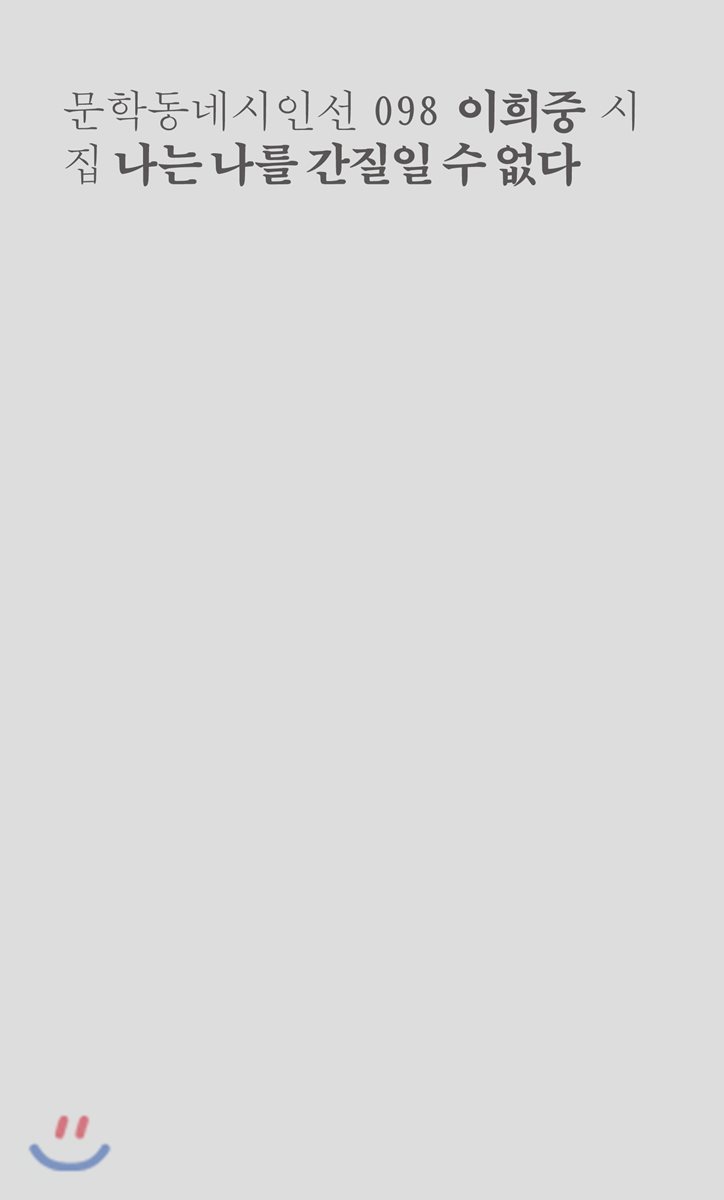 |
 |
그리고 지금 26살의 나는 내 나이에 나를 낳았을 엄마를 ‘엄마’가 아닌 한 사람으로 보고 싶었다. 나의 속 이야기도 들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더욱 이곳 저곳을 함께 하고 싶었고,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내 욕심이 과했는지, 내 생각과 페이스대로 짰던 여행은 엄마에게 꽤나 힘들었던 것 같았다. 미식의 나라 프랑스에 왔으니 미슐랭 레스토랑에도 가 보고, 개선문에 올라 야경도 보아야 하고, 현지인처럼 걷기도 해야 했다.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하는 딸과, “뭐 되는 대로”라며 그곳에 있는 그 자체를 즐기고 싶은 엄마의 여행. 의욕 넘치는 딸에게 엄마가 끌려 다니는 여행이 될 게 뻔했다. 딸의 손에 이끌려 걷다 지친 엄마가 끝내 말했다. “그냥 편하게 관광버스 타고 다니면 안돼?”
관광버스를 타는 것만은 하고 싶지 않았던 나였다. 엄마나 나나 파리는 세 번째였다. 관광버스는 파리가 처음인 여행자에게나 필요한 멋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여행 첫날 모녀는 관광버스를 타느냐 마느냐로 신경전을 벌였다. 몇 시간의 침묵이 흘렀다, 문득 몇 해 전 친구들과 파리에 왔었던 엄마의 사진이 기억났다. 지금보다 더 환하게 웃고 재미 있어 보였던 엄마의 얼굴. 엄마가 나보다 친구들과의 여행이 더욱 편안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과 왠지 모를 질투가 났다. 나와의 여행이 가장 행복한 파리로 남았으면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다음 날부터 관광버스에 올랐고, 엄마도 나도 서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함께 하려고 꽤나 노력했다.

생각보다 속 깊은 이야기들을 나눌 순 없었다. 우리가 사랑한 파리의 풍경에 빠져서이기도 했고, 모녀 사이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데엔 그다지 깊은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아서이기도 했다. 지금 바로 여기, 엄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했다. 그리고 내가 원했던 ‘엄마이기 이전의 엄마’는 별 말을 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다. 팔짱을 끼면서, 엄마의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같은 풍경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레.
엄마도 하고 싶은 게 많았을 한 여자였고, 한 사람이다. 그런 엄마가 가족들의 기호에 맞추느라 “뭐 되는 대로 좋은 대로”를 외치게 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집 센 딸과 함께 떠난 여행에서 원하는 걸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딸이니까 원하는 대로 해 주고자 했던 건 아니었는지. 엄마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 엄마는 앞으로 뭘 더 하고 싶은지 더 알고 싶어졌다. 누군가에게 조율하지 않은 엄마 본연의 모습을.
딸과의 여행에서 힘들기도 했을 엄마에게, 나는 이번 여행에서 엄마를 엄마가 아닌 한 여자로, 나와 다른 한 사람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진부한 변명을 해 보겠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함께 떠난 것이었다고.
그래서 말인데, 다음에는 어디로 떠날까, 엄마?
돌아올 확률이 아주 낮은 발길은 여행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를 이르는 말은 따로 있다. 우리가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구경하는 즐거움, 더 정확하게는 구경하는 편안함 때문이다. 이 구경에는 위로 누대에 걸친 담합의 혐의가 없지 않아 보이는, 지나친 의미 만들기가 있어왔으므로 우리는 아주 떳떳하게, 지긋지긋한 생활이란 것에서 도망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 (중략) 그러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서 자주 우리는 두 겹의 감정을 경험한다. 정든 정착지에 곧 닿게 된다는 안도감과, 방관과 회피의 시간이 곧 마감된다는 서운함이 그것이다. 서로 반대라고 해도 좋을 이 두 기분은 너무 안 섞이는 것이어서 우리에게 천착될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본질적으로 매혹의 감정이면서 경계의 감정이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흔한 이법을 확인하게 된다. 사람들이 돌아오기 위해 떠난다는 사실, 나아가 내 생활의 터를 다른 눈으로 새롭게 보고 싶어서, 조금이나마 일상에 낯설어지고 싶어서 떠난다는 사실을.
-이희중, 『나는 나를 간질일 수 없다』 中
-
나는 나를 간질일 수 없다이희중 저 | 문학동네
책 곳곳에 수포처럼 퍼져 있는 ‘~론시’부터 보시라. 삶의 해무를 걷어주는 그 누가 있다. 시인 이희중 얘기다.
나는 나를 간질일 수 없다
출판사 | 문학동네

이나영(도서 PD)
가끔 쓰고 가끔 읽는 게으름을 꿈꿔요.









![[더뮤지컬] <미세스 다웃파이어> 리디아, 어른의 조건을 묻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1/20251121-6158f2c7.jpg)
![[비움을 시작합니다] 네가 변해야 모든 게 변한다 ①](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21-ebeed89d.jpg)

![[둘이서] 김사월X이훤 – 마지막 편지](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1/20250131-bb9a96f0.jpg)




jem0131
2017.11.03
작가님께서 그 때는 어머님을 바라보는 감정이 또 어떻게 변해있을까요?
40대를 지내면서 엄마와 단 둘의 여행을 해보지 못 한 제 자신도 생각해보면서 저도 조만간 엄마와의 여행을 꿈꿔봅니다.
leesomi90
2017.11.03
엄마와의 또 다른 여행을 빠른 시일 내에 계획하시길!
함께하는 순간, 오늘을 충분히 사랑하며 살아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생각하면서 .... ^^
beni
2017.11.03
작가님 글을 읽으면서 이제는 다리가 온전치 못해 길 떠나지 못하는 나의 엄마가 생각나서 눈물납니다. 이제서야 나보다는 엄마의 입장에서 더 많은걸 챙겨줄수 있을 나이가 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