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칼럼은 최근 국가 부도 사태로 똥줄 타는 그리스 얘기다. 세상에, 그리스인들이 망할 줄은 몰랐다. 적어도 내가 십년 전에 받은 인상은 그랬다. 아테네 공항에서 택시를 타자마자 기사님이 운전을 너무 열심히 해 손잡이를 꽉 틀어쥐어야 할 지경이었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도 어찌나 급하게 걷는지 길을 물어보기 힘들었다. 수블라키(그리스식 숯불 꼬치구이)를 굽는 남자는 연기 속에서도 생생한 눈빛으로 여자에게 멘트를 날렸으며 그릭 요거트는 장(腸)안에서 아주 활발한 활동력을 보여 화장실을 찾아 뛰어야 했다. 내가 묵었던 싸구려 호텔의 침대 스프링도 스파르타식으로 강직해서 잘 때 자꾸만 튀어나올 정도였다.
내 느낌엔 성질 급하고 터프하고 일 열심히 하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였다. 오후에 낮잠 타임이 잠깐 있지만 땡 아침부터 깊은 밤까지 그들의 하루는 유쾌하고 활발했다. 만약 그리스인들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쭉 성실하고 똑똑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류 문명의 정치, 철학, 예술 등의 레벨이 한참 못생긴 지점에 뒤처져있을 것임에 틀림없지 않은가.
그런 나라가 망해가다니 뭔가 안타깝다. 경제 구조의 문제든, 양심에 털 난 탐욕자들의 탈세와 착복의 문제든, 과도한 복지비용의 문제든, 그리스 서민들이 처한 혼란과 고통을 보며 나 역시 마음 아프다. 카드 돌려막으며 사는 인생이고 남의 나라 걱정할 처지가 아니지만 내가 그리스를 꽤 좋아해서 감정이 이입된다. 일례로 여행 중에 파르테논 신전에 갔더니 슬랩스틱 개그를 맘껏 펼치기 좋게 되어있었다. 닳고 닳은 대리석 바닥이 미끄러워 몇 번이고 계속 자빠지면서 웃길 수 있었다. 그때부터 그리스가 참 마음에 들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산토리니의 이아 마을 절벽 계단을 오르는 당나귀들이었다. 원래 당나귀가 좀 불쌍하게 생겼지만 무거운 짐이나 관광객을 태우고 가파른 길을 오르는 표정이 몹시 힘겨워 보였다. 그걸 보며 꼭 착하게 살아야지 다짐했다. 다음 생이 있어서 그리스의 당나귀로 태어나면 곤란할 테니까.
얘기가 산으로 가니 얼른 음악 얘기로 넘어가겠다. 그리스 하면 일단 전설의 뮤지컬 <그리스>의 명곡 섬머 나이츠(Summer Nights)가 떠오른다. 영화 버전에 나온 존 트라볼타의 개다리춤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칼럼은 딱 이 곡이네 하고 써나갔다. 그러나 뮤지컬 그리스(Grease)는 우리말 발음 ‘구리스’ 즉, 헤어 스타일링 포마드 기름 얘기고 그리스(Greece)와는 상관이 없다는 걸 반쯤 쓰다 기억해냈다. 이것 참 뇌에 구리스를 좀 바르든지 술을 좀 줄이든지 해야겠다.
그렇다면 오늘 칼럼 소재 그리스에 대해 과연 무슨 음악을 소개팅 시키면 좋은가? 사실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 뮤지컬 <맘마미아>가 있는 것이다. 스웨덴 뮤지션 아바(ABBA)의 음악으로만 구성된 뮤지컬이지만 일단 배경이 그리스의 어느 작은 섬이니까.
나는 <맘마미아>를 뮤지컬의 성지 런던 웨스트엔드의 극장에서 봤다. 인생이 궁상맞고 불안하던 시절이었다. 돈이 모자라 가장 저렴한 표를 샀더니 맨 뒤에서도 가장 높은 곳이었다. 영국에선 극장의 그런 궁상맞은 자리를 코피 나는 구역(Nose Bleeding Section)라 불렀다. 설마 코피가 날까 했지만 상체를 숙이고 무대를 내려다보자 까마득해서 과연 코피가 날 것 같았다. 그렇지만 싸다는 매력이 비강의 혈관들을 꿋꿋이 견디게 했다. 공연이 시작되자 그리스 산토리니 섬의 까마득한 절벽 위에서 해안가를 내려다보는 듯한 기분이 들어 극의 배경에 이입하기 참 쉬웠다.

관람객들은 나이 지긋한 분들이 다수였다. 아바의 음악을 추억하기 좋은 세대이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아바를 잘 몰라서 예습을 좀 하고 갔었다. 낡고 촌스러운 반짝이 디스코 아닐까 걱정했지만 놀랍게도 펄펄 살아있고 유통기한이 영원할 음악들이어서 당장 팬이 되었다. 그래선지 한창 뮤지컬을 보다 <수퍼 트루퍼>가 나오는 장면에서 엉덩이가 움찔거렸고, 급기야 플롯의 클라이맥스에서 <댄싱 퀸>이 생 라이브로 터지며 극장 안을 강력한 열정으로 채우자 참을 수 없어 일어나 춤을 추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극장에 모인 대부분의 관객들이 벌떡 일어나 춤을 추었다. 높은 코피 구역에서는 위험한 춤인 자이브(Jive)를 뱅뱅 돌리는 노신사숙녀 커플을 보며 감명 받은 나는 존 트라볼타 식의 개다리춤을 췄다. <댄싱 퀸>은 암만 몸치라도 춤의 여왕으로 만드는 기묘한 마력적 코어를 가진 음악인 것이었다. 모두가 웃는 얼굴로 춤 출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음악이라니. 세상에 마약 말고 그런 게 또 있을까 싶다.
분위기에 압도되어 몸을 흔들다보니 내 삶을 짓누르던 궁상, 공포, 불안 따위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있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도 떠올랐다. 공들였던 광산의 철탑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며 “양고기가 타버리겠어.” 라고 말했던 여유만만 조르바. 망해 나가는 와중에 춤을 추며 처절함을 극복하려 한 그리스인 조르바. <맘마미아>의 스토리를 쓴 캐서린 존슨(Catherine Johnson)이 왜 그리스를 배경으로 삼았는지 알 것 같았다. 음악과 춤을 통한 위대한 극복. 그것이 자유로운 영혼 조르바의 메시지가 아니었던가.
2008년에 할리우드에서 만든 <맘마미아>에서도 <댄싱 퀸>을 부르는 장면에 무슨 인도영화를 방불케 하는 떼춤이 동원된다. 나는 정서적인 압박감을 느낄 때마다 이 음악을 들으며 영화 속의 아주머니들처럼 춤을 춘다. 춤이 해결책이 되지는 않지만 최소한 해결책을 만들 의지를 다시 만들어주는 건 분명하니까.
그리스가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멀리서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지만 그들이 조르바의 후예들이라면, 또한 영화 <300>으로 유명한 레오디나스 왕의 후예들이라면, 반드시 극복하리라 믿어본다. 안 되겠으면 아바의 음악을 열심히 들으면 된다. 나 역시 이번 달 카드 값 걱정에 소설 원고 부도 위기까지 겹쳐있어선지 쭉쭉 처졌는데 <댄싱 퀸>을 들으며 다시 용기를 내는 중이다. 아무튼 유서 깊고 아름다운 그리스 너 힘내라. 수블라키 먹으러 또 한 번 갈게. 파이팅.
끝으로 그리스를, 그리고 세상의 질서를 비극으로 만들 정도로 이성과 합리를 잃고 썩어빠진 일부 힘 센 탐욕자들이 인간성에 구리스를 좀 바르든지 다음 생에 산토리니 섬의 당나귀로 태어나면 좋겠다고 뜬금없이 빌며 오늘 칼럼을 마친다.
[관련 기사]
- 지하에서 우주로, 비틀즈 〈Across the universe〉
- 사랑에 빠지고 싶을 때
- 드레스덴 축제의 매혹적인 단조
- 공항에서 딱 떠오르는 노래, 거북이 〈비행기〉
- 후진 분위기를 경감시키는 감성 백신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박상 (소설가)
소설가. 장편소설 『15번 진짜 안 와』, 『말이 되냐』,『예테보리 쌍쌍바』와 소설집 『이원식 씨의 타격폼』을 냈다.






![[김해인의 만화절경] 너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1/20251110-fb1ac232.jpg)

![[더뮤지컬] 아찔한 곡예로 전하는 삶의 여정…태양의 서커스 <쿠자>](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0/20251017-bfb237a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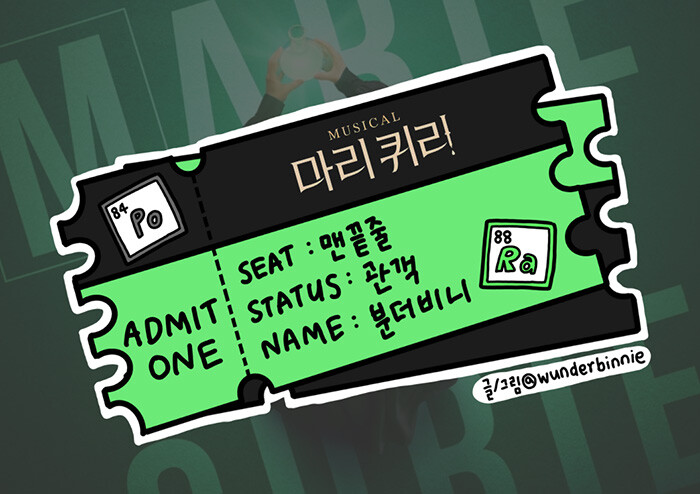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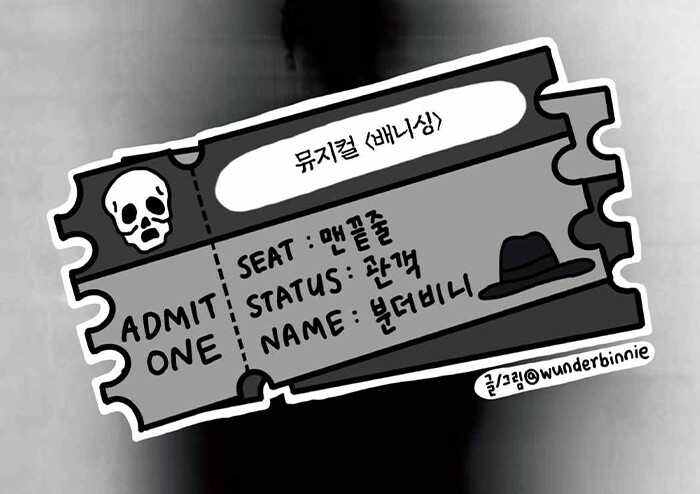






kokoko111
201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