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막 문장 슬프게 하기>는 내 친구 차도하 시인의 죽음 이후에 만든 수업이다. 당시에 나는 차도하의 첫 시집 『미래의 손』의 발문을 쓰고 있었다. 그 시집에 실린 시는 대부분 마지막 문장이 슬펐다.
*
마지막 문장 슬프게 하기
사랑하는 친구를 잃고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마지막은 어딘가에 내동댕이쳐지는 장면이 나오는 마지막이다. 주인공이나 화자가, 생명체나 무생물이, 어떤 감정이나 논리로부터 차분히 헤어지면서 끝나는 것이 좋다. 헤어지는 것이 내동댕이다. 나는 그래서 문학이 좋다. 마지막 문장이 있어서 무조건 헤어질 수밖에 없는. 뒤에 아무것도 없는. 마지막이 항상 비정하고 슬프기를 바란다. 영화로 치면 롱테이크가 이어지는 거다. 누가 멀리서 걸어온다. 3분의 2쯤 걸어왔을 때, 갑자기 걸어오던 사람이 사라진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주지 않고 갑자기 끝이라는 글자가 뜬다. 그걸 보던 사람은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화를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줬다. 이미 오랫동안 걸어왔다. 너무 오랫동안 걸어왔다.”
이번 수업에서는 마지막 부분이 슬픈 시를 씁니다. 제가 그런 시를 많이 써서, 인터넷에 제 이름을 쳐보다가 어떤 이름 모를 사람에게서 김승일은 마지막에 몇 줄 쓰려고 시를 쓴다는 평가도 받곤 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시의 마지막 부분이 슬프려면 앞에서 조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만 쓰는 수업은 아닙니다. 마지막이 슬픈 시인들의 시를 매주 읽어봅니다. 쓸 수 있으면 매주 시를 써 오고 합평을 합니다. 함께 읽을 시인들의 목록은 바뀔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17일에서 6월 12일까지 진행했던 수업
*
차도하가 내가 쓴 시를 좋아했다면(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의 시가 닮았기 때문일 것이다. 내 생각엔 말투가 닮았던 것 같다. 어쩌면 도하는 다음과 같이 말할지도 모른다. 아닌데요?
미안한 얘기지만 만약 네가 아니라고 대꾸한다면. 그 대답이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닮았는지를 증명한다고 생각해.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아닌데요” 밖에 없는 사람이거든. 충분하지 않은데요? 충분할 수 없는데요? 충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아닌데요? 아니면 좋겠는데요? 말이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떠들고 있거든요. 말이 될 때까지.
첫 행은 세계를 정말로 부정해야 한다. 누구도 한 번도 부정해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두 번째 행은 첫 행을 부정해야 한다. 10년 전에 쓴 일기를 마주한 사람처럼. 첫 행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두 번째 행에서 우리는 10년 전이라면 떠올릴 수 없었던 말을 떠올려야 한다. 그 말이 첫 행을 부정해야 한다. 첫 행과 두 번째 행 사이에 10년이,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 사이에 10년이 존재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그냥 그렇게 되곤 했다. 참을성이 없는 내가 기대해도 좋은 것은, 기약 없이 기다려도 좋은 것은, 언제나 다음 행의 나뿐이었다. 2010년 여름. 어느 시상식에서 어떤 시인이 내게 물었다. 어떻게 그런 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답했다. 첫 행을 두 번째 행이…… 완전히…… 아니라고 해요. 내 대답을 들은 그 시인은 실망했다. 그게 눈에 보였다. 그 뒤로는 언제 어디서 만나도,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럴 만했다. 당시의 나는 시가 뭔지 몰라서 불안했으니까. 정말 끊임없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으니까.
이제 나는 꽤 오래 시를 쓴 사람이 되었다. 시 쓰기를 가르치기도 오래 가르쳤다. 이제 나는 시를 쓸 때마다 매번 시가 뭔지 생각한다. 학생들에게도 알려준다. 이번에 쓸 글이 왜 시인지 생각해 보세요. 항상 무엇을 어떻게 써야 시가 되는지 고민하세요. 정답은 없어요. 그냥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부러지거든요. 하던 대로만 하게 되거든요. 시 쓰기 수업은 유연해지기 위한 수업이에요. 유연해지면 계속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 썼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학생들에게 하나만 알려줘야 한다면. 나는 내가 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불안 속에서 동아줄처럼 잡고 있었던 단 하나의 방법. 첫 행을, 두 번째 행을 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하나도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어쩌면 도움이 되는 조언도 아닐 것 같은데. 내가 기억을 잃어도, 내가 내가 아니게 돼도, 나는 계속 아닌데요, 아닌데요, 그런 말을 할 것 같아. 그렇게 행이 행을 계속 부정하다가. 화자가 화자를 부정하다가. 부정하는 자기 자신이 부정되는 것이 슬픈 마지막 문장이다.
인간은 모두 죽음에 부정된다. 하지만 시에서는 화자가 죽어도 화자가 쉽게 부정되지 않는다. 화자는 원래 대부분 죽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제로 죽는 것도 아니니까. 그건 그냥 가상의 소원 성취이다. 화자가 더는 부정하는 일을 못 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 말문이 막히는 것. 끝에 다다르는 것. 슬픈 마지막 문장에 당도한 화자는 더 이상 시인이 아니다. 슬픈 마지막 문장은 멋진 말도, 감정에 호소하는 말도 아니다.
차도하의 시 「구현되지 않은 슬픔」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다. “이해해요. 당신의 슬픔을 이해해요./사람들이 돌림노래처럼 정해진 음정으로 서로의 슬픔을 다독여주는 동안//루비는 더러운 곳으로/더 더러운 곳으로//사람은 갈 수 없는 지하로//어떤 사람이 일하고 있는 지하로 쏟아져 내렸다.” 루비는 슬픔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의심하며, 스스로를 파괴하고 부정한다.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으로 쏟아져 내린다. 상상을 넘어서는 더러운 곳으로 간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일하고 있다. 그 사람 앞에서 루비는 더 이상 시인이 아니다. 일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루비는 그 사람도, 자기 자신도 더는 부정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말이 사라진 것이다. 마지막 문장은 차도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든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을 때 차도하는 비로소 자유롭다. 하지만 자기가 자유로운지도 모른다. 슬프다.
도하야 우리는 거기까지 쓰지 않으면 멈출 수 없었다. 마지막 문장 슬프게 하기는 쓸 수 없게 될 때까지 쓰는 수업이다.
* AI 학습 데이터 활용 금지
미래의 손
출판사 | 봄날의책

김승일
2009년 현대문학 신인추천으로 데뷔. 시집으로 『에듀케이션』, 『여기까지 인용하세요』, 『항상 조금 추운 극장』, 산문집으로 『지옥보다 더 아래』가 있다. 2016년 현대시학 작품상. 2024년 박인환 문학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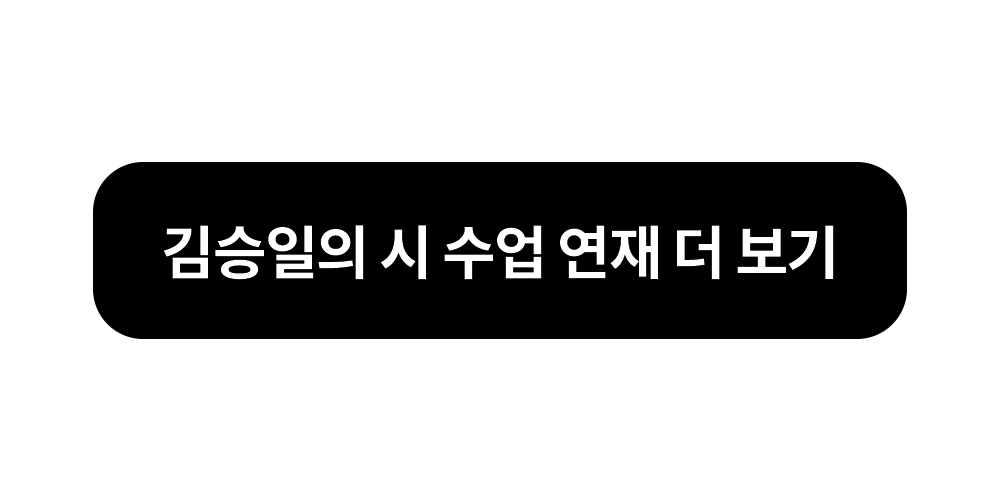
![[김승일의 시 수업] 서간체로 시 쓰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25-2e229c91.png)

![[에디터의 장바구니] 『노가다가 아닌 노동자로 삽니다』부터 『절대 진공 & 상상된 위대함』까지](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5/20250512-0311a97d.jpg)
![[송섬별 칼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몽땅 ①](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5/20250507-df966cd9.png)
![[김승일의 시 수업] 에필로그로서의 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30-218f8487.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