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려령 작가
김려령 작가
때론 별것 아닌 인사말이 밑바닥에 가라앉은 허전하고 외로운 마음을 건져 올리는 연대의 그물이 되어 주기도 한다. 사람의 관계와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따뜻한 시선으로 동화에서 소설까지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독자층의 사랑을 받아 온 작가 김려령이, 진한 안부를 건네는 이야기 『모두의 연수』로 독자들을 찾아왔다. 오래된 명도단 골목을 제집처럼 누비는 열다섯 여자아이. 거기에 꼭 있을 것만 같은 대흥슈퍼의 문을 활짝 열면, 연수가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건넬 것만 같다. 부모가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보호자가 많은 아이. 상상만 해도 아찔한 슬픔인데, 왜 연수를 보면 부러움 같은 감정이 슬며시 솟아오르는 걸까?
청소년 장편 소설로는 정말 오랜만에 독자들을 찾아와 주신 것 같아요. 이 이야기의 씨앗이 궁금합니다.
『가시고백』 이후로 11년 만에 발표하는 청소년 장편 소설입니다. 초고는 꽤 오래전에 바로 완성했는데, 고치고 다듬는 과정이 길었습니다. 상처에 못이 박힌 아이. 상처도 내가 낸 것이 아닌데, 못도 내 실수로 박힌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픔을 이겨내야 할 사람은 정작 나입니다. 바로 이 아이, 즉 연수가 이 소설의 씨앗이었습니다.
명도단 골목과 그 안의 사람들의 모습이 생생해서 정말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명도단'이란 장소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나요?
몇 년 전에 지방 항구 도시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도착한 첫날 저녁을 한 변두리 맛집으로 정했는데, 여덟 시 겨우 됐음에도 가게 대부분이 문을 닫아 무척 어둡고 한산했습니다.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두고, 밝은 낮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무서워서 걸음을 재촉했던 밤길과는 달리 구석구석 둘러보고 싶은 활기찬 지역이었습니다. 대로변의 오래된 작은 슈퍼, 안에 계시던 두 어르신, 가운데 놓인 탁자. 그 슈퍼를 중심으로 가상의 '명도단'을 구상했습니다. 실재에 가상을 올렸기 때문에 아마 더 생생하게 느껴진 듯합니다.
연수의 탄생을 상상해 보면, 정말 아픔의 한가운데 있을 것만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책을 읽다 보면 연수가 부럽게 느껴지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연수는 어떤 아이일까요?
연수가 부럽게 느껴진 건, 연수를 둘러싼 환경 때문이었을 겁니다. 함께 보듬으면서 끊임없이 호명해주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가 곁에 있으니까요. 대화가 없는 집, 말없이 스치기만 하는 이웃, 서로 관심 없는 냉랭한 또래 집단. 만일 연수가 이런 환경에 놓였었다면, 홀로 자신의 아픔에만 천착해 무척 외로웠을 것입니다. 명도단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네 곁에는 우리가 있다, 라는 따뜻한 울타리를 제공해 준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연수는 상처는 품었으나 상처에 억눌리지는 않은 아이로 자랐죠. 연수의 타고난 기질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 때문이든 기질 때문이든, 저도 이런 연수가 멋지고 부럽기는 합니다.
비싼 걸 사지 못하고 자꾸 어설픈 빙수기를 사서 실패하는 연수 이모의 모습이 정말 공감되었는데요. 그 장면에서 자격지심과 거지 근성을 빗댄 지점이 너무 절묘했어요. 우리 인생에서 둘 중에 어떤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치사하지만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떤 것을 취하거나, 제아무리 좋은 기회일지라도 과감하게 걷어차야 할 때도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는 영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렇게 행동해야만 하는 개인의 사정이나 삶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속사정은 본인만 알죠. 중요한 건 스스로 당당하였는가, 입니다. 그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보다는, 마주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삶은 늘 결정의 연속에서 지탱되는 것이니까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로부터 이미 아픔이 있는 연수에게 닥친 일이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 사건을 겪어내는 연수 가족을 통해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셨을까요?
당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전혀. 보란 듯이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아낌의 속살'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아낌에도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겉으로 확 드러나는 아낌과 뭉근하게 챙겨주는 아낌, 그리고 꼭 드러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내면 깊숙한 아낌. 이 아낌의 속을 채우는 건 결국 애정입니다. 특히, 저 속 깊은 아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희로애락을 함께 하면서 층층이 쌓인 두터운 애정입니다. 상대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속정, 혹은 사랑, 이것을 아낌의 속살로 표현했습니다.
'보호자'라는 말이 주는 위안과 위로가 이렇게 큰 것인지 몰랐습니다. 연수 이야기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독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연대입니다. 야속한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마저도 덜 외롭게 헤쳐 나가려면 가끔은 기댈 수 있는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것, 그것이 연대입니다. 아이 하나가 크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경구가 있습니다. 이웃이라는 연대의 울타리죠. 명도단의 그들처럼 혼자 두지 마세요. 혼자 있지 마세요. 아이든 어른이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십시오. 홀로 버티는 것도 삶의 한 모습이겠으나, 이왕이면 함께 사는 세상이 더 낫습니다.
*김려령 마해송문학상과 문학동네 어린이문학상, 창비청소년문학상을 석권하며 2008년 가장 주목해야 할 거물급 신인의 등장을 알린 작가. 진지한 주제 의식을 놓지 않으면서도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필력이 단연 돋보인다. |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출판사 제공
출판사에서 제공한 자료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채널예스>에만 보내주시는 자료를 토대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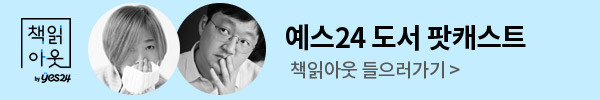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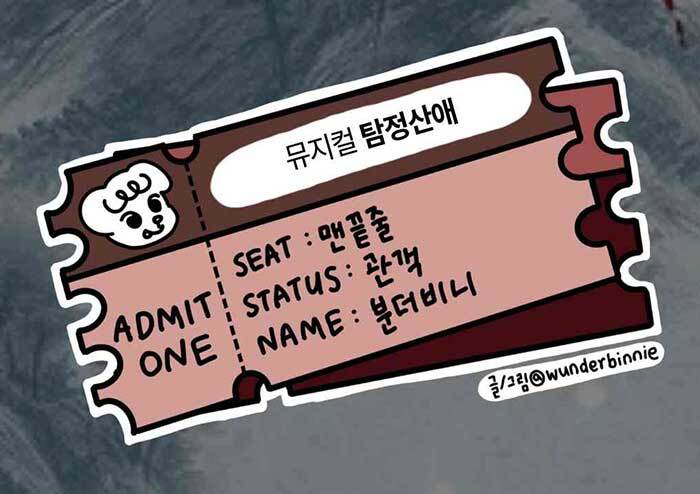

![[큐레이션] 새해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1/20250117-f231ede7.pn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