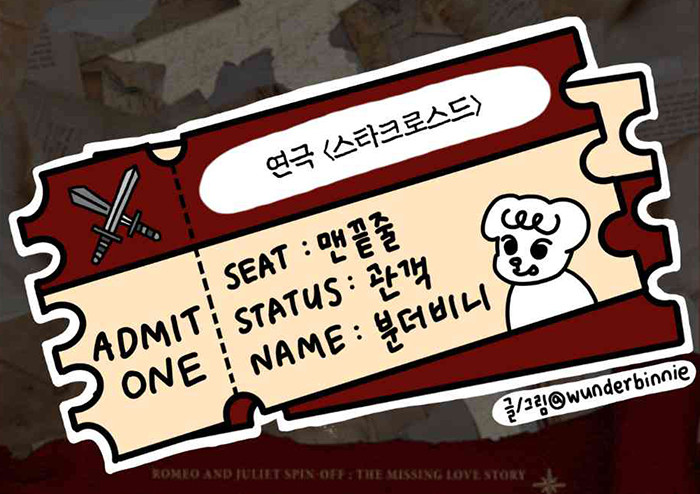『당신이 살았던 날들』의 원제목은 'Vivre avec nos morts', 한국어로는 ‘우리의 죽은 이들과 함께 살기’ 정도로 옮길 수 있지요. 랍비인 저자는 많은 날들을 죽은 이들을 배웅하고, 남은 이들을 위로하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삶의 어느 한순간, 상실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한 책을 썼지요.
‘죽음과 동반하기’
델핀 오르빌뢰르는 고인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자신의 일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오로지 죽음과 함께할 때라야 더 강렬하게 와닿는 삶의 본질이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이는 단순히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살아 있음에 안도하게 되는 마음과는 다릅니다. 그보다는 우리의 삶이 죽음에 빚지지 않고서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깨달음에 가깝지요. 죽음 앞에서도 “레하임LeH’ayim”(삶을 위하여!)을 외치는 유대인들은 어쩌면 바로 그 점을 의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떠난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남긴 흔적은 무엇일까? 그들이 이룩한 것이나 반대로 그들이 실현할 수 없었던 것 가운데 어떤 흔적이 우리에게 남았을까? 우리가 지나갈 뿐인 이 땅에 우리 또한 무엇을 남기게 될까?”
이 책은 ‘죽음에 관한 책’이지만, 한때 주목을 받았던 ‘웰 다잉well-dying’, 말하자면 아름답고 평화롭게 삶을 마무리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은 아닙니다. 오르빌뢰르는 마치 든든한 묘지기처럼 무덤가에 앉아 우리에게 자신이 한때 동반했던 죽음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고인이 생전 남기고 간 삶의 흔적들을 따라가는 긴 여정 속에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사람들이 가진 회한과 슬픔, 죄책감과 두려움을 다독이지요.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죽음이라는 입구로 들어간 이야기가 삶이라는 출구로 빠져나오는 듯한 기묘한 감각에 휩싸입니다.
“히브리어로 유령은 ‘루아흐 레파임rouaH’ refaïm’이라고 불린다. 문자 그대로 ‘늘어진 영혼’, 올 풀린 영혼을 의미한다. 유령은 그들의 너덜너덜 해어진 이야기의 흔적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다. 그들은 풀려버린 올이 뜯겨나가기를,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손봐주기를 기다린다.”
각각의 장은 우리가 모르는 이들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생판 모르거나, 알더라도 글이나 방송에서 한두 번 가볍게 스쳐지나갔을 이름들이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낯선 죽음들은 우리의 기억 속을 비집고 들어와 말을 건넵니다. “여기에 이제 없는 이들을 기억하라”라고요. 아무런 예고 없이 들이닥친 이별에 슬픔조차 느낄 새 없던 시간, 세상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것 같은 감각에 휩싸였던 날들, 누군가를 향해 건넨 위로의 말이 오히려 부끄러움으로 남았던 기억들까지…….

유대인들은 무덤을 꽃으로 장식하는 대신 작은 조약돌을 무덤 위에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시드는 꽃과 달리, 조약돌은 무덤가에 머무르며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아마도 그 의미를 가장 강렬한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은 영화 〈쉰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일 겁니다. 이스라엘에 안치된 독일 기업인의 무덤 뒤로 줄이 길게 늘어서 있고, 거기엔 실제 ‘쉰들러 리스트’ 덕에 목숨을 구한 유대인들, 그들의 후손들이 그들을 연기한 배우들과 뒤섞여 있지요. 그들 손에는 저마다 작은 조약돌이 있고, 그 조약돌이 무덤 위에 하나둘 쌓여갑니다. 『당신이 살았던 날들』을 읽는다는 건, 어쩌면 이 작은 조약돌 하나하나를 들추고, 닦고,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델핀 오르빌뢰르의 『당신이 살았던 날들』을 편집하며 내내 귓가에 맴돌았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날들의
열에 하나만 기억해줄래
우리가 아파했던 날은 모두
나 혼자 기억할게
혹시 힘든 일이 있다면
모두 잊어줘 다 나의 몫이지만
듣고 싶은 말이 남았다면
네가 했던 말 다 너에게 줄게
우리가 살아 있던 날들의
열에 하나만 기억해줄래
우리가 아파했던 날은 모두
나 혼자 기억할게
_브로콜리 너마저 '1/10' 가사 중
먹먹한 마음으로 책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마치 지금까지 읽은 이야기들이 이 노래에 대한 ‘답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함께했던 날의 열에 하나만이라도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이에게, 그 기억을 기꺼이 우리의 삶 안에 품고 살아가겠다는 다짐. 당신이 나에게 건네준 말들이 한 올의 실이 되어, ‘미도르 레도르(대대손손)’이어지는 거대한 태피스트리가 되어가는 상상. 『당신이 살았던 날들』은 그렇게 떠난 이의 말과 남은 이의 기억이 만들어낸 이야기로 죽음과 삶 사이 깊은 간극을 메웁니다.
“우리가 튼튼하게 세운 모든 것이 결국 마모되거나 사라질 때, 약하고 일시적이며 빈틈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세상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긴다. 지나간 존재의 입김은 증발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숨을 불어넣고, 우리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데려간다.”
이 책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사람들에게 섣부른 위로를 건네지 않습니다. 슬픔을 털고 일어나라고 말하기보다, 그 슬픔의 의미를 곱씹게 하지요. 언젠가 불쑥, 우리 삶을 비집고 들어올 상실의 시간을 위해 델핀 오르빌뢰르의 『당신이 살았던 날들』 속 이야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당신이 살았던 날들
출판사 | 북하우스

신원제(북하우스 편집자)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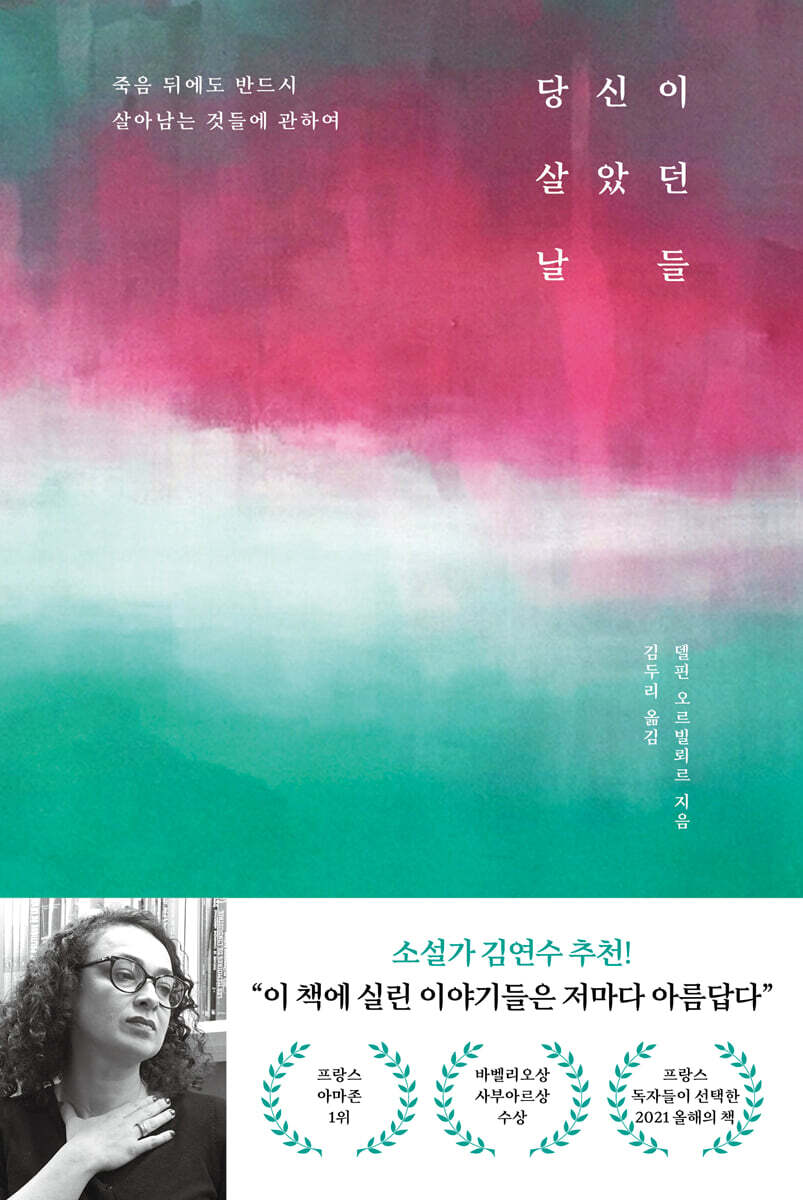





![[김미래의 만화 절경] 더께 밑의 우리, 더께 너머의 우리](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30-d1bcfc3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