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_imagetoday
오래 전 일입니다. 병원에 스위스 아이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여행 중인데 열이 아주 심했습니다. 진찰해보니 목 속이 벌겋게 부어있었습니다. 먹기도 그런대로 먹고, 열이 없으면 잘 논다고 하기에 감기라고 설명하고 해열제만 줘서 보냈습니다. 이틀 후에 다시 찾아 왔는데 여전히 열이 심했습니다. 목을 보니 양쪽 편도가 서로 닿을 정도로 부어있었습니다. 세균 감염일 수 있고, 아이도 힘들어 하니 항생제를 쓰자고 했지만, 부모는 좀 더 지켜보기를 원했습니다. 심해지면 합병증도 생길 수 있고, 나중에 더 심각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지만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5일째에도 여전히 고열이 났습니다. 부모가 양해한다지만 진료의 책임은 의사한테 있는 것이니 슬슬 걱정이 됐습니다. 부모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니 좀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러나 7일째, 마침내 아이의 열이 뚝 떨어지며 온몸에 발진이 돋았습니다. 돌발진이라는 병이었습니다. 항생제가 필요 없는 바이러스 질환이었던 거죠.
폐렴구균이란 균이 있습니다. 폐렴과 중이염의 주 원인균입니다. 페니실린으로 치료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항생제 내성이 늘어납니다. 몇 년 전에 각국의 폐렴구균 내성을 조사했더니 미국은 51.8퍼센트가 페니실린에 내성을 보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내성이 80%에 육박합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선 중이염에 페니실린이 무용지물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필요 이상으로 항생제를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수치입니다. 내성률이 7.4퍼센트에 불과합니다. 페니실린만 써도 치료가 잘 된다는 얘기지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노르웨이에서는 중이염에 “항생제를 최소한으로 쓴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쓴다”가 답입니다. 노르웨이 의사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이염입니다. 저절로 낫는 경우가 많으니 일단 해열제만 먹이며 지켜봅시다. 하지만 일부에서 뇌수막염이나 중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니 이틀 동안 아이를 잘 봐야 합니다. 그 사이에 열이 너무 심해서 많이 보채거나, 거의 먹지 못하거나, 토하거나, 심한 두통이 생기면 바로 데려오세요.”
중이염은 대부분 세균성 질환입니다. 하지만 세균성 질환이라고 반드시 항생제를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둬도 3분의 2 정도는 우리 면역계가 이겨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항생제를 쓰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의사들은 부도덕한 걸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나머지 3분의 1에선 중이염이 만성화되어 청력에 이상이 생기거나, 귀 주변의 뼈 또는 뇌까지 침범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항생제가 개발되기 전에는 중이염으로 죽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세균성 뇌수막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중이염이었지요. 만일 중이염에 항생제를 쓰지 않았다가 뇌수막염이 생겨 아이가 입원하거나 위독해진다면? 미국 같으면 거액 소송감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그 의사는 더 이상 병원하기 힘들 겁니다. 물론 우리는 다음 날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바로 다른 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농담도 있습니다만… 그럼 노르웨이 아이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자주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의사의 설명을 잘 듣고 아이가 증상이 나빠지면 즉시 병원에 데리고 오기 때문입니다.
우린 남의 욕을 잘하지요. 시원하게 욕을 하고 모욕을 줘야 자기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항생제 얘기가 나오면 즉시 의사들이 항생제를 남용해서 그렇다는 기사가 뜹니다. “감기는 바이러스 질환이라 항생제가 듣지 않는데도 병의원의 44.4퍼센트가 감기에 항생제를 사용”한다고 꾸짖습니다. 물론 공부도 안 하고 무능하여 감기든 뭐든 무조건 항생제를 처방하는 의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약회사의 리베이트가 근절되었다지만 어떤 형태로든 마케팅도 할 겁니다. 그러나 의료계의 무능과 자본의 부도덕함을 냉소하고 개탄하는 데서 그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욕할 대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의사를 욕해도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으니 이제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봅시다.
노르웨이처럼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의사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왜 당장 항생제를 쓰지 않아도 되는지, 어떤 증상이 있으면 바로 데려와야 하는지를 충분히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부모들이 얼마나 똑똑한지는 몰라도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교육 수준을 자랑하는 국가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친절하고 꼼꼼하게 설명한다면 우리 부모들이 못 알아들을 리 없습니다.
둘째, 아이가 아플 때 부모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아이를 돌보는 시설에서 부모처럼 꼼꼼히 아이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의료제도의 문제고, 둘째는 사회제도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제도의 문제이기 전에 사회적 신뢰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바로 좋아지지 않아도 의사를 믿고 기다리는 곳에서는 교과서대로 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에 대한 불신과 증오가 심하고, 수가가 너무 낮아 환자를 많이 봐야만 병원을 유지할 수 있는데 치료가 조금만 길어져도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가버린다면 의사는 항생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수가를 올리는 대신 충분한 진료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의사가 설명을 많이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의사가 설명을 많이 하면 환자의 지식 수준도 올라가지만 의사도 공부를 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습니다. 결국 사회의 지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가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사회가 되고 의료비도 줄어듭니다. 위에서 예로 든 스위스 아이도 부모가 충분한 의학적 지식을 갖고 의사에게 당신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항생제를 쓰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바쁘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믿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 많은 의사를 싫어합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설명 잘 해주는 의사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설명이 조금 길어지면 거의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는 겁니다. 직장에서 눈치 봐가며 겨우 아이를 병원에 데려올 시간을 냈으니 빨리 약을 받아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이를 이틀 동안 잘 관찰하라고요? 그랬다간 바로 잘리겠죠. 하지만 자식이 아프고 열이 펄펄 나는데 고작 이틀을 옆에서 돌보지 못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걸까요? 결국 이 문제는 의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안 된다고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멀쩡한 강물에 수십 조를 퍼붓고, 남의 나라에 가서 쓸모 없는 광산을 사는 데 수십 조를 쓸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일개 무당 딸이 수조 원을 꿀꺽하는데 왜 우리는 항상 뭔가에 쫓기며 살아야 합니까?
?

강병철(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꿈꿀자유 서울의학서적 대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소아과 전문의가 되었다. 2005년 영국 왕립소아과학회의 ‘베이직 스페셜리스트Basic Specialist’ 자격을 취득했다. 현재 캐나다 밴쿠버에 거주하며 번역가이자 출판인으로 살고 있다. 도서출판 꿈꿀자유 서울의학서적의 대표이기도 하다. 옮긴 책으로 《원전, 죽음의 유혹》《살인단백질 이야기》《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때》《존스 홉킨스도 위험한 병원이었다》《제약회사들은 어떻게 우리 주머니를 털었나?》 등이 있다.









![[작지만 선명한] 군산의 작은 만화 출판사, 삐약삐약북스의 책](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0/20251030-ff67c20f.jpg)
![[김해인의 만화절경] 절박한 사랑의 고백, 입시만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0/20251013-ae1a35af.jpg)
![[윤경희 칼럼] 인 메디아스 레스 Ⅰ (사건의 한가운데서 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21-361c6026.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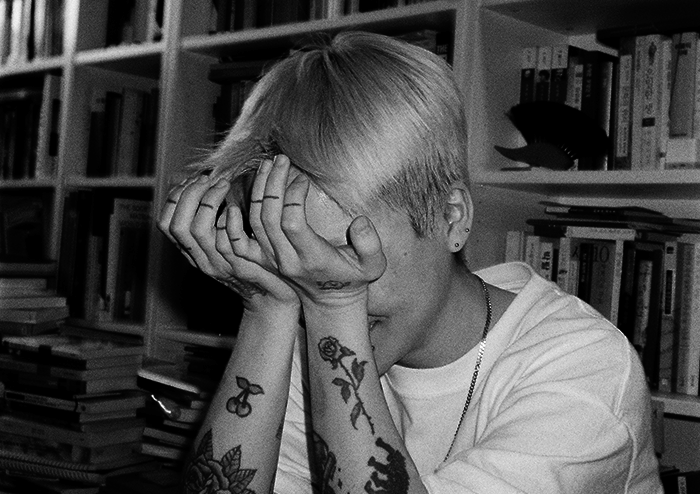



snowyevening
2017.04.03
abraxas01
2017.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