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크 버그, 아날로그 사운드의 매력으로 2010년대를 공략하다
1년의 공백기를 지나 다소 빠르게 발표된 제이크 버그의 신보, 함께 만나보세요.
2013.12.12
제이크 버그(Jake Bugg)
「Slumville sunrise」 와 「What doesn't kill you」 는 상당히 흥미롭다. 음반의 시작을 여는 「There's a beast and we all feed it」 도 이 시점에서 함께 언급할 만하나 곡의 길이도 짧을 뿐더러 질감으로 따지자면 전작에 더 가깝기에 변화의 성향을 맛보는 정도에만 의미를 두어야겠다. 그런 연유로 본격적인 출발은 「Slumville sunrise」 와 「What doesn't kill you」 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다가오는 인상은 일렉 기타를 잘 다룬다는 점이다. 단순하게 연주의 능력에만 잠깐 머물고 지나치면 안 될 것이, 악기를 달리 잡았다는 차원에만 그치는 모습이 아니라 로킹하게 몰고나가는 전체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데에 역량을 드러내고 있다. 덕분에 「Slumville sunrise」 는 완벽한 포크 록이 되었으며 「What doesn't kill you」 는 1960년대 개러지 록의 환생으로 다가왔고 중반부의 「All your reasons」 와 「Kingpin」 은 멋들어진 록 넘버로 음반을 대표하는 자리에 위치한다.
일렉 기타는 어색하지 않다. 오히려 예상했던 일이다. 거칠어진 사운드에 난색을 표하는 시각들도 여럿 있으나 갈아놓는다면 더 갈아놓지, 날을 보여 놓고는 구태여 수줍게 내민다면 그 꼴에야말로 가치는 더더욱 없다. 그런 점에 있어 원초적인 사운드를 지향하는 프로듀서 릭 루빈과의 협업도 꽤나 괜찮은 일이라 생각한다. 허나 이를 어떤 대단한 혁신이나 변화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아티스트의 성향이나 지향점이 분명하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이처럼 방향이 확고한 경우, 다음 궤적을 계산하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다. 스타일의 차이라면 모를까 본질로부터의 변동이라는 쪽으로 해석하다면 다소 곤란하다.
과거를 건드리는 아티스트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위험부담이 따른다. 이들을 향한 기대치가 도달해 있는 곳은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위에 자리한 재해석라는 위치다. 물론, 재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제이크 버그가 구현하는 사운드는 훌륭하다. 포크도 좋고 컨트리도 좋고, 로큰롤과 블루스도 좋게 빠지는 형상이다. 「Me and you」 나 「Pine trees」 와 같은 트랙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송라이터로서의 역량 역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를 증명하는 작업은 전작에서 일찌감치 완료됐다. 2010년대라는 시대 속에서 1960년대를 풀어낼 것이냐는 새로운 과제에 이번 앨범의 관건이 달려있었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아쉽다.
충격을 매번 바란다면야 이는 향유자가 범하는 횡포겠지만, 사과를 덧붙이며 책임을 조금 면피해보고자 한다. 데뷔의 순간이 워낙 강렬했다. 소포모어 징크스랄 것도 없다. 이 정도면 사실 훌륭하다. 다만 일렉 기타로 바꿔 들고 나온 것만으로는 채 만족할 수 없다. 이를 또 다른 새로움이라 칭하겠다면 뉴포트 포크 페스티벌에 올라선 1965년의 밥 딜런에게나 가능할 일이지, 2013년의 제이크 버그에게는 다른 새로움이 적용되어야 하겠다. 결국, 전작의 연속이고 클리셰의 재생산이다. 1년만이라는 짧은 공백기가 이 지점에서 오히려 독이 됐을지도 모르겠다. 왕성함이라기보다는 조급함에 더 가까운, 허전함을 동반한 재출발을 남겼다.
[관련 기사]
-밴드의 이름을 내 건 새로운 출발 - 파라모어, 제이크 버그, 루시아
-음악의 본류를 찾아가다 - 존 메이어(John Mayer)
-그는 어떻게 그래미의 남자가 되었나 - 존 메이어(John Mayer)
-반전 음악의 표상이 된 작품 - 밥 딜런(Bob Dylan)
-제이슨 므라즈, “한국 팬들을 염두에 두고 곡 썼다”
 |
일렉 기타는 어색하지 않다. 오히려 예상했던 일이다. 거칠어진 사운드에 난색을 표하는 시각들도 여럿 있으나 갈아놓는다면 더 갈아놓지, 날을 보여 놓고는 구태여 수줍게 내민다면 그 꼴에야말로 가치는 더더욱 없다. 그런 점에 있어 원초적인 사운드를 지향하는 프로듀서 릭 루빈과의 협업도 꽤나 괜찮은 일이라 생각한다. 허나 이를 어떤 대단한 혁신이나 변화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아티스트의 성향이나 지향점이 분명하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이처럼 방향이 확고한 경우, 다음 궤적을 계산하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다. 스타일의 차이라면 모를까 본질로부터의 변동이라는 쪽으로 해석하다면 다소 곤란하다.
과거를 건드리는 아티스트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위험부담이 따른다. 이들을 향한 기대치가 도달해 있는 곳은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위에 자리한 재해석라는 위치다. 물론, 재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제이크 버그가 구현하는 사운드는 훌륭하다. 포크도 좋고 컨트리도 좋고, 로큰롤과 블루스도 좋게 빠지는 형상이다. 「Me and you」 나 「Pine trees」 와 같은 트랙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송라이터로서의 역량 역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를 증명하는 작업은 전작에서 일찌감치 완료됐다. 2010년대라는 시대 속에서 1960년대를 풀어낼 것이냐는 새로운 과제에 이번 앨범의 관건이 달려있었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아쉽다.
충격을 매번 바란다면야 이는 향유자가 범하는 횡포겠지만, 사과를 덧붙이며 책임을 조금 면피해보고자 한다. 데뷔의 순간이 워낙 강렬했다. 소포모어 징크스랄 것도 없다. 이 정도면 사실 훌륭하다. 다만 일렉 기타로 바꿔 들고 나온 것만으로는 채 만족할 수 없다. 이를 또 다른 새로움이라 칭하겠다면 뉴포트 포크 페스티벌에 올라선 1965년의 밥 딜런에게나 가능할 일이지, 2013년의 제이크 버그에게는 다른 새로움이 적용되어야 하겠다. 결국, 전작의 연속이고 클리셰의 재생산이다. 1년만이라는 짧은 공백기가 이 지점에서 오히려 독이 됐을지도 모르겠다. 왕성함이라기보다는 조급함에 더 가까운, 허전함을 동반한 재출발을 남겼다.
글/ 이수호 (howard19@naver.com)
[관련 기사]
-밴드의 이름을 내 건 새로운 출발 - 파라모어, 제이크 버그, 루시아
-음악의 본류를 찾아가다 - 존 메이어(John Mayer)
-그는 어떻게 그래미의 남자가 되었나 - 존 메이어(John Mayer)
-반전 음악의 표상이 된 작품 - 밥 딜런(Bob Dylan)
-제이슨 므라즈, “한국 팬들을 염두에 두고 곡 썼다”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0개의 댓글
추천 기사
추천 상품
필자

이즘
이즘(www.izm.co.kr)은 음악 평론가 임진모를 주축으로 운영되는 대중음악 웹진이다. 2001년 8월에 오픈한 이래로 매주 가요, 팝, 영화음악에 대한 리뷰를 게재해 오고 있다. 초기에는 한국의 ‘올뮤직가이드’를 목표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힘썼으나 지금은 인터뷰와 리뷰 중심의 웹진에 비중을 두고 있다. 풍부한 자료가 구비된 음악 라이브러리와 필자 개개인의 관점이 살아 있는 비평 사이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미술 전시] 두 거장](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11-3322cc2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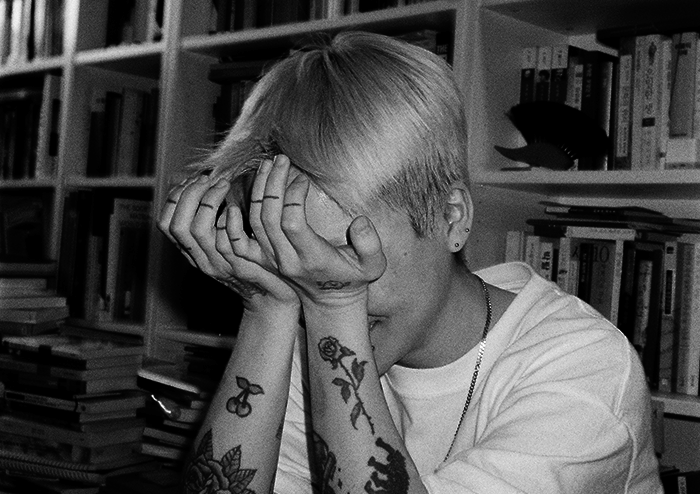
![[리뷰] 미키를 난민으로, 우주선을 보트로 읽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3/20250305-ab7602c8.jpg)
![[클래식] 미니멀리즘, 네오클래식 음악을 아시나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1/20241129-8817a94f.jpg)




